철학과 굴뚝청소부, 제6부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 : 근대 너머의 철학을 위하여 - 6. 들뢰즈와 가타리 : 차이의 철학에서 노마디즘으로, 기계주의
기계주의
반복하자면, 노마디즘에서 결정적인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 즉 새로운 차이를 만드는 것이고, 새로운 변이를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를 긍정하라고 요구하는 차이의 철학에 잇닿아 있다는 걸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특정한 양상의 계열화가 반복될 때 배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 역시 들뢰즈가 말하는 반복의 개념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 배치라는 개념이 언제나 탈영토화의 첨점이라는 차이화의 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반복이 ‘구조’와 달리 차이에 대해 열려 있고 차이의 개념이 작동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들뢰즈가 말하는 사건의 철학, 탈주의 철학, 노마디즘 등은 모두 그가 말하는 차이의 철학이 다른 양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들이 『차이와 반복』에서 제시된 차이의 철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중요한 차이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의 반복’이며 ‘차이화하는 반복’임을 덧붙여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골격을 짜고 있는 문제설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해볼까 합니다(주체, 대상, 진리의 세 항으로 만들어진 이 문제설정에는 ‘신’이나 ‘근거’, ‘원리’ 등과 같은 개념들이 들어갈 또 하나의 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지금 생각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론으로 추가될 글을 참조하세요).
들뢰즈와 가타리는 매우 일반화된 의미로 ‘기계’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기계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것과 접속하여 어떤 흐름을 절단하여 채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입은 식도와 접속하여 영양소의 흐름을 절단하여 채취하는 먹는-기계가 됩니다. 그렇지만 접속하는 항이 달라지고 채취하는 흐름이 달라지면 다른 기계가 됩니다. 입이 식도 대신 성대와 접속하여 공기의 흐름을 절단하여 음운적인 소리로 절단하여 채취하게 되면 말하는-기계가 되고, 공기의 흐름을 음악적인 소리로 절단하여 채취하면 노래하는-기계가 됩니다. 사람이 문-기계와 접속하여 사람들의 동선의 흐름을 절단하여 채취하게 되면 수위-기계가 되고, 컴퓨터(타자-기계!)와 접속하여 사유의 흐름을 절단하고 채취하여 글로 만들어내면 글쓰는-기계가 됩니다.
여기서 기계는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 생명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지요. 사실 기계와 생명을 대립시키는 견해는 생물학이 탄생한 19세기 이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생명현상의 가장 근저에 있는 유전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유전자란 뉴클레오티드(nucleotide)라고 부르는 유기화합물의 배열이며, 그것이 작동하는 양상은 정확하게 ‘기계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생화학자 모노(J. Monod)는 세포란 “화학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계”라고 정의하지요. 그리고 그의 동료 자콥(F. Jacob)은 유전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결과 기계와 생명, 기계론과 생기론의 대립은 소멸하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들뢰즈와 가타리는 통상적인 기계는 물론 생명체나 그의 기관들을 ‘기계’라는 개념으로 파악합니다. 이처럼 생물권과 기계권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것을 기계라고 보는 입장을 그들은 ‘일반화된 기계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는 인위적인 것, 통상적인 ‘기계’조차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으로서 다루는 스피노자의 ‘일반화된 자연주의’와 정확하게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기계주의를 생기론과 대립되는 이전의 기계론(mechanism)과 구별하기 위해 마쉬니즘(machinism)이라고 명명하며, 기계론적인 기계 개념인 mechanic과 구별해서 machinique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기계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계도 접속하는 항이 달라지면 다른 기계가 된다는 집입니다. 이는 접속하는 이웃항에 의해 사물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건’의 철학에서 차이 개념과 결부되어 있음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 어떤 것도 정해진 불변의 본질은 없으며, 다른 것(이웃항)과 어떤 관계, 어떤 배치를 이루는가에 따라 다른 본성을 갖는 다른 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계는 배치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배치를 구성하는 각각의 항이 바로 기계인 것이고, 역으로 기계들의 접속과 계열화를 통해 배치가 정의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기계들의 계열화를 통해 구성되는 배치를 기계적 배치’라고 합니다. 물론 배치에는 기계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적 배치와 결부된 ‘언표행위의 배치’가 대개는 더불어 있게 마련입니다. 가령 재판소나 교도소, 판사와 검사, 교도관 등이 감옥의 기계적 배치를 구성한다면, 범죄라는 개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행형법, 범죄심리학 등이 그와 결부된 언표행위의 배치를 구성합니다. 전자가 없다면 범죄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나 담론들은 집행될 수 없는 무력한 것이 되고, 후자가 없다면 감금시설은 감금의 대상을 선별할 기준이나 감금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감금하는 장치가 되고 말지요.
어떤 사물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 ‘어떤 대상인가’는 이처럼 배치 안에서 결정되며, 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의 변함없는 본성 역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맑스 식으로 말한다면, “건물은 건물이다. 특정한 배치 속에서만 그것은 감옥이 된다”, 혹은 “감금은 가두는 것이다. 특정한 조건 속에서만 그것은 처벌이 된다”고 할 수 있지요. 이것이 근대적인 대상 개념, 혹은 오래된 형이상학적 대상 개념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이미 맑스에 대해 말하면서 충분히 살펴본 바 있지요.
주체 또한 마찬가집니다. ‘나’는 항상-이미 주체인 게 아니라, 배치 안에서 어떤 위치를 부여받았는가에 따라 주체가 되기도 하고 주체가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병원의 배치 안에서, 혹은 임상의학이라는 담론(언표 행위의 배치) 안에서 저나 여러분은 결코 말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의사라는 주체에 의해 진단받고 처방받는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지요. 물론 환자로서 말하고 생각하지만, 그 말이나 생각은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들리지 않고 침묵 속에 갇히고 만다는 것을 이미 푸코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또 말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나는 배치가 달라지면, 즉 이웃항이 달라지면 다른 주체로 변화됩니다. 가정의 배치 안에서는 자애롭고 따뜻한 아버지-주체지만, 공안경찰이라는 직업적 배치 안에서는 너무도 잔인하고 냉혹한 고문경관-주체가 되었다가, 주식 시세표를 보면서 자신이 투자한 주식값이 잘 오르고 있는지 확인하려 할 때 즉 돈을 벌기 위해 머리를 굴릴 때는 부르주아-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인식이나 태도의 전제가 되는 확고한 출발점으로서 주체, 그런 ‘나’는 없으며, 배치마다 만나는 이웃항에 따라 달라지는 수많은 ‘나’들의 반복이 있는 거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나’들을 통합하여 ‘나’, ‘자아’라는 통합된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사실 어떤 단일한 본질도, 고정된 경계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허구입니다. 주체란 근대철학자들 생각처럼 확고한 출발점이나 선험적 종합을 수행하는 선험적 형식이 아니라, 관계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지며 관계가 달라지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그때그때의 ‘결과물’이며 잠정적인 ‘고정점’들일 뿐이라는 거지요.
따라서 주체의 인식과 대상의 합치를 통해 참된 지식의 척도로 삼을 하나의 진리, 대문자 진리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계적 배치와 결부하여 만들어지는 언표행위의 배치들이 있을 뿐이고, 각각의 언표행위의 배치가 작동시키는 지식의 형식, 진리의 형식이 있을 뿐입니다. 진리가 있다면 수많은 진리들이 있다고 해야 하며, 어떤 것이 진리인가 아닌 가는 배치에 따라, 각각의 배치 안에서의 효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규정 이전에 진리에 대한 문제설정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진정한 진리, ‘더럽고 불완전한’ 현실에서 분리된 완전하고 변함없는 고상한 지식을 함축하는 ‘진리’를 상정하곤, 어떠한 조건에서도 타당한 ‘진리란 무엇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현실적인 유효성을 갖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진리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진리를 자처하는 지식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떤 진리인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삶과 분리된 채 고결하고 완전하게 머물러 있는 진리가 아니라, 다양한 지식들이 진리의 형식으로 관여하면서 만들어지고 변형되는 우리 자신의 삶이니까요. 하고자 하는 것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차이를 보고 새로운 것을 창안하게 촉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래된 것ㆍ낡은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게 하는 것인지, 그리하여 차이를 긍정하며 다양하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밀고 가게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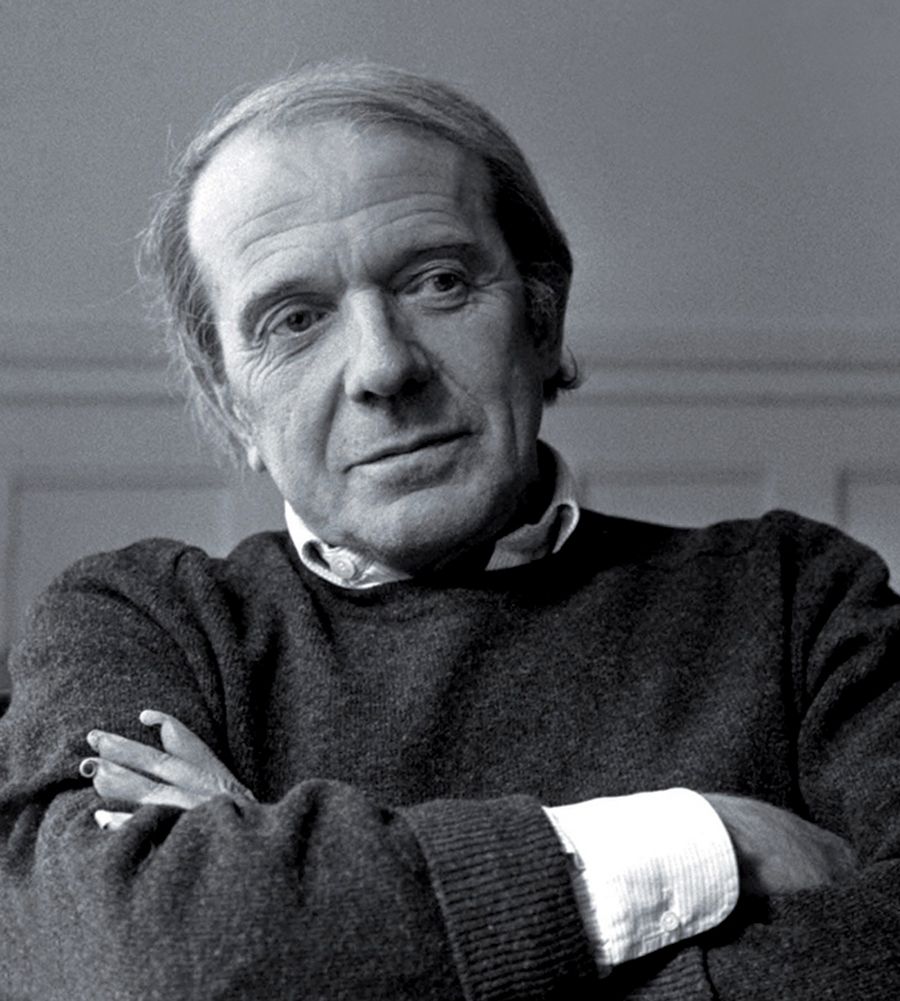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