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허균(許筠)이 비평가로서의 높은 조감(藻鑑)을 과시한 것은 성률(聲律)에 있다. 그는 『국조시산(國朝詩刪)』 뿐만 아니라 『성수시화(惺叟詩話)』와 『학산초담(鶴山樵談)』의 도처에서 시(詩)의 음악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는 『국조시산(國朝詩刪)』에 최경창(崔慶昌)과 이달(李達)의 시작(詩作)을 수십편이나 뽑아 넣으면서 그 경위를 『성수시화(惺叟詩話)』 63번과 64번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두 사람의 시(詩)를 내가 『국조시산(國朝詩刪)』에 뽑아 넣은 것이 각각 수십편이나 되는데 음절(音節)은 정음(正音)에 들 만하지만 그 밖에는 뇌동(雷同)을 면치 못한다.
二家詩, 余選入於詩刪者, 各數十篇, 音節可入正音, 而其外不耐雷同也.
그가 이들의 시(詩)를 선발(選拔)한 기준이 음절(音節)에 있었음을 사실대로 토로하고 있다. 계속하여 그는, 내 일찍이 고죽(孤竹)의 오언고시(五言古詩)와 율시(律詩), 망형(亡兄)의 가(歌)ㆍ행(行), 소재(蘇齋)의 오언율시(五言律詩), 지천(芝川)의 칠언율시(七言律詩), 손곡(蓀谷)ㆍ옥봉(玉峯) 및 죽은 누이의 칠언절구(七言絶句)를 한 책으로 만들어 보니 그 음절(音節)과 격률(格律)은 모두 옛 사람에 가까우나 다만 한스러운 것은 죄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아아! 누가 그 원래의 소리로 돌이키겠는가?
余嘗聚孤竹五言古詩, 亡兄古歌行, 蘇相五言律, 芝川七言律, 蓀谷玉峯及亡姊七言絶句, 爲一帙看之, 其音節格律, 悉逼古人, 而所恨氣不及焉. 嗚呼, 孰返其元聲耶.
라 하여 역시 선시(選詩)에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음절(音節)이나 격률(格律)과 같은 시(詩)의 소리에 있었음을 알게 한다. 그가 『국조시산(國朝詩刪)』에서 개별 작품에 대한 실제비평을 행함에 있어서도 당(唐)과 비당(非唐)은 엄격히 구별하고 있으며 특히 근당(近唐)의 시편(詩篇)에 대해서는 성운(聲韻)을 논하는 의지를 아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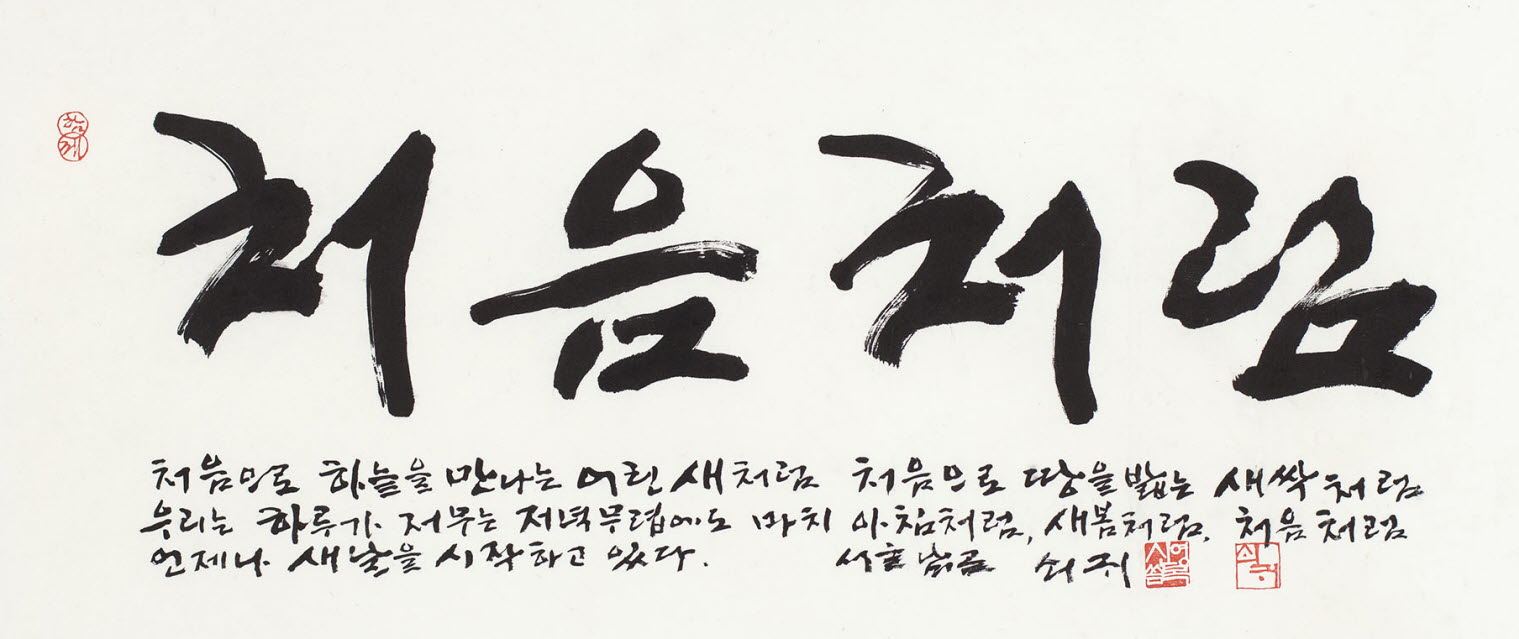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