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연재/한문이랑 놀자 (206)
건빵이랑 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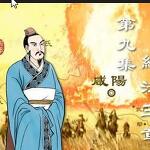 소화시평 감상 - 하권 92. 유방의 역사에 담은 인생 철학
소화시평 감상 - 하권 92. 유방의 역사에 담은 인생 철학
유방의 역사에 담은 인생 철학 『소화시평』 권하 92번에서 이원진은 한고조 유방을 주제로 해서 초한쟁패 초반기에 함곡관에 항우보다 먼저 들어갔음에도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지 않고 약법삼장을 선언하며 항우를 기다리던 순간을 배경으로 시를 쓰고 있다. 잠시 삼천포를 좀 빠지자면 소화시평을 공부하면서 유방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첫 발표였던 권상 39번에서도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를 다뤘었고 권상 47번도 발표를 맡았었는데 여기서도 전횡장군 이야기가 나오며 간접적으로 유방과 밀접한 이야기를 다뤘으니 말이다. 이렇게 유방의 이야기를 두 군데서 다루고 나니 초한쟁패의 이야기가 무척이나 가깝게 느껴지더라. 이래서 발표를 준비하며 역사적 상황이나 인물에 대해 다방면으로 함께 공부하는 건 여러모로 좋은 일이라..
 소화시평 감상 - 하권 92. 명성과 편견에 갇히지 않고 시를 봐야 하는 이유
소화시평 감상 - 하권 92. 명성과 편견에 갇히지 않고 시를 봐야 하는 이유
명성과 편견에 갇히지 않고 시를 봐야 하는 이유 길고 길었던 『소화시평』 선독(選讀)의 대망의 마지막 편이다. 작년 1학기부터 시작하여 지금에서야 끝장에 이른 것이다. 권상에선 55편의 시화를 읽었고 권하에선 48편의 시화를 읽었다. 물론 아직 64번과 66번 글을 빠뜨리고 오는 바람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권의 마지막 편의 글을 정리하는 이 순간의 기분은 매우 좋다. 어쨌든 한문을 오랜만에 다시 공부하며 뭣도 모른 상태로 달려들었던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 마무리 지어지게 됐으니 말이다. 물론 소화시평을 마친 소회는 64번과 66번 글까지 마친 후에 본격적으로 적어보기로 하고 여기선 마지막 글을 쓰는 느낌을 이렇게 간단히 남겨본다. 『소화시평』 권하 92번에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원..
 소화시평 감상 - 하권 91. 피상적인 이해와 적극적인 이해의 차이
소화시평 감상 - 하권 91. 피상적인 이해와 적극적인 이해의 차이
피상적인 이해와 적극적인 이해의 차이 弊屣堯天下 淸風有許由 요임금의 천하를 헌신짝처럼 버렸으니 맑은 풍도는 허유에게 남았지만 分中無棄物 獨挈自家牛 분에 맞으면 버리는 물건이 없어서 다만 자기 집 소를 끌고 갔다네. 『소화시평』 권하 91번을 얘기하기 전에 ‘소통과 이해’에 대해 길게 얘기한 이유는 윤정이 쓴 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정이 쓴 시를 그저 피상적으로, 시에서 보여지는 느낌으로만 평가할 경우 분명히 홍만종처럼 비판하는 게 당연하다. 우선 이 시의 1~2구에선 요임금이 천하를 허유에게 선양하려 하자 허유는 듣지 못할 더러운 말을 들었다며 귀를 냇가에서 씻었다. 이런 태도에선 마치 알렉산더와 디오게네스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 그만큼 ‘요임금-허유’, ‘알렉산더-디오..
 소화시평 감상 - 하권 91. 이해의 어려움에 대해
소화시평 감상 - 하권 91. 이해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의 어려움에 대해 『소화시평』 권하 91번에서 우린 ‘이해란 무엇인가?’에 대해 배우게 된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든, 어떤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든 이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학교에서 주구장창 작품의 이해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게 뭐가 어렵나요?’라고 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우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간을 작품의 이해나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배워왔고 대학교나 대학원까지 들어가면 더 긴 시간을 할애하여 배우게 된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배웠다면 당연히 ‘이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줄 안다’고 자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학교에서 배운 이해의 방법은 결코 제대로 된 이해의 방법이 아니다. 작품을 볼 때..
 소화시평 감상 - 하권 90. 조선시대 문인들의 우정을 엿보다
소화시평 감상 - 하권 90. 조선시대 문인들의 우정을 엿보다
조선시대 문인들의 우정을 엿보다 相離千里遠 相憶幾時休 서로의 거리 천 리나 머니 그리워하는 마음 언제나 그칠까? 以我虛漂梗 憐君誤決疣 나는 부질없이 떠도는 신세로 그대가 잘못 혹을 째버림을 가엾게 여기네. 靑春愁已過 碧海暮長流 푸르른 봄날은 시름 속에 지나버렸고 푸른 바다는 저물도록 길게 흐르는 구나. 夢裏還携手 同登明月樓 꿈에서나 도리어 손을 잡고서 함께 명월루에 올라보세. 世故殊難了 離愁苦未休 세상일 매우 이해하기 어려우니 이별시름 기어이 그치지 않네. 緣詩君太瘦 隨事我生疣 시 때문에 그대는 너무 야위었고 일 때문에 나는 혹이 났구려. 夜月誰同酌 春天獨泛流 달밤에 그 누가 술자리 함께 하랴. 봄날에 홀로 배를 띄웠다네. 還朝知不遠 匹馬候江樓 돌아올 날 멀지 않다는 걸 알겠으니, 필마로 강의 누각에서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90. 홍만종이 잘난 체를 하는 방법
소화시평 감상 - 하권 90. 홍만종이 잘난 체를 하는 방법
홍만종이 잘난 체를 하는 방법 『소화시평』 권하 90번은 김석주와 자신이 친한 관계였으며 김석주의 문장을 짓는 자질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관해선 자신을 칭찬했었다는 말로 서두를 열고 있다. 그러면서 홍만종은 “아마도 사백은 사와 부에는 뛰어나지만 느지막이 시를 썼기 때문에 이런 지나친 허여함이 있었던 것이리라[蓋斯伯工於詞賦, 晩業於詩, 故有此過許].”라고 김석주가 자신을 칭찬한 이유를 대고 있다. 이런 구절에서 드러나는 심성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자신이 시를 잘 짓는다는 것을 자부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나는 꼼수다’라는 팟케스트를 통해 유명해진 말 중에 ‘깔때기’라는 말이 있다. 그건 어떤 주제의 말을 하던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결국 자신의 잘난 척할 수 있는 주제로 빨아..
 소화시평 감상 - 하권 87. 새벽에 출발하며 쓴 시를 비교하다
소화시평 감상 - 하권 87. 새벽에 출발하며 쓴 시를 비교하다
새벽에 출발하며 쓴 시를 비교하다 『소화시평』 권하 87번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쓰인 시를 얘기하고서 그 두 시를 비교하며 평가하고 있다. 이런 비슷한 구절을 권상 101번에서도 본 적이 있지만 그땐 ‘뜻은 일치하지만 각각 운치가 있다[意則一串, 而各有風致].’라고 평가했었던 것과 비교가 된다. 우선 두 시는 똑같은 상황에서 쓰인 시다. 어디를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막에 머물다가 새벽에 출발하며 그 소회를 적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과연 두 시엔 어떤 느낌이 담겨 있는지 보기로 하자. 鷄聲來野店 鬼火渡溪橋 닭울음은 들판 주막에서 들려오고 도깨비불은 시내의 다리를 건너오네. 백곡의 시는 새벽에 출발하는 장면을 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출발하여 주막이 어렴풋이 멀어진 상황의 장면을 읊은 것이다. 그러니 아침을..
 소화시평 감상 - 하권 85. 2분이란 시간에 왕소군과 의순공주를 담아내다
소화시평 감상 - 하권 85. 2분이란 시간에 왕소군과 의순공주를 담아내다
2분이란 시간에 왕소군과 의순공주를 담아내다 순발력 테스트식으로 2분 만의 시간 동안에 홍석기가 짓게 된 시가 바로 『소화시평』 권하 85번에 실려 있는 시다. 이 시는 기승전결의 일반적인 흐름을 따라 가지 않는다. 일반적인 흐름에서 전구(轉句)는 기구와 승구에서 전개한 시상을 완전히 뒤바꾸며 환기를 시키고 결구의 의미를 강조하게 된다. 하지만 이 시는 결구의 내용을 강화하기에 위해 1~3구까지 감정을 켜켜이 쌓아간다. 그래서 한 구 한 구 읽을 때마다 깊은 울분과 회한이 짙게 느껴지며 결구에 이르고 보면 그 감정이 제대로 폭발되는 것이다. 千秋哀怨不堪聞 천추토록 애절한 원망 차마 듣질 못하겠는데, 落月蒼蒼萬壑雲 지는 달이 희끄무레한데다 온 골짜기엔 구름까지 꼈네. 莫向樽前彈一曲 술잔 앞을 향하여 한 곡..
 소화시평 감상 - 하권 85. 한시로 순발력테스트를 하다
소화시평 감상 - 하권 85. 한시로 순발력테스트를 하다
한시로 순발력테스트를 하다 『소화시평』 권하 85번은 시가 지어진 배경을 담고 있다. 아무래도 이전의 시들은 이미 시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시가 지어진 배경을 얘기하지 못하고(예외적으로 시가 지어진 배경이 문집에 실린 경우엔 그 배경과 함께 시를 설명하기도 한다) 그저 인상 비평을 가할 수밖에 없는 반면, 비교적 최근의 시이고 더욱이 자기 형의 시이기에 이 시에 대해선 배경 설명과 함께 그 당시의 분위기를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편을 읽고 있으면 그 당시에 왜 이런 시를 짓게 됐는지 상황을 이해하게 되며 홍만종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인 ‘형은 천부적 자질이 민첩하여 붓을 잡고 시를 지을 적엔 샘물이 솟구치는 듯 큰 강물이 매달린 듯했다[天才敏捷. 操筆賦詩, 泉湧河懸].’는..
 소화시평 감상 - 김득신의 귀정문적(龜亭聞笛)시가 더 좋은 이유
소화시평 감상 - 김득신의 귀정문적(龜亭聞笛)시가 더 좋은 이유
김득신의 귀정문적(龜亭聞笛)시가 좋은 이유 斷橋平楚夕陽低 끊어진 다리, 저편 평평한 들판에 석양이 내려앉고 政是前山宿鳥棲 앞 숲으론 잠 잘 새가 깃드네. 隔水何人三弄笛 건너편 강에서 어떤 사람이 「매화삼롱(梅花三弄)」 부는데, 梅花落盡故城西 매화는 고성 저편 모두 다 저버렸네. 『소화시평』 권하 84번의 두 번째 시는 읽고 있으면 그 상황이 절로 그려지는 시다. 1구에선 귀정에 올라 보인 광경을 서술하고 있다. 귀정이 어느 곳에 있는 정자인 줄은 모르겠지만 1구에 묘사된 정황을 통해 평평한 들판의 우뚝 솟은 곳에 있는 정자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정자에서 내려다보면 끊어진 다리가 보이고 그곳 근처엔 평평한 들판이 보인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석양이 질 때라 들판엔 석양빛이 내려앉아 있는 것이다. 이 광경..
 소화시평 감상 - 하권 84. 김득신이 지은 용산시 감상하기
소화시평 감상 - 하권 84. 김득신이 지은 용산시 감상하기
김득신이 지은 용산시 감상하기 古木寒雲裏 秋山白雨邊 고목은 찬 구름 속에 서 있고 가을산에 하얀 비 내리더니, 暮江風浪起 漁子急回船 저물녘 강에서 풍랑 일어나자 어부가 황급히 배를 돌리네. 위에서 쭉 얘기했다시피 김득신은 노둔했기 때문에 예리해진 사람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쓴 시는 어떨까? 그걸 『소화시평』 권하 84번에선 두 편이나 볼 수 있으니 이번 편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시는 1구와 2구는 시적 화자가 놓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찬 구름 속에 서 있는 고목, 하얀 비가 내리는 가을산이라고 명사만을 쭉 나열하고 있다. 이건 마치 백광훈의 「홍경사(弘慶寺)」를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다. 이 배경을 통해 조금은 스산한, 그러면서도 왠지 외로운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런 배경 속..
 소화시평 감상 - 하권 84. 노둔함의 저력
소화시평 감상 - 하권 84. 노둔함의 저력
노둔함의 저력 『소화시평』 권하 84번의 주인공은 백곡 김득신이다. 김득신하면 「글을 읽은 횟수를 기록하다[讀數記]」란 글을 지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이 글에도 나타나다시피 진득하게, 어찌 보면 매우 바보처럼 앉아 하나의 글을 여러 번 읽는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를 표현할 때 ‘노둔하다[魯]’는 표현은 빠지질 않는다. 실제로 84번에도 ‘천부적 자질이 매우 노둔했다[才稟甚魯]’고 홍만종도 서술하고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하지만 홍만종은 노둔함이야말로 학자로서 최고의 자질이란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둔하기 때문에 예리해졌다[由鈍而銳]’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황당해할 것이다. 노둔함과 예리함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건 마치 ‘소리..
 이름 새기는 사람의 심리를 비판한 한시(소화시평 하권83)
이름 새기는 사람의 심리를 비판한 한시(소화시평 하권83)
이름 새기는 사람의 심리를 비판한 한시 鏟石題名姓 山僧笑不休 돌 깎아 성명을 써놨더니 산 스님이 웃음을 그치질 않네. 乾坤一泡幻 能得幾時留 천지도 하나의 물거품이거늘 얼마나 그 이름 남길 수 있겠소. 임유후의 두 번째 시도 전혀 어렵지 않다. 그건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담아냈기 때문이다. 지금도 기사를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게 어느 유적지에 사람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는 기사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남기고 싶은 욕망이 있는 듯하다. 그러니 종족번식을 통해 자신의 증표를 남기려고도 하며, 그도 아니라면 의미 있는 것(문학작품, 한 시대를 풍미한 유행품들)을 남기려고도 하고, 그도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남기려 하니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83. 사찰시의 특징을 깨버린 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83. 사찰시의 특징을 깨버린 시
사찰시의 특징을 깨버린 시 시를 볼 때 당시풍이라느니, 송시풍이라느니 하는 표현들을 쓴다. 그때 두 시풍을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당시풍은 있는 사실을 핍진하게 그려내어 머리로도 그 상황이나 환경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묘사하는 반면, 송시풍은 성리학이 발달한 송나라답게 시에도 그저 환경이나 묘사하는 시를 쓰지 않고 철학적인 함의를 담은 시를 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시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송시풍보단 당시풍을 더 좋은 시로 쳤다. 이런 정도로만 나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 분간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풍 내에서도 초당ㆍ성당ㆍ중당ㆍ만당으로 시풍을 나누며 성당풍의 시를 최고로 치는 상황에 이르고 보면 이건 마치 어려운 수학기호를 보듯 난해함에 저절로 혀가 내둘러질 정도가 되고 만..
 소화시평 감상 - 하권 81. 유교 속의 불교, 불교 속의 유교
소화시평 감상 - 하권 81. 유교 속의 불교, 불교 속의 유교
유교 속의 불교, 불교 속의 유교 방편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선악을 확연히 구분하여 한 개체 내에 이미 그런 속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던지, 능력 여부 또한 한 개체 내에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어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본다던지, 조선은 유교의 나라로 불교는 아예 배척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방편적인 사고는 복잡다단한 세상을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을지언정, 실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린 티비에 범죄자로 나오는 사람을 보며 우리와는 다른 ‘악이 화신’이라도 된 양 생각하며 모든 걸 까발리고 사회에서 완벽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여대며, 조선을 생각하면 모든 사회의 악이 가득 찬 시대로 그리며 그런 부조리한 사회가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80. 은자의 세 가지 유형과 고정관념을 넘어
소화시평 감상 - 하권 80. 은자의 세 가지 유형과 고정관념을 넘어
은자의 세 가지 유형과 고정관념을 넘어 偶入城中數月淹 우연히 성중에 들어와 몇 개월을 머물다가 忽驚秋色着山尖 가을빛이 산 정상에 들러붙은 걸 보고 깜짝 놀랐네. 行裝理去孤舟在 떠날 짐 꾸려서 가니 외로운 배 남아 있고, 急影侵來素髮添 빠른 세월이 쳐들어와 흰 머리가 불어났구나. 早謝朝班誰道勇 일찌감치 조정을 떠난 들 누가 용맹하다 말하겠으며 晩饞丘壑不稱廉 느지막이 은거지를 탐한 들 청렴하다 할 이 없구나. 且愁未免天公怪 또한 하느님이 괴이하게 여길까 걱정되니 欲向成都問姓嚴 성도를 향해 가서 엄준한테 물어보려네. 『소화시평』 권하 80번의 시는 내가 맡은 분량이기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부끄럽게도 전혀 그러질 못했다. 완전히 시적화자가 처한 환경을 다르게 보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걸 시에서 간파해내지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80. 1년 동안 함께 한 스터디, 그리고 변화
소화시평 감상 - 하권 80. 1년 동안 함께 한 스터디, 그리고 변화
1년 동안 함께 한 스터디, 그리고 변화 『소화시평』 권하 80번은 오랜만에 발표하게 된 내용이다. 작년 4월 초에 소화시평 스터디에 합류하게 됐고, 운 좋게도 바로 그 다음 주에 발표를 맡게 되어 권상 39번을 발표하게 됐다. 여기서 ‘운 좋게’라고 표현한 이유는 반어법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그 당시 나는 오랜만에 임용공부를 하는지라 공부의 방향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고 밀려오던 불안감에 과거 낙방 때의 씁쓸함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 발표를 계기로 한문공부의 맛을 오랜만에 맛볼 수 있었고 공부의 방향도 잡을 수 있었다. 그렇게 권상 39번을 시작으로, 권상 47번, 권상 62번, 권상 75번, 권상 92번까지 총 다섯 편을 맡게 됐고 그걸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9. 역사를 한시에 담아내다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9. 역사를 한시에 담아내다
역사를 한시에 담아내다 睥睨平臨薩水湄 성가퀴 살수가를 굽어보는데 高風獵獵動旌旗 높은 바람에 펄럭펄럭 정기가 나부끼네. 路通遼瀋三千里 길은 요동과 심양 삼천리로 통하고 城敵隋唐百萬師 성은 수나라와 당나라 백만 군사를 대적했지 天地未曾忘戰伐 천지는 일찍이 전쟁을 잊은 적이 없으니 山河何必繫安危 산하에 하필 안위가 달렸으랴. 悽然欲下新亭淚 처연히 신정의 눈물 떨구려 하니 樓上胡笳莫謾吹 누각 위에서 호가 쓸데없이 불지 마라 . 『소화시평』 권하 79번에 나오는 이계의 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해도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얼핏 느껴지긴 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가 이해했던 것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새삼 느끼게 되는 건 어느 작품이든 좀 더 깊숙이 살펴보면, 내밀하게 궁리해보면, 알쏭달..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9. 알아가는 즐거움, 알게 되는 기쁨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9. 알아가는 즐거움, 알게 되는 기쁨
알아가는 즐거움, 알게 되는 기쁨 『소화시평』 권하 79번에서 나오는 이계(李烓)는 한문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한 인물이다. 그래서 작품집을 읽는다는 건 이런 부분에서 좋다. 늘 관심 갖던, 여러 사람에게 회자된 인물 외에 저자가 관심 갖던 인물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으니 말이다.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다보면 학생들은 누군가를 알아야만 할 때 “이 사람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런 건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하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고 보면 내가 학창시절에도 그건 마찬가지였다. 내가 알고자 해서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아야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의 작품이 교과서에 실려 있단 이유만으로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었으니 말이다. 그건 한문학사 상의 인물을 대할 때도 똑같이 적..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7. 계곡과 택당이 담지 못한 것을 담은 동명의 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7. 계곡과 택당이 담지 못한 것을 담은 동명의 시
계곡과 택당이 담지 못한 것을 담은 동명의 시 『소화시평』 권하 77번에서 ‘계곡ㆍ택당ㆍ동명 세 사람의 문학적 재능을 우열로 나누어볼 게 아니라 각자가 장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홍만종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저번 후기에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에 홍만종은 각자 시인들의 장점을 네 글자로 얘기한 다음에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어떤 느낌인지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계곡 장유의 문장에 대해선 ‘혼후류창(渾厚流鬯)’하다고 평가했는데 그건 거대하고 거침이 없으며, 확 트였다는 뉘앙스다. 스케일 자체가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홍만종은 끝없는 호수에 바람이 불어봤자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했다. 택당 이식의 문장에 대해선 ‘정묘투철(精妙透徹)’하다고 평가했는..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7. 문학의 우열을 나누는 것에 대해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7. 문학의 우열을 나누는 것에 대해
문학의 우열을 나누는 것에 대해 『소화시평』 권하 77번에선 계곡과 택당, 동명 세 사람의 시풍에 대해 홍만종이 평가를 하고 있다. 우선 평가에 들어가기 전에 평가를 하는 풍토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한다. 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좋아하는 것, 또는 좋다고 여기는 것에 따라 우열을 가르고 경중을 나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만종은 ‘매우 쓸데없는 이야기[甚無謂也]’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러면서 ‘문장엔 각각의 가치가 담겨 있다[凡文章之美, 各有定價]’라고 말한다. 그건 곧 자신의 좋아하고 싫어함에 따라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등급을 나누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물론 이 말 자체가 개인적인 비평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누구나 어떤 작품에 대해 개인적인 호불호를 얘기할 수 있으며..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6. 동명의 웅장함이 가득 시 감상하기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6. 동명의 웅장함이 가득 시 감상하기
동명의 웅장함이 가득 시 감상하기 統軍亭前江作池 통군정 앞의 강물은 연못이 되고 統軍亭上角聲悲 통군정 위로 나팔소리 비장하다. 使君五馬靑絲絡 부윤의 오마의 머리는 푸른 실로 장식했고 都督千夫赤羽旗 도독의 천 명 군사들 적우기 들었네. 塞垣兒童盡華語 변방성의 아이들은 중국어를 할 줄 알고 遼東山川非昔時 요동의 산천은 옛날이 아니로구나. 自是單于事田獵 그저 선우는 사냥을 일삼는 것뿐이니, 城頭夜火不須疑 성머리의 밤 횃불 의심하지 말라. 『소화시평』 권하 76번의 「휴용만이부윤등통군정(携龍灣李府尹登統軍亭)」이라는 시는 딱 읽는 순간에 절로 삼연이 했던 ‘매번 지을 적마다 이렇게 웅대한 말이로구나[每作此雄大語].’라는 평어가 매우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삼연은 비판적인 어조로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웅장한 말로만..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6. 의주 통군정과 변새시의 종류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6. 의주 통군정과 변새시의 종류
의주 통군정과 변새시의 종류 『소화시평』 권하 76번은 권하 75번에 이어 정두경의 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단순히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77번까지 네 편이나 정두경을 다루기 있기 때문에 홍만종이 정두경에게 얼마나 매료(魅了)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왜 홍만종이 후기 학자들은 비판 일색으로 정두경을 묘사한데 반해 홍만종만은 칭찬일색으로 정두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왜 이렇게 경도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저번 후기에서 밝힌 그대로다. 그러니 여기선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는 재론하지 않겠고 바로 그의 시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다. 지금은 북한 땅에 있어 가볼 수 없는 곳, 의주. 지금은 중국과 접경지역이며 압록강이 펼쳐져 있..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5. 정두경이 흰 갈매기를 사랑한 이유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5. 정두경이 흰 갈매기를 사랑한 이유
정두경이 흰 갈매기를 사랑한 이유 白鷗在江海 泛泛無冬夏 백구가 강과 바다에 있어 떠다니며 겨울 여름이 없으니 羽族非不多 吾憐是鳥也 새의 족속들이 많지 않은 건 아니나, 나는 이 새를 사랑한다네. 年年不與雁南北 해마다 남과 북으로 오가는 기러기와 같이 하지 않고 日日常隨波上下 날마다 항상 파도 따라 오르락내리락. 寄語白鷗莫相疑 “백구야 말 붙여도 서로 의심하지 말자꾸나. 余亦海上忘機者 나 또한 바다 위에서 기심을 잃은 사람이니까.” 『소화시평』 권하 75번에서 갈매기를 노래한 시는 정두경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작품이기도 하다. 갈매기와 기러기를 비교하며 자신은 기러기보단 갈매기와 같은 사람이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정치권에서 쓰는 철새라는 말은 결코 좋은 말은 아니다. 그건 자신의 유불리에 따..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5. 정두경을 보는 두 가지 시선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5. 정두경을 보는 두 가지 시선
정두경을 보는 두 가지 시선 『소화시평』 권하 75번에서 홍만종은 정두경의 문학적 자질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만약 이 글만 먼저 읽게 됐다면 홍만종의 시선에 따라 정두경을 엄청 대단한 인물로 기억하게 됐을 것이다. 하지만 작년 11월에 했던 김형술 교수의 한시 특강에서 정두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다. 홍만종 이후에 나오는 김창협, 김창흡 형제를 위시한 백악시단의 천기(天機)를 중시하는 학자들에겐 비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김창흡은 아예 정두경의 시는 한결 같이 웅장하기만 하다고 비판한다. 즉 기존에 중국학자들이 썼던 풍을 그대로 흉내내어 모작을 하는 정도이지, 직접적인 실상을 담아내진 않는다는 뜻이다. 그건 마치 지리산에 가보지 않고서도 시를 지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보지 않아도..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5. 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5. 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소화시평』 권하 75번에선 재밌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바로 정두경을 대단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홍만종의 기록을 통해 우린 ‘한 개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니 말이다. 작년 1월엔 홀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었다. 불현듯 떠나고 싶었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갔지만 해온 게 자전거 여행이라고 습관적으로 자전거를 빌려 제주도를 무작정 한 바퀴 돌았다. 그렇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작정 떠날 수 있었던 데엔 현실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무언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 무작정 떠난 제주도. 그곳엔 역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 여행 중에 건진 게 참으로 많지만 마지막 날에 김만덕 기념관에 간 건 신의 한수였다. 거기서 인물..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2. 이민구의 시에 차운한 홍만종의 강서시풍 한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2. 이민구의 시에 차운한 홍만종의 강서시풍 한시
이민구의 시에 차운한 홍만종의 강서시풍 한시 『소화시평』 권하 72번엔 직접적으로 이민구의 시를 관어대에서 본 홍만종은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나 보다. 최근에 ‘어머! 저건! 사야 돼!’라고 풍자하듯이 홍만종도 이민구의 시를 보고 나선 ‘어머! 이건 차운해야 돼!’라는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정감이 일었던 듯싶다. 이번 편엔 ‘왜 차운하게 됐는지?’, ‘누군가가 부탁해서 짓게 됐는지?’라는 정황들은 나오지 않지만, 자신도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는 건 확실히 알 수가 있다. 홍만종이 차운한 시도, 결코 이민구의 시에 뒤지지 않는 전고(典故) 파티를 보여준다. 아마도 자신이 잘 짓는 시풍으로 이민구 옹께서 먼저 시를 지었기에 홍만종도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배신감..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2. 실론티의 꿈을 그린 난삽한 이민구의 관어대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2. 실론티의 꿈을 그린 난삽한 이민구의 관어대시
실론티의 꿈을 그린 난삽한 이민구의 관어대시 『소화시평』 권하 72번은 다른 편에서 그저 시만을 평가하는 정도에 그친 것과는 다르게 홍만종이 이민구 어르신과 겪었던 에피소드가 아주 생생한 필치로 담아내고 있다. 그러니 다른 글에 비해 양이 꽤나 길었고, 더욱이 여기에 인용된 시들이 꽤나 어렵다보니 스터디 시간 내내 초집중 상태여야 했다. 권상 102번에 인용된 지천의 「차기윤자앙(次寄尹子仰)」이라는 시를 통해 그렇지 않아도 강서시파의 시는 정말 어렵다 못해 너무도 머리를 잔뜩 써서 글자 안배에 신경 쓴 지은 나머지 마치 퍼즐을 맞추듯 해석해나가야 한다고 손발을 다 들었었는데 이번 편에서 나오는 이민구의 시나, 그걸 차운한 홍만종의 시도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얼핏 봐서는 도무지 해석할 엄두조차 안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2. 갑자기 72번이라고요? 64번이 아니고!!
소화시평 감상 - 하권 72. 갑자기 72번이라고요? 64번이 아니고!!
갑자기 72번이라고요? 64번이 아니고!! 『소화시평』 권하 72번에 대해서는 에피소드가 있다. 하나는 권하 63번의 해석을 맡았던 학생이 권상 63번을 해석해오는 바람에 시간이 더 지체되었다는 사실이다. 솔직히 잘못 판단한 덕에 권상 63번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땐 속으로 은근히 좋아하긴 했었다. 이렇게 되면 막상 오늘 4개를 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3개만 하게 될 거란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소화시평 스터디 하던 초반에 감상을 적던 것에 비하면 분량 자체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하게 늘어났다. 그건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한 편 한 편을 다시 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고,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의 느낌과 알게 된 것들을 빠짐없이 담아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새벽에 출발하며 울적한 심사를 표현한 장유의 한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새벽에 출발하며 울적한 심사를 표현한 장유의 한시
새벽에 출발하며 울적한 심사를 표현한 장유의 한시 晨發板橋官路脩 새벽에 판교를 출발하니 관로는 아득하네. 客子弊衣風露秋 나그네의 해진 옷이 가을바람 맞고 이슬에 젖는다네. 寒蟲切切草間語 추위벌레들은 절절하게 풀 사이에서 울어대고 缺月輝輝天際流 조각만 환하게 하늘가로 흐르네. 馬上瞌睡不成夢 말 위의 말뚝잠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眼中景物添却愁 눈에 들어온 경물들은 도리어 시름만 더하네. 人生百年各形役 우리네 한 평생 각자 육신의 부림받기 마련이나 南去北來何日休 남북으로 오가는 일, 어느 때나 그치려나. 『谿谷先生集』 卷之三十 수련에선 새벽에 출발하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다. 어찌 보면 수련에선 감정이 드러난다기보다 사실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새벽에 출발했지만 아직 대로에 접어들기까진..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새벽에 출발하며 시를 짓는 이유와 소화시평 후기를 마무리 지으며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새벽에 출발하며 시를 짓는 이유와 소화시평 후기를 마무리 지으며
새벽에 출발하며 시를 짓는 이유와 소화시평 후기를 마무리 지으며 『소화시평』 권하 64번의 마지막에 초대된 사람은 장유다. 작년 4월 11일에 소화시평 스터디에 참여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맨 마지막 후기를 쓰게 됐다. 더욱이 소화시평 하권64는 다른 편들에선 발췌된 시만 있을 경우 발췌된 시들만 보며 홍만종의 시평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반면에 이번 편에선 모두 한 번씩은 봐야 하는 좋은 시들만 수록되어 있다며 전문을 함께 공부했고 이야기를 나눴었다. 그에 발맞춰 나도 64번에 나온 시들은 한 편 한 편에 대한 기록을 남겨 모두 15편을 썼고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기록을 남기게 된 것이다. 이 기록은 소화시평 후기를 마무리 짓는 기록이자 하권64번에 기록된 15편 중 마지막을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나 이제 시 안 쓸래요’라는 의미를 담아 시를 쓴 최립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나 이제 시 안 쓸래요’라는 의미를 담아 시를 쓴 최립
‘나 이제 시 안 쓸래요’라는 의미를 담아 시를 쓴 최립 『소화시평』 권하 64번에 초대된 인물은 최립이다.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최립이 왜 중국으로 사신을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시대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통 사신 가는 일은 국가적인 대사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박지원이 지은 『열하일기』라는 책은 청나라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의 일부로 함께 청나라로 가게 되며 겪게 된 일들을 써놓은 책이다. 축하사절단이니 가는 길이 무겁지 않고 마치 여행을 하듯 그 상황들을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축하해주기 위해, 또는 중국과 조선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오고 가는 사절단의 경우엔 무겁지 않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황정욱의 한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황정욱의 한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황정욱의 한시 『소화시평』 권하 64번에 초대된 사람은 황정욱이다. 이 시 또한 황정욱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황정욱도 호소지의 한 명인 노수신과 마찬가지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고 손녀가 선조의 아들인 순화군과 결혼하며 외척의 지위까지 누리며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에 왜적과 내통했다는 모함을 받게 되어 유배를 가게 됐고 거기서부터 인생은 180도 꼬이게 된다. 노수신은 해배된 후에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간 반면, 황정욱은 재기하지 못하고 울분을 안은 채 살다가 죽게 된다. 午憩東樓缷馬鞍 오후에 동루에서 쉬려 말안장을 푸니 窮陰忽作暮天寒 섣달이라 홀연 저녁 기운 차갑구나. 紅塵謾說歸田好 세상살이할 땐 공연히 ‘전원으로 돌아가길 좋아한다’..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노수신의 ‘친구야 보고 싶다’를 한시로 표현하는 법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노수신의 ‘친구야 보고 싶다’를 한시로 표현하는 법
노수신의 ‘친구야 보고 싶다’를 한시로 표현하는 법 由來嶺海能死人 고개와 바다 거쳐 오려고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 不必驅馳也喪眞 힘들게 말달려 죽을 필욘 없네. 日暮林烏啼有血 석양에 숲의 까마귀 울음에 피가 있고 天寒沙雁影無隣 날씨 차가운 모래사장 기러기 그림자 짝이 없네. 政逢蘧伯知非歲 정이 거백옥이 49년의 삶이 잘못됨을 안 50살이 되었고 空逼蘇卿返國春 부질없이 소무가 귀국하던 때가 닥쳐왔네. 災疾難消老形具 질병은 없애기 힘든 늙은 형구(刑具)이니, 此生良覿更何因 다시 어느 인연으로 이 생애에 즐겁게 만날 수 있을까. 『穌齋先生文集』 卷之四 『소화시평』 권하 64번에 초대된 사람은 노수신이다. 이 시를 해석하기 이전에 노수신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안다고 좀 더 이해하기 쉽다. 노..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정사룡이 한시로 쓴 용비어천가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정사룡이 한시로 쓴 용비어천가
정사룡이 한시로 쓴 용비어천가 『소화시평』 권하 64번에 초대된 작가는 정사룡이다. 이 글은 권하 64번에서 최치원의 「등윤주자화사(登潤州慈和寺)」를 발표한 이후 두 번째로 하는 발표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아쉽게도 완전히 포인트가 엇나갔고 해석도 많은 부분이 틀렸다. 아직도 한시를 보는 게 많이 서툴다는 게 느껴진다. 이번 시는 조선의 태조인 이성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고려 말에 왜구가 금강으로 진출해서 몰리고 몰리다 남원지방까지 내려갔고 이성계가 출진하여 황산에서 왜구의 적장인 아지발도를 죽이고 왜구를 섬멸했다. 이번 시는 바로 이런 사실을 담고 있는 영사시(詠史詩)라고 할 수 있다. 이성계가 나오면 당연히 한나라 고조인 유방과 매칭시키곤 한다. 유방은 농민출신으로 이미 엄청난 세력을 유지하..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기심을 잊은 이행이 여행하며 쓴 한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기심을 잊은 이행이 여행하며 쓴 한시
기심을 잊은 이행이 여행하며 쓴 한시 그렇다면 『소화시평』 권하 64번에 인용된 이행의 「대흥동도중(大興洞途中)」이라는 시는 여행시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한 것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보는 것도 재밌는 감상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선 전편을 본 후에 어디에 들어갈지 각자 생각해보며 정리해보도록 하자. 芒鞋藜杖木綿衣 짚신 신고 명아주 지팡이 짚고 목면 입고 나니까, 未覺吾生與願違 나의 삶이 원하는 것과 어긋나지 않는구나. 塵土十年寧有是 속세에 10년 동안 어찌 이것이 있었겠나. 溪山終日便忘機 산수 속에서 종일토록 문득 기심마저 잊었네. 多情谷鳥勸歸去 다정한 골짜기의 새는 돌아가길 권하고 一笑野僧無是非 한바탕 웃는 들의 스님은 시비를 안 따지네. 更着詩翁哦妙句 다시 시옹이 붙어서 묘한 시구 읊조리..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여행을 담은 한시의 유형들, 그리고 여행을 기록할 수 있는 정신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여행을 담은 한시의 유형들, 그리고 여행을 기록할 수 있는 정신
여행을 담은 한시의 유형들, 그리고 여행을 기록할 수 있는 정신 『소화시평』 권하 64번에 초대된 인물은 이행이다. 이 시는 대흥동으로 가는 도중에 쓴 시다. 이런 식의 여행 도중에 써낸 몇 편의 시의 내용을 살펴보자. 유몽인이 쓴 「양양도중(襄陽途中)」이란 한시에선 유종원이 쓴 「포사자설(捕蛇者說)」처럼 현장에서 직접 본 그대로 세금문제로 핍박받는 민심을 드러냈으며, 성간이 쓴 「도중(途中)」이라는 한시에선 마치 내가 같이 여행을 하는 듯이 핍진하게 여행 도중의 풍경을 그려냈으며, 이곡이 쓴 「도중피우유감(途中避雨有感)」이라는 한시에선 길에서 만난 비를 피하러 큰 저택에 들어갔다가 뜻밖의 인생무상을 맛본 경험담을 서술했으며, 권필이 쓴 「도중(途中)」이라는 한시에선 당시풍의 대가답게 여행 도중의 한 상..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속세를 벗어나 사찰에 들어가야만 보이는 것을 노래한 박은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속세를 벗어나 사찰에 들어가야만 보이는 것을 노래한 박은
속세를 벗어나 사찰에 들어가야만 보이는 것을 노래한 박은 『소화시평』 권하 64번에서 네 번째로 초대된 인물은 박은이다. 이번 시에서 박은 복령사라는 사찰을 노래하고 있다. 재밌는 점은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억불숭유(抑佛崇儒)’가 떠오르며 스님이나 사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것 같고 배제하려는 마음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진 않았다는 사실이다.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에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엔 국교가 불교였을 정도였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심상에 불교는 깊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건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고 합리성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지만 그 안엔 유교관이 자리하고 있는 것과 같다. 600년 이상을 유교국가의 이상 속에서 살았으니 그게 다른 사상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영사시에 담긴 서글픈 마음을 담아낸 성현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영사시에 담긴 서글픈 마음을 담아낸 성현
영사시에 담긴 서글픈 마음을 담아낸 성현 『소화시평』 권하 64번에 세 번째로 초대된 사람은 성현이다. 조선 초기에 서거정과 마찬가지로 세조의 왕위 찬탈과 같은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일신을 잘 보전하여 부침도 없이 벼슬살이를 했던 관각문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살아 있을 땐 부침이 없었다 해도 죽고 나선 무오사화에 휘말리며 그의 시체에 매질을 가하게 되는 ‘부관참시’를 당하게 되었으니 이걸 다행이라 할까, 불행이라 할까. 鵠嶺凌空紫翠浮 송악산이 하늘을 침범해서 붉고 푸른 기운이 서려있고, 龍蟠虎踞擁神州 용 앉고 범이 앉아 도성을 끌어안았네. 康安殿上松千夫 강안전 위에 소나무 천 그루. 威鳳樓前土一丘 위봉루 앞에 흙 만한 언덕이네. 羅綺香消春獨在 여인 향기 사라진 채 봄만 홀로 있고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도인을 칭송하는 품격 있는 김시습의 한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도인을 칭송하는 품격 있는 김시습의 한시
도인을 칭송하는 품격 있는 김시습의 한시 『소화시평』 권하 64번에 초대된 사람은 김시습이다. 세조의 왕위 찬탈에 항거하여 산지를 떠돌았던 시인이자 문인인 김시습은 유교일색으로 변해가는 조선사회에 유불도를 망라하는 사상세계를 구축한 반항아이기도 했다. 김시습이 쓴 시를 해석했었는데 스터디를 하면서 완전히 포커스가 엇나갔다는 걸 느꼈다. 그건 애초에 전제해둔 방향이 잘못된 데서 비롯된 거였다. 나는 이 시를 해석할 때 ‘이 시는 김시습이 지은 것이니 당연히 김시습의 얘기를 담은 거겠지’라는 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해석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내용 자체가 도통한 스님과 같은 시였기에 김시습의 사상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증준상인(贈峻上人)」이란 시처럼 명약관화하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문학이 그렇듯 시를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슬픈 정감으로도, 시원한 정감으로도 읽히는 기이한 김종직의 한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슬픈 정감으로도, 시원한 정감으로도 읽히는 기이한 김종직의 한시
슬픈 정감으로도, 시원한 정감으로도 읽히는 기이한 김종직의 한시 『소화시평』 권하 64번에서 두 번째로 초대된 사람은 김종직이다. 이미 권상 62번에서 그의 시 세계와 왜 그런 시를 쓰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본 적이 있으니, 그 내용과 함께 이번 편에 소개된 시를 본다면 그를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차청심루운(次淸心樓韻)」이라는 시를 이해하기 위해선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청심루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주에 있는 누각으로 한양에서 머물던 그가 선산부사로 가기 위해 한양을 떠나며 여주 청심루에 들러 그곳 누각의 주인을 만나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고 그때의 누각에 오른 소감을 적은 것이니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관수루 제영시(觀水樓 題詠詩)」를 보면..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늙음의 여유로움이 담긴 서거정의 한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늙음의 여유로움이 담긴 서거정의 한시
늙음의 여유로움이 담긴 서거정의 한시 『소화시평』 권하 64번에 처음으로 초대받은 사람은 서거정이다. 서거정은 조선시대의 뭇 학자들과는 달리 흔한 유배조차 가지 않았으며 임금의 총애를 받아 외직조차 맡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기에 그는 언제나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고 그 권력에서 밀려나지 않았다. 이렇게만 보면 그가 살았던 시기는 권력이 안정되고 문제가 없던 시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가 살았던 시기는 세조의 왕위찬탈과 단종복위가 일어나던 혼란의 시기였다. 그런데도 그런 변화무쌍한 권력의 흐름 속에서도 목숨 부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중심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처세술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 여기에 인용된 시는 아마도 그가 벼슬에서 물러나 지내던 말년 때의 시일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과거를 회상할 이유를 알려준 이색의 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과거를 회상할 이유를 알려준 이색의 시
과거를 회상할 이유를 알려준 이색의 시 『소화시평』 권하 64번에서 네 번째로 초대받은 작가는 목은 이색이다. 그의 이력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는 여말선초(麗末鮮初)의 대표적인 작가로 고려 말기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고려 왕들을 위해 한 몸 불살라 최선을 다했고 조선의 건국을 반대했었다. 그는 고려 뿐 아니라 원나라에 들어가 과거에 급제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으며 원나라와 고려를 오가며 눈 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그런 자신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용된 「억산중(憶山中)」이란 시는 확 와 닿는다. 그건 마치 가족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던 중년 남성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없이 살다 보니 막상 젊을 때 꿈꿨던 대로 살고 있는지 회한도 들고, 그때 친구와 밤하..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여행을 담는 한시의 품격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여행을 담는 한시의 품격
여행을 담는 한시의 품격 『소화시평』 권하 64번의 작가는 이제현이다. 이제현이 지은 「팔월십칠일 방주향아미산(八月十七日 放舟向峨眉山)」을 보기 위해선 그가 왜 원나라의 아미산에 갔는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는 15살이던 1301년에 과거에 급제했고 당시의 유력자인 권부(權溥)의 사위가 되었다. 그만큼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이다. 그렇게 잘 나가며 여러 벼슬을 맡다가 28살이던 1314년에 충선왕으로 부름을 받아 원나라 연경(燕京)의 만권당(萬卷堂)에 머물게 되었고 원나라 여러 선비들과 교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30살이던 1316년에 충선왕을 대신하여 아미산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 3개월 동안 서촉(西蜀) 지방을 다녀오게 된 것이다. 바로 이 시의 배경인 아미산은 이때 가게 된 거라는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이규보가 지은 아부시, 화려한데도 씁쓸한 이유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이규보가 지은 아부시, 화려한데도 씁쓸한 이유
이규보가 지은 아부시, 화려한데도 씁쓸한 이유 『소화시평』 권하 64번에서 두 번째로 인용된 시의 주인공은 이규보다. 최치원 다음에 이규보가 나온다는 건 물론 홍만종의 개인적인 취향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확 나갔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건 곧 삼국시대엔 최치원을 최고로 치는 것까진 인정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고려 전기엔 괜찮은 시가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고려 전기에 활약한 시인 중엔 정지상이나 김부식, 이인로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의 시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다루지 한 명 정도는 다룰 만한데도 다루지 않았다. 이쯤 되면 홍만종에게 정말 묻고 싶어진다. 이번 편은 좋다는 한시들만을 선별했는데 그 기준이 무언지 궁금하다고, 그리고 고려 전기의 작품을 하나도 들지 않은 건 왜 그런지 궁금하다고 말이..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등윤주자화사(登潤州慈和寺)를 여러 번 음미하며 읽어야 하는 이유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등윤주자화사(登潤州慈和寺)를 여러 번 음미하며 읽어야 하는 이유
등윤주자화사(登潤州慈和寺)를 여러 번 음미하며 읽어야 하는 이유 『소화시평』 권하 64번의 첫 번째 시는 최치원의 「등윤주자화사(登潤州慈和寺)」라는 시다. 이 시는 워낙 유명해서 문학사를 다루는 책이나 한시를 다루는 책에선 빠짐없이 인용되는 시이기도 하다. 그러니 지금까지 아무리 못해도 10번 이상은 읽었을 것이고 그만큼 내용도 분명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선 기존에 읽던 방식대로 시를 읽게 되어 있고 그 방식대로 발표 준비를 하게 되어 있다. 당연히 그 방식이 옳은 줄만 아니, 지금까지 이해한 방식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스터디를 하면서 기존에 이해한 방식이 얼마나 많은 걸 놓치게 만들고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작은 차이가 천지의 뒤틀림을 낳는다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4. 작은 차이가 천지의 뒤틀림을 낳는다
작은 차이가 천지의 뒤틀림을 낳는다 『소화시평』 권하 64번에선 홍만종이 생각하는 최고의 시를 선별하여 수록하고 그에 대한 평을 하고 있다. 시평은 ‘일찍이 ~함에 감탄하지 않은 적이 없다[未嘗不歎]’라는 통일된 양식으로 ‘탄(歎)’이란 글자 뒤에 ‘감개(感慨)ㆍ장려(壯麗)ㆍ정치(精緻)’와 같은 두 글자의 단어들이 들어간다. 이쯤에서 잠시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다. 그건 당신은 최근에 문학작품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나서 감탄해본 적이 있냐는 것이다. 나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예전에 돈도 궁하고 지지리도 궁상 맞게 공부하던 시기엔 꽤나 감명 깊게 본 영화들이 많았었다. 그런데 재밌게도 막상 단재학교에 들어가 영화팀 교사가 되었고 아이들과 매년 전주와 부산의 국제영화제에 다니며 영화를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3. 21자로 표현된 장유의 심리학 보고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3. 21자로 표현된 장유의 심리학 보고서
21자로 표현된 장유의 심리학 보고서 『소화시평』 권하 63번의 주인공은 장유다. 지금의 나에게 계곡 장유는 「회맹후반교석물사연양공신사전(會盟後頒敎錫物賜宴兩功臣謝箋)」이라는 악명 높은 글을 쓴 장본인으로 남아 있다. 한문실력이 좋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웬만한 글들은 여러 가지를 조합하다보면 해석이 되는 정도다. 하지만 이 글은 길지도 않음에도, 그리고 해석본까지 참고하면서 보는 데도 도무지 해석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곳 투성이다. 임금께 드리는 글답게 전고(典故)가 가득 차 있어 산 넘어 산이듯 전고를 지나면 또 다시 전고가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니 말이다.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썼냐고 따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막고 품는 수밖에 없다. 이렇듯 나에겐 어려운 글을 쓰는 사람으로 남아 있는데 홍만..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2. 연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2. 연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연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소화시평』 권하 62번에선 연원이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원이 있다는 건 무엇일까? 그건 다름 아닌 근본이 있다는 얘기이고 기본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이다. 정약용이 쓴 「원교(原敎)」라는 글을 통해 얘기해보자면, 다산은 효제충신(孝弟慈忠信)과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선 인의(仁義)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인의(仁義)가 밑바탕에 있는 사람은 어른을 만나면 공경할 것이고, 상사를 만나면 충성할 것이며, 자식을 만나면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그때그때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근본에 인의(仁義)만 있다면 저절로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시적 재능도 힘차느냐, 부드러우면서도 담백하느냐 하는 것은 그런 자질을 연마하는 것..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1. 빙탄상애(氷炭相愛)의 감성을 담은 소암의 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1. 빙탄상애(氷炭相愛)의 감성을 담은 소암의 시
빙탄상애(氷炭相愛)의 감성을 담은 소암의 시 儒言實理釋言空 선비는 실리를 말하고 스님은 공(空)을 말하니, 氷炭難盛一器中 얼음과 숯을 한 그릇에 담기 어려워라. 惟有秋山綠蘿月 오직 가을 산의 푸른 넝쿨 사이로 비추는 달빛이 있어야 上人淸興與吾同 스님의 맑은 흥이 나와 같구려. 『소화시평』 권하 61번 맨 마지막에 인용된 시는 임숙영의 시다. 임숙영은 이미 권필이 쓴 「임무숙이 삭과됐다는 걸 듣고[聞任茂叔削科]」라는 시의 주인공을 말했던 인물이다. 그는 과거에 급제했고 광해군과의 대책을 나누는 자리에서 광해군의 비인 유씨의 친족(유희사, 유희분)이 국정을 좌우하며 고혈을 빼먹고 있는 걸 보고 광해군에게 버드나무[柳]에 빗대어 뼈 있는 얘기를 했다가 유희분의 눈 밖에 나서 관직이 삭과되었다가 다시 급제하는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1. 스님이 보고 싶었던 동악의 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1. 스님이 보고 싶었던 동악의 시
스님이 보고 싶었던 동악의 시 『소화시평』 권하 61번에선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스님에게 준 시 네 편을 모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미 앞선 편에서 호음이 준 시와 동고가 준 시를 보며 어떤 부분이 이색적이었는지를 살펴봤기에, 이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인 동악시를 중심으로 살펴볼 차례다. 老來何事喜逢僧 늘그막에 무슨 일로 스님 보길 좋아하나? 欲訪名山病未能 명산을 방문하려 해도 병들어 할 수 없어서지. 花落矮簷春晝永 꽃 지는 낮은 처마엔 봄날이 기나긴데, 夢中皆骨碧層層 꿈속에서 개골산은 층층이 푸르더이다. 동악의 시는 1~2구가 하나로 이어져 의미를 만들어낸다. 마치 이백의 「산중답인(山中答人)」이라는 시처럼 1구에서 스스로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자문..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1. 은근한 마음을 스님에게 전한 동고의 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1. 은근한 마음을 스님에게 전한 동고의 시
은근히 스님에 대한 마음을 드러낸 동고의 시 白雲涵影古溪寒 흰 구름의 그림자를 담아 놓으니 오래된 시내는 차고 和月時時上石壇 달과 때때로 석단에 오르네. 詩在山中自奇絶 시는 산 속에 있어야 절로 기이해지는데, 枉尋岐路太漫漫 잘못 갈림길을 찾아 너무나 오랫동안 헤매었네. 『소화시평』 권하 61번에 두 번째로 소개된 시는 동고의 시다. 호음의 시는 스님 자체를 중심에 놓고 그를 인정해주는 말들로 가득 찬 반면에 동고의 시엔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나오지 않는다. 즉 두 사람의 시는 접근부터 완벽히 달랐던 셈이고, 그 말은 곧 이 시를 쓰려했던 이유가 완전히 달랐던 셈이다. 1구와 2구엔 스님에게 준 시라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산 속 제단의 모습만 드러나고 있다. 1구 자체는 시내를 매우 환상적으로 묘사하..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1. 산이 된 스님을 담은 호음의 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1. 산이 된 스님을 담은 호음의 시
산이 된 스님을 담은 호음의 시 『소화시평』 권하 61번은 서두부터 간단명료하게 ‘옛 사람이 스님에게 준 시가 많다[古人贈僧詩, 多矣].’라고 말하며 훅 치고 들어온다. 저번에 김형술 교수의 특강과 박동섭 교수의 특강에 대한 후기를 쓸 때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 세심하게 결을 가다듬으며 서두를 정성껏 전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두 분의 교수님처럼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분위기 자체를 압도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처럼 이 글에서 홍만종은 말하고 싶은 걸 짧고도 굵게 단번에 내뱉으며 연이어 네 편의 시를 첨부하며 마지막엔 네 편에 시를 단 두 글자의 평가하며 마무리 짓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아주 심플하면서도 말하고..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1. 조선과 불교, 선비와 불교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1. 조선과 불교, 선비와 불교
조선과 불교, 선비와 불교 고려와 조선을 나누는 기준점을 왕씨에서 이씨로 왕조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역성혁명(易姓革命)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단순히 왕의 성씨가 바뀐 것만으로는 백성들에게 새 왕조에 대한 인식이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고려 후반기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도록 만든 건 송나라 때 주희에 의해 체계화되어 수입된 주자학(성리학)이라는 것이었고 그건 고려 후기 신진사대부에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단초가 되었던 것이다. 이중에 일개 신진학자임에도 뭔가 고려라는 사회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한 명의 학자는 맹자의 ‘무도한 임금은 그저 한 명의 외로운 사내(獨夫)에 불과하기에 죽이거나 갈아치우는 것도 가능하..
 소화시평 감상 - 하권 54. 의고파 시의 특징과 이안눌의 시가 굳센 이유
소화시평 감상 - 하권 54. 의고파 시의 특징과 이안눌의 시가 굳센 이유
의고파 시의 특징과 이안눌의 시가 굳센 이유 『소화시평』 권하 54번의 주인공도 앞에서부터 쭉 살펴봤다시피 이안눌(1571~1637)이다. 아무래도 홍만종(1637~1688)의 입장에선 그나마 2세대 위의 선배로 가장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고 많은 자료들도 남아 있는 이안눌에 대한 글을 쓰기가 쉬웠을 것이다. 그러니 권하 50번부터는 계속해서 이안눌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며 그의 시적 재능을 평가하고 그와 관련 있었던 양경우 시와의 비교(50번, 51번)를 했었고, 이번 편에선 석주 시와의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50번 감상글에서도 썼다시피 이안눌은 의고파다. 의고파는 ‘문장은 반드시 진나라와 한나라 때의 문장으로 짓고 시는 반드시 성당의 시체로 짓는다[文必秦漢, 詩必盛唐].’를 핵심적인 기치로 걸고..
 소화시평 감상 - 하권 52. 죽은 이를 그리는 방법
소화시평 감상 - 하권 52. 죽은 이를 그리는 방법
죽은 이를 그리는 방법 『소화시평』 권하 52번에선 동악과 석주, 그리고 체소와의 진한 우정이 담겨 있다. 이미 석주와의 인연과 마음에 대해선 글을 쓰기도 했으니, 둘의 관계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체소와도 가까운 관계란 건 이번 글을 통해 처음으로 알았다. 석주와 동악은 정철 스승에게 동문수학한 사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 단순히 동문수학한 동기 정도가 아니라 남다른 서로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권필에 궁류시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유배를 가다가 죽은 이후 「곡석주(哭石洲)」라는 정말 친한 사이에서 억지로 꾸며내려 하지 않아도 절로 우러나는 만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동악이었으니 석주와 체소의 아이들이 강화도에 살고 있는 자신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는가. 어떤 연유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51. 분석보단 이해의 중요성을 알려주다
소화시평 감상 - 하권 51. 분석보단 이해의 중요성을 알려주다
분석보단 이해의 중요성을 알려주다 『소화시평』 권하 51번에선 권하 50번의 글과는 달리 서로 경쟁적으로 글을 짓는 분위기는 아니다. 왜 이런 시를 짓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은 생략된 채 처음부터 양경우의 시가 인용되어 있다. 殘花杜宇聲中落 쇠잔한 꽃은 두견새 소리 속에 지고 芳草王孫去後靑 향기론 풀은 왕손이 떠난 후에 푸르네. 여기까지만 보면 매우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만 같다. 누군가 어떤 환경에서 시를 지었다는 정도의 이야기이니 말이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듯 누군가 애써 지은 작품에 대해 바로 그 앞에서 평가를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긴 하다. 서로의 관계도 있지만 시의 우열로 인해 너무 기고만장한 사람으로 비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런 것조차도 허물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친했던..
 소화시평 감상 - 하권 51. 소화시평이 준 공부의 변화
소화시평 감상 - 하권 51. 소화시평이 준 공부의 변화
소화시평이 준 공부의 변화 『소화시평』 권하 51번은 권하 50번에서 봤던 글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번 글을 보기 이전에 50번 글과 함께 보면 무슨 내용인지 더 이해하기가 쉽다.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과거 회상을 해보려 한다. 예전에 임용을 공부하던 시기에도 한시는 여러 편 봤었고 시화도 『파한집(破閑集)』, 『성수시화(惺叟詩話)』를 보긴 했었다. 그땐 그게 공부하는 방식이라 생각했고 임용고시를 위해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참이나 시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그 당시를 회고해보면 한계가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 그 한계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모든 그저 눈으로만 보고 피상적으로 이해된 것을 ‘마치 잘 이해한 것처럼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50. 한시엔 정답이 아닌 관점만이 있다
소화시평 감상 - 하권 50. 한시엔 정답이 아닌 관점만이 있다
한시엔 정답이 아닌 관점만이 있다 『소화시평』 권하 50번엔 면앙정에 올라 제호와 동악이 한시 대결을 했고 두 시에 대해 제호 양경우는 동악의 시가 더 좋다고 평가했다. 여기까지 글을 보고 나면 단순히 ‘이안눌의 시가 양경우의 시보다 좋았구나’라는 결론이 지어지게 된다. 하지만 보통의 영화가 그렇듯 반전의 묘미가 잘 살 때 그 영화가 남다르게 보이고 다시 처음부터 곱씹으며 보고 싶어지듯, 이 글에서도 반전을 숨겨놓아 글을 읽는 맛을 배가 시키고 있다. 그건 바로 홍만종의 평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양경우는 이안눌의 시가 자신의 시보다 훨씬 낫다고 평가했던 반면에, 홍만종은 그런 얘기를 거절하며 ‘양경우의 시가 훨씬 낫다’고 매우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홍만종은 ‘동악의 시는 비록 원만하게 전..
 소화시평 감상 - 하권 50. 면앙정에서 펼쳐진 제호와 동악의 한시 대결
소화시평 감상 - 하권 50. 면앙정에서 펼쳐진 제호와 동악의 한시 대결
면앙정에서 펼쳐진 제호와 동악의 한시 대결 『소화시평』 권하 50번의 주인공은 양경우와 이안눌이다. 양경우에 대한 글은 이미 권상 37번에서 다뤘었다. 그 글을 읽으며 한시를 읽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의 그 경치가 그대로 그려지는 걸 보며 감탄하고 또 감탄했던 기억이 있다. 이안눌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스승 정철, 그리고 친구인 권필과의 추억을 글로 정리하며 좀 더 가까운 사람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마치 마주치지 않던 평행선처럼 느껴졌던 두 사람이 이번 글에서는 같은 시대에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양경우의 말을 통해 상황과 서로의 시에 대한 평가를 첨부하고 그런 평가에 대하 홍만종 자신의 평가를 싣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50. 소화시평, 글쓰기 그리고 도전정신
소화시평 감상 - 하권 50. 소화시평, 글쓰기 그리고 도전정신
소화시평, 글쓰기 그리고 도전정신 이미 여러 글에서 밝혔지만 참으로 막막했다. 한때 임용을 5년 정도 준비했다곤 하지만 임용공부란 게 그렇지 않은가. 자신을 좁디 좁은 공간에 유폐시켜 놓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도 오로지 ‘임용공부’라는 네 글자에 가둬놓는다. 그렇다고 제대로 공부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초반에야 이것저것 글을 보고 의미를 부여하며 공부를 하지만 그것 또한 어느 순간부턴 관성이 작용해서 하던 공부를 그저 해야만 하기에 들여다보는 정도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부의 장수생에게 최고의 적은 바로 그와 같은 무맥락적이고, 무의미적인 공부란 활동의 반복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임용공부를 징하게 할 때에도 실력은 늘 제자리를 멤돌 수밖에 없었는데 막상 임용공부를 그..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9. 시엔 그 사람이 드러나며, 한 글자엔 미래가 보인다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9. 시엔 그 사람이 드러나며, 한 글자엔 미래가 보인다
시엔 그 사람이 드러나며, 한 글자엔 미래가 보인다 『소화시평』 권하 49번은 권상 85번에서 봤던 것처럼 시참(詩讖)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미 85번 감상글에서 서술했다시피 시참은 너무도 결과론적으로 상황을 껴 맞추는 느낌이 나서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이다. 그래도 85번의 내용은 시참이라기보단 시를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예언한 경우라 보아야 한다.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해 결과론적으로 시를 껴맞추기보단 시에 드러난 그 사람의 기상을 보고 훗날의 일을 예상한 것이니 말이다. 홍섬이 모함에 의해 투옥되어 다들 걱정을 한아름 하고 있을 때 유독 소세양만은 걱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홍섬이 이전에 지은 시를 보니 어떤 극적인 상황이든 극복하려 애쓰지 않고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의..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8. 독창적인 글세계를 열어젖힌 유몽인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8. 독창적인 글세계를 열어젖힌 유몽인
독창적인 글세계를 열어젖힌 유몽인 『소화시평』 권하 48번은 권하 47번 글과 이어서 보면 이 시를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야 그가 왜 과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부는 누굴 상징하며 과부의 어떤 정조를 기리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七十老孀婦 端居守閨壺 70살의 늙은 과부가 단정히 규방을 지키네. 家人勸改嫁 善男顔如槿 집사람이 개가하라 권하는데 좋은 사람인데 얼굴도 무궁화 같다고. 頗誦女史詩 稍知妊姒訓 “여사의 시를 많이 익혔고 임사의 가르침을 조금은 알고 있어요. 白首作春容 寧不愧脂粉 흰 머리로 젊은 자태 짓는다면 어찌 연지분에 부끄럽지 않겠소.” 1구~2구에선 ‘과부=정조’를 표현하고 있다. 매우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석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정..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7. 시에 드러난 유몽인의 반반정 정신과 숨겨진 의미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7. 시에 드러난 유몽인의 반반정 정신과 숨겨진 의미
시에 드러난 유몽인의 반반정 정신과 숨겨진 의미 『소화시평』 권하 47번에 소개된 이 시를 보면 이미 유몽인은 현실의 벼슬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걸 지레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건 직접적으로 드러내선 안 되고 이와 같이 좀벌레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야만 하는 것이었다. 사화(士禍)의 시대엔 관직에 있지 않은 유학자라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여러 가지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당쟁이 본격화되는 시대엔 어느 당파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리고 변화무쌍한 권력지형의 요동침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줄을 타느냐에 따라 출세와 질시, 삶과 죽임이 갈린다. 유몽인이 볼 땐 이런 정치지형은 매우 나쁜 것으로 보였고, 매우 공적이어야할 정치활동이 사적인 정치활동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7. 인조반정과 임진왜란을 대처하는 유몽인의 방식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7. 인조반정과 임진왜란을 대처하는 유몽인의 방식
인조반정과 임진왜란을 대처하는 유몽인의 방식 『소화시평』 권하 47번에서는 ‘좀벌레두[蠹]’라는 글자가 핵심적인 글자로 나오는데, 이 글자와의 인연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고 보니 그게 벌써 12년 전의 일이 되어 버렸다. 2007년 다산연구소에서 기획하여 떠난 실학캠프에서 정여창 고택에 갔을 때 처음 알게 됐다. 정여창의 호가 바로 ‘일두(一蠹)’였고 그에 따라 여러 감상을 만들어냈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 당시엔 아래와 같은 감상을 담아놨다. 그의 호는 대단히 이색적이다. 보통 자신의 거주지나 추구하는 인생관을 호에 담기 마련이어서 호를 통해 그 사람을 볼 수 있는데, 그의 자호는 일두(一蠹)이지 않은가. 바로 ‘한 마리의 좀벌레’라는 뜻이다. 왜 그런 자기비하에 가까운 호를 붙였는지,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5. 가문의 시재를 풀어낸 홍만종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5. 가문의 시재를 풀어낸 홍만종
가문의 시재를 풀어낸 홍만종 楊柳依依二十橋 버드나무 휘늘어진 열두 다리. 碧潭春水正迢迢 푸른 호수엔 봄물이 참으로 아스라하네. 粧樓珠箔待新月 고운 누대 구슬 늘어뜨린 주렴에서 새로 뜰 달을 기다리니, 江畔家家吹紫簫 강가에선 집집마다 퉁소를 불고 있네. 위에서 말한 시풍에 대한 지식으로 『소화시평』 권하 45번에서 두 번째로 소개된 「항주도(杭州圖)」라는 시를 보면 이건 두 말할 나위 없이 당시풍의 시라는 걸 알 수 있다. 항주엔 가본 적도 없지만 위 시를 읽는 것만으로도 항주의 풍경을 그려낼 수 있으니 말이다. 그곳은 물로 가득 찬 베네치아 같은 곳이리라는 상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교수님도 그곳은 운하가 뚫리며 문화의 도시로 각광 받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수많은 문인들이 그곳을 찾게 됐노라고 이야기를 해줬..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5. 단장취의로 한시의 시풍이 바뀌다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5. 단장취의로 한시의 시풍이 바뀌다
단장취의로 한시의 시풍이 바뀌다 한문에는 관습적으로 한 부분만을 인용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풀어내는 ‘단장취의(斷章取義)’의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느 한 부분만을 인용하여 그 의미를 풀어내고 거기에 자신의 주제를 강화하는 용도로 쓰곤 했었다. 하지만 이렇게 할 때의 문제점은 전체내용이 아닌 부분의 내용으로 전체내용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글이란 게 쓰다 보면 여러 예시도 들어가고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반대되는 말도 하게 마련이다. 나의 글에도 여러 부분에 ‘빨갱이’란 단어들이 들어 있는데 누군가 그 부분만 딱 떼어내어 “건빵은 빨갱이를 싫어하는 반공주의자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억울한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니 맹자는 ‘단장취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4. 차운로의 호기로운 한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4. 차운로의 호기로운 한시
차운로의 호기로운 한시 峽墮新霜草木知 골짜기에 내린 새 서리, 초목이 알려주는데, 寒江脈脈向何之 차가운 강은 말없이 어디로 흘러가나? 老龍抱子深淵裏 노룡은 새끼 품고 깊은 못에서 臥敎明春行雨期 누워 내년 봄의 비 내릴 때를 가르치겠구나. 『소화시평』 권하 44번에서 두 번째로 소개된 시는 「산행즉사(山行卽事)」다. 1~2구에서 즉석에서 지은 시답게 눈에 보인 그대로의 풍경을 읊었다. 골짜기에 서리가 내렸다는 건 풀과 나무의 이슬을 통해 알 수 있고, 차가운 시냇물을 졸졸졸 어딜 향해 흘러가기만 한다. 공자 같았으면 물을 보고 철학적인 깨달음을 담았을지도 모르지만, 차운로는 그렇게까지 나아가진 않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한다. 그 물속엔 늙은 용이 살고 있으며 지금은 서리가 내린 때라 칩거한 채 자식을..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4. 정돈된 시를 잘 짓는 차운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4. 정돈된 시를 잘 짓는 차운로
정돈된 시를 잘 짓는 차운로 차천로에 대해선 다루고 있는 글들이 많아 접할 기회가 많았지만 그의 동생인 차운로에 대해선 그나마 『소화시평』 권하 44번에서 다룬 덕에 보게 되었다. 이게 바로 시화집을 읽는 맛이다. 한문학사든, 임용고사에서 다루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다룰 수는 없다. 이미 ‘교육학에서 다룬 비고츠키를 지워라’라는 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현실을 자기의 의식 속에서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취사선택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지도, 문학적 영향력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차운로보단 차천로가 더 영향력이 있다는 판단 하에 우리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것이고 차천로의 글 위주로 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기준과 홍만종이 살던 당..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3. 총석정을 보며 마음을 다잡은 김정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3. 총석정을 보며 마음을 다잡은 김정
총석정을 보며 마음을 다잡은 김정 千古高皐叢石勝 천고의 높은 언덕, 총석정이 빼어나서 登臨寥落九秋懷 올라서 보니 가을 회포 쓸쓸하네. 斗魁散彩隨滄海 두괴의 광채를 흩어 푸른 바다에 떨구고, 月宮借斧削丹崖 월궁의 도끼를 빌려 붉은 벼랑 깎았네. 巨溟欲泛危巒去 거대한 바다는 가파른 산봉우리를 띄워 보내려 하는데, 頑骨長衝激浪排 억센 바위는 오래도록 힘찬 파도와 부딪혀 밀쳐내네. 蓬島笙簫空淡竚 봉래산 신선의 피리소리, 부질없이 기다리면서 夕陽搔首寄天涯 석양에 머리 긁으며 하늘 끝에 붙어 있노라. 『소화시평』 권하 43번에 소개된 조위한의 시에 비하면 김정의 시는 그런 군더더기가 없어서 훨씬 좋다. 이런 이유와는 다르겠지만 홍만종도 조위한의 시보단 김정의 시가 훨씬 좋다고 봤다. 김정이 총석정을 읊은 시는 모두..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3. 총석정의 탁월한 묘사와 찝찝한 뒷맛을 담은 조위한의 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3. 총석정의 탁월한 묘사와 찝찝한 뒷맛을 담은 조위한의 시
총석정의 탁월한 묘사와 찝찝한 뒷맛을 담은 조위한의 시 우린 한반도에서 태어났다고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섬에 살고 있는 셈이다. 육로로는 휴전선 부근까지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생활을 철원 GOP에서 하면서 휴전선에서 대치하는 상황을 온몸으로 느꼈던 터라, 휴전선의 역설(휴전선이 주는 안전하다는 의식과 함께 이곳을 넘어설 수 없다는 한계)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 『소화시평』 권하 43번에서 다루는 총석정의 경우는 조선시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로 남아 있다. 심지어 시를 별로 쓰지 않았던 연암 박지원마저도 총석정에 대한 시를 남길 정도니 말이다. 지금 우린 분단되기 전에 남아 있는 사진으로 밖에 보지 못하는 정도지만, 막상 사진으로만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2. 반골기질의 허균을 비판한 홍만종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2. 반골기질의 허균을 비판한 홍만종
반골기질의 허균을 비판한 홍만종 허균은 과거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누비며 실력을 뽐내지만 예교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태도 탓에 여러 구설수에 휘말리며 파직 당했다가 재임용되는 등 여러 고초를 겪게 된다. 그러다 결국 광해군 때에 역모를 꾀했다는 이유로 거열형에 처해져 능지처참되며 생애를 마감한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호걸스런 사내다운 삶이라 할 수 있겠다. 바로 이런 내용을 알고 『소화시평』 권하 42번을 읽으면 더 이해하기가 쉽다. 권하 41번에서도 봤다시피 허균은 끊임없이 벼슬을 그만두고 전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꿈을 꾸고 있었다. 하지만 실력이 출중했던 탓에 주요보직에 머물며 일을 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아예 겸춘추관이란 직위까지 겸직하게 되자 여러 감상이 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2. 반골기질의 허균과 그를 도와준 사람들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2. 반골기질의 허균과 그를 도와준 사람들
반골기질의 허균과 그를 도와준 사람들 『소화시평』 권하 42번의 주인공은 허균이다. 우리에게 허균은 한글소설인 『홍길동전』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 한문이 권력의 지표가 되고 한글은 아녀자들이나 쓰는 글로 폄하되던 당시에 한문으로 유창한 글을 쓸 수 있던 사람이 한문이 아닌 한글로 글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다. 더욱이 조선시대엔 소설이란 장르는 하나의 문학 장르로 호평을 받지 못하고 ‘그저 신변잡기나 읊어대는 불온한 글’이란 인상까지 있었으니, 『홍길동전』이 조선 전기 문인사회에 어떻게 비춰졌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허균은 양반가의 막내아들로 뛰어난 문학적 소양으로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다. 신분제 사회에선 모든 기득권을 향유할 수 있는 계층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1. 태평한 기운을 한시로 표현하는 방법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1. 태평한 기운을 한시로 표현하는 방법
태평한 기운을 한시로 표현하는 방법 田園蕪沒幾時歸 전원이 거칠어졌으니, 어느 때에 돌아갈꼬? 頭白人間宦念微 머리 세니 인간세상 벼슬생각이 옅어지네. 寂寞上林春事盡 적막해라. 상림원에 봄 풍경 끝났지만, 更看疎雨濕薔薇 보슬비가 다시 장미를 적셨구나. 懕懕晝睡雨來初 나른한 낮잠은 비온 처음에 一枕薰風殿閣餘 배게엔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 전각엔 여운이 있구나. 小吏莫催嘗午飯 아전들아 일찍이 점심 먹으라 재촉하지 말게, 夢中方食武昌魚 꿈속에서 곧 무창의 물고기를 먹으려던 참이니, 『소화시평』 권하 41번에 나오는 「초하성중작(初夏省中作)」이라는 시는 위의 시와 그닥 다르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 1~2구에선 전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인다는 것에 대해 풀어냈다. 그런데 3~4구에 오면 위의 시와 확연히 다..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1. 주지번과 허균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1. 주지번과 허균
주지번과 허균 『소화시평』 권하 41번에서는 중국 사신인 주지번이 말하는 허균에 대한 평가를 들을 수 있다. 이미 권상 35번 글을 통해 허균과 주지번이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번 글에서 평가하는 걸 보니 단순히 친한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소울 메이트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아예 허균을 매우 칭송하며 ‘중국에 있더라도 상위권에 랭킹될 정도의 실력파 문장가[雖在中朝, 亦居八九人中]’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중과 포숙아의 이야기를 다룬 ‘관포지교(管鮑之交)’나 백아와 종자기의 우정담을 다룬 ‘지음(知音)’이나 이안눌과 권필의 우정담 등이 모두 그렇듯이 자기를 알아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설 연휴에 모처럼 성남에 사는 친구와 만..
 소화시평 감상 - 하권 36. 해직 당한 후 써나간 천연스러움이 가득한 권필의 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36. 해직 당한 후 써나간 천연스러움이 가득한 권필의 시
해직 당한 후 써나간 천연스러움이 가득한 권필의 시 『소화시평』 권하 36번에서는 홍만종이 생각하는 문학론을 볼 수 있고 권상 97번의 후기에서 당시(唐詩)와 강서시(江西詩)를 이야기하면서 다룬 창작관까지 볼 수 있다. 홍만종은 아주 파격적인 선포를 하면서 글을 열어젖히고 있다. ‘시는 하늘로부터 얻은 게 아니면 시라고 말할 수 없다[詩非天得, 不可謂之詩].’라는 서두가 그것인데, 너무도 확고하고 너무도 분명한 어조라 감히 다른 말을 섞어선 안 될 것 같은 느낌마저 감돈다. 이건 문학론으로 한정되어 말한 발언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흔히 사상 점검을 할 때 “‘김일성이 싫어요’, ‘북한은 인권 후진국’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말하지 못하면 ‘빨갱이’다.”라는 말과 매우 비슷한 구조를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33. 한시의 표절 시비에 대해
소화시평 감상 - 하권 33. 한시의 표절 시비에 대해
한시의 표절 시비에 대해 『소화시평』 권하 33번은 지금까지 읽은 『소화시평』의 내용 중, 아니 어떤 한문 기록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처럼 여러 작품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비교ㆍ대조해볼 수 있는 세상에선 표절을 하게 되면 금방 들통 나고, 조금이라도 비슷한 구석이 있으면 표절 시비가 붙곤 한다. 최근엔 ‘상어가족’ 표절 시비가 붙었을 정도로, 문학작품, 영화, 음악 할 것 없이 광범위하게 원저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주려 한다. 하지만 이처럼 자료의 검색이 수월하기 이전엔 표절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졌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70~80년대 대표 만화들은 일본 작품들을 무단으로 표절하여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 로봇만화인 ‘태권도 V’는 ‘마징가Z’의 아류라는 오명에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28. 소나무에 담은 문인의 가치와 문학의 위대성
소화시평 감상 - 하권 28. 소나무에 담은 문인의 가치와 문학의 위대성
소나무에 담은 문인의 가치와 문학의 위대성 그렇다면 『소화시평』 권하 28번에 나온 이 시는 과연 정말 그렇게까지 추앙을 받을 만한 작품일까?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 시를 짓게 된 모티프는 물가에 잠긴 소나무에 있다. 과연 이런 광경을 보고 홍만식은 어떤 시를 썼을까? 高直千年幹 臨溪學老龍 고상하고 곧은 천년의 가지, 시내를 굽어보며 늙은 용을 배웠구나. 蟠根帶流水 似欲洗秦封 서린 뿌리를 흐르는 물로 둘렀으니 진나라에 봉해진 소나무 씻겨주려는 듯. 1구 자체는 매우 평범하다. 물가에 잠긴 소나무를 칭송하는 말로 포문을 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2구에선 확 전환되어 소나무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투영한다. 소나무가 물을 굽어보며 ‘노룡을 배웠구나’라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니 말이다. 갑..
 소화시평 감상 - 하권 28. ‘내가 졌소’를 외칠 수 있는 문화풍토
소화시평 감상 - 하권 28. ‘내가 졌소’를 외칠 수 있는 문화풍토
‘내가 졌소’를 외칠 수 있는 문화풍토 『소화시평』 권하 28번은 『소화시평』의 시리즈 중 하나인 ‘내가 졌소[閣筆]’의 두 번째 편이다. 이미 권상 57번에서 이와 비슷한 흐름을 가진 이야기가 나왔었다. 조선 문인들에게 시를 짓는다는 건 단순히 글 솜씨만을 뽐내는 건 아니었다. 그들 또한 하나의 운자를 가지고 시를 지으며 얼마나 빨리 시를 짓냐를 경쟁하며 자신의 시재를 뽐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권하 22번과 같이 치열한 경쟁의식이 표출되기도 하고, 사람을 대하기도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선입견으로 깔보다가 시 한 수를 보고 경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이들에게 한시를 짓는 일이란 문학소양을 드러내는 일임과 동시에 실력발휘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고..
 소화시평 감상 - 하권 26. 힘을 지닌 시의 특징
소화시평 감상 - 하권 26. 힘을 지닌 시의 특징
힘을 지닌 시의 특징 『소화시평』 권하 26번은 ‘글이란 무엇인가?’란 주제의 문학론을 담고 있다. 글을 써본 사람은 이 글을 읽는 순간 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계의 주장에 동의하게 되었을 것이다. 글이 힘을 지니려면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거나 간접체험일지라도 무수히 고민하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을 잘 버무리거나 할 때다. 그래서 국토종단을 다녀와선 쓴 글들이나 학교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며 쓴 글들은 경험에 기반하여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내용이 알찰 수밖에 없고 읽는 사람도 그 경험에 장에 초대되어 그 순간을 함께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글들이, 모든 작품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만 진실성을 얻는 건 아니다. 오히려 간접체험을 통해 더 너른 세상을 누비고,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며 생각을 넓히고 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25. 임진왜란 때 쓰여진 한시로 본 조선의 무능
소화시평 감상 - 하권 25. 임진왜란 때 쓰여진 한시로 본 조선의 무능
임진왜란 때 쓰여진 한시로 본 조선의 무능 干戈誰着老萊衣 전쟁에 누가 노래자의 색동옷을 입을 수 있겠는가? 萬事人間意漸微 만사 인간의 뜻이 점점 희미해져가네. 地勢已從蘭子盡 지세는 이미 난자도로부터 끝났고, 行人不見漢陽歸 행인은 서울로 돌아가는 이 보이질 않네. 天心錯莫臨江水 임금께선 암담하게 압록강을 굽어보고, 廟算悽凉對夕暉 묘당의 계책은 처량하게 석양을 바라볼 뿐. 聞道南兵近乘勝 남도의 관군이 요즘 승기를 탔다고 들리던데, 幾時三捷復王畿 언제나 전승하여 서울을 수복하려나. 『소화시평』 권하 25번을 보면서 그런 역사의 순간들이 스칠 수밖에 없었다. 홍만종은 마치 선조가 나라에 대한 걱정에 눈물을 흘리는 뜨거운 임금처럼 묘사했고, 이호민의 시가 우국충정을 담은 것처럼 묘사하곤 있지만 난 이 글을 보며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25. 임진왜란과 선조의 꽁무니 빼기
소화시평 감상 - 하권 25. 임진왜란과 선조의 꽁무니 빼기
임진왜란과 선조의 꽁무니 빼기 『소화시평』 권하 25번은 임진왜란의 참상을 담고 있다. 일본은 각 막부 중심으로 뿔뿔이 나누어져 있었다. 그들은 각각의 막부에 소속된 사무라이들이란 군사집단을 가지고 있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화로 물꼬를 트기보다 사무라이란 힘을 통해서 무력으로 해결하려 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비견할 만한 일본의 전국시대라 할 만하다. 그런데 이렇게 사분오열로 나누어진, 그래서 모든 걸 칼과 힘으로만 제압하려 하는 야만이 판치던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엎어 통일하게 만든 사람이 등장했으니 그가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다. 그는 월등한 힘과 정략으로 일본 내의 통일을 이룩하긴 했지만 통일이 되면서 졸지에 애물단지가 된 사무라이들의 불만을 해결해줘야만 했었다. 만약..
 소화시평 감상 - 하권 22. 석주의 시와 오산의 시를 비교하다
소화시평 감상 - 하권 22. 석주의 시와 오산의 시를 비교하다
석주의 시와 오산의 시를 비교하다 『소화시평』 권하 22번엔엔 석주와 오산의 시가 동시에 실려 있고 이 두 시를 홍만종은 비교하고 있다. 鶴邊松老千秋月 학 곁의 소나무는 천년 세월 달빛 속에 묵어가고, 鰲背雲開萬里風 자라 등의 구름은 만 리의 바람에 열리네. 여기서도 석주는 마치 자신이 ‘이런 식의 차운한 시엔 나를 따를 사람이 없지’라는 걸 안다는 듯이 자신감 넘치게 휘리릭 써버렸다. 그런데 그가 쓴 내용은 정말로 호탕하기 그지없는 시였다. 그는 ‘소나무에 걸린 달 곁으로 날아가는 학과 자라 모양의 구름이 확 개는 광경’을 상상하며 이 시를 썼던 것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보면 너무도 평이한 광경이지만 석주는 그런 광경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아주 절묘하게 시어를 배치하여 멋들어지게 써냈다. 나는 그렇게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22. 한시와 순발력
소화시평 감상 - 하권 22. 한시와 순발력
한시와 순발력 사람에게 간단명료하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려 할 때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 특정 요소만을 놓고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둘 사이가 매우 명확해지고 하나의 개념이 더욱 분명하게 정의되어 전해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매우 선명하게 들리게 된다. 보통 이런 방편은 심각한 문제도 야기 시킨다.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든 단순한 요소만 집중할 경우 그 외의 수많은 것들은 묻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에서 성적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일이다. 얼핏 보면 성적을 통해 그 사람의 학업능력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고, 그로 인해 성적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게 매우 객관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로 인해 대부분의 능력들을 가리게 만들고 ‘성적만을 위해 다른 능력은 철저히 퇴화시키는 방향’으로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21. 호기롭던 차천로, 그리고 그의 작품에 대한 상반된 평가
소화시평 감상 - 하권 21. 호기롭던 차천로, 그리고 그의 작품에 대한 상반된 평가
호기롭던 차천로, 그리고 그의 작품에 대한 상반된 평가 『소화시평』 권하 21번도 에피소드가 있는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많긴 해도 재밌는 부분이며 홍만종의 시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는 우선 이규보의 일화로 시작한다. 당시의 글 잘 짓는다는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규보는 일필휘지로 302운이 제시된 시의 차운시를 적어나간다. 그래서 홍만종은 이규보가 재빨리 시를 적어나가는 것에 대해 “비록 바람을 탄 돛단배나 군진 속의 전투마라도 쉽게 그 빠름을 견주질 못했다[雖風檣陣馬, 未易擬其速].”라는 매우 인상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금의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KTX만큼 빨랐고 롯데월드타워 123층 전망대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만큼 잽쌌다.’는 식의 표현이 될 것이다...
 소화시평 감상 - 하권 19. 개성이 묻어나는 시와 그걸 알아보는 사람
소화시평 감상 - 하권 19. 개성이 묻어나는 시와 그걸 알아보는 사람
개성이 묻어나는 시와 그걸 알아보는 사람 『소화시평』 권하 19번의 에피소드는 바로 이런 ‘조회수 높은 글 VS 쓰고 싶은 글’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아주 서두를 파격적으로 열어젖히고 있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란 진실한 사람이 아니며, 모두가 좋아하는 글이란 지극한 글이 아니다[爲人而欲一世之皆好之, 非正人也; 爲文而欲一世之皆好之, 非至文也]’라고 말이다. 이 말에 나는 충분히 동의한다. 애초부터 ‘모두가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에선 불가능한 환상에 가까운 것임을 알기 때문이고, 설혹 천만 영화와 같이 대다수가 보는 좋아하는 영화가 나왔을지라도 그건 그 당시의 시대상황, 영화관 여건 등이 전체적으로 고려된 결과치일뿐, 작품의 질과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약 어떤 글 한 편..
 소화시평 감상 - 하권 19. 조회수 높은 글과 쓰고 싶은 글 사이
소화시평 감상 - 하권 19. 조회수 높은 글과 쓰고 싶은 글 사이
조회수 높은 글과 쓰고 싶은 글 사이 최근에 극장가에선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천만을 가느냐 마느냐로 시끄러웠었다. 영화에서 천만을 넘는다는 게 영화의 퀄리티와 상관없다는 걸 누구나 알면서도 천만이란 기준을 마치 ‘우월한 작품’이라는 식으로 모든 언론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천만을 넘어가면 ‘천만클럽’이란 걸 만들어 엄청난 혜택과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영화를 만들든, 음악을 만들든, 글을 쓰든 위와 같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좀 더 다양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의 색채는 걷어내고 흥행공식을 따라 갈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색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람들의 관심엔 무관심한 채 나만의 것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 말이다. 나의 경우엔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위의 공식에..
 소화시평 감상 - 하권 18. 시인의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소화시평 감상 - 하권 18. 시인의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시인의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소화시평』 권하 18번에서는 최립의 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우선 시를 해석할 때 중심에 놓고 생각해봐야 할 거리에 대해 교수님은 이야기를 해줬다. 이 시에서 시인과 스님은 같이 있는가? 따로 있는가? 만약 따로 있다면 시인은 어느 곳에 있는가? 시를 짓게 된 배경을 알고 두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면 그에 따라 시의 해석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수님은 “지금 시인은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반반이 나누어져 한 편은 ‘스님과 함께 절에 있습니다.’라고 했고, 다른 한 편은 ‘관청에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만큼 이 시는 시인의 위치를 딱 확정지어 말하기에 복잡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文..
 소화시평 감상 - 하권 17. 한시로 선연동의 기녀를 기린 권필
소화시평 감상 - 하권 17. 한시로 선연동의 기녀를 기린 권필
한시로 선연동의 기녀를 기린 권필 年年春色到荒墳 해마다 봄빛이 황량한 무덤에 찾아오면, 花似殘粧草似裙 꽃은 남은 화장인 듯, 풀은 치마인 듯. 無限芳魂飛不散 무한한 꽃다운 넋들이 흩어지지 않아서 秪今爲雨更爲雲 다만 지금은 비가 되었다가 다시 구름이 되었다가. 『소화시평』 권하 17번에서 나온 석주의 시는 절구로 되어 있기에 윤계선의 시에 비하면 사족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담백하게 느껴진다. 1구부터 아주 파격적으로 해마다 봄이면 찾아왔다고 자기 고백을 하며 2구에선 그때마다 보이는 꽃과 풀은 기녀들의 생전 모습처럼 보이기까지 하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매년 찾아와 넋들을 조문하지만 그럼에도 3구에선 넋들이 돌아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곳에 남아 있다고 말을 한다. 동양사회에선 사람을 혼과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17. 한시로 선연동의 기녀를 기린 윤계선
소화시평 감상 - 하권 17. 한시로 선연동의 기녀를 기린 윤계선
한시로 선연동의 기녀를 기린 윤계선 『소화시평』 권하 17번을 보려면 이미 말했던 권하 14번의 글과 함께 보면 도움이 된다. 선연동에 대한 얘기는 이미 『우리 한시를 읽다』의 8번째 단원인 ‘대동강 부벽루의 한시 기행’에서 익히 봤었고 여기선 박제가의 시가 실려 있다. 선연동은 기녀들이 집단으로 묻힌 곳으로 을밀대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한다. 신기하게도 어느 깊숙한 골짜기에 마련된 것이 아니라 주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 맘만 먹으면 어느 시인이고 이곳에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시 한 수를 남기는 건 ‘체면’을 무척이나 중시하던 조선시대에도 크게 흠이 되지 않았던가 보다. 瑤琴橫抱發纖歌 가야금 비껴 안고 가녀린 가락 부르던 이 宿昔京城價最多 지난 날 한양에서 몸값이 최고였다지. 春色易凋鸞..
 소화시평 감상 - 하권 14. 선비들이 기생에 대해 시를 쓰는 이유
소화시평 감상 - 하권 14. 선비들이 기생에 대해 시를 쓰는 이유
선비들이 기생에 대해 시를 쓰는 이유 『소화시평』 권하 14번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권하 17번에서 나오는 선연동에서 읊은 시들과 함께 보면 더욱 좋다. 그건 한 때는 미모[春色]를 과시하고 맘껏 나래를 펼쳤지만 스러져가는 젊음에 대한 탄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기녀를 읊은 시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이다. 한때는 미모를 과시하며 고관대작들과 어우러지던 꽃들이 시간이 흘러 이젠 시들어졌고 그에 대한 서글픈 정조를 담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기녀에 대한 얘기일 뿐 아니라, 스러져 가는 자신의 청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정조를 지닌 시인들이 기녀들의 무덤인 선연동을 지나치면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을 것이다. 기녀들의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바로 ..
 소화시평 감상 - 하권 13. 재상의 기운을 담아 장난스럽게 쓴 이항복의 한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13. 재상의 기운을 담아 장난스럽게 쓴 이항복의 한시
재상의 기운을 담아 장난스럽게 쓴 이항복의 한시 常願身爲萬斛舟 몸이 만 섬을 실을 수 있는 배가 되어 中間寬處起柁樓 중간 넓은 곳에 선실을 세워둔 채 時來濟盡東南客 때가 되면 동쪽과 남쪽의 나그네를 모두 건네주고서 日暮無心穩泛遊 해지면 말없이 평온하게 떠다니리. 『소화시평』 권하 13번에 소개된 이 시는 제목이 따로 없고 시를 짓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수초ㆍ인수와 함께 강가 집에 있었는데 여러 날 동안 배를 물색했지만 구하질 못하자 수초는 매우 울적해했었다. 그러자 수초가 탄식하며 말했다. “어떻게 하면 몸이 큰 배가 되어 바람을 타고서 풍랑을 깨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장난삼아 이 시를 지었다. 與守初ㆍ仁叟同在江舍, 數日索舟不得, 守初甚欝欝. 歎曰: “安得身爲巨艦, 乘風破..
 소화시평 감상 - 하권 13. 홍만종의 조선인재발굴단, 이항복편
소화시평 감상 - 하권 13. 홍만종의 조선인재발굴단, 이항복편
홍만종의 조선인재발굴단, 이항복편 『소화시평』 권하 13번은 이항복이 어렸을 때부터 시를 지을 수 있는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판이 자자했다는 것과 그럼에도 그 또한 노는 인간(호모 루덴스)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옛날부터 최근까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프로그램 중에 ‘영재발굴단’이란 이름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는 말 그대로 ‘영재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많은 영재들이 배출되었다. 그런데 이 프로를 볼 때 단순히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영재란 무엇인가?’라는 기준 자체에 있다. 즉, 영재라는 기준 자체는 방송이 정한 ‘기업 비밀’에 해당되며, 그건 이 사회가 생각하는 ‘영재란 이런 거야’라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영..
 소화시평 감상 - 하권 9. 홍만종, 윤두수 시 평론에 실수를 하다
소화시평 감상 - 하권 9. 홍만종, 윤두수 시 평론에 실수를 하다
홍만종, 윤두수 시 평론에 실수를 하다 關外羈懷不自裁 변방에서 나그네 회포를 스스로 다잡지 못했는데 一春詩興賴官梅 봄 내내 시 흥취는 관청의 매화에 의지했었다네. 日長公館文書靜 날은 길고 공관의 문서작업은 뜸한데 時有高僧數往來 마침 고승이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한다네. 『소화시평』 권하 9번에선 윤두수의 시를 다루고 있고 홍만종은 이에 대해 ‘시(時)와 삭(數), 두 글자는 말의 뜻이 서로 반대된다[其時ㆍ數二字, 語意相反].’라고 평가를 했다. 홍만종은 위 시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을 발견한다. ‘시(時)와 수(數), 두 글자는 말의 뜻이 서로 반대된다.’고 본 것이다. 물론 두 글자엔 상반된 의미가 담겨져 있긴 하다. 시(時)엔 간헐적으로라는 뜻이, 삭(數)엔 자주라는 뜻이 있으니 홍만종이 저..
 소화시평 감상 - 하권 9. 윤두수의 한시 이해하기
소화시평 감상 - 하권 9. 윤두수의 한시 이해하기
윤두수의 한시 이해하기 도올 김용옥샘의 책을 읽다 보면 판본에 대한 정밀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걸 여러 장면에서 볼 수 있다. 지금처럼 한 권의 책이 다량으로 나올 수 있는 시기에도 개정판이나 증보판이 나오기 때문에 출처를 밝힐 땐 어느 출판사에서 언제 나온 책인지를 명확히 써야 한다. 그래야 판본에 대해 명확히 밝힐 수 있고 논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지금도 그런데 예전의 책들은 많이 생산되지 않았다 해도 사람들이 필사를 하며 글자가 바뀌거나 아예 내용이 달라진 부분도 있다. 그러니 자신이 연구하는 판본이 제대로 된 판본인지, 그리고 다른 판본에는 다른 글자나 내용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저자의 입장을 정확히 비판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런 과정이 빠진 채 한 권의 책이 어떤 출처에서 나..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 이산해의 왕소군에 관한 시를 비판하다
소화시평 감상 - 하권 6. 이산해의 왕소군에 관한 시를 비판하다
이산해의 왕소군에 관한 시를 비판하다 『소화시평』 권하 6번에 나온 왕소군은 한나라 궁궐에 있던 궁녀로 미모가 빼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외모가 빼어나다고 해서 임금의 눈에 쉬이 뜨일 리는 없었다. 궁궐 안에만 3000명의 궁녀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임금에 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제(元帝)의 측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직책을 맡거나 그도 아니면 궁중 화공(畵工)의 눈에 들어야 한다. 왜 갑자기 화공이 등장하냐면 이 당시 원제는 궁녀를 일일이 볼 수 없었기에 화공들이 그린 초상화를 보고 합방할 궁녀들을 선택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화공이 예쁘게 그려주면 간택될 확률이 높은 건 자명한 이치였고, 이에 따라 궁녀들은 화공에게 여러 뇌물을 건네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왕소군은 화공에게 잘 보..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 시를 통해 관리들을 경계한 유몽인의 한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 시를 통해 관리들을 경계한 유몽인의 한시
시를 통해 관리들을 경계한 유몽인의 한시 貧女鳴梭淚滿腮 가난한 계집이 베 짜면서, 눈물이 뺨에 가득하니, 寒衣初欲爲郞裁 겨울옷 처음에 생각할 땐 낭군을 위해 만들려 했었는데, 朝來裂與催租吏 아침에 와서 세금을 재촉하는 아전에게 찢어서 줬는데, 一吏纔歸一吏來 한 아전이 겨우 돌아가니 다른 한 아전이 오는구나. 『소화시평』 권하 4번의 여섯 번째 소개된 유몽인의 시는 읽는 순간에 최치원의 「강남녀(江南女)」가 절로 떠올랐다. 60~70년대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무수한 시골 남녀들이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 올라왔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가장 말단에서 미싱을 돌리며 옷을 만들고 막노동판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밤잠 못 자가며 일했던 끈기 덕에 우리는 이만큼 먹..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 시를 통해 관리들을 경계한 최립의 한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 시를 통해 관리들을 경계한 최립의 한시
시를 통해 관리들을 경계한 최립의 한시 一年霖雨後西成 한 해의 장마비가 추수 뒤에 내렸지만 休說玄冥太不情 물의 신이 매우 무정하다 말하지 마라. 正叶朝家荒政晩 바로 조정의 구황정책이 늦는 것과 같으니, 飢時料理死時行 굶주릴 땐 재더니만 죽을 때에야 시행하는 구나. 『소화시평』 권하 4번의 다섯 번째 소개된 최립의 시는 농부의 마음을 담고 있다. 지금이야 먹을거리가 풍족해서 보릿고개와 같은 게 없고, 구황정책도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지만 5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먹는 것은 큰 문제였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건 모두 ‘박정희 대통령 덕’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저시급을 받아가며 밤낮을 세워가며, 온갖 안 좋은 환경에도 최선을 다해 일을 한..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 신천이 나무다리를 통해 경계하고 싶은 것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 신천이 나무다리를 통해 경계하고 싶은 것
신천이 나무다리를 통해 경계하고 싶은 것 斫斷長條跨一灘 긴 가지를 잘라 한 여울에 걸치니 濺霜飛雪帶驚瀾 흩뿌린 서리와 나는 눈, 거기에 사나운 물결까지 두르고 있네, 須將步步臨深意 걸음걸음 깊은 곳에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移向功名宦路看 공명을 탐하는 벼슬길로 옮겨서 봐야하리. 『소화시평』 권하 4번의 네 번째 소개된 신천의 시는 나무다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한다. 1~2구에선 나무를 잘라 다리를 만들었으니 그 다리엔 서리와 눈도 쌓이고 놀란 여울물까지 수시로 다리를 흔들어댄다는 내용이다. 여기까지 보면 매우 평이한 상황에 대한 묘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나 3~4구에선 문의가 확 달라진다. 나무다리를 건널 때 우리는 온 힘을 다해 건너는 게 아니라, 조심조심 건너 듯하는 행동을 통해 전혀 다른 상..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 권사복이 기러기를 통해 경계하고 싶은 것
소화시평 감상 - 하권 4. 권사복이 기러기를 통해 경계하고 싶은 것
권사복이 기러기를 통해 경계하고 싶은 것 雲漢猶堪任意飛 하늘은 오히려 니 뜻대로 날 수 있는데, 稻田胡自蹈危機 어쩌자고 논을 밟아 위기에 처했나? 從今去向冥冥外 이제부터 까마득한 저 하늘 밖으로 날아가서 只要全身勿要肥 다만 몸을 보전하길 구하고 살찌길 구하지 말라. 『소화시평』 권하 4번에서 권사복의 시와 신천의 시도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막상 시를 볼 땐 몰랐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니 하권 4번에 나오는 6편의 시는 교묘히 안배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2편씩 같은 주제를 말하는 시를 묶음으로 내용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들으면 더 뇌리에 강하게 박히듯, 아마도 홍만종은 그걸 염두에 두고 이런 식으로 편집한 것이리라. 권사복의 시를 읽는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