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의 분위기②
이와 같은 새로운 건국의 분위기 속에서 1746년에는 『속대전』이 간행된다. 무엇의 후속편이기에 이름이 『속대전』일까? 말할 것도 없이 『경국대전』의 후속편이다. 『속대전』은 『경국대전』이 편찬된 이후에 공표된 각종 법령들을 총정리한 새 법전이다. 그런데 『경국대전』이라면 15세기 중반 세조(世祖) 때, 바꿔 말하면 조선이 왕국이었을 때 만들어진 법전이 아닌가? 그 뒤 무려 300년 동안 법전의 개정판이 없다가 영조(英祖) 때에야 비로소 개수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을 말해준다(숙종肅宗 때인 1688년에 법전을 편찬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소폭의 개정만 이루어졌다).
하나는 지난 3세기 동안 사대부(士大夫) 정치가 판을 치면서 새 법전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혼란스러웠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영조가 조선 초기의 왕국 이념을 계승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다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영조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속대전』의 편찬을 지휘했는데, 아마 형벌제도를 손볼 때부터 새 법전 편찬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영조가 이룬 가장 큰 개혁의 성과는 1750년에 균역법(均役法)을 제정한 것이다. 균역법이란 말뜻 그대로 백성들의 요역 부담을 균등하고 공평하게 하자는 취지를 가진 제도이다. 요역 중에서도 으뜸은 군역이었으니까 사실상의 군제(軍制)라고 봐도 되겠다.
오늘날에도 병역비리의 문제가 끊이지 않지만, 온 백성을 ‘인적 자원’ 으로 관리하는 기능이 지금보다 크게 뒤떨어진 조선사회에서는 병역으로 인한 문제와 폐단이 훨씬 심했다. 더욱이 지금은 국민개병제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병역의 의무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쉽지 않으나 조선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물론 병역이 의무적이었던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의무는 양반과 천인 신분이 제외된 양인(良人)만의 몫이다. 원래 군역은 역대 한반도 왕조들의 기본적인 조세제도인 조용조(租庸調) 가운데 용(庸)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앞에서 보았듯이 조용조란 각각 토지세, 요역, 특산물을 뜻한다). 따라서 국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백성들을 동원해서 부릴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징집된 병사들을 상시적으로 훈련시키는 기관이나 제도가 없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으므로 군역은 사실상 ‘돈’의 문제가 되어 버린다(앞에서도 말했듯이 조선은 중국에 사대하는 처지였으므로 상비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는 않았다). 거의가 다 농민인 백성들이 농사를 팽개치고 국가에서 명령하는 시기와 장소에 맞춰 군역에 종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 초기부터 사람을 사서 자신의 군역을 대신하게 하는 방식이 성행했는데, 지금 같으면 병역기피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인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차츰 관습으로 자리잡게 된다. 결국 중종(中宗) 때부터는 그 관습을 아예 제도로 만들어 국가가 백성들에게서 돈을 받고 그 일을 대행해주기에 이르렀다. 화폐경제가 없었던 당시의 돈이란 바로 베, 즉 포(布)를 가리킨다. 그래서 군역을 면하기 위해 바치는 베를 군포(軍布)라고 부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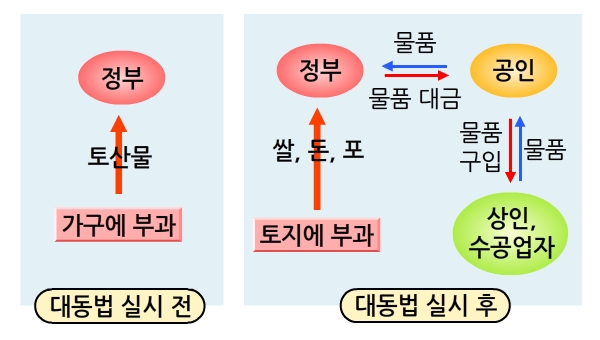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