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격적인 제문
| 살아 있는 석치石癡1라면 함께 모여 곡도 하고, 함께 모여 조문도 하고, 함께 모여 욕지거리도 하고, 함께 모여 웃기도 하고, 몇 섬이나 되는 술을 마시기도 하고, 맨몸으로 서로 치고받고 하며 고주망태가 되도록 잔뜩 취해 서로 친한 사이라는 것도 잊어버린 채 인사불성이 되어, 마구 토해서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뒤집혀 어질어질하여 저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그만둘 터인데, 지금 석치는 진짜 죽었구나! 生石癡, 可會哭可會吊, 可會罵可會笑. 可飮之數石酒, 相臝體敺擊, 酩酊大醉, 忘爾汝, 歐吐頭痛, 胃翻眩暈, 幾死乃已. 今石癡眞死矣. |
제문祭文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글로서, 흔히 제물祭物을 올려 축문祝文처럼 읽게 되어 있다. 그 형식은 보통 글의 서두에 ‘언제 누가 누구를 위해 제문을 지은바 제수를 갖춰 곡하며 읽는다’라는 말을 한 다음 망자亡者의 언행을 찬미하거나 망자와 자기 사이의 특별한 일을 거론하면서 망자를 추모함이 일반적이다. 서두에 제시되는 ‘언제 누가 누구를 위해 제문을 지어 제수를 갖춰 곡하며 읽는다’라는 말은 산문으로 되어 있으며, 극히 간단한 진술이게 마련이다. 이 말 뒤에 이어지는 제문의 본문은 산문일 경우도 있고 4언의 운문일 경우도 있다. 한편, 제문은 진실한 감정을 토로하되 그 문체와 어조는 공손하고 경건함이 일반적이다.
이 글은 제문의 일반적 형식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 보통의 제문은 그 서두에 언제 누가 제문을 쓰며 망자는 누구며 제문을 쓴 사람과 망자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을 간단히 밝히고, 그에 이어 조촐한 제수를 갖춰 곡하며 글을 읽는다는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선 망자를 추모하는 말을 기다랗게 쭉 늘어놓은 뒤 맨 끝에 ‘상향尙饗’하고서 끝맺는다.
제문의 이런 일반적 형식에 비추어볼 때 이 글의 서두는 파격 중의 파격이라 할 만하다. 서두에 나와야 할 말은 일체 나오지 않고 다짜고짜 “살아 있는 석치라면(生石癡)” 운운하는 말로 시작됨으로써다. 형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제문은 그 어조와 문체 역시 대단히 파격적이다. 제문은 비록 진실한 정을 표출함을 귀하게 여기는 장르이긴 하나 그럼에도 그 어조와 문체는 공손하고 점잖아야 한다. 그리고 슬프다는 뜻을 갖는 영탄사인 ‘차호嗟乎’라든가 ‘오호嗚呼’라는 말을 되풀이해 사용하면서 비탄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함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제문에는 그런 단어가 일체 발견되지 않으며, 공손하고 점잖다기보다 비속하다 못해 상스러운 느낌마저 든다. 이처럼 이 제목은 그 형식에서부터 어조와 문체에 이르기까지 심한 파격과 일탈을 보여준다.
독자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연암이 쓴 여러 장르의 글을 읽어오면서 연암의 파격적인 글쓰기를 여러 차례 목도했을 줄 안다. 하지만 이 글처럼 그 장르적 규범으로부터의 심한 일탈을 보여주는 글은 여태껏 없었다. 연암은 대체 무슨 심보로 하필 정석치의 제문에 이다지도 심한 파격을 구사한 것일까? 여기에는 분명 예사롭지 않은 의도와 사연이 있을 터이다. 다시 말해 연암은 이 글에서 단지 그 내용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파격적인 형식과 문체를 통해서도 뭔가 이 글을 쓴 당시 자신의 기본과 심리상태를 전달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글을 읽어 나가면서 더 생각해보기로 한다.

- 석치石癡: 정철조鄭喆祚(1730~1772)의 호다. 소북小北 집안으로 공조판서를 지낸 정운유鄭運維(1704~1772)의 아들이다. 18세기의 저명한 산림 학자인 미호渼湖 김원행金元行의 문인이며, 남인南人인 이가환李家煥의 처남이다. 1774년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과 정언을 지냈다. 홍대용(1731~1783), 황윤석黃胤錫(1729~1791) 등과 친교가 있었으며, 영ㆍ정조 때의 뛰어난 자연과학자의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뛰어나 정조의 초상화 제작에 관여한 적이 있다. 벼루 제작에 조예가 깊어 ‘석치(硯石, 즉 벼룻돌에 미친 바보라는 뜻)’라고 자호하였다. [본문으로]
2. 일상 속 빈자리를 통해 너의 부재를 확인하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단락이 느닷없는 출발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서양의 산문 분석에서는 이런 시작 방식을 ‘sudden start’라고 부른다. 이런 방식으로 시작되는 서두는 독자의 심리에 강한 인상과 파문을 던지면서 초입에서부터 독자를 긴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독자는 어떤 심리적 준비 과정도 없이 단박에 대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강요당한다. 그런데다가 이 단락의 문장은 그 호흡이 유장하고 느긋한 것이 아니라, 아주 짧고 촉급하다. 빠른 숨으로 단숨에 읽도록 씌어진 문장인 것이다. 왜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급한 템포의 문장을 서술한 걸까? 이는 연암의 심리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단락의 통사 구조統辭構造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 (A) | (B) |
| 살아 있는 석치라면 이러이러할 텐데, | 그럴 수 없는 걸 보니 석치가 진짜 죽었구나. |
여기서 (A)의 ‘이러이러할 텐데’는 석치가 살아있을 때 연암과 함께한 일상의 이런저런 행위들을 말한다. 이 일상의 행위들은 몇 개의 병렬구竝列句를 통해 질풍노도와 같이 단숨에 서술된다. 그것은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어서 굳이 생각지 않아도 툭 튀어나와 쭈르르 열거되는 사안들이다. 그만큼 둘은 가까웠던 것이다. 둘은 친구나 친지의 초상을 당하면 함께 문상을 가 곡을 하거나 조문을 했다(可會哭可會吊). 그렇건만 지금 그런 석치가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석치가 살아있을 때 연암은 늘상 석치와 함께 껄껄대고 함께 누군가를 욕하고 말술을 마셔 고주망태가 되어 서로 엉겨 붙어 싸우기도 하고 인사불성이 되어 속칭 오바이트를 하기도 했는데(可會罵可會笑. 可飮之數石酒, 相臝體敺擊, 酩酊大醉) 지금 그런 석치가 있어야 할 자리건만 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석치는 정말 죽은 게 맞구나! 석치는 늘 연암의 일상 속에서 연암과 함께했다. 하지만 지금 석치는 연암의 일상 속에 있지 않다.
연암은 이를 통해 석치의 부재(=죽음)를 확인한다. 친한 사람의 죽음은 그와 함께했던 일상 속 그의 빈자리에서 가장 잘 느껴지는 법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와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걸 의미한다. 그것은 공부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으며, 자전거 타기나 등산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그림일 수도 있으며, 유쾌하고 즐거운 조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런 것을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부재를 뚜렷이 느끼며 커다란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 연암은 이런 심리적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금 석치는 진짜 죽었구나!(今石癡眞死矣)”라는 구절에서 ‘지금(今)’이라는 말에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단어는 긴 가정문과 그에 이어지는 단정문의 경계 부분에 서 있다. 그리하여 이 단어는 현실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음에 이르기까지의, 한편으로는 퍽 당혹스럽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슬픈 연암의 심리적 추이를 응축해내고 있다.

3. 자유분방하게 감정을 토로하다
| (A) | (B) |
| 살아 있는 석치라면 이러이러할 텐데, | 그럴 수 없는 걸 보니 석치가 진짜 죽었구나. |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A)의 가정문은 절묘하게도 두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하나는 이를 통해 연암과 석치의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석치의 죽음을 도무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연암의 감정 상태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연암은 일상 속 석치의 부재를 통해 ‘석치가 진짜 죽은 게 맞긴 맞구나!(今石癡眞死矣)’하고 석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이 단락은 가정문 (A)와 그에 이어지는 단정문 (B)를 통해 친한 벗 석치의 죽음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연암의 심리 상태 및 그럼에도 결국 석치의 죽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슬픈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좀 어려운 말을 쓴다면, “살아 있는”에서 시작하여 “죽었구나”로 종결되는 이 단락의 문장은 이러한 심리적 상황을 잘 ‘구조화’해 놓고 있다고 할 만하다. 이 단락의 문장이 몹시 짧고 촉급한 호흡을 보여주는 것은 이 글을 쓸 당시 연암의 이런 심리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 단락에는 “함께 모여 ~하고(可會哭可會吊, 可會罵可會笑)”라는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된다. 이는 예전에 함께 모여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그런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 점에서 “지금 석치는 진짜 죽었구나”라는 이 마지막 어구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하고”라고 반복되는 말 속에도 연암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연암은 당시의 사람들이 점잖고 고상한 말만 주워다 써야 훌륭한 글이 되는 줄들 아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라는 투의 말을 여러 곳에서 한 바 있다. 연암은 문장이란 아름다운 말과 고상한 말만 쭉 나열한다고 해서 훌륭하게 되지 않으며, 추한 말이나 비속한 말도 적절히 잘 쓰면 진실하고 훌륭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연암은, 글에는 못 쓸 말이 하나도 없으며,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라고 했다. 고상한 말만 잔뜩 늘어놓아서는 진실한 글은커녕 진부하고 뻔한 글이 되기 십상인바 그런 글은 죽은 글이며, 속담이나 비속한 말이라도 잘 살려 쓰면 생기를 발하는바 살아 있는 글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말하자면 연암은 언어의 아속雅俗(고상함과 비속함)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던 당대 사대부의 문학론에서 탈피해 글쓰기에서 언어와 표현의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문학의 진실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단락이 보여주는 언어와 표현은 퍽 비속하여 당시 점잖은 문인이나 사대부가 이 글을 봤다면 필시 눈썹을 찌푸리거나 혀를 쯧쯧 찼을 것이다. “맨몸으로 서로 치고받고(相臝體敺擊)” “마구 토해서(歐吐)” “속이 뒤집혀(胃翻眩暈)”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그만둘(幾死乃已)” 따위의 말은 점잖은 신분의 사대부를 형용한 말치고는 지나치게 상스럽고 적나라하다.
게다가 이 글은 소설이나 패설류稗說類도 아니고 명색이 제문이지 않은가. 제문이란 정통 한문학의 한 문체로서, 그것대로의 족보가 있고 관습이 있으며 규범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연암은 굳어 있는 격식이나 상투적인 언어를 따르지 않고 파격적이고 자유분방한 글쓰기를 통해 석치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대담하고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이 글은 의례적인 글이 아닌 연암의 진실한 마음이 속속들이 배어 있는 글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4. 천문학ㆍ수학ㆍ지리학 등 학문에 뛰어났던 그대
| 석치가 죽자 시신을 둘러싸고 곡하는 이들은 석치의 처첩과 함께, 아들과 손자, 친척들인데, 그 곁에 함께 모여 곡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석치 유족의 손을 잡고 이렇게 위로한다. “훌륭한 가문의 불행입니다. 철인哲人이 어찌해 이렇게 되셨는지……” 그러면 그 형제와 아들과 손자들이 절하고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대꾸한다. “저희 집안의 흉액입니다.” 석치의 벗들은 서로 이렇게 탄식한다. “이런 사람은 정말 쉽게 얻을 수 없는데……” 함께 모여 조문하는 이들도 실로 적지 않다. 한편, 석치에게 원한이 있던 자들은 평소 석치더러 병들어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곤 했거늘 이제 석치가 죽었으니 그 원한을 갚은 셈이다. 죽음보다 더한 벌은 없는 법이니까. 세상에는 참으로 삶을 한낱 꿈으로 여기며 이 세상에 노니는 사람이 있거늘 그런 사람이 석치가 죽었다는 말을 듣는담녀 껄껄 웃으며 “진眞으로 돌아갔구먼!”이라고 말할 텐데, 하도 크게 웃어 입안에 머금은 밥알이 벌처럼 날고 갓끈은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질 테지. 石癡死而環尸而哭者, 乃石癡妻妾昆弟子姓, 親嫟固不乏. 會哭者握手相慰曰: “德門不幸, 哲人云胡至此?” 其昆弟子姓拜起, 頓首對曰: “私門凶禍.” 其朋朋友友相與歎息言, “斯人者固不易得之人.” 而固不乏會吊者. 與石癡有怨者, 痛罵石癡病死, 石癡死而罵者之怨已報, 罪罰無以加乎死. 世固有夢幻此世, 遊戱人間, 聞石癡死, 固將大笑, 以爲歸眞, 噴飯如飛蜂, 絶纓如拉朽. |
철인哲人이란 지혜가 탁월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흔히 제문이나 애도하는 말에서 죽은 사람을 높일 때 이 단어를 쓴다. 정석치는 천문학과 수학, 지리학 등의 학문에 빼어났는데, 그 학문적 면모를 보여주는 두어 개의 기록을 아래에 소개한다.
대사간 운유運維의 아들 집이 서울 집거동集巨洞에 있는데 그는 경술년庚戌年(1730)에 태어났으며 과거科擧 문장에 능하고 천문학과 수학에 정통한바, 마테오 리치가 남긴 학문을 근본으로 삼은 지 20여 년이나 되었다. 그가 있는 방에는 서학서西學書(서양의 자연과학에 대한 책)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비록 그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방에 들어오는 걸 허락지 않았다. -황윤석의 『이재난고頤齋亂藁』
석치는 문예적 교양이 높았을 뿐 아니라 뛰어난 기예를 지녔다. 그래서 기계로 움직이는 여러 기구들, 이를테면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기구, 물건을 높은 데로 나르는 기구, 회전 장치를 한 방아, 물을 퍼 올리는 기구 따위를 능히 마음속으로 궁구하여 손수 제작해냈다. 모두 옛날의 것을 본떠 현재에 시험하여 세상의 쓰임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이다. -박종채의 『과정록』 1권 25번
石癡文雅, 有絕藝. 凡機轉諸器, 如引重ㆍ升高ㆍ磨轉ㆍ取水之類, 能心究手造. 皆欲倣古試今, 需諸世用也.
관상대 위에 있는 여러 기구들은 혼천의渾天儀나 선기옥형璇璣玉衡(일종의 천문관측 기구) 같은 것일 듯하며, 뜰에 비치해 둔 것은 내 친구 정석치의 집에서 본 것과 비슷했다. 석치는 대나무를 깎아 손수 여러 천문 관측기구를 만들었는데 다음 날 가서 찾아보면 이미 다 부숴버리고 없었다. 언젠가 홍덕보(홍대용)와 함께 석치의 집에 간 적이 있다. 두 사람은 황도黃道와 적도赤道, 남극과 북극에 관해 서로 토론하면서 혹은 머리를 젓고 혹은 고개를 끄덕이곤 하였다. 그 내용은 모두 난해하여 알아듣기 어려웠으며, 나는 조느라 자세히 듣지도 못하였다. 새벽에 보니 두 사람은 아직도 어두운 등불 아래 서로 마주 앉아 토론을 하고 있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
盖臺上諸器, 似是渾天儀ㆍ璿璣玉衡之類, 而庭中所置, 亦有似吾友鄭石癡家所見者. 石癡甞削竹手造諸器, 明日索之, 已毁矣. 甞與洪德保共詣鄭, 兩相論黃赤道南北極, 或擺頭, 或頤可. 其說皆渺茫難稽, 余睡不聽, 及曉, 兩人猶暗燈相對也.

5. 석치를 저주한 사람들
이 단락은 잠시 숨을 고르는 부분이다. 앞 단락이 아주 빠른 템포로 감정의 직절적直截的 분출을 보여주었다면, 이 단락은 망자亡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서술해놓고 있다. 앞 단락을 ‘급急’이라 한다면 이 단락은 ‘완緩’이다. 이렇듯 두 단락은 퍽 대조적이다. 이처럼 완급을 교대해가며 서술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독자를 편안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글에 입체감을 부여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급’으로만 일관하거나 ‘완’으로만 일관하는 글을 한번 상상해보라. 독자는 전자의 경우 숨이 가빠 죽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 지루해 죽을 것이다.
한편, 앞 단락이 격렬함과 당혹감이라는 감정을 거쳐 체념의 감정으로 끝나고 있고, 그것을 받아 이 단락이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연암은 격한 감정이 잠시 잦아듦에 따라 초점을 잃은 듯한 멍한 눈으로 빈소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른다. 하지만 이 대목이 보여주는 연암의 관찰과 생각들은 이 제문을 한갓 개인적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적 의미를 갖게 만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역시 연암답다. 개인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사회와의 연관, 사회와의 긴장 관계를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석치의 죽음은 심중한 사회적 의미관련을 획득한다.
이 단락에는 석치와의 관계에 따라 네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다. 그 하나는 모여서 곡을 하는 유족들과 친지들이고, 그 둘은 모여서 조문하는 벗들이고, 그 셋은 평소 석치를 미워하거나 석치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자들이고, 그 넷은 이 세상을 초월해 도인道人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석치의 죽음을 가장 슬퍼할 사람은 그 형제, 아내, 자식 등의 가족일 터이지만, 외가와 처가의 인척들 및 석치의 벗들 역시 슬픔에 잠겨 애도를 표한다. 석치의 학문적 재능과 예술적 출중함을 생각한다면 52세로 타계한 석치의 죽음은 몹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석치의 죽음을 안타까운 일로 애도한 것은 아니다. 이 단락은 그 중간 부분, 즉 “한편, 석치에게 원한이 있던 자들은 평소 석치더러 병들어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곤 했거늘(與石癡有怨者, 痛罵石癡病死)”에 이르러 분위기가 싹 바뀐다. 어찌 보면 이 단락의 핵심은 바로 이 대목에 있을지 모른다. “그 원한을 갚은 셈이다. 죽음보다 더한 벌은 없는 법이니까(石癡死而罵者之怨已報, 罪罰無以加乎死)”라는 말은 흡사 연암의 독백처럼 들리는데, 역설적 표현을 통해 그런 자들을 조소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석치를 저주한 자들은 대체 어떤 자들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하지만 석치가 소북小北에 속했으며 그 매부가 남인南人의 촉망받던 학자인 이가환이었음을 생각한다면 반대당인 노론의 인사들, 특히 벽파僻派 계열의 인물들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당시 소북은 당세黨勢가 미미했으며 대개 남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석치의 둘째 누이동생이 이가환에게 시집간 데서도 이런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이가환은 성호 이익의 종손從孫으로서, 정조 즉위년에 문과에 급제했으며, 정조가 친히 임한 문신제술文臣製述(문신에게 글을 짓는 시험을 보이는 일)에서 누차 수석을 차지함으로써 일찍부터 정조의 주목과 인정을 받은 인물이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탕평을 강조한 정조는 강성한 노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남인과 소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므로 남인의 대학자인 성호 이래의 가학家學과 타고난 박람강기를 바탕으로 경학經學과 자연과학 등 온갖 학문에 통달해 있던 이가환은 정조에게는 좀 귀한 존재가 아니었다. 가령 『정조실록』의 정조 2년(1778) 2월 14일 조에 보면 정조가 당시 승문원 정자正字로 있던 이가환을 불러 경서와 천문역법 등에 대해 문답한 내용이 길게 실려 있는데 정조는 이가환이 ‘해박하다’고 평하면서 몹시 흐뭇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후 이가환은 출세가도를 달려 정도 5년 8월에는 임금의 특지特旨로 지평에 제수되기에 이른다. 지평은 사헌부 소속의 정5품관이다. 비록 품계는 그리 높지 않아도 이 벼슬은 조정의 요직 중의 요직이었다. 왜냐하면 3정승과 판서를 비롯한 백관百官의 비위 사실에 대한 탄핵권을 갖고 있었고, 인사 및 법률 개편에 대한 동의와 거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것은 정조 5년 7월 무렵 석치 역시 지평의 벼슬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석치는 얼마 안 있다 사간원의 정6품 벼슬인 정언으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데, 『정조실록』의 정조 5년 9월 4일자 기사에는 당시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이 글을 올려 정철조를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데 참여시킬 것을 청하는 말이 보인다. 이 기사를 끝으로 실록에는 석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데, 아마 이해 9월 이후의 어느 시점에 타개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볼 때 석치와 이가환은 한 묶음으로 묶이는 사람이다. 둘은 중국에서 간행된 최신 서학서인 『역상고성曆象考成(천문역법에 관한 책)』과 『수리정온數理精蘊(수학에 관한 책)』 등을 깊이 탐구하는 등 실학에 대한 학문적 감수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문과에 급제하여 조정에서 청요직淸要職의 벼슬을 맡고 있었으며, 게다가 이가환은 그 출중한 능력으로 인해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석치가 저주를 받은 것은 이런 사정과 관련이 없지 않을 터이다. 노론 강경파 측에서 본다면 석치와 그 매부 이가환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이고 질서와 음해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6. 머리로 아는 죽음과 가슴으로 느껴지는 죽음
이 단락의 포인트는 평소 석치를 저주하던 자들에게 대한 역설적 조소에 있다고 해야겠지만, 이 단락의 가장 미묘한 대목은 석치의 죽음에 대한 도인의 반응을 언급한 구절이 아닌가 한다(世固有夢幻此世, 遊戱人間, 聞石癡死, 固將大笑, 以爲歸眞, 噴飯如飛蜂, 絶纓如拉朽).
이런 도인은 『장자』라는 책에 허다하게 등장한다. 『장자』는 이런 인물을 내세워 삶이란 한낱 꿈에 지니지 않는다는 것, 삶과 죽음은 결코 분리되지 않으며 죽음이야말로 삶의 근원이라는 것, 따라서 죽음이란 특별한 일도 슬퍼할 일도 아니며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단락 끝 부분에서 도인이 보여주는 태도는 이런 생사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생사관은 그야말로 아주 높은 정신적 경지로서, 석치의 유족들이나 먼 친인척들이나 친구들이 그의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슬퍼하는 태도라든가 적대적 인물들의 고소해하는 태도와는 전연 다른 차원의 것이다.
연암은 이 단락의 맨 마지막에서 굳이 죽음에 대한 이런 태도를 언급함으로써 죽음이란 사실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건 장자가 말한 대로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일이다, 석치의 죽음도 결국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죽음을 반성적으로 관조케 함으로써 연암의 마음을 잠시 위로해주었을 수 있다. 그건 사실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지 않을까?
이 구절을 가만히 음미해보면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석치가 죽었다는 말을 듣는다면 껄껄 웃으며 ‘진眞으로 돌아갔구먼!’이라고 말할 터이다(聞石癡死, 固將大笑, 以爲歸眞)”라고 끝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 뒤에 사족처럼 “하도 크게 웃어 입안에 머금은 밥알이 벌처럼 날고 갓끈은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질 테지(噴飯如飛蜂, 絶纓如拉朽)”라는 말을 덧붙였을까? 비통한 심정을 담은 이런 제문에서도 연암은 유머러스한 표현을 즐긴 것일까? 하지만 그런 추론은 사리에 통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일까? 그냥 재미있으라고 그렇게 과장되게 표현한 걸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연암의 글은 퍽 용의주도하여, 쓸데없는 말이나 이유 없는 말, 하나마나한 말은 일체 않는 게 특징이다. 더군다나 이 글은 장난삼아 쓴 글이 아니고, 제문이지 않은가.
나는 이 과장된 서술 속에 연암의 미묘한 심경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연암은 머리로는 『장자』의 생사관을 떠올리며, 그래 죽음이란 본시 그런 거야, 그러니 슬퍼할 건 없어, 슬퍼한다는 건 뭘 모르고 그러는 거지, 하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슴으로는 여전히 슬프다. 좋다, 석치가 ‘진’으로 돌아갔다고 치자. 하지만 그딴 게 뭐가 중요한가.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나는 지금 석치가 말할 수 없이 그립고, 석치의 부재가 애통하기만 하고, 그래서 여전히 울고 싶어진다. 이런 마음이 도인의 웃음에 대한 묘사를 왠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과장된 쪽으로 이끈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목의 과장된 표현에는, 죽음이란 마땅히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는 현상이기에 슬퍼할 일이 아닌 줄 번연히 앎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슬픔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는 연암의 심경이 역설적으로 투사되어 있다고 할 만하다.

▲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7. 진짜로 네가 죽었구나
| 석치는 진짜 죽었구나. 귓바퀴는 이미 문드러지고 눈알도 이미 썩었으니, 이젠 진짜 듣지도 보지도 못하겠지. 잔에 술을 따라 강신降神1해도 진짜 마시지도 못하고 취하지도 못할 테지. 평소 석치와 함께 술을 마시던 무리를 진짜로 놔두고 떠나가 돌아보지도 않는단 말인가. 정말 우리를 놔두고 떠나가 돌아보지도 않는다면 우리끼리 모여 큼직한 술잔에다 술을 따라 마시지 뭐. 石癡眞死. 耳郭已爛, 眼珠已朽, 眞乃不聞不覩, 酌酒酹之, 眞乃不飮不醉. 平日所與石癡飮徒, 眞乃罷去不顧. 固將罷去不顧, 則相與會酌一大盃. |
이 단락은 “석치는 진짜 죽었구나”라는 말로써 시작된다. 1단락의 맨 끝 문장이 “지금 석치는 진짜 죽었구나(今石癡眞死矣)”였음을 상기한다면, 이 단락은 1단락을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암은 2단락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석치의 죽음에 대해 이런저런 성찰을 가한 다음 다시 이 단락에서 1단락의 감정을 되살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 단락에 ‘진짜眞’라는 말이 무려 네 번이나 나온다는 점이다. 이 단어에는 석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데 따른 체념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다. 석치가 죽은 것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석치는 이제 그 좋아하던 술을 마시지도 못한다. 같이 어울려 지내던 주당酒黨들을 놔두고 떠나 버렸다. 석치야, 너 정말 돌아보지도 않고 가 버리기냐? 우리를 놔두고 그럴 수가 있냐! 만일 네가 그런다면 너 없이 우리끼리 술을 마시면 되지 뭐. 너 없다고 우리가 술을 못 마실 줄 아냐?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잘 놀 수 있다. 연암은 표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반어로 들린다. 이런 반어적 표현은 석치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며, 그래서 연암을 비롯한 벗들의 가슴이 뻥 뚫려 있음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 강신降神: 제사의 한 절차로, 혼령을 부르기 위해 술을 따라 모사茅沙(그릇에 담은 띠풀의 묶음과 모래) 위에 붓는 일을 말한다. [본문으로]
8. 사라져 버린 본문
| 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지어 읽는다. (이하 글을 잃어버렸음) 爲文而讀之曰 缺 |
“글을 지어 읽는다”라는 말 뒤에 비로소 본격적인 제문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현재 탈락되고 없다. 아마 4언으로 된 운문이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묘지명의 ‘명’이 보통 아주 짤막한 운문인 것과는 달리 제문의 운문은 아주 길어 60구句 내지 100여 구에 이르는바 제문의 중심부분을 이룬다. 가령 연암이 그 처삼촌인 이양천李亮天을 위해 쓴 제문의 경우 4언구가 96구이며, 형수의 아버지인 이동필을 위해 쓴 제문의 경우 61구이다. 이 두 제문은 4언구를 통해 고인의 인품과 생전의 언행, 고인에 대한 연암의 특별한 추억과 애통한 심정 등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4언구가 끝나면 ‘상향’이라는 말로 제문이 종결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정석치 제문은 그 서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운문으로 씌어진 본론 부분은 탈락되어 버린 것이다. 보통의 제문이라면 정석치 제문처럼 이렇게 서문이 길지 않다. 누가, 언제, 누구를 위해 제문을 지어 곡한다는 말이 너덧 구절 정도 나온 다음 제문의 본문이 시작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석치 제문은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상하리만큼 확장되어 있다 할 만하다.
한편, 우리가 읽은 정석치 제문에는 주로 연암 자신의 심정이 토로되어 있고, 정작 망자亡者인 정석치에 대한 회고라든가 그의 인간적 특성이라든가 그의 업적이라든가 그의 학문과 예술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이 없다. 이런 면에 대한 서술은 필시 탈락된 부분 속에 들어 있었을 터이다. 일찍이 위당 정인보 선생은 연암의 이 제문이 정석치의 학문과 예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말하지 않고 정석치를 마치 술주정뱅이처럼 보이게 해 놓은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지만, 이는 탈락된 부분을 고려치 않은 데 따른 오해라고 해야 할 것이다.

9. 너무나 인간적인 나의 친구
탈락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그리고 혹 그 부분에 대한 보충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여기서 잠시 연암과 정석치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정석치의 인간적 특성과 재예才藝에 대해 조금 언급해두기로 한다.
연암과 정석치는 언제부터 알게 된 걸까? 『과정록』 초고본에는 이런 기록이 보인다.
아버지는 임진년(1772)과 계사년(1773) 사이에 가족을 석마石馬(지금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 일대)에 있는 처가로 보내고 늘 홀로 서울의 전의감동 집에 거처하셨다. 홍담헌 대용, 정석치 철조, 이강산李薑山 서구書九와 때때로 서로 왕래하셨고, 이무관 덕무, 박재선朴在先 제가齊家, 유혜풍 득공이 늘 아버지를 좇아 노닐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연암이 정철조와 알게 된 것은 적어도 1772년 이전이다. 한편 홍대용과 정철조는 지금의 남양주시 북한강변에 있던 석실서원의 미호 김원행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사이다. 두 사람은 나이도 비슷하고(정철조가 홍대용보다 한 살 위임), 천문학과 수학 등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홍대용이 연암과 처음 만난 것은 1766년경으로 추정된다. 홍대용은 중국여행에서 돌아온 그해 자신이 편찬한 책 『중국인 벗들과의 우정(會友錄)』의 서문을 받기 위해 연암의 집을 찾았고 이것이 둘의 첫 만남이지 않을까 짐작된다. 홍대용과 정철조의 관계를 생각해본다면 정철조는 빠르면 이때쯤, 늦어도 1770년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연암과 교유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위에 인용한 『과정록』에 의하면 연암이 1772년 무렵 가장 가까이했던 사람은 홍대용, 정철조, 이서구,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이 다섯 사람이다. 앞의 세 사람은 문벌이 있는 양반이고, 뒤의 세 사람은 서얼이다. 한편 이서구는 그 문벌과 훗날의 지위 때문에 홍대용 등과 함께 묶여 거론된 것으로 보이지만 연암보다 17세 연하로서 연암의 문생에 해당한다. 서얼 출신의 세 사람은 주지하다시피 모두 연암의 문생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연암과 동급의 친구란 홍대용과 정철조 단 두 사람이다.
홍대용과 연암이 얼마나 가까웠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누차 언급했으므로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터이다. 연암이 키가 크고 거구였으며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였음에 반해 홍대용은 몸이 호리호리하고 성격이 단아했다. 한편 연암이 불우한 중년기 이래 술을 좋아하여 말술을 불사했음에 반해 담헌은 술을 하지 못했다. 요컨대 연암이 문인형이라면 담헌은 학자형이었던 셈이다. 두 사람은 사뭇 다른 면모를 지녔지만 서로를 존중해 처음 만난 이래 끝까지 서로 공경하는 태도를 잃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정철조는 평생 천문학과 지리학에 전념하면서 천문 관측기구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지도를 만들기도 하는 등 학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홍대용과는 달리 아주 술을 좋아했으며 주량이 크기로 유명했던 것 같다. 지도를 제작하고 천문학에 전심한 것을 보면 정철조의 성격은 꼼꼼하고 치밀했던 게 틀림없다(지도 제작에는 대단한 세심함이 요구되는바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소탈하고 호방하기도 했던 것 같다. 이런 성격은 그의 예술가적 기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철조는 당대 1급의 자연과학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빼어난 화가이기도 했던 것이다. 성대중의 문집에 의하면 그는 술에 대취하여 영감이 이르면 그때 붓을 휘저어 그림을 그리곤 하였다. 호방하고 술을 몹시 좋아하며 예술가적 일탈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정철조는 연암과 기질적으로 너무나 잘 통하는 둘도 없는 벗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연암은 홍대용과 마주해서는 점잖은 말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정철조와는 술이 거나해지면 때로 광태狂態를 연출하면서 흉허물 없이 지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10. 울울하던 그날 함께 하던 벗
홍국영은 1780년 2월 권력에서 축출된다. 박지원은 더 이상 연암협에 은거해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는 서울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해 5월 중국 여행길에 올라 동년 10월에 귀국한다. 박지원은 귀국 후 서울과 연암협을 오가며 『열하일기』의 집필에 힘을 쏟는다. 『과정록』은 당시의 사정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아버지는 경자년(1780)에 서울로 돌아와 평계平谿에 거처하셨으니 곧 지계공芝溪公(연암의 처남인 이재성)의 집이었다. 이때 홍국영이 실세하여 화근은 사라졌지만 점잖은 옛 친구들은 거의 다 세상을 떴다. 그래서 분위기가 싹 변해 옛날 같지 않았다. 아버지는 더욱 뜻을 잃고 스스로 방달하게 지내셨는데 그것이 몸을 보존하는 비결임을 도리어 기뻐하셨다. 그러면서도 항상 답답해하시며 멀리 떠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
마침 아버지의 삼종형인 금성도위錦城都尉(임금의 부마인 박명원)께서 청나라 건륭 황제의 칠순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로 북경에 가시게 되어 아버지에게 함께 가자고 했다. (중략) 아버지는 귀국 후 더욱 배회하셨으며 즐거운 일이 없었다. 아버지는 당시 연암협에 혼자 들어가 지내셨는데 혹은 해를 넘기시기도 하고 혹은 반년이 지나 돌아오시기도 했다. -1권 35번
庚子撤還京師, 寓平谿, 卽芝溪公宅也. 時洪國榮敗, 禍色始熄, 而老成舊要, 凋謝殆盡. 風氣一變, 非復舊日者. 益濩落自放, 反喜其爲存身之訣. 然常鬱鬱, 有遐擧之想.
會先君三從兄錦城都尉, 以賀使赴燕, 要先君共行. (중략) 時獨入處燕峽, 或經年或半歲, 乃歸.
이 기록은 1780년을 전후한 시기 연암의 울울한 처지를 잘 전하고 있다. 당시 홍대용은 경상도 영천의 군수로 나가 있었다. 따라서 연암은 이 무렵 조정에서 벼슬을 하고 있던 정철조와 주로 어울리곤 했을 것이다. 일찍이 정철조는 연암이 은거하던 연암협을 그림으로 그린 적이 있다. 연암은 『열하일기』를 집필할 때 정철조에게 중국 책을 참조해 북경 지도를 좀 그려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글을 쓸 때 참조하기 위해서였다. 연암은 『열하일기』 속에다 이 사실을 특별히 명기해 놓고 있다.
내가 중국에서 돌아와 여행했던 곳을 생각할 때면 기억이 흐릿하여 마치 눈앞에 안개가 낀 것 같고, 정신이 아득하여 새벽꿈에 죽은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그리하여 남북이 헷갈려 이름과 실상이 어긋났다. 나는 어느 날 정석치에게 『팔기통지八旗通志』(청나라 웅정제 때 편찬된 책)를 보고 북경의 자금성을 좀 그려달라고 했다. 석치가 그려 준 지도를 펼쳐보니 북경의 성곽, 해자垓子(성 주위에 둘러 판 못), 궁궐, 거리, 상점, 관아가 손금을 보듯 또렷했으며, 종이에서 사람들의 신발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황도기략
余旣自中國還, 每思過境, 愔愔如朝霞纈眼, 窅窅如曉夢斂魂. 朔南易方, 名實爽眞. 一日俾鄭石癡, 就『八旗通志』圖出皇城. 一披圖而城池宮闕街坊府署, 如覩掌紋, 紙上如聞履屐聲.
당시 연암이 정철조와 얼마나 가까이 지냈던가를 잘 보여주는 기록이다. 그런 정철조가 1781년 겨울 갑자기 세상을 떴다. 연암의 충격과 상심이 오죽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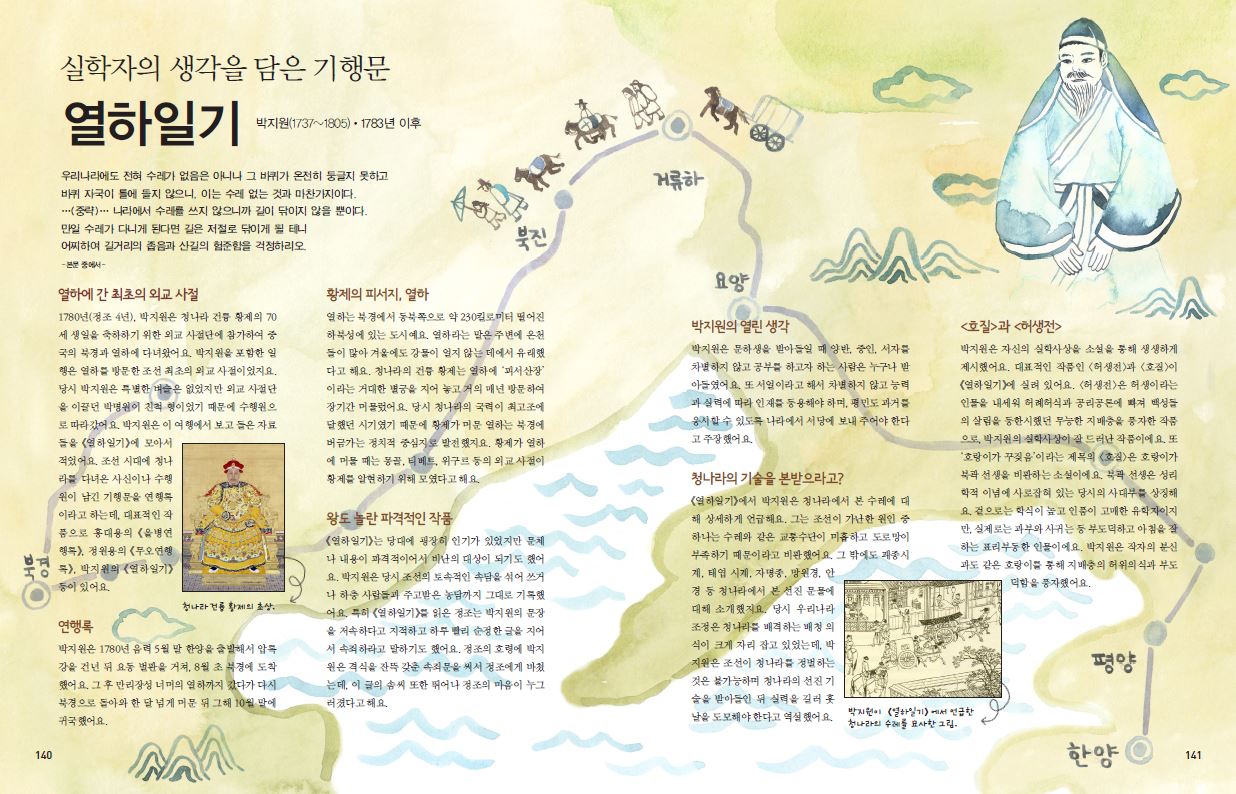
11. 파격적인 제문을 쓸 수밖에 없던 이유
이제 끝으로, 연암이 정석치의 제문을 왜 그리도 파격적으로 썼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 하나는, 제문의 대상 인물인 석치 자체가 몹시 파격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제문의 대상 인물이 음전하고 순순한 인간이었다면 굳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석치는 방달불기放達不羈(말과 행동에 거리낌이 없고 예법 따위에 구속되지 않는 태도)한 인간 타입이었다. 박제가가 그를 “청동 술잔으로 3백 잔을 마신 술꾼이어라(靑銅三百酒人乎)”라고 읊었듯이, 그는 당대의 주호酒豪였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연암이 처해 있었던 상황과 그 심경에서 찾아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에서 말했듯 연암은 이 시기에 매우 울적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2년 전 연암협에 은거할 때로 소급된다. 당시 홍국영이 권력을 잡자 사람들은 그에게 아부하면서 연암을 마구 비방하였다. 『과정록』에서는 당시의 일을 이렇게 적고 있다.
당시 아버지를 비방하는 소리가 세상에 가득하였다. 대개 평소부터 질투하고 시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세가에 아첨하여 따라 떠드는 자도 있었으며, 또 옛날의 친분을 꺼림칙하게 여겨 비방하는 자도 있었다. 이들이 모두 이러쿵저러쿵 입을 쉬지 않고 놀리며 아버지를 헐뜯었다. -1권 30번
時先君訿謗溢世. 蓋有素所嫉媢者, 又有諂口隨唱者, 又有遠嫌宿契者, 喙喙不已, 哆若南箕.
이런 상황이었으므로 홍국영이 제거되고 나서도 연암은 퍽 소조蕭條하게 지내며 고립무원의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속에서 연암과 변함없는 우정을 나눈 사람은, 적어도 연암 동급의 인물로는 홍대용과 정철조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여겨진다. 특히 정철조는 기질적으로 연암과 잘 통했던바, 실학의 동지로서, 술친구로서, 각별한 관계에 있었다. 이런 그가 죽었으니 연암으로서는 꼭 자신의 절반을 잃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절망적이고, 참담하기 그지없으며,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현실을 대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제문이 그 형식에서든 문체나 어조에서든 파격 중의 파격을 보이게 된 데에는 이처럼 당시 연암의 처지와 심경, 연암과 석치와의 특별한 관계가 작용한 것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12. 총평
1
이 글은 당시 보수적인 문예관을 지닌 사람의 눈에는 경망스럽고 상스러운 글로 보였을 테지만, 제문의 매너리즘을 깨뜨리면서 인간의 진정眞情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빛이 바래지 않으며, 퍽 감동적이다.
2
이 글에서는 정작 슬픔이라든가 애통함이라든가 이런 말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지만 친구의 죽음을 앞에 한 채 비탄과 슬픔에 잠겨 있는 인간 연암의 마음이 약여하게 느껴진다.
3
이 글은 연암의 심리적 추이에 따라 글이 구성되어 있다. 1단락은 석치의 죽음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럼에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연암의 착잡하고 당혹스런 마음을 빠른 필치로 적고 있다면, 2단락은 너무나 큰 슬픔 앞에서 잠시 망연자실하여 멍한 눈으로 우두커니 빈소를 바로보고 있는 연암의 시선을 내재화하고 있고, 마지막 단락은 석치의 죽음에서 느끼는 절망감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
이 글은 그 형식도 묘하고, 문체와 어조도 묘하고, 표현도 재미있다면 재미있다. 하지만 한갓 이런 점에만 눈을 빼앗긴다면 연암옹燕巖翁이 자못 섭섭해할지 모른다. 왜냐면 연암은 늘 글을 읽을 때 눈에 빤히 보이는 거죽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자의 고심苦心, 즉 작자의 마음을 읽을 것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인용
지도 / 목차 / 작가 / 비슷한 것은 가짜다
'책 > 한문(漢文)'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암을 읽는다 - 15. ‘관재’라는 집의 기문 (0) | 2020.03.30 |
|---|---|
| 연암을 읽는다 - 14.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 (0) | 2020.03.30 |
| 연암을 읽는다 - 12. 형수님 묘지명 (0) | 2020.03.30 |
| 연암을 읽는다 - 11. 기린협으로 들어가는 백영숙에게 주는 서 (0) | 2020.03.30 |
| 연암을 읽는다 - 10. 발승암 기문 (0) | 2020.03.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