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장 1. 반어적 용법과 상상력
| 君子之道, 費而隱. 군자의 길은 명백하면서도 또한 가물가물 숨겨져 있다. 費, 用之廣也. 隱, 體之微也. 비(費)는 용(用)의 넓음이다. 은(隱)은 체(體)의 작디작음이다. |
여기 ‘비(費)’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용’할 때 쓰는 말이지만, 이 구절에서의 뜻은 영어로 하면 ‘익스텐시브(extensive, 광범위한)’, ‘에비던트(evident, 명백한)’란 말입니다. 즉, 광범위하다, 명백하다, 어디든지 가지 않는 데가 없다는 뜻이죠. 주자 주(註)에 ‘비 용지광야(費 用之廣也)’라고 했듯이 그 기능이 한없이 넓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이(而)’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리고’의 뜻이 있고, 앞과 뒤가 반대될 때 연결해 주는 뜻이 있어요. ‘∼이면서도 ∼이다’라는 식으로 상반되는 것을 연결할 때 이 ‘이(而)’를 씁니다. 여기서도 그 뜻이죠. 비(費)하고 은(隱)하다. 비(費)는 에비던트(Evident)한 것이고, 은(隱)은 상당히 서브틀(Subtle, 섬세한)한 것, 아주 미묘하다는 말인데, 히든(Hidden), 즉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정반대의 개념이 ‘이(而)’를 통해서 연결되고 있죠. 영어로는 그냥 ‘벗(but)’ 그러면 되요. ‘∼is extensive and evident but subtle’
그러면, ‘비(費)하면서 은(隱)하고, 은(隱)하면서 비(費)하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쉽게 이해가 되세요? 이 ‘비이은(費而隱)’은 동양사상의 상당히 심오한 측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동양사상은 항상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개념들을 하나로 꿰뚫는 성격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어적 용법이라든가 아주 파라독시컬(Paradoxical)한 스테이트먼트(Statement, 진술)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가(道家)계열의 저술들을 보면 이런 식의 용법이 거의 99%를 차지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깨닫는데 상상력을 동원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사장시키지 말고 자꾸만 길러서, 그것이 다시 우리를 자극시키도록 하라는 말이죠.
비(費)하지만 은미(隱微)하다. 역시 도가계통에서 잘 쓰는 말입니다.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言者不知 知者不言-『노자(老子)』 56장, 『장자(莊子)』 「천도(天道)」]” 그런 식의 말이예요. 또 “접으려면 피고, 필려면 접고[將欲歙之, 必固張之]”, “강하게 하려면 약하게 하고[將欲弱之, 必固强之]” 등등이 도가에 팽배한 논리구조인데, 중용(中庸)이라는 문헌에도 같은 구조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봐서 유가(儒家)에도 도가(道家)적인 사유구조가 들어와 있다고 봐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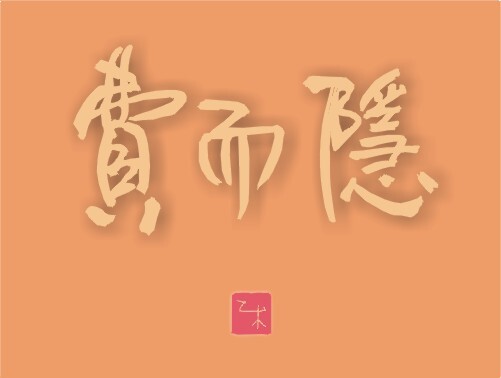
12장 2. 가장 원초적이며 지속적인 사회
| 夫婦之愚, 可以與知焉, 及其至也, 雖聖人亦有所不知焉; 夫婦之不肖, 可以能行焉, 及其至也, 雖聖人亦有所不能焉. 天地之大也, 人猶有所憾. 故君子語大, 天下莫能載焉; 語小, 天下莫能破焉. 그러나 어리석은 보통 부부라고 할지라도 더불어 같이 애쓰면 그 위대한 길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 평범한 부부의 앎이라도 지극한데 이르면 비록 성인이라도 알지 못하는 바가 있다. 또한, 못난 부부라 할지라도 그 위대한 길을 잘 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 못난 부부의 행동이라도 지극 데 이르러서는 비록 성인이라 할지라도 능하지 못하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통의 인식을 벗어난 광대한 하늘과 땅의 움직임에 대하여 사람들은 유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도를 실천하는 위대한 사람이 큰 것을 말하면 천하라도 그걸 다 실을 수가 없고, 작은 것을 말하더라도 그것을 다 깰 수가 없다. 君子之道, 近自夫婦居室之間, 遠而至於聖人天地之所不能盡. 군자의 도는 가까이 부부가 한 집에 있는 것으로부터 멀리 성인과 천지가 다 할 수 없는 것까지에 이른다. 其大無外, 其小無內, 可謂費矣. 然其理之所以然, 則隱而莫之見也. 크기 때문에 외부가 없고 작기 때문에 내부가 없으니 비(費)라 할 만하다. 그러나 그러한 이치가 된 이유는 은미하여 볼 수가 없다. 蓋可知可能者, 道中之一事. 及其至而聖人不知不能, 則擧全體而言, 聖人固有所不能盡也. 대개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도의 한 가지 일이다. 지극함에 이르러 성인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전체를 들어 말한 것이니, 성인도 본래 다하지 못할 게 있다는 것이다. 侯氏曰: “聖人所不知, 如孔子問禮ㆍ問官之類. 所不能, 如孔子不得位ㆍ堯舜病博施之類.” 후씨가 “성인이 알지 못하는 것이란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묻고, 담자에게 관제(官制)를 물은 종류와 같은 것이다. 하지 못하는 것이란 공자가 지위를 얻지 못한 것과 「옹야」 28장의 ‘요순도 은혜를 널리 베풂을 어렵게 여겼다’는 종류와 같은 것이다. 愚謂人所憾於天地, 如覆載生成之偏, 及寒署灾祥之不得其正者. 내가 생각하기로는 사람이 천지에 섭섭한 것은 천지가 덮어주고 실어주며 만물을 생성시킴에 치우침이 있는 것과 추위와 더위, 재앙과 상서로움이 바름을 얻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다. |
인류 사회의 기본인 그루핑(Grouping)
제일 처음에 부부(夫婦)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중용론(中庸論)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좀 뒤에 고찰하기로 하고, 가족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개념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회를 소사이어티(Society)라고 하죠. 인류가 모여 사는 특징을 가지고, 인류의 성격이 그루핑(Grouping)에 있다고 합니다. 그루핑(Grouping)은 사람이 군집해 사는 것이고, 그룹을 지어서 사는 것을 소사이어티(Society)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사이어티에는 항상 레벨(Level)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립자 세계에 들어가도 입자가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입자들의 소사이어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물학에도 셀(Cell)의 소사이어티(Society)가 있어요. 셀의 소사이어티가 모이면 조직(tissue)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organ)이 됩니다. 간의 조직과 폐의 조직의 형태가 다르고, 또 각 소사이어티마다 레벨(Level)이 있어요. 이 소사이어티는 항상 레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소사이어티(Society)라는 말하고 스테이트(State)를 자꾸 혼동하는데, 이것들은 서로 다른 말이예요. 소사이어티는 모든 그루핑(Grouping)의 현상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말이고, 스테이트는 소사이어티의 하나의 형태일 뿐입니다. 특히 스테이트는 그 제도적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국가사회라는 말을 쓰는데, 개념적 정리부터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사회라는 이 소사이어티의 그루핑 방식에 있어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원초적이면서 가장 지속적인 소사이어티가 뭐겠습니까? 바로 패밀리(Familly)예요. 이건 인간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다 생기죠. 모든 동물에 다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의 군집(Lebensgemeinschaft)은 주로 먹이사슬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그 개체군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분(baboon), 비비 원숭이은 굉장히 사나운 원숭이의 일종인데, 인간과 비슷한 소사이어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생태학자들이 바분 소사이어티를 많이 연구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콘라드 로렌쯔(Konrad Z. Lorentz, 1903∼1981)라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유명합니다. 노벨상까지 받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한 우익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책은 상당히 괜찮은 게 많아요. 개괄적이죠. 이화대학출판부에서 『An agression』이란 책을 번역 출간했는데, 번역본의 제목이 『인간의 침략: 공격본능에 대한 연구』일 겁니다. 한 번 읽어보세요. 상당히 읽을 만한 책입니다.
사회화란 무엇인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든 동물에게도 다 패밀리는 있다고 했죠? 그런데 왜 패밀리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내 이론이지만,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동물과 인간을 한 번 비교해 봅시다. 동물에게 있어 패밀리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동물이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가 하나의 완전한 독립개체로서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고, 살아나갈 수 있게 될 때까지가 사회화 과정이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미 곁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엊그저께 TV에서 방영한 청둥오리에 대한 프로그램 봤습니까? 새 같은 거 하나만 봐도 엄청나지 않아요? 어떻게 그 녀석들이 그렇게 알을 낳고 그렇게 자기 둥지를 틀고 앉아 있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내 강의 듣기 위해 앉아 있는 것만도 괴로워하는데, 오리 같은 놈들이 몇 달을 알을 품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 그 인내력을 누가 가르쳐 주었는지 몰라도 참 대단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개체가 사회화 된다는 것은 자기가 소속해 있는 사회에서(청둥오리면 청둥오리 소사이어티) 하나의 인디비주얼(Individual, 개인)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과정이죠. 그렇게 되면 동물의 세계에서는 가정이라는 레벨의 사회가 해체됩니다. 없어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끼 날 때 또 형성됩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수컷 중심이 아니고 암컷 중심의 패밀리가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새끼를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패밀리는 엄마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간사회에서도 그런 구조가 있어요. 이혼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새끼를 누가 갖느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간도 똑같았을 거란 말이예요. 새끼를 낳고 기르다가 이 새끼가 크면 해체되었을 텐데…
인간은 왜 해체가 어려운가 하면, 새 같은 경우는 어미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인디비주얼(Individual)로 성숙되어 다음 새끼를 낳을 때까지 사이의 인터벌(Interval)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새의 경우에 어미가 자기 새끼와 또 그 새끼의 새끼를 훼밀리 안에서 동시에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경우에는 점점 문명이 복잡화될 수록 사회화되는 기간이 길어졌고, 따라서 어미 곁을 떠나기 전까지의 그 사회화 기간하고 그 다음 새끼를 날 시간 하고 겹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훼밀리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내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기엔 동물과 같았을 텐데, 말이 생겨나면서 사회화에 언어 습득 과정이 첨가되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사회는 점점 사회화 과정이 길어진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너무 기니까 생략하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인간에게는 훼밀리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지속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결국 모든 사회가치(social value)가 훼밀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12장 3. 가족에 대한 동양과 서양의 차이
서양사회학 : 국(國)을 가(家)에서 해방시켜라!
중국말에 쓰이는 국가라는 말은 가(家)와 국(國)을 하나의 동일한, 동질적 공간체계로 보는 겁니다. 국(國). 가(家)라는 개념, 이게 동양의 특이한 사고 방식이예요. 근대 사상에 의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회학의 기본 가설이 뭔지 알아요? ‘국(國)과 가(家)의 컨티뉴티(Continuity, 연속성)를 끊어라’는 겁니다. 즉, ‘국(國)의 윤리를 가(家)의 윤리로부터 해방시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근세 사회과학의 출발입니다. 마키아벨리즘이라던가, 서구라파 근대화 사상은 사회 현상이란 사회 현상 나름대로의 독특한 밸류(Value,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윤리나 도덕성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왕조를 돌아봤을 때,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든가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어엿비 여기시어 한글을 창제했다는 말을 듣거나, 요즘 시대에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를 아들 딸 같이 여기사 . 운운하면, 여러분들 사고구조에 반발감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현대적인 사유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가정윤리(family ethic)와 사회가치(social value)를 일치시키는 것을 거부하도록 교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가정윤리와 사회가치를 분리시키는 데서 근세 학문이 출발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儒家)는 어디까지나 그 훼밀리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존속할 수 없다고 끝까지 고집합니다. 이 유가의 고집은 대단해서, 이런 측면을 서구의 사회과학(social science)은 감당해 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닌데, 교육만 해도 국(國)을 가(家)로부터 해방시키는 데서부터 근세 교육개념이 생겨난 것입니다. 즉, 교육을 가(家)로부터 분리시켜 국가가 독점한 거예요. 이게 소위 의무교육이고, 공교육이고, 근대교육의 출발이란 말입니다. ‘국가는 그 국민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국가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의무교육이라는 기치 아래 교묘히 숨어 있는 원래 의도가 도대체 뭐예요? 왜 미쳤다고 나라가 교육을 시키냐고? 그 근대교육사상의 실상은,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규격화되고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집체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근세로 오면서 국(國)이라는 게 거대한 자본주의회사가 되어버렸거든요. 알겠어요? 18세기 초부터 시작되어서 19,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자본주의 공장제가 성행되어 매뉴팩처(Manufacture)가 되자, 국가로서는 균일한 교육이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대중교육(massive education)의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유교의 국가주의와 반국가주의
공자의 사상은 대중교육(mass education) 개념이 없던 시대의 사상이니까 비교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훼밀리가 인간의 교육을 포기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가정교육이라는 말이 있지만, 도대체 사람들 서로가 얼마만큼 거기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의 행태를 봅시다. 자식을 낳고서 그 자식이 스물 너댓. 일고여덟이 되면,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아요. 그리곤 어떻게 키우는 지도 모르면서 엉겁결에 5∼6년 키우다가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이젠 도시락만 싸는 걸로 때우죠. 그러면서 대학에 들여보내 두면 무슨 지랄을 하든 졸업을 해! 그러니까 처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교육을 받는지 몰라요! 부모가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 졸업 때까지 자녀를 국가에 위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완전히 넌센스죠. 이만 저만한 넌센스가 아닙니다! 유교적으로 보면 이것만큼 웃기는 일도 없어요. 공자시대도 훼밀리보다 더 큰 단위의 조직이 있었다고. 다 있었지만, 공자는 끝까지 훼밀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아주 특이한 사상이죠.
맑스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도 프롤레타리아를 지배할 윤리가 그들 내부에서는 안 나온다는 점입니다. 해방된 프롤레타리아 에토스(Ethos, 풍조)가 유지되려면, 프롤레타리아 해방을 지배할 윤리가 있어야 합니다. 맑스는 오직 사회 혁명에만 관심을 두었지 윤리니 에토스니 이런 것엔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에 관한 맑스의 저서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자본론』만 쓸 게 아니라 ‘윤리론’도 썼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러시아가 저렇게 실패는 안 했을 거예요. 맑스가 프롤레타리아 윤리라는 중대한 문제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또 그런 ‘윤리론’이 부재한 탓에 구소련이라는 거대국가가 해체되어버렸다는 것을 보면, 역시 공자가 훨씬 더 현명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 사회의 가장 원초적이고 지속적이며 가장 믿을만한 조직체계는 훼밀리 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게 유가의 기본적인 대전제라는 점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 믿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하겠지만, 그 국가 사회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만주족이나 여진족들 나라가 있다가 없어졌죠? 이렇게 국가라는 것은 제 아무리 굳건하게 있다가도 또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뭘 믿고 사느냐, 왜 사느냐를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유교주의의 패러독스가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건 궁극적으로 훼밀리밖에 없다는 거죠.
12장 4. 부부로부터 시작한 이유
유가와 묵가의 싸움
유교주의를 지새끼, 지애비만 안다고 비난합니다. 유교주의는 끝까지 훼밀리 윤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건데, 이게 타락하면 묵자가 ‘유교는 지새끼. 지애비만 안다’고 까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버리는 것이죠. ‘공자라는 새끼는 지새끼. 지애비만 안다. 짜식들이 겸애(兼愛)가 있어야지 말이야 ∼ . 그러니까 유교주의는 보편주의가 없어!’ 가장 중요하게 내걸고 있는 훼밀리 윤리는 너무 협애하다는 통렬한 지적입니다. 즉, 지애비, 지에미가 아니더라도 똑같이 내 부모같이 사랑할 줄 아는 겸애가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맹자(孟子)는 또 어떻습니까. 묵자를 까죠? 저 새끼는 지애비. 지에미도 모르는 새끼라고 깝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싸움이고, 해답이 없는 싸움이예요. 그러니까 춘추 제자백가시대에 있었던 묵가(墨家)와 유가(儒家)의 대립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인류사회의 모든 문제가 이미 제기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기독교가 상당히 묵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훼밀리즘은 아니고, 겸애를 강조하는 묵가적인 종교예요. 그러나 유가는 어디까지나 모든 윤리관의 기초를 가족윤리에다가 둡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루어 남을 아는 것이지, 처음부터 보편적인 겸애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유교 패밀리즘의 리바이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 유교의 훼밀리즘이 현대에서 리바이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제도의 정비만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해도 제도 자체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좋은 제도가 좋게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 토양이 일궈져야만 하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것은 가정교육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가는 지애비. 지에미만 알자는 것이 아니라 가족윤리를 강조하고, 그것을 근원적으로 삼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정교육에다가 어떠한 보편적 원리를 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12장이 유가주의의 기본구조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장이 되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비이은(費而隱)’이라고 했는지, 익스텐시브(Extensive)하지만 서브틀(Subtle)한, 크지만 작은, 매크로하지만 마이크로한, 잘 보이지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세계를 왜 자꾸만 연결하려고 했는지 이제 좀 감이 잡힙니까? 다시 말해서 문명에 있어서 매크로한 세계와 마이크로한 세계의 연결은 훼밀리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아무리 거대한 사회형태(국가·제국·문명권 등)를 이룬다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조건인 생식기능(reproductive function)을 져버릴 수 없는 한 인간의 모든 경험의 출발은 훼밀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훼밀리의 경험체계에서 비롯한 윤리의식이 결국 모든 매크로한 사회체제의 가치관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가정윤리에 충실한 인재들이 우리사회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러한 유교전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문명은 끝입니다. 서구라파의 도덕(Sollen)과 정치(Sein)의 분리라는 그러한 작위(作爲)의 논리는 자본주의의 광란에 아부하는 얄팍한 철학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광란이 인류문명의 대세라면 이 세상 모든 국가도 끝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소멸해도 가정은 죽지 않습니다. 인간이 지구상에 생존하는 한 가정은 존속합니다. 국가가 없고 가족만 있는 사회! 노자가 80章에서 그리고 있는 유토피아의 모습에 가깝게 오는 사회입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런 사회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개똥같은 정치인들 그리고 세리들이 설치는 그런 꼬락서니가 없어서 오히려 맘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농민대중의 입장에서 모든 체제를 부정한 일본의 ‘안도오 쇼오에키(安藤昌益)’라는 사상가를 한번 읽어보세요.(통나무에서 간행된 마루야마 마사오의 『日本政治思想史硏究』에 수록되어 있음)
처음 시작에서 ‘부부’라는 단어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는데,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살펴봅시다.
‘부부지우 가이여지언 급기지야 수성인 역유소부지언(夫婦之愚 可以與知焉 及其至也 雖聖人 亦有所不知焉)’ 가족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평범한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더불어 군자지도(君子之道)·중용지도(中庸之道)를 같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급기지야 수성인 역유소부지언(及其至也 雖聖人 亦有所不知焉)’ 즉, 부부의 道라는 것이 단지 지애비ㆍ지에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부의 일용지간에서 파생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문제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용(中庸)의 발상의 위대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부지불초 가이능행언(夫婦之不肖 可以能行焉)’ ‘능(能)’을 여기서는 부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되니까 쭉 해석만 하죠. ‘급기지야 수성인 역유소불능언(及其至也 雖聖人 亦有所不能焉)’ 중용론(中庸論)에 가장 중요한 사고의 전환은 평범성에 있습니다. 중용(中庸)이 주장하고자 하는 평범성은 부부의 도(道)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그 부부의 도(道)라는 것은 모든 인류문명의 윤리의 출발이고, 이것은 온 우주천지를 뒤덮을 수 있는 매크로한 법칙과 통한다는 거죠【부자지도(父子之道)도 아니고 형제지도(兄弟之道)도 아니고 군신지도(君臣之道)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부부지도(夫婦之道)냐? 이 중용을 한 권의 일기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주 지극히 성실한 삶을 살았던, 그러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평범한 사람의 생활사 속에서 탄생한 소박한 일기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평범성, 그 소박성에 중용의 진짜 위대함이 있다】.
‘천지지대야(天地之大也)’ 여기 천지(天地)라는 말 나왔는데, 두 번째 날 텍스트 크리틱(Text critic) 이야기하면서, 천지 코스몰로지의 명백한 인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천지’라는 개념이라고 했죠?
‘인유유소감(人猶有所憾)이라’ ‘감(憾)’자는 ‘유감이 많다’로 해석하세요, 유감이 많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천지를 바라볼 때 너무 커서 헤맨다는 말입니다. 어떤 날은 이유도 없이 벼락도 쳤다가, 또 어떤 날은 비만 내리질 않나. 하여튼, 천지라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인간에게는 유감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천지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잘 알 수가 없어!
‘군자어대(君子語大)’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스케일로 군자가 큰 것을 말하면, 인간 이메지내이션(Imagination, 상상)의 거대함은 천하막능재언(天下莫能載焉)이라, 천하라도 다 실을 수가 없다! “스티븐 호킹의 우주에 대한 상상력을 천하가 다 실을 수 있겠어요?”
‘어소 천하막능파언(語小 天下莫能破焉)’ “작은 것을 말하더라도, 그것을 깰 수가 없다.”
12장 5. 통합적 지식을 갖추려면
물리학과 생물학의 통일장
주자 주(註)에도 인용이 되고 있고, 『장자(莊子)』의 「천하(天下)」편에 나오는 유명한 혜시(惠施)의 말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큰 것은 밖이 없고, 가장 작은 것은 안이 없다[至大無外 至小無內].’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로, 현대물리학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명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우주가 밖이 있지요. 천문학에서 말하는 우주(Cosmos)는 아무리 큰 것이라 하더라도 밖이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시간의 역사』에서 우주의 모형을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밖이 있다고 본다는 것을 말해 줘요. 그러나 그 밖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시간 밖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즉, 우리가 천문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은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 밖은 현대물리학에서 대상으로 하지 않으니 모르는 거예요. 기하학적인 점(geometrical point)은 질량이 없다는 말과 같은 논리죠. 포인트라는 것은 질량이 없고, 광대무변한 이 우주는 밖이 없다, 지대(至大)의 세계와 지소(至小)의 세계, 결국 무내(無內)와 무외(無外)는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밖이 없고 안이 없으면 하나로 통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이은(費而隱)’에서 언급한, 논리적으로는 상반되는, 매크로한 세계와 마이크로한 세계를 하나로 꿰뚫는 구조를 동양인의 사유체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가 오늘날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천체물리학이나 천문학에서 말하는 세계에 대한 연구와 입자물리학에서의 소립자의 연구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었는데, 가다 보니까 천문학에서 말하는 거대한 천체에서의 법칙의 세계와 소립자에서의 법칙의 세계가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체에 블랙홀이 있으면 소립자의 세계에도 블랙홀이 있고 등등【진공 중에 고도로 집적된 에너지를 방사하면 양전자(positive eletron)와 음전자(negative eletron)이 생성되는 쌍생성(pair production)은 화이트홀(white hole)과 비교될 수 있고, 양전자와 음전자가 충돌하여 고에너지를 방출하며 사라지는 쌍소멸(pair annihilation)은 블랙홀(Black hole)에 대비시킬 수 있다】. 이런 발견이 현대물리학에서 굉장한 에포크(epoch)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물리학적 세계와 생물학적 세포의 세계가 또 하나의 법칙으로 묶여지는 이것이 가장 큰 혁명이 될 것입니다. 즉, 먼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예로 들면, 현대물리학과 『논어(論語)』·중용(中庸)을 따로따로 생각했던 사유구조가, 물론 언어의 내용이나 맛이 다르겠지만, 근본적인 인간 사유구조의 공통점을 근원으로 하여서 하나로 통합되어져 갈 것이라는 얘깁니다. 이것이 김용옥의 기철학이 지향하는 세계입니다.
통합에 앞서 전문적 지식이 철저해야
그러나 여러분! 헷갈리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향으로만 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전문성을 가지고,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철저하게 그 쪽으로 파야지, 애매하게 이쪽저쪽 양다리를 걸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방면으로는 카프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얄팍한 측면이 있어요. 요즘 그런 헷갈리는 책들을 중점적으로 펴내는 출판사들이 많은데, 그런 얄팍한 책들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통합하는 세계, 통합되어지는 과정은 그것대로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지식들 위에서 그럴듯한 말로 잘 포장된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통합적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거나 또는 사유체계의 상통성을 알기 위해서는 각 부문의 전문가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동양적 사유의 중요한 측면은 매크로한 세계와 마이크로한 세계가 항상 하나로 통한다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6. 생명의 약동
| 詩云: “鳶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 『시경(詩經)』에 “솔개가 하늘로 날고 고기가 연못에 뛴다”라고 한 것은 이러한 위대한 길이 위(하늘)와 아래(땅)에 모두 명백히 드러남을 은유한 것이다. 詩, 「大雅旱麓」之篇. 鳶, 鴟類. 戾, 至也. 察, 著也. 시는 「대아한록」의 편이다. 연(鳶)는 솔개의 종류다. 려(戾)는 이른다는 뜻이다. 찰(察)은 나타나는 것이다. 子思引此詩以明化育流行, 上下昭著, 莫非此理之用, 所謂費也. 然其所以然者, 則非見聞所及, 所謂隱也. 자사는 이 시를 인용하여 변화하며 기르고 유행하여 위와 아래에 밝게 드러나 이 이치의 용(用)이 아님이 없음을 밝혔으니, 비(費)라 할 만하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는 견문(見聞)에 미치질 못하니, 은(隱)이라 할 수 있다. 故程子曰: “此一節, 子思喫緊爲人處, 活潑潑地.” 讀者其致思焉. 그렇기 때문에 정자는 “여기의 한 구절은 자사가 사람을 위한 요긴한 부분으로 활발발한 곳이다.”라고 했으니, 읽는 이는 생각을 다해야 한다. |

엘랑비탈과 비약
지금까지 논리를 진행시키는 순서가 평범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오면 천지를 말하였고, 그 다음에 ‘시운(詩云)…’하면서 『시경(詩經)』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참 멋있어요! 어떤 일본의 도자기 연구가가(홍이섭 선생 강의 중에 나온 말이지만) 고려청자에 미쳐서 청자의 빛이 어디에서 왔나를 탐구하다가 밝혀낸 사실인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그림 한 장면을 머리속에 사악 그려보세요. 시골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중에 호수가 있는데, 겨울이기보다는 청명한 여름 새벽 4시, 이슬이 촉촉하게 내렸다가 서광이 비칠 때 쯤 하늘의 벌거스름한 기운이 나오기 전에,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듯한 바로 그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나타나는 색! 녹색도 아니고 파란 색도 아닌 그 색깔이 고려청자의 색깔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신비적인(esoteric) 말이지만 얼마나 고려청자에 미쳤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정말 새벽에 하늘을 보면 고려청자 색깔이 나와요. 그런 신비적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시경(詩經)』도 한 번 그런 식으로 느껴 보세요.
먼동이 틀 적에 연못에 물안개가 쫘악 끼죠. 그 고요한 아침에 대단한 파워(Power)를 지닌 잉어 한 마리가 정적을 깨면서 ‘팍‘하고 튀어 올랐어요. 팍 튀어 오를 때의 그 느낌! 이건 정말, 베르그송이 ‘엘랑비탈(élan vital, 생명의 飛躍)’이란 말을 쓰는데, 그런 말로는 형용이 안 되는 ‘생명의 약동’인 거예요. ‘어약우연(魚躍于淵)이라’ 연못에서 팍 튀는 고기는 천지론에서는 지(地)의 상징이죠. ‘연비려천(鳶飛戾天)’ 솔개가 하늘 위에서 ‘샤~악’ 활강하여 내려오다가 다시 하늘로 되돌아간다. 잘못 생각하면 마치 땅에서 날아올라서 하늘로 가는 것 같은데, 그건 후대 사람들이 조류를 지상의 동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조류란 동양인에게는 곧 바람이며 신성(神性)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풍(風)자와 봉(鳳)자의 형태와 발음이 같거든(그 상고음은 각각 [plim], [blium]). 새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지상의 동물이 아니라 하늘의 동물로 상징한 것이죠. 솔개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러워요! 그래서 내가 패러글라이딩을 배우고 있긴 한데.. 떠 보지는 못했지만.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하늘을 나는 새들이 부럽고 또한 땅에 붙어서 사는 자신들의 처지가 답답하고 그랬겠어요. 호랑이를 백수의 제왕이라고 하지만, 그건 새들에 비하면 진짜 새발의 피 밖에 안 되죠. 철새들이 지구를 한 바퀴 돌다시피 하고 오면, 꼭 그전에 자기가 틀었던 보금자리를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 기억작용을 지금 조류학자들이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또 독수리는 6마일 밖에 있는 개미새끼 움직임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니, 이건 정말 엄청난 감각입니다. 요즘 초능력 운운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우주는 초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생물의 세계는 곧 초능력의 세계인 거죠. 풀 한포기 하나가 최대의 신비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엉성하고 얄팍한 내용의 책이나 사상에 빠지지 마세요. 생물학 하나만 제대로 해도, 아니 생물학이든 뭐든 어느 학문이고 제대로 하기만 해도, 모든 신비가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현혹스런 책들에 미치고, 기(氣)에 미치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타락하고, 학문이 타락하는 거예요. 나의 철학의 명칭이 ‘기철학(氣哲學)’이고, 내가 한복이나, 이런 츠앙파오까지 입고 다니니까, ‘저 사람은 중국에까지 가서 기(氣)를 마스터한 기공(氣功)의 대가구나’하는데, 기공(氣功). 그건 우주의 신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흔한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기공이니 하는 것에 미쳐 있는 이런 현실은 무지막지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달고~ 상상의 나래를 펴고~’라는 그런 말을 쓰죠? 그건 새가 상징하는 광범위한 공간영역을 Brain으로 도달한 표현으로서, 예로부터 있어왔던 새에 대한 동경, 근원적 동경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경(詩經)』에 나타난 이런 말 한 마디도 간단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보십시오! “저 솔개가 날아, 그래서 하늘로 돌아가고, 또 한 쪽에서는 물고기가 튀어 올랐다가 연못 속으로 들어가.” 이것은 나는 새와 튀는 고기의 신비로 가득 찬 천지. 생명의 세계예요. 천지를 둘러보았을 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생명이 없는 것이 없고, 신비를 가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쓴 것이고. 이 ‘연비려천 어약우연(鳶飛戾天 魚躍于淵)’은 참으로 동양인들이 즐겨 쓰는 문구인데, 그 맛을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이 없어요. 비약(飛躍)이라는 말의 출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언기상하찰야(言其上下察也)’ 이것으로 문장의 말미에 시적인 이미지를 ‘슥’ 주고 나서는 다시 처음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군자지도 조단호부부 급기지야 찰호천지(君子之道 造端乎夫婦 及其至也 察乎天地)”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용(中庸)입니다. 부부지도(夫婦之道)에서 천지(天地)의 도(道)까지 하나로 꿰뚫은 것, 이것이 바로 중용(中庸)의 위대함이죠. 그러니 어찌 부부지도(夫婦之道)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서 부부지도(夫婦之道)로부터 이 세계의 법칙을 체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교의 논리예요.
그러나 불교의 논리는 상당히 달라요. 불교는 독신주의잖아요. 그러니 불교가 중국에 들어 왔을 때, 유교의 가족주의와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사회에 부부는 쌔고 쌨으니까 독신의 형태도 아주 기쁘게 인정합니다. 꼭 결혼해야 한다고 우길 것은 없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세계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유교의 정통론은 ‘군자지도 조단호부부(君子之道 造端乎夫婦)’로, 이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 君子之道, 造端乎夫婦, 及其至也, 察乎天地. 군자의 길은 부부간의 평범한 삶에서 발단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 평범한 세계라 할지라도 지극한 데 이르면 하늘과 땅에 꽉 들어차 빛나는 것이다. 結上文. 右第十二章. 子思之言, 蓋以申明首章道不可離之意也. 其下八章, 雜引孔子之言以明之. 제12장은 자사의 말로 전부 1장을 끌어내어 펼쳐서 밝힌 것(申明)이다. 이 밑으로 8장은 공자의 말을 잡스럽게 인용하여 설명한 것이다. |
즉, 앞에까지는 잡스럽지 않고 1장에 대한 체계적 해설인데 반해서, 여기서부터는 이것저것 공자의 말을 잡스럽게 인용하여 뜻을 풀어 놓은 것이라는 주자의 설명입니다.
 |
 |
인용
'고전 > 대학&학기&중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올선생 중용강의 - 14장 (0) | 2021.09.17 |
|---|---|
| 도올선생 중용강의 - 13장 (0) | 2021.09.17 |
| 도올선생 중용강의 - 11장 (0) | 2021.09.17 |
| 도올선생 중용강의 - 10장 (0) | 2021.09.17 |
| 도올선생 중용강의 - 9장 (0) | 2021.09.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