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장 1. 넓기에 깊다
지난 수요일 강의를 안 들은 사람은 중용(中庸)강의 전체를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집니다. 오늘 중용(中庸)강의가 이번 3림(林)의 전체 강의 중에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만큼 시시하게 나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멋을 내고 나왔습니다. 내가 한복만 입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한복이 아니드래도 나는 멋을 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비로소 몸이 제대로 잡힌 것 같습니다. 항상 골치가 띵한 상태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괜찮아요. 내가 그 미세한 바이러스한테 이토록 당해버렸다는 것이 일생일대의 수치입니다. 아직 ‘도(道)’가 멀었다는 거겠죠.
하려면 최선을 다하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학생들 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을 잠시 소개하면, 도올서원에 온 학생들은 모두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찾아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학생들이 모두 자발적인 의지가 있고 생각하는 바가 상당히 깊고, 참으로 이 시대에 좋은 학생들이 모인 것 같아요.
내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내가 도올서원에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교양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방면에 뻗을 수 있는 데까지 뻗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문에 뜻을 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최소한 박사학위 논문을 써보는 데까지 나갔으면 좋겠고, 진취적으로 외국 유학도 갈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젊은 날에 여러분들이 받은 자극과 충격을 단순하게 교양적인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기 방면에서 뻗을 수 있는 데까지 뻗어 줬으면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다들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민옹이 그랬듯 “도올은 대학 4학년 때 논문을 썼다”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안에 「동양적이라는 의미」라는 글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쓴 글입니다. 이 글은 여러분 대부분들보다 어렸을 때, 약관의 나이에 중용(中庸)을 읽고 터득한 바를 바탕으로 쓴 글이고 또한 중용(中庸)을 읽고 나서 최초로 쓴 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어 보면 내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거예요. ‘성자(誠者)’라든가 ‘성지자(誠之者)’, ‘천도(天道)’, ‘인도(人道)’ 등에 대한 생각은 그 당시 남들이 나에게 강의해 준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읽고서 독창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논문을 썼고,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중용(中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인간의 성장과정이라든가 ‘지(知)·인(仁)·용(勇)’ 등등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ㅈ중용(中庸)에서 따온 것입니다. 「동양적이란 의미」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 보고, 지금의 내 강의와 비교해 보세요. 김용옥이는 불과 약관의 나이에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이러한 논문을 썼다는 것을 헤아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0년의 시차를 두고 생생하게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한 인간의 생각의 여정을 한번 추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일 거예요.
내가 대학생 시절에 서양철학교수 등등 각 교수들이 강의에 들어 와서 막 떠드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제각기 평생 공부한 것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풀어 놓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강의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행운인가 하고 느껴졌었어요. 학생들은 인(仁), 센시티비티(sensitivity)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는 이 선생이 이렇게 말하면 엣센스를 탁 취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정리하고. 하는 식으로 다 종합이 되더라고.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가 정리되어 하나의 철학으로서 내 머릿속에서 나타나는데, 교수들은 서로 모르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무시하고 그러고 있었지요. 나는 그 당시 강의를 쫘악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전달하는 것을 하나로 통합시키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쓴 글이 바로 「동양적이란 의미」예요. 여기에 보면 상당한 스케일의 생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감히 이런 글을 쓰면서, “내가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건가, 이렇게 동서고금을 종횡무진해서 써도 되는 건가?”하는 공포심이 대단했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 당시는 이런 글은 감히 쓸 수 없는 글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그 당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발분망식(發憤忘食)의 학문자세
그런데 그 당시 60년대에는, 서울 대학의 꼴찌가 고대 법대 일등으로 들어 올 정도였을 때니깐, 고려대학 철학과라고 하는 것은 최하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와 서울대학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고대는 지금 지방의 하바리 대학의 위치나 마찬가지였다고. 서울대학만 하나 우뚝 서 있고 연세대, 고대 할 것 없이 다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저 밑으로 쳐져 있었던 거죠. 그런 데다가 고려대학 내에서도 철학과라고 하는 것은 최하바리였습니다. 그 시시한 고려대에서도 최하바리였던 철학과의 무명의 촌놈 김용옥! 그런 사람이 쓴 논문이 「동양적이란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 동양학에 대한 학문풍토가 없었던 60년대의 살벌한 상황에서 이런 논문을 썼고, 그 바탕이 오늘 내가 중용(中庸)강의하고 있는 현재의 바탕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 글을 보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깐 여러분들이 꼭 한 번 이 글을 읽어 보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30년 전의 나와 비교해 볼 때에 나보다 더 유리한 조건 속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0년 후에 지금의 김용옥을 능가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깊으면 넓을 수 없고, 넓으면 깊을 수 없다?
이 세상에는 아주 하찮은 이야기이면서도 사람을 기죽이고 병신 만드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깊이가 있으면 좁으며, 넓게 섭렵하는 놈은 얄팍하다든가, 글 잘 쓰는 사람은 말을 잘 못하며, 말 잘하는 사람은 글을 잘 못쓴다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런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근세에 들어오면서 프로이드의 인성구조론(personal structure theory)이 미친 영향이라고 생각되요.
프로이드의 인성구조론에는 자아ㆍ초자아ㆍ이드가 있는데, 프로이드는 이런 인성구조론에 입각해서 싸이킥 에너지를 닫힌계(closed system)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선에 비유한다면, 한 쪽을 눌러서 그 부분의 부피를 줄이면 다른 쪽의 부피가 늘어나는 식이죠. 초자아가 확대되거나 또는 자아의 현실원리(reality principle)가 강화되면 이드(Id)가 약화되어 무의식층에 어떤 축적이 진행되었다가, 잠잘 때가 되면 자아가 약화되므로 다른 쪽 부피가 늘어나서, 즉 이드가 활발해져서 이드적 충동이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꿈의 내용이라는 것, 한마디로 인간의 피직 에너지(Psychic energy)는 일정한 규모를 갖는다는 것이 프로이드의 썰입니다. 이것은 바로 뉴톤역학적으로 인간을 규정한 거예요. 프로이드의 전 이론체계라는 것은 뉴토니안 다이나믹스를 전제로 해서만, 뉴톤역학적 인간관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한계 지우지 마라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프로이드의 이론에는 인간의 싸이킥 에너지를 물량적으로 정의해 놓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프로이드의 사고에는 전부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별로 하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프로이드의 인간관은 고전물리학적인 이론체계에서 보는 인간관입니다. 그러니까 융(C.G Jung) 같은 사람은 이런 생각에 반대했던 거예요. 그는 이드의 싸이킥 에너지를 터버렸습니다. 끝이 없다, 밑창이 없다 이거야! 그게 집단무의식입니다. 아케 타입 이론(arche type theory)이라든가 하는 융의 이론은 뉴토니안 메카닉스의 구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암암리에 자기의 싸이킥 에너지나 인간의 가능성을 뉴토니안 다이나믹스로 규정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나는 벌써 대학생 때 그런 인간관에 대해서 반발을 느꼈습니다. 학문이, 서양학문이 사람을 죽이려 든다고 느꼈던 것이죠. 사람이 깊으면 넓지 못하고 넓으면 깊지 못하다는 등의 말은 기를 죽이는 말입니다. “야! 김용옥! 니가 뭐 잘났다고, 여기 저기 헤집고 다니면서 온갖 거 다 하겠다고 설쳐대는 거냐?”고 사람들이 찔러대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폭을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으로 넓으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참으로 깊게 들어가면 갈수록 넓어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싸이킥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가능성에 대한 형편없는 엉터리 같은 그림을 그리지 마십시오! 어렸을 때 이런 엉터리 그림에 빠지면 평생을 속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니깐 글을 못 쓰는 게 당연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서는 글을 실제로 못 쓰는 병신들이 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만에 말씀! 말을 잘 하려면 글을 잘 써야 합니다. 글도 못 쓰면서 말만 잘하면, 그것은 엉터리 말이죠. 넓으면 깊지 못하고 깊으면 넓지 못하다는 말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엄청난 협박이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짓부렁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서도(書道)를 잘 못하고, 서도(書道)를 잘하는 사람은 그림을 잘 못 그린다는 맨 이따위 말들만 무성해요. 이런 엉터리 말들이 많은데,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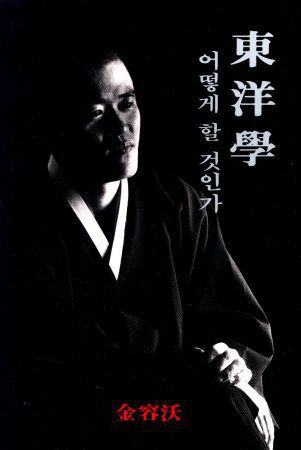
21장 2. 무한히 뻗어나가라
중용(中庸)의 인간관 : 원대하게, 무한히 뻗어나가라
중용(中庸)이 말하고자 하는 인간관은, 인간은 양단을 다 포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기양단 용기중(執其兩端 用其中)! 깊으면서 동시에 넓을 수 있고, 말 잘하면서 글 잘 쓸 수 있고, 양단이 다 가능한 게 인간입니다. “그 양단을 잡을 수 있으면서 그 중(中)을 쓰는 게 중용(中庸)이다.” 인간에게 가능한 자기의 가능성을 여러분들은 잡아야 합니다. ‘집기양단(執其兩端)’해야만 용기중(用其中)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집기양단(執其兩端)’하지 않고 ‘용기중(用其中)’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용(中庸)이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적에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추구하고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가능성을 좁히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뻗어 나가서 이 시대의 위대한 석학, 인물, 기업가들이 되고 또한 자기의 가능성을 폭넓게 발휘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미 자기의 가능성을 좁혀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인간의 정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한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부를 원대하게 갖고 살며 무한히 뻗어나가라! 젊었을 때,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가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세요. 인간의 싸이킥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광대무변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세계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무궁무진한 세계이거든요. 최고의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도올의 무한히 뻗어나간 이야기
내가 6·70년대에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한 그 과정이라는 것은 피눈물 나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집안이 풍족해가지고 집안 돈을 가지고 편하게 공부한 줄 아는데, 나는 고대 철학과에 들어가서부터 오늘 이때까지 집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나는 완전히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유학비용은 장학금으로 내가 벌었거든요. 이 피눈물 나는 과정이 나에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내가 「동양적이란 의미」란 글을 썼을 때, 그 정도의 생각을 당시 우리사회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미친놈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었죠.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나의 생각을 이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세계 일류대학의 학위를 따서 그 학문적 권위를 빌리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표를 수집하듯 학위콜렉션하는 게 취미냐?”는 농담을 콰인(W.V Quine)으로부터 들을 정도로, 대만대학, 동경대학, 하버드 대학 등지의 학위를 받았던 거예요.
내가 그 어려운 유학의 길을 걸었던 것은 그 당시 나의 이상과 생각을 이 사회에 설득시킬 길이 달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열한 삶의 도전을 했어야만 했고 피눈물 나는 공부를 했어야만 했던 거지요. 내가 일본 동경대학에서 일본사람들과 맞서 가지고 자존심을 걸고 그 지독한 경쟁을 벌였던 것,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석사학위를 최우수성적으로 취득하고 나올 때의 그 감격, 그 고생의 역정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방면에서 최고가 되자!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요즘과 같이 효과적인 여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라면 50 평생에 성취한 양을 30세 정도면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0년은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효율적으로 치열하게, 엉덩이가 땀으로 짓물러 터지도록 공부를 하십시오. 어떤 것을 하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이 시대의 인물들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내가 이런 뜻이 있어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이지, 시간이 남아돌고 할 짓이 아닙니다. 궁하니까 젊은이들보고 기껏 교양이나 쌓으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하고 있는 자기의 방면에서 최고의 인물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한 20년 후에, 신문에 내가 크게 공고를 낼 테니깐, 신라호텔 크리스탈 볼룸같은 데를 하나 빌리든지 해서 도올서원 동창회를 하면, 다 모였을 때 20년 전 도올서원에 대한 이야기꽃을 활짝 피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웃음>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올서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자기의 위대한 미래상을 그려 달라는 것입니다. 작은 인간들이 되지 말라 그 말이예요. 내가 하나의 산 표본 아닙니까? 제일 별 볼일 없던 촌놈이 이렇게 되었잖아요! 요전에 로스엔젤레스에 갔었을 때, 보성고등학교 동창들을 여럿 만났었는데, 그 친구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깐 내가 제일 별 볼일 없던 놈이었어요. 거기 있는 그 친구들은 고교시절에 전부 다 나보다 우수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학교 안에 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놈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나보다 더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도올서원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1장 3. 다시 몸으로
20장에 ‘성론(誠論)’이 나오면서, “상(上)으로부터 믿음을 얻는 길이 있다. 그것은 우선 붕우(朋友)에게 신임을 얻는 것이다. 붕우에게 신임을 얻는 것은 순친(順親)해야 되고, 순친(順親)한 것은 반저신(反諸身)이다”라고 했습니다. 인륜관계에 있어서 ‘획호상 신호붕우 순호친(獲乎上 信乎朋友 順乎親)’해가지고 ‘반저신불성(反諸身不誠)’, 결국은 ‘성(誠)’으로 갔죠? 궁극은 자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학(大學)』에서 보면,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둘러싼 문장구성이 앞에서 뒤로 전개되었다가 다시 뒤에서 앞으로 주욱 나가고 있습니다. 즉, ‘명덕어천하(明德於天下)’에서 ‘격물(格物)’까지 갔다가, 다시 ‘물격(物格)’에서 ‘국치이후천하평(國治而后天下平)’까지 가서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 “자천자 이지어서인 일시개이수신위본(自天子 以至於庶人 壹是皆以修身爲本)”이라고 했습니다. 수신(修身)이 본(本)이라고 했어요. 전 프로세스가 뭘로 가고 있습니까? 결국 ‘큰 배움[大學]’도 수신(修身) 하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중용(中庸)도 모든 인간관계가 ‘반저신(反諸身)’에서 ‘성(誠)’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내가 항상 말하는 몸철학의 몸의 문제가 나오는데, ‘반저신(反諸身)’이라고 할 적에 ‘신(身)’이라고 하는 게 뭐냐? 왜 ‘저신(諸身)’이냐 하면, 중용(中庸)이 말하는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 속에 존재하는 최후의 자연인 것이죠.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自然, 스스로 그러함)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문명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그 몸은 항상 자연이고, 따라서 자연의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身)’으로 돌아가라는 ‘반저신(反諸身)’은 뭐냐, 이것은, “몸은 천지이다! 자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자연에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용(中庸)이 하는 말은, ‘신(身)’에게서 어떠한 도덕적인 원리를 뽑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천지만물의 중용(中庸)을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중용(中庸)이 말하는 천지(天地)의 특성은 바로 ‘성(誠)’입니다. 천지(天地)가 바로 ‘성(誠)’이예요. ‘천지운행지도(天地運行之道)’는 모든 것이 성실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질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이러한 자연의 성실함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밤이 오고 나면 낮이 오고, 그 다음엔 또 밤이 오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등등의 천지 운행이 성실하게 궤도이탈을 하지 않고 부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최후의 도덕성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살아야 하느냐는 것을 중용(中庸)의 저자는 천지(天地)의 법칙에 입각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완전히 통일되고 있어요.
「동양적이란 의미」를 보면, “우리의 인생은 ‘성지(誠之)’호의 기차를 타고 ‘성(誠)’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이다【유가의 프래그머티즘이 정립하고자 하는 인간은 편협한 가장적(家長的) 존재가 아니라 우주적 인간이다. 즉 수신(修身)의 본질인 성실함을 궁극적으로 우주에 귀속시키고 있다. 성실함 그 자체는 하늘의 길이다. 하늘의 길이란 하늘의 운행을 말하며 고대 중국인들은 자연의 관찰에 있어서 자연의 성실한 운행 그 자체에 일종의 타우마제인(taumazein, 놀람, 경탄)을 느꼈던 것이다. 해와 달, 별 그리고 주야, 사시의 움직임이 몇 백만년을 통해서 그렇게도 어김없이 일순간의 오류도 없이 성실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 그것은 경탄이며 예찬인 동시에 또 인간 삶의 최후보루라고 느꼈던 것이다. 그러한 성실한 자연의 경지는 “힘쓰지 않아도 깨달아 지며 자연스럽게 길에 들어 맞는” 경지이니, 곧 그것은 우주(宇宙)와 합일(合一)이 된 성인(聖人)의 경지이다. 그러나 인간의 현실은 성인(聖人)의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으나 곧 성인(聖人) 그 자체는 아니다. 나의 현실은 “발현(發現)하여 모두 상황에 척척 들어 맞는” 것도 아니고 “힘쓰지 않아도 들어맞고 생각지 않아도 깨달아지는” 그러한 현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성실함 그 자체”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야만 한다. 그 노력의 과정을 『중용(中庸)』의 저자는 “성실하려고 하는 것[誠之者]”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사람의 길[人之道]’이다. 『중용(中庸)』의 첫머리에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것 그것을 일컬어 길이라 한다[率性之謂道]”라고 했을 때의 ‘길’이며 사람의 길이란 곧 자기가 타고난 본성을 따르는 길, 그곳에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길이다. 즉 그길은 ‘성(誠)’이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성지(誠之)’호의 열차길이요, 그것이 우리 삶의 과정(process of life)이다.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東洋的’이라는 의미」pp 321】”라는 말이 있는데, 인간의 삶이란 ‘성(誠)’할려고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之)’란 프로세스, 과정을 나타내죠?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과정과 실재(process and reality)’로 말한다면, 프로세스가 ‘성지자(誠之者)’이고 리얼리티가 ‘성자(誠者)’입니다. ‘성자천지도야 성지자인지도야(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라는 말은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과정과 실재’와도 통하는 말이예요. ‘대본(大本)’의 세계[誠者]와 ‘달도(達道)’의 세계[誠之者]라! 이런 프레임웤을 이미 20장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21장에서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아주 명쾌하게 풀어 놓고 있습니다. 주자 주(註)를 보면, “21장은 앞 장을 이어서, 공자가 말한 ‘천도(天道)’, ‘인도(人道)’의 뜻을 세워서 말한 것이고, 그리고 21장 이하로 12개의 장은 21장의 의미를 전개(unfold)한 것이다[夫子天道人道之意 而立言也 自此以下十二章 以反覆推明此章之意].”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장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장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1장과 제20장이 연결된 프레임웤이 21장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피기 바랍니다.
21장 4. 유(幽)가 성(誠)으로
| 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敎. 誠則明矣, 明則誠矣. 성(誠)으로부터 명(明)하여 지는 것을 성(性)이라 일컫고, 명(明)으로부터 성(誠)하여 지는 것을 교(敎)라고 일컫는다. 성(誠)은 곧 명(明)이요, 명(明)은 곧 성(誠)이다. 自, 由也. 德無不實而明無不照者, 聖人之德, 所性而有者也, 天道也. 先明乎善而後能實其善者, 賢人之學, 由敎而入者也, 人道也. 誠則無不明矣, 明則可以至於誠矣. 자(自)는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덕은 실제가 아님이 없고 명(明)은 밝지 않음이 없는 것은 성인의 덕(德)으로 본성에 따라 소유한 것이니, 천도(天道)다. 먼저 선(善)에 밝은 후에 그 선을 실증할 수 있는 것은 현인의 학문으로 가르침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니, 인도(人道)다. 성(誠)은 밝지 않음이 없고, 명(明)은 성(誠)에 나갈 수 있다. 右第二十一章. 子思承上章夫子天道ㆍ人道之意而立言也. 自此以下十二章, 皆子思之言, 以反覆推明此章之意. 여기까지가 21장이다. 자사는 윗장의 천도(天道)와 인도(人道)의 뜻을 말한 것을 이은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하 33장까지의 12장은 모두 자사의 말로 반복하여 이장의 뜻을 미루어 밝힌 것이다. |
‘자성명 위지성 자명성 위지교(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敎)’ 여기서는 제1장의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의 구조에서 도(道)만 빠지고 성(性)과 교(敎)를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것은 한 사람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성론(誠論)’을 집어넣고 있는 것인데, ‘성론(誠論)’을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성(誠)’으로부터 밝아지는 것이 ‘성(性)’이요, ‘명(明)’으로부터 ‘성(誠)’하여 지는 것이 ‘교(敎)’이다.”
중용(中庸)의 위대한 말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사실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내력이 있습니다. 중용(中庸)이라는 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예요. 이런 위대한 도덕(道德)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루아침에 구성된 게 아니라, 사실은 종교적인 배경과 내력에서 축적된 것입니다.
마을 안은 코스모스, 마을 밖은 카오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명(明)’은 “유명(幽明)을 달리한다, ‘유(幽)’와 ‘명(明)’이 딱 갈려 버렸다”고 할 때의 그 ‘명(明)’입니다. ‘혼(魂)’과 ‘백(魄)’이 갈려지는 게 죽는 것인데, “혼백(魂魄)이 달리 했다”와 “유명(幽明)을 달리 했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지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본다면, 밝다라는 말은, 일본인들이 시빌라이제이션(Civilization)을 번역할 때 문명(文明)이라고 번역했던 것처럼 그런 ‘명(明)’의 체계를 가리킵니다. 이원적으로 보자면, ‘유(幽)’라는 것은 카오스의 세계이고, ‘명(明)’이라는 것은 코스모스의 세계예요. ‘유(幽)’라는 것은 카오틱해서 몰라,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는 것은 뭐냐, 자기들의 인식구조에서 질서라고 뽑아낸 코스모스의 세계입니다. 코스모스는 항상 인간에게 밝게 인식이 되고, 카오스는 인간에게 어둡게 인식 되요. 인간의 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육체, 인간의 ‘백(魄)’의 세계는 명백하다, 그것은 ‘명(明)’하다! 그러나 ‘혼(魂)’의 세계는 ‘암(暗)’하다, 컴컴하다, 혼돈스럽다!
옛날에 마을공동체를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이런 ‘혼백(魂魄)·기혈(氣血)’의 문제를 공간적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마을만이 인간의 코스모스요, 마을을 벗어나면 카오스의 세계이다! 마을 밖은 맹수들이 우굴거리고 무섭고 어두운 세계이고, 사람들이 함부로 못가는 세계인 것이죠.
카오스에 사는 도깨비
그래서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경계에 얼씬거리고 있는 것들이 도깨비입니다. 옛날에 도깨비들은 다 그런 경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안팎을 가르는 그런 경계에다가 신목(神木)을 만들고 성황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도깨비들보고 “니들은 여기까지만 와라!” 이겁니다. 옛날에 여자들이 어쩌다가 밤에 부득불 마을 사이를 오갈 때 뒤에서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치마를 자꾸만 잡아 당겨요. 치마자락을 잡아당기는 도깨비의 손을 탁! 치고 또 당기면 탁! 치고, 모르는 채 이렇게 걸어가면서 탁 치고 탁 치고…<웃음> 도깨비가 나타날 때, 도깨비를 아는 척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는 척하면 그게 도깨비에게 홀리는 거예요. 모르는 체 해야지, 아는 척 했다가는 죽습니다. 모르는 체 하고 가는 게 도깨비하고 싸우는 것이죠. 도깨비가 주욱 따라오다가 동네 어귀까지 이르면 사악 사라집니다.
옛날에 정말로 도깨비가 있었어요. 나도 봤으니깐, 같이 놀고 그랬으니깐. 그러니까 마을 안은 인간의 세계이고, 마을 밖은 카오스의 세계요 귀신의 세계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간이라는 한 몸에서 보면 여긴 인간의 정신의 세계이고 여긴 인간의 육체의 세계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제사는 수렵문화에서 발생했다
옛날에 제사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는 수렵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수렵이라는 것은 먹고 살려고 장정들이 모여서 카오스의 세계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냥을 나갈 때에는 마을에서 거대한 제식이 벌어집니다. 이런 수렵문화의 제식에서 모든 제식이 나왔는데, 고대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부터 그 내력이 쌓여져 온 거예요.
수렵은 동네의 코스모스의 세계, 다 아는 세계, 질서의 세계에서 카오스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 모르는 무질서의 세계, 귀신의 세계로 나가는 데 대한 불안감과 거기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호해 달라고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또한 사냥을 해 가지고 돌아오면 포획물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한 제사가 크게 벌어집니다. 영신(迎神)이고 송신(送神)이고 모든 구조가 수렵문화의 구조에 있어요. 지금도 김금화씨 굿을 보면 돼지를 놓고 활 쏘고 창질하는 시늉을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는 수렵문화의 잔재가 요즘의 굿에도 남아 있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요새처럼 의사가 진단을 해봐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판단을 내리는 어떤 기준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결국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세계는 마을 밖의 세계나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카오스의 세계로 간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삶의 세계는 밝음의 세계이고, 죽음의 세계는 ‘유(幽)’의 세계, 어둠의 세계다! 이러한 것이 역사적으로 점점 변천을 했는데, 서양의 경우에는 갓(God)으로 발전한 겁니다. 원시공동체로부터 귀신이 점점 극대화 되어 가지고 갓으로 발전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카오스 세계를 성(誠)으로 설명하다
그런데 중용(中庸)에서는 이 ‘유(幽)’가 ‘성(誠)’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인간세의 합리적·도덕적 질서의 근본으로서의 자연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誠)’으로부터 ‘명(明)’하여지는 것, 어두운 데서부터 밝아져 내려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性)’입니다. 휴먼 네이춰(Human Nature)! 본체적인 세계죠. 서양철학으로 말한다면, ‘성(性)’은 본체(substance)가 되는 것이고 ‘교(敎)’라는 것은 현상(phenomena)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誠)’에서부터 ‘명(明)’으로 내려오는 것은 인간의 본래적인 ‘성(性)’의 문제이고, 대신 이미 밝아져 있는 질서의 세계로부터 이 문명의 법칙을 배워서 ‘성(誠)’으로 나가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학습입니다. 교육심리에서 말하는 학습(learning)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규범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문명 속에서 주어져 있는 질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誠)’으로 가는 것이예요.
‘명(明)’을 통해서 ‘성(誠)’으로 가는 것은 모두 다 교육이다, ‘자명성(自明誠)’은 다 ‘교(敎)’다! 사실 ‘자성명(自誠明)’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흐름에서 볼 때, 오규 소라이(荻生徂徠)의 논점을 빌린다면 기본적으로 성인(聖人)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컬츄럴 히어로(Cultural Hero)’, 최초의 문명을 창조한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문명을 맨들어 냈으니깐 ‘자성명(自誠明)‘이죠. 『주역(周易)』에 보면, 그물을 어떻게 만들고, 불을 어떻게 만들고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문명의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자성명(自誠明)’의 세계는 성인(聖人)들이 세계이고, ‘자명성(自明誠)’의 세계는 범인들의 세계다!
21장 5. 보편적 패러다임인 성(誠)
언어가 나를 빌려 표현한다
‘자명성(自明誠)’의 구조와 현상을 미셸 푸꼬의 이론, 디스코스(discourse, 담론)의 이론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푸꼬의 담론이란 쉽게 말하면, 인간은 언어의 창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인(聖人)은 언어의 창조자들이지만, 범인들은 언어의 창조자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언어를 수단으로 해서 나의 사고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푸꼬는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이죠. 푸꼬의 생각은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빌려서 자기를 표현할 뿐’이라는 겁니다. 개별적인 우리의 사고가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디스코스, 담론이 선행한다는 것이죠. 언어가 우리의 존재 이전에 이미 있다는 말이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전에 존재하는 언어를 단지 습득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언어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해가는 과정, 즉 우리의 사고가 언어에 의해서 프레임 당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기만적(deceptive)입니다. 자기가 창조적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알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언어는 그 언어의 사용자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언어의 정의에서부터 단순한 습득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 습득을 잘하면 문명화된 인간(civilized man), 즉 그 문명에 적응을 잘하는 인간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기만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담론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인식의 구조인데, 그 인식의 구조를 푸꼬는 에피스팀(episteme)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인식의 구조는 사실은 순수한 인식의 구조가 아니라 사회과학적으로 말한다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권력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 권력의 구조에 우리는 오염되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디스코스는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으니깐, 디스코스는 한동안을 지배하지 영원히 지배하지는 않으니깐, 그 디스코스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자 같은 사람들은 뭡니까? 디스코스의 축을 바꾼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자를 또 하나의 성인(聖人)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푸꼬의 논의는 참으로 기발합니다. 사회과학적인 문제를 철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의 체계가 한낱 정치 권력의 도구화된 시대적 패러다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런 만큼 기만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재미난 통시적인(diachronic) 시각에서 규명해 나간 것이 푸꼬예요.
푸코는 위대하나 그의 말은 번잡하다
내가 보기에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상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불란서놈들, 이 짜식들은 왜 그렇게 쓸데없이 말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지 읽기가 더럽게 난해해요. 내가 푸꼬를 읽은 바에 의하면(그의 저작을 모두 읽지는 않았다), 이야기는 별 게 없는데 그걸 가지고 지독하게 어렵게 구라를 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푸꼬를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말에 속아가지고 평생 ‘푸꼬연구가’다 이러고들 있고, 푸꼬의 말이 워낙 어려우니까 서로 “너는 푸꼬를 몰라 나만 알아” 맨 그러고들 있습니다. 그게 전문가라고 서로 뜯고 찔러대고 그러고들 싸우다가 뒈지는 거지 뭐!
참으로 한심한 거예요! 나는 푸꼬 전문가들하고 몇 번 대화해보고, 푸꼬가 대개 어떤 놈이라고 파악하고 나면, 내 구라를 펴서 푸꼬를 말합니다. 내 식으로 파악하고 내 구라로 푸꼬를 넉아웃 시켜버리면 되는 것이지, 내가 미쳤다고 그 자식을 언제 다 읽어 주냐? <웃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핵심을 파악하십시오.
보편 패러다임으로서의 성(誠)
‘자명성(自明誠)’이라는 것이 ‘교(敎)’이고, 결국 그것은 문명 속에서의 습득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 ‘교(敎)’를 거치기 마련이죠. 그런데 푸꼬가 이 ‘교(敎)’의 문제에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데 반해서, 중용(中庸)은 “참으로 ‘성(誠)’하면 ‘명(明)’할 수밖에 없고, ‘명(明)’하면 궁극에 가선 ‘성(誠)’해진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푸꼬가 말하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패러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사의 변천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패러다임은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패러다임이 바로 ‘성(誠)’이라는 겁니다. ‘성(誠)’만은 변할 수가 없다, 이것만은 양보가 되질 않는다! 이것은 대단한 말입니다. 이 21장은 대학생 시절에 읽었을 때, “바로 이거다!”라고 외쳤던 그런 장이예요. ‘자성명(自誠明)’, ‘자명성(自明誠)’을 읽는 순간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 구조가 아주 명료하게 잡혔던 겁니다. 대학교 3학년때 이 중용(中庸)을 읽고, 4학년때 「동양적이란 의미」를 쓴 거예요.
| 21장 핵심 내용 |
천도 (天道) |
22장 | 24장 | 26장 | 30장 | 31장 | 32장 | 33장 전편 요약 |
||
| 인도 (人道) |
23장 | 25장 | 27장 | 28장 | 29장 |
'고전 > 대학&학기&중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올선생 중용강의 - 23장 (0) | 2021.09.20 |
|---|---|
| 도올선생 중용강의 - 22장 (0) | 2021.09.20 |
| 도올선생 중용강의 - 20장 (0) | 2021.09.19 |
| 도올선생 중용강의 - 19장 (0) | 2021.09.19 |
| 도올선생 중용강의 - 18장 (0) | 2021.09.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