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아타나시우스의 부활절 메시지까지
- 정경과 외경이 없던 시대 -
AD 367년 알렉산드리아
자아! 우리의 최종적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오늘 우리가 신약성서라고 알고 있는 27서의 체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확정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나라와 같은 교계내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면 그냥 성령의 말씀으로서 시공을 초월하여 예수님시대에 하늘에서 툭 떨어진 책이라고만 단순히 생각하는 한국의 그리스도교인들에게, 또 그러한 생각을 조장하는 그리스도교계의 우매한 지도자들에게 초대교회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 단순한 사실의 지적이야말로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단도직입적인 정답을 먼저 제시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정도일 것 같다. 27서체제의 확립, 거의 정경화작업의 최종적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AD 367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아리우스를 이단자로서 휘몰면서 자신도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던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c. 293~373)가 5번의 망명생활【도합하면 망명기간은 정확하게 15년 10개월이 된다. 그러나 기번은 앞뒤의 박해 받은 상황을 합쳐 20년이나 되는 파란만장의 생애라고 쓰고 있다】 끝에 마지막으로 알렉산드리아 주교로 복귀한 366년 2월 1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27서정경이 발표된 것은 그 이듬해 부활절에 회중에게 낭독된 권위로운 주교서한 속에서였다.
독자들이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C. AD 298~373)에 관하여 좀 상세한 정보를 얻고 싶어한다면 기번의 『로마제국쇠망사』를 들여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까치글방에서 나온 우리말 번역도 있다). 손더스의 발췌본에도 놀랍도록 상세하게 아타나시우스의 생애가 기술되어 있다(Gibbon,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ed. by Saunders [N. Y : The Viking Portable Library, 1958], 제10장 전체).

지금의 정통은 과거의 이단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c. 293~373)의 기나긴 이론투쟁을 논의했는데, 기번의 아타나시우스에 관한 기술은 매우 정중하다.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아리우스파에 대한 폄하의 붓길에 하등의 재고의 여지를 두지 않는다. 20년 가까운 기나긴 세월을 자신의 종교적 이념 때문에 정치적 박해를 받았어야 했던 성자적 인품에 기번은 한없는 존경의 염을 표시하고 있다. 아타나시우스는 분명 ‘온갖 영욕과 성쇠를 겪으면서도 결코 동료들의 신임과 반대파의 존경을 잃는 법이 없었던’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을지도 모른다(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409).
그러나 우리는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논쟁을 단순히 예수가 사람이냐 신이냐? 하는 주제에 대한 이론적 대결로 파악하면 곤란하다. 예수는 일차적으로 사람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아리우스의 주장은 알렉산드리아를 포함한 당대 동방교회 전체의 주류였으며 당대 기독교사상의 일반적 정서를 대변하는 상식이었다. 학자들이 아리아니즘과 그노스티시즘을 직접 연결해서 분석하는 논의를 접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리아니즘도 영지주의라는 거대한 사상 운동의 한 갈래로서 이해될 수 있다. 영지주의는 당대 동방교회의 대세였다. 지금 우리의 교회사적 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아리우스가 이단이고 아타나시우스가 정통인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당대의 상식으로는 아타나시우스야말로 이단이고 아리우스가 정통이었다. 정통이 이단을 내모는 데 그토록 20년 동안이나 처절하게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료해(了解)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통이 없으면 이단도 없다
우선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과연 정통(orthodoxy)과 이단(heresy)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이단이란 옳다고 인정받는 종교ㆍ사상ㆍ학설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의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옳다고 인정받는 이론 이 과연 무엇인지를 규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이단도 규정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통이 없으면 이단도 없고, 이단이 없으면 정통도 없다. ‘이단’(異端)이라는 말의 당시 라틴어는 ‘하에레시스’(haeresis) 그것은 ‘선택’이라는 의미이다. 그리스ㆍ로마시대의 ‘이단’이라는 것은 ‘심사숙고한 끝에 선택한 설’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통해석에서 벗어나는 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이단이냐? 이 질문은 단지 초대 교회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만 던져져야 한다. 과연 정통과 이단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기독교의 경우, 이 질문에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첫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 팔레스타인 사역을 통하여 순결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어 놓으셨다.
둘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 (40일간?) 순결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어 놓으셨다.
셋째,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사도들에게 이 세계를 분할하여 책임지우고 그들에게 순결한 복음을 위탁하셨다.

내용적으로는 기준이 없다
결국 초대교회에서 정통을 얘기하고 이단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말씀과 사도들의 권능을 들먹거렸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며,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순결한 내용이란 무엇인가를 아무도 확정지을 수 있는 절대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데 있다. 지금 한국의 독실한 기독교인은 누구라도 그 절대적 근거는 성서가 아닌가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은 초대교회에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성경이 근원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27서정경도 존재하지 않았고, 복음서의 권위도 절대적이 아니었으며, 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동일한 자격을 지니는 성서문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당시의 문헌은 모두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필사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제목의 책이라도 필사본마다 심각하게 달랐다. 필사라는 것이 대개 낭독하는 것을 옮겨적은 것이었기 때문에 필사하는 사람의 인식구조에 따라 제각기 다른 단어나 이디엄이 선택된다. 그리고 첨삭이 아주 자유로웠다. 통일된 스탠다드 텍스트(Standard Text)라는 것은 그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은 정경(正經)이 없는 상태에서는 위경(僞經)도 외경(外經)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말하는 27서정경은 AD 367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기독교에 대한 개념 자체를 혁명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통이란 무엇이고 이단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미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막 13:22). ‘거짓 형제(고후 11:26, 갈 2:4)’ ‘거짓 사도(고후 11:13)’ ‘거짓 선생 (벧후 2:1)’, ‘거짓말(마 5:11)’ 등 희랍어로 ‘프슈도’(pseudo)를 접두어로 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표현들이 현재 성서에는 존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이미 초대교회 내에서 정통과 이단을 가리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할 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서 무엇이 가짜이고 진짜인지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수학문제라면 정ㆍ오를 가릴 수 있겠지만, 신앙문제에 있어서 정ㆍ오를 가리기는 참으로 난감한 것이다. 무엇이 참 신앙(true belief)이고, 무엇이 거짓 신앙(false belief)이란 말인가?

목소리 큰 놈이 정통
결국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대답은 이런 것이다: ‘목소리 큰 놈이 정통이고 목소리 작은 놈이 이단이다.’ 여기서 ‘목소리 크다’라는 우리 구어의 표현은 주장하는 사람의 성세나 권세가 크다는 말인데, 대개 목소리가 커지려면 그 목소리를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야 한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정통과 이단의 구분은 다수(majority)와 소수(minority)의 문제로 결착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 이단으로 몰려 쫓겨나가는 사람은 아마도 대부분 소수파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통과 이단의 구분이 다수와 소수의 문제로 가려진다면 또 역사기술은 간단해지겠지만, 이 다수와 소수의 문제는 ‘권불십년 (權不十年)이라는 말이 있듯이 짧은 시간내에 변할 수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더구나 초대교회 같이 유동성이 심한 커뮤니티 속에서는 다수와 소수의 문제는 매우 불확실한 기준이었다. 역사적으로 ‘이단’이라는 규정을 남발한 최초의 사람들은 유대화파(Judizers) 사람들이었는데, 기독교가 이방인의 종교로 급격하게 방향을 틀면서 유대화파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이단’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이다. 할례를 부르짖으며 정통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곧 이단이 되어 기독교사에서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초대교회사를 바라볼 때 가장 아이러니칼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정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소수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in my judgement, for a long time after the close of the post-apostolic age the sum total of consciously orthodox and anti-heretical Christians was numerically inferior to that of the ‘heretics.’ W. Bauer, Orthodoxy and Heresy in Earliest Christianity 231).
그렇다면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정통의 확실한 기준도 없고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수이며 권세도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들은 정통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단 말인가?

로마교회의 지지
사실 동방교회의 일반적 통례는 정통과 이단이라는 개념에 의하여 신도들을 분리하거나 파문시키는 그러한 분위기가 부재하였다. 정통과 이단이 공존하면서 항상 티격태격거리는 상황은 있을지라도 일자가 타자를 ‘이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배타적 권위가 부재했다. 그러한 일반적 분위기가 바로 초기기독교의 생명력이었으며 급속한 팽창의 주원인이었다.
그런데 ‘정통’(Orthodoxy)이라는 개념은 2세기초부터 로마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정통’이라는 것은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교회의 다수에 의하여 지지를 받는 기독교의 형태’(the form of Christianity supported by the majority in Rome, 同上 229)를 말하는 것이다. 이 로마교회의 입장이 결국 200여 년의 투쟁을 통하여 로마황제의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불가항력적인 권위를 획득했다는 데에 정통성의 역사적 계기가 존하는 것이다. 27서의 정경화작업도 그것이 정경으로서 권위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 이후 반세기가 지난 후에 로마가톨릭교회의 입장이 정립되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로마교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1세기의 초기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구약에서 분리시키려는 입장이었고, 바울도 그러한 분리적 입장에서 그리스도교리의 기본구조를 잡았다

로마교회의 보수성과 27서 체제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는 유대화파들은 전혀 경쟁대상이 아니었으며, 유대교전통은 전혀 신흥기독교에 대하여 위협적인 그 무엇이 아니었다. 따라서 로마교회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롭게 유대교 전통, 특히 구약을 활용할 필요를 느끼었던 것이다. 즉 구약의 율법적 세계관이야말로 오히려 정통과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많은 근거를 제시하였고, 그 권위로운 전통의 하중은 그들의 신학적 입장을 결정적으로 지지하였으며, 구약의 다양한 문학전통은 그리스도교의 예배(worship service) 형식이나 구도에 풍요로운 내용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동방교회는 다양한 이방철학이나 종교, 관습을 포용하는 절충주의적,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영지주의적 개방성을 유지한 반면 로마교회는 구약의 정통성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로마교회는 애초부터 영지주의적 개방성에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도 로마교회에 보낸 로마인서가 구약적 가치관이 가장 짙게 도색되어 있다. 이미 바울의 시대로부터 로마교회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리고 로마교회와의 커넥션이 확실한 베드로전서와 히브리서는 매우 구약적이다. 구약의 전승 속에서 신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27서 체제도 복음서중에서 구약과의 연속성이 가장 강한 마태복음이 제일 앞머리를 차지하고, 구약적 묵시문학의 기독교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이 그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것도 우연만은 아니다.

아타나시우스의 로마유학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c. 293~373)는 동방의 주교였지만, 서방 로마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외로운 사상가였다. 그는 그의 생애에서 제2차로 박해를 받았을 때, 즉 아리우스파가 동방의 지배자인 콘스탄티우스(Constantius)의 지지를 얻어 아타나시우스를 알렉산드리아에서 추방했을 때, 아타나시우스는 현명하게도 로마로 유학을 했다. 당시 서방 로마는 콘스탄티우스의 지배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는 망명생활을 새로운 지지기반의 획득으로 역이용했다.
아타나시우스는 로마의 주교(교황) 율리우스 1세(Julius Ⅰ)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이탈리아의 주교 50명이 모인 지역 종교회의에서는 그의 무죄를 만장일치로 선언하였다. 아타나시우스는 원래 희랍어에 정통한 인물이었으나, 이 기회를 활용하여 라틴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서방 성직자들과 우아한 담론을 직접 벌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서방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스(Constans)를 카푸아, 로디, 밀라노, 베로나, 파두아, 아퀼레이아, 트레베스 등지에서 직접 알현할 기회를 얻었고, 콘스탄스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획득했다.
아타나시우스는 콘스탄스 황제로 하여금 가톨릭교회가 처한 역경과 위험을 개탄하고 선제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의 결정과 신앙과 영광을 본받도록 부추겼다. 이에 콘스탄스 황제는 정통파 옹호를 위하여 유럽의 군대와 재력을 동원한다는 결의를 선포하는 한편, 자기 형이며 동방의 황제인 콘스탄티우스(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관할)에게 간결한 최후통첩을 보내 아타나시우스를 즉각 복직시키지 않으면 자신이 친히 육해군을 이끌고 가서 그를 직접 알렉산드리아 주교 자리에 앉히겠다고 통보했다. 알렉산드리아 주교 자리에 사람을 하나 복직시키기 위하여 동ㆍ서로마의 일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황제들의 행태를 지켜보면서 당시의 기독교라는 문제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종교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팍스 로마나(Pax Romana)는 이미 종언을 고하고 있었다. 로마 사회는 급격히 해체되어 갔고 콘스탄티누스 이전부터 시작된 병영황제시대의 전국시대적 무질서와 난맥상, 지배계급간의 무력충돌은 콘스탄티누스 1인황제시대로 접어들면서 가라앉는 듯했으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사후 다시 폭발하였던 것이다.

콘스탄티누스의 세 아들과 네 조카
콘스탄티누스 대제(‘대제’는 기독교를 처음으로 공인한 로마 황제라는 이유로 후세에 붙여진 칭호)가 AD 337년 5월 22일 니코메디아(Nicomedia)에서 죽었을 때,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맏아들 콘스탄티누스 2세, 둘째아들 콘스탄티우스, 셋째아들 콘스탄스였다. 아버지가 죽은 해에 이들의 나이는 20세, 19세, 17세였다. 이들에게는 이미 ‘카이사르’(가이사)라는 칭호가 있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는 부제로 임명되면서 국법에 의하여 선술집 딸이었던 첫 부인 헬레나와 이혼하고 당시의 정제인 막시미아누스(Maximianus)의 딸 테오도라와 재혼해야만 했다. 콘스탄티누스는 첫 부인 헬레나의 아들이다. 그런데 테오도라에게서도 두 아들(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의 두 이복동생)이 있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도 각각 두 아들씩을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제의 세 아들에게는 사촌형제가 4명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대제는 그 사촌형제 4명 중(달마티우스, 한니발리우스, 갈루스, 율리아누스) 나이가 든 달마티우스와 한니발리우스에게는 카이사르의 칭호를 주었다. 그들은 사실 황통으로 말하자면 콘스탄티누스의 세 아들보다 더 자격이 있었다. 콘스탄티누스는 그러니까 조카 두 명과 세 아들, 도합 5명에게 로마제국을 분할하여 주었던 것이다. 황통의 농도가 더 짙은 조카들에게도 ‘몫’을 나누어주어 내란의 가능성을 배제하려 했던 것 같다.

콘스탄스ㆍ콘스탄티우스와 아타나시우스
그러나 337년 7월 무렵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는 황궁을 피로 물들인 대숙청이 일어났다. 이방원의 살생부는 그래도 오랜 세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 대숙청은 무지막지하게 한꺼번에 선대의 정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싹 쓸어버린 사건이었다. 대제의 육친 중에 살해되지 않은 것은 12세인 갈루스와 6세인 율리아누스뿐이었다. 그리고 천하는 콘스탄티누스 2세, 콘스탄티우스, 콘스탄스 3형제에게로 3분되었던 것이다. 이 대숙청을 주도한 인물은 둘째아들 콘스탄티우스였다.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c. 293~373)는 동방을 지배하던 콘스탄티우스 황제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었는데 그의 탄압을 받고 로마로 가서 성격이 경쾌하고 활달했던 막내 콘스탄스 황제의 신임을 받고 그의 도움을 얻어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입성하게 된 것이다. 콘스탄스의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최후통첩에 형 콘스탄티우스는 하는 수 없이 양보를 했다. 동방의 황제 콘스탄티우스는 자신이 박해했던 일개 신민에게 몸소 화해를 간청하기까지 했다.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c. 293~373)는 콘스탄티우스 황제에게서 보호와 지원과 존경을 강력하게 다짐하는 세 차례의 친서를 받을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렸다. 콘스탄티우스 황제는 그에게 대주교직에 복귀하도록 권하는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가 체면손상을 무릅쓰고 주요 대신들로 하여금 자신의 뜻이 진정임을 입증하게 하는 조치까지도 취했다. 이 뜻을 더 한층 공식화하기 위해 그는 이집트에 엄격한 칙령서를 보내 아타나시우스 지지자들을 다시 불러들여 특권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무죄를 선포하고, 또한 에우세비우스파의 주도하에 작성되었던 아타나시우스 정죄의 재판기록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처럼 자기에게 유리한 만반의 대책이 마련된 후에야 아타나시우스는 느긋하게 트라케, 아시아, 시리아 등 여러 지방을 거쳐 귀국길에 올랐다.
여행중에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동방주교들이 그에게 비굴하게 경의를 표했지만 그는 그들을 경멸했을 뿐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보이지 않았다. 그는 안티옥에서 콘스탄티우스 황제를 만났다. 덤덤하게 그의 포옹과 항변을 동시에 받아들였다. 알렉산드리아 대주교로 그가 가면 최소한 그의 교구내에 하나의 아리우스파 교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황제의 제안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는 그렇다면 제국내의 다른 지방에서도 자기교파에 대해서도 똑같은 관용이 베풀어져야 한다고 대꾸하면서 확답을 회피했다. 이것은 마치 더 강한 국가의 독립군주가 내뱉을 성싶은 그런 언사였다. 아타나시우스의 알렉산드리아 입성은 줄리어스 시이저의 개선행렬처럼 성대했다. 그가 탄압을 받고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있는 동안 주민들은 그에게 사모의 정을 키웠다. 그리고 그가 황제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주교로서 돌아오는 모습에 그들은 프라이드를 느꼈다. 그는 이집트 민중의 영웅이었으며 제국종교화되어가고 있던 신흥기독교에 어떤 확고한 정통의 기준을 세워주는 진리의 화신이었다. 근엄한 그의 자세와 함께 그의 권위는 확고해졌으며, 그의 명성은 에티오피아에서 브리타니아에 이르기까지 온 기독교세계에 널리 전파되었다(The Decline and Fall of Roman Empire 415~6).

아타나시우스의 영광과 수난
그러나 바로 이러한 화려한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c. 293~373)의 승리, 그 자체야말로 그의 생애의 수난이요 비극이었다. 그의 거만한 자세는 당시 이미 얼마나 교권이 황권과 대적할 수 있을 만큼의 조직적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방증하는 한 사례이기도 했지만, 결국 황제를 능멸하는 신민이 편하게 버틸 수 있을 만큼의 판도는 아니었다. 더구나 세 황제 중 애초부터 실권자는 아타나시우스와 대결한 콘스탄티우스였다. 맏형 콘스탄티누스 2세는 막내동생 콘스탄스와 영토싸움을 벌이다가 불과 23세의 젊은 나이에 일찍 제거되고 만다(AD 340). 아타나시우스를 지원한 로마의 황제 콘스탄스도 10년 후 야만족 출신의 장수인 마그넨티우스에게 제거되고 만다. 콘스탄스는 피레네산맥 기슭까지 도망쳐왔는데 추격해온 기병대에 따라잡혔다. 황제는 따라잡히자마자 무참히 살해되었다. 그리고 시체는 들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방치되었다. 이것이 아타나시우스를 알렉산드리아로 입성시킨 황제, 10년 동안이나 광대한 로마제국의 3분의 2를 다스린 콘스탄스 황제의 최후였다. 그의 나이 30세였다(AD 350).
아리우스파를 적극 지지하는 콘스탄티우스 황제는 로마제국 독존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자 아타나시우스의 모독적 행동을 감내할 길이 없었다. 콘스탄티우스는 집요하게 아타나시우스를 박해한다. 여기서부터 아타나시우스의 ‘도바리길’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또 다시 시작되지만 결국 콘스탄티우스 황제는 그를 죽이는 데 실패한다. 기번의 다음과 같은 멘트는 로마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의미심장한 통찰이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아들, 콘스탄티우스야말로 세속적 권력의 가장 격렬한 발휘조차도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종교적 명분의 원리의 힘을 체험해야 했던 최초의 기독교도 황제가 되었다.
…… and the son of Constanine was the first of the Christian princes who experienced the strength of those principles which, in the cause of religion, could resist the most violent exertions of the civil power(The Decline and Fall of Roman Empire 428).

이교라는 말의 비극적 의미
콘스탄티우스 황제는 아버지의 기독교편향의 지지정책을 더욱 편향적으로 몰고갔다. 여기서 ‘편향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의 종교를 기독교와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탄압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기독교적 가치관 일색으로 도배질된 후대의 관점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방’(gentile)이니 ‘이교’(pagan)니 하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교도라는 것은 천여 년에 걸친 우수한 헬라스ㆍ로마문명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 교도를 뜻하는 ‘파가누스’(paganus)는 원래 ‘시골뜨기’ ‘촌놈’이란 뜻인데 한번 생각해보자! 헬라스ㆍ로마문명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누가 더 촌스러운 사람들이었겠는가? 그러나 기독교의 공인으로 하루아침에 헬라스ㆍ로마문명 전체가 촌놈ㆍ이교도들의 문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기독교를 정통으로, 유일신에 대한 유일한 신앙체계로서 수용하는 순간, 길거리에 가득찬 제우스 쥬피터ㆍ아테나ㆍ비너스…… 나체의 신상들이 모두 우상이 되어버리고, 인류문명의 극상의 예술품이었던 위대한 신전들이 모두 악령의 소굴이 되며 저주와 파괴와 약탈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 오늘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희랍 로마신상들이 대부분 잘라지고 꺾어지고 뭉개지고 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전들의 돌기둥은 뽑히어 새로 짓는 기독교 교회의 기둥으로 둔갑하였던 것이다. 웅대한 회암사의 파괴된 불상들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더 가슴아픈 일이다. 사실 기독교의 공인이라는 이 사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역사에서 가장 야만스러운 문명의 전환이기도 했던 것이다.

배교자가 아닌 공평한 황제 율리아누스
콘스탄티우스의 뒤를 이은 황제는 바로 337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육친을 살해하는 대학살에서 6살이라서 너무 어렸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 못하고(이것도 역사의 우연이었겠지만) 살려두었던 대제의 막내조카, 콘스탄티우스의 사촌동생 율리아누스였다. 그런데 오늘날 역사에서는 율리아누스 황제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배교자 율리아누스’(Julianus Apostata, Julian the Apostate)라고 쓴다. ‘아포스타타’라는 말은 ‘기독교신앙을 버렸다’는 뜻이다. 그러나 율리아누스는 결코 배교자는 아니었다. 그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칙령(the Edict of Milan)의 원래 정신으로만 돌아가자고 말했을 뿐이다. “오늘부터 기독교든 다른 어떤 종교든 관계없이 각자 원하는 종교를 믿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의에 참가할 자유를 완전히 인정받는다. …… 기독교도에게 인정된 이 완전한 신앙의 자유는 다른 신을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인정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이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도 그 명예와 존엄성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원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독점’을 원했다. 따라서 신앙의 자유를 공평하게 고려하는 황제에게는 ‘배교자’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 제우스신전의 신탁도 하나님의 로고스(Logos)와 동등한 신앙의 형태로 인정하면 ‘배교자’가 되는 것이다. 어린 율리아누스는 니코메디아(Nicomedia)에 살았던 외할머니 슬하로 보내졌다. 니코메디아는 아리우스파들의 본거지 중의 하나였다. 율리아누스는 아리우스파 성직자들의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마르도니우스라는 희랍고전문화에 정통한 노예가 그를 애지중지 길렀다. 마르도니우스는 율리아누스에게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와 핀다로스의 시를 암송케 했으며 고대 희랍철학자들의 방대한 저술들을 계속 낭독해주었다. 율리아누스는 어려서부터 엄격하고 결점이 없는 완벽하고 지배적인 기독교 유일신보다는, 인간적이고 결점투성이인 그리스 신들과 장난치고 놀면서 성장했던 것이다. 율리아누스는 그리스철학의 학도로서 자처했으며 헬라스의 사변과 문학의 세계에서 신유(神遊)하는 데 더없는 기쁨을 느끼고 산 순수한 인간이었다.

▲ 율리아누스 황제,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대리석 상. 종교적 감각이 가장 탁월했던 위대한 황제
율리아누스의 인생역전
그의 형 갈루스가 부제로 임명되어 떠나자, 그는 이오니아의 에베소로 가서 자유로운 삶을 만끽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친형 갈루스 부제는 콘스탄티우스에게 손을 뒤로 결박당하고 무릅 꿇은 자세로 목이 잘렸다. 정제 콘스탄티우스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다. 그의 모가지는 무죄를 항변하지도 못하고 입을 다문 채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율리아누스는 콘스탄티우스에 의해 밀라노로 호출되었다. 율리아누스는 콘스탄티우스에게 살살 빌었다. 자기는 오직 철학공부하는 것만이 삶의 기쁨이며 정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살살 빌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래서 그는 아테네로 유학을 갔다. 그리고 철학의 본고장의 유적들을 바라보며 탈레스로부터 소크라테스를 거쳐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는 보이지 않는 지적 유산의 향기를 흠뻑 만끽했다. 그러나 반 년 후(355년 11월) 콘스탄티우스는 그를 다시 밀라노로 불러 ‘카이사르’에 임명한다. 부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24세의 그를 골(Gaul) 지방의 전쟁사령관으로 보낸다. 그를 제거시키기 위한 심산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웁게도 전쟁경험이 하나도 없었던, 칼자루 한번 손에 전 적이 없었던 철학도 율리아누스는 탁월한 전략가로서 변모하면서 모든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스트라스부르 전투’에서 대승하여 라인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한다. 역사가들은 설명키 어려운 변신이라고 말하지만 전쟁도 결국 인술(人術)이며 인술(仁術)이다. 용인(用人)의 지혜와 부하를 아끼는 인(仁)한 마음이 있으면 나머지는 베테랑들이 다 해결한다. 더구나 율리아누스는 냉철한 철학적 이성의 소유자였다. 율리아누스는 결국 병사들에 의하여 ‘정제’로 옹립되었고 사촌형 콘스탄티우스와의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다행히 콘스탄티우스가 병사한다. 그래서 반복되는 근친살해의 비극을 거치지 않고 그는 황제가 된 것이다.

아름다운 토착적 전통을 회복시키고 짧은 생을 마감한 율리아누스
황제가 된 후 그가 실천하고 싶었던 것은 기독교에 짓눌린 그리스ㆍ로마문명의 아름다운 토착적 전통의 회복이었다. 그러나 그의 생애도 결국 ‘배교자’로서 낙인 찍히고 만다. 그러나 그가 황제로 있을 동안에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c. 293~373)는 또다시 탄압을 받는다. 아리우스파에 의하여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은 그가 아타나시우스의 주교권한을 인정할 리가 없다. 그러나 율리아누스의 생애는 짧았다. 페르시아 영토를 탈환하여 로마의 위세를 다시 한번 과시하고자 했던 전투에서, 현재의 바그다드 아래에 있는 크데시폰(Ctesiphon) 전투에서 퇴각하던 중 말 탄 율리아누스의 상복부에 ‘누가 던진 것인지 알 수 없는 창’이 깊숙이 꽂혔다. 하얀 투니카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고 그의 간까지도 파열되었다. 그런 중에서 온종일 격투를 벌인 뒤 하룻밤을 지새웠다. 침대에 누운 채 이와 같이 말했다.
“나도 인생에 작별을 고할 때가 온 것 같소. 나는 항상 나에게 생명을 준 위대한 자연에 보답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오. 현세에서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 신들이 주는 마지막 포상이 죽음이라고 내가 배운 철학은 말하고 있소. 나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하나도 후회하지 않소. 남을 살해하지도 않고 비열한 짓을 하지 않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오. 세간에서 격리되어 있었던 시기에도, 그 후 권력을 혼자 독점한 시기에도 나 자신에게 충실하게, 내 생각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온 것은 마찬가지였소. …… 나의 정치의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세에서 결과가 좋으면 신들이 도와준 덕분이고 결과가 나쁘면 인간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소. …… 후임자 문제는 그대들 자신의 양식에 맡기겠소. 단지 로마제국의 사람들이 내 후임자의 치하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뿐이오.”
그는 찬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했다. 율리아누스는 하인이 가져온 연보라색 유리그릇에 담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AD 363년 6월 26일 자정경이었다. 31년 7개월의 생애, 율리아누스 황제재위기간이 19개월이 아니라 19년만 되었어도 로마의 운명, 아니 세계사의 운명이 바뀌었으리라! 참으로 안타까운 좌절이었다. 그는 일신교의 폐해를 자각한 유일한 황제였다(『로마인 이야기』 14-286).

예수님의 말씀과 인간의 언어
아타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의 대결,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습을 비로소 확정 지운 아타나시우스의 27서 정경의 출현,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종교교리상의 문제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그 배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간들의 생활상과 역사의 하부구조, 경제사적 토대와 같은 매우 착실한 기반으로부터 분석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의 독자들은 나의 역사서술방식이 약간 기독교 정통론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역사의 흐름에 대해 나의 주관적 포폄의 절대성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내가 비록 안타까움을 표현할지라도 독자들에게 그것이 강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클레오파트라(Cleopatra VII, BC 69~30)의 코’는 무의미하다. 내가 지나간 역사에 대해 세우고 싶어하는 가설대로 역사가 흘러갔다면 인간의 역사는 재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부정적인 방향이든 긍정적인 방향이든 그 주어진 역사의 모든 성쇠와 희비를 극복해가는 것은 당대 역사의 담임자들이며 민중이다. 기독교의 역사만 해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해도 오늘까지 흘러 내려온 기독교의 모습은 그 많은 민중들의 피땀에 의하여 최선의 방향으로 선택되어온 것이고 또 그렇게 흘러가리라고 나는 믿고 있다. 따라서 나는 기독교의 모든 정통적 교설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나의 마음자세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실’은 인간의 역사와 얽혀있으며 인간의 언어 속에 일차적으로 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를 혼동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지금 탐색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언어다. 그것은 오직 인간의 언어와 역사의 사실을 밝힘으로써만 접근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우 날카롭고 다양한 관점의 메스를 가하기를 주저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순교는 공포 아닌 영광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공인은 기독교신앙의 자유라는 어떠한 사상자유를 선포하는 사건이 아니다. 박해를 하던 대상을 하루아침에 숭배의 대상으로 돌변시키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하부구조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박해로서는 기독교를 제압할 길이 없었다. 왜냐하면 순교는 초기기독교인들에게는 전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광신자들은 삶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다. ‘그들은 종종 도로상에서 여행자를 멈춰 세우고 자기들을 죽여 순교자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부탁을 들어주면 사례금을 주고 거절하면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곤 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해진 날에 절벽 위에서 몸을 던져 자살하고 했다(The Decline and Fall of Roman Empire 430). 로마의 지배자들은 기독교도들을 처형할 때는 몰래 해야했다. 공개처형은 더 많은 순교자를 불러일으켜 오히려 기독교를 열화같이 번창시킬 뿐이었다.

희랍신전의 성격: 전업 성직자의 부재
기독교를 이교신앙과 구분 지우는 가장 획기적 사실은 전문적 성직자의 존재였다. 다시 말해서 오직 성직에만 전념하는 전업클래스의 존재였다. 헬라스(희랍) 종교에는 이러한 전업 성직자계급이 존재하질 않았다. 희랍의 신전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신이 거(居)하는 전당이었으며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다. 희랍의 신전이란 인간들의 예배장소가 아닌 신의 거처였다. 신전은 반드시 폴리스와 일체를 이룬다. 신전은 대개 폴리스의 중심에 있는 아고라나 아크로폴리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것은 폴리스 시민의 공동소유였다. 그 신전에 거하는 신은 대개 그 폴리스의 수호신이었으며, 물론 폴리스마다 다른 다양한 신을 모시고 있었다. 예배란 개념은 따로 없고 희생의 제식(sacrificial rites)만 있었는데, 그 제식은 원칙적으로 시민이면 누구든지 거행할 수 있었다. 그 희생제식은 신전 주변의 돌무덤의 제단(bōmos) 위에서 행하였다. 가축을 사용하는데 머리에 리본을 달아 관을 씌우고 앞에 가게 하고 피리를 불면서 행렬이 이어졌다. 제단에 도착하면 주변에 물을 뿌리고 또 보리씨를 뿌린다. 그리고 난 후 가축의 목을 치켜올리고 마카이라(machaira)라는 칼로 목을 쭉 찢어 피를 내고 간을 꺼내어 신에게 보인다. 펄떡이는 간을 보고 신이 제물을 용납하셨다고 인정되면, 가축을 도살하여 긴 뼈는 발라서 제단에 바치는데 하이얀 지방질로 덮고 그 위에 향초나 후추 같은 것을 뿌린다. 그리고 태워서 그 향내나는 연기가 하늘로 오르게 하여 신이 흠향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살을 솥에 삶아 맛있게 요리하여 제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분량으로 나누어 먹는다. 남는 분량이 있으면 동네로 가져가서 이웃에게 나누어준다. 이때 혓바닥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먹고, 피혁은 제사를 주관한 사람이 갖는다. 이렇게 하여 신과 인간이 같이 즐기는 것이다.
희랍의 종교는 폴리스에 사는 사람들의 세간(世間) 즉 속(俗)에 속한 것이었다. 막스 베버의 말대로 그것은 출세간적 종교가 아니라 입세간적(intra-world religion)종교였다. 성(聖, the sacred)과 속(俗, secular)의 확연한 이원적 구분이 없었다. 따라서 신전의 제사장은 그 폴리스의 행정장관과 일치했다. 모든 고급관료는 어떤 의미에서 성스러운 제사를 지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전쟁을 하기 전이라 든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든가, 의회를 소집한다든가, 장관의 이취임식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이 제식으로 이루어졌다. 폴리스라는 사회를 화합적으로 작동시키는 모든 제스처가 이러한 종교적 제식이었다. 이러한 종교는 실상 정치적이었다. 그것은 ‘정치종교’(political religion)였다. 따라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사회의 결속력이 없어지면 신전은 폐허가 되고 만다.

전업 성직자계급의 발전: 기독교
그런데 비해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제사장전통과 그것을 민중화시킨 바리새인들의 시나고그 랍비전통을 계승하고 또 예수의 12사도의 상징적 권능에 따라 초기부터 감독(주교), 장로, 집사들이 있었고 곧 이들은 전문적 성직자계급으로 발전해갔다. 그리고 유대교나 희랍종교와 같은 번거로운 피의 희생제식이나 번제가 없이 간결하고 의미가 깊은 성찬식을 발전시켰으며, 세례나 캐더키즘(catechism, 교리문답)의 초기형태나 서약 같은 것이 발달했으며, 복음서와 같은 낭송문화가 가세하면서 교회조직은 독자적인 성스러운 세계로 발전해 나갔다.
그리고 성스럽게 규정된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기적 모임(congregation)의 형식은 기독교인의 사회경제적 기반에도 크게 도움을 주었다. 일주일에 한 번의 휴식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농경사회에서 일하는 인간과 가축에게 온전한 휴식을 제공했다.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공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성직자를 전업화시키고 그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부여함으로써 그들 중심으로 로마사회의 결속력과 정신적 일체감(spiritual unity)을 재건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기독교는 로마라는 정치권력의 파트너가 된 것이다. 이 파트너십(harmonia, symphōnia)이야말로 기독교제국의 기초였다. 이 하르모니아의 기초는 비잔틴제국(4~15세기)으로부터 시작하여, 8~9세기 카롤링왕조를 거쳐 신성로마제국으로 이어졌는데, 그것은 나폴레옹이 1806년에 해체시킬 때까지 존속하였던 것이다.

콘스탄티누스의 파격적 기독교우대
콘스탄티누스는 우선 밀라노칙령을 통하여 기독교를 공인하는 동시에 탄압시대에 몰수한 교회재산의 반환을 명령하고 거기에 필요한 보상은 국가가 하기로 명령했다. 그는 곧 정책 제2탄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참으로 파격적이면서도 로마의 법전통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처사였다. 그는 황제의 전재산을 교회에 기증하였던 것이다. 제정으로 이행한지 300년이 지난 당시의 황제 소유의 농경지는 어마어마했다. 로마황제는 로마제국의 최대의 지주였다. 다시 말해서 하루아침에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최대의 지주가 된 것이다.
다음 콘스탄티누스는 성직자의 모든 공무를 면제해주었다. 그는 이와 같이 말했다. “성직자는 번거롭게 다른 임무에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성스러운 임무에만 전념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에 헤아릴 수 없이 큰 이바지가 된다.” 이렇게 모든 국가의 부역으로부터 면제가 되면 로마사회의 중간층에 속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버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로마사회의 중산층계급은 점점 더 궤멸되어간다. 콘스탄티누스의 더 중요한 결정은 성직자에게 일체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무면제, 세금면제, 독신자에게 불리했던 원수정시대의 세금제도의 폐지로 진행된 역사의 방향은 지배의 도구(instrummentum regni)로서의 기독교의 진흥에 온 힘을 다하기로 결정한 콘스탄티누스에게는 하나의 당위였다(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14-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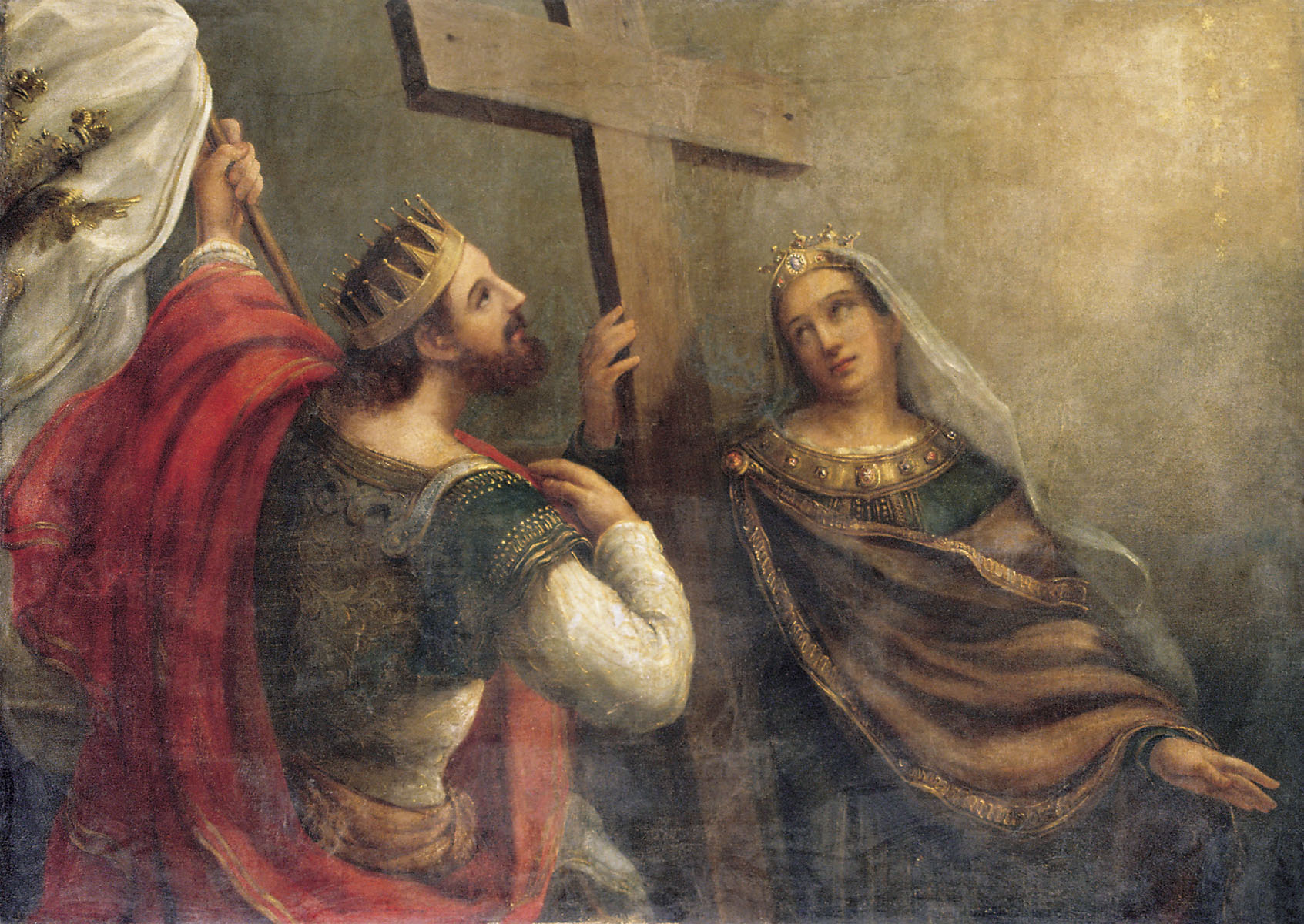
그리스ㆍ로마 신전폐쇄명령
이것만 해도 이미 너무도 과분하게 편파적인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콘스탄티우스는 면세의 범위를 더욱 넓힌다. 아버지 시대에는 면세대상자는 주교ㆍ사제ㆍ부제로 한정되어 교회성직자 내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콘스탄티우스는 교회의 고용인이나 교회 소유의 농지나 공장이나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납세자명단에서 제외시켰다.
교회는 더욱 우쭐하여져서 인두세는 물론 토지세도 면제해달라고 리미니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청원했다. 2년 후에 콘스탄티우스는 이 청원도 들어주었다. 그리고 더 더욱 한심한 것은 성직자의 사유재산에 관한 특례적 결정이었다. 성직자가 된 뒤에는 사유재산을 갖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성직에 취임하는 동시에 그때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교회에 기부하거나 육친에게 주어야 했다. 그런데 콘스탄티우스는 성직자가 된 뒤에도 사유재산을 계속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여 이제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외쳤던 예수의 복음은 이제 부유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외쳐대는 로마사회의 새로운 법질서로 변질되어간 것이다. ‘성스러운 임무’가 이제는 ‘성스럽지 않은 임무’보다 더 많은 수입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콘스탄티우스는 밤중에 산 제물을 바치는 것을 금지시켰고, 나아가 낮에 거행되는 로마의 전래신들에게 바치는 모든 희생제식도 금지시켰다. 3년 후에는 이 금지령을 위반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포고문을 발동시킨다. 그리고 우상숭배가 금지되었다. 최고신 제우스도, 바다의 신 포세이돈도, 지혜의 여신 아테네도, 신격화된 카이사르나 아우구스투스는 우상으로 단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성 베드로,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우상숭배금지령에 이어 신전폐쇄명령이 내려졌다. 앞서 말했지만 이 신전은 그리스ㆍ로마의 종교를 의미했다. 신전폐쇄는 신전파괴로 진행되었다.

삼위일체논쟁의 이권실속
항상 모든 조직은 외부로부터 탄압을 받을 때는 내부는 하나로 결속된다. 그러나 박해와 탄압이 사라지고 억압되었던 조직이 지배조직으로 둔갑하면 내부갈등이 격렬해지게 마련이다. 일제강점시대 때는 우리민족은 독립을 위해 하나로 싸웠다. 그런데 해방이 이루어진 공간에서는 공동의 목적을 향해 한마음으로 싸우던 한 민족이 좌ㆍ우로 갈라져 서로 물고뜯고 싸웠다. 그리고 그것은 6ㆍ25라는 참혹한 동족상잔의 전쟁으로까지 치달았다.
바로 아타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의 삼위일체논쟁이라는 것은 외면적 명목에 그치는 것이었고 그 실상은 새로 개편되어가는 교구를 놓고 주교들끼리 벌인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 동ㆍ서로마 황제들까지도 가담했어야 했다. 300여 년 동안 재야생활을 해온 기독교가 이제 집권여당이 되면서 세력 판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놓고 싸우는 내분의 한 표출이었던 것이다. 아리우스는 대체적으로 동방기독교의 포용적 자세를 대변했고 아타나시우스는 로마가톨릭교회의 정통적 입장을 대변하면서 알렉산드리아 교구를 동방교구의 지배권에서 분리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아타나시우스의 화려한 입성: 부활절 메시지(27서 정경안 발표)
율리아누스 황제가 시도한 것은 그리스ㆍ로마신전에 기독교에 대항할 수 있는 전문사제직을 형성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복안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근원적 전통과 관습이 다른 상황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어도 그러한 계급의 형성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율리아누스 황제가 죽고 난 후 그의 뒤를 이어 요비아누스(Flavius Claudius Jovianus)가 황제로 취임했다. 요비아누스는 기독교도였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c. 293~373)는 다시 득세했다. 그러나 요비아누스는 7개월 만에 죽는다.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여행하던 중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
그 뒤에 동방의 황제가 된 발렌스(Flavius Julius Valens)는 아리우스파를 지지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시 아타나시우스를 탄압했다. 5번째로 아타나시우스는 주교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이미 기나긴 망명생활을 통하여 이집트의 영웅이 된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근교에 머물렀다.
지방장관들은 새 황제에게 아타나시우스의 복직을 종용하였다. 아타나시우스는 366년 2월 1일 다시 화려한 입성을 하였다. 그리고 다음해 부활절 메시지에서 27 서정경안을 권위롭게 발표하였던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37년만에야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성서의 최초의 모습이 역사의 지평 위에 떠오른 것이다. 아타나시우스는 로마가톨릭의 입장을 동방세계에서 대변한 인물이었지만 아이러니칼하게도 그는 그러한 노력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기나긴 박해의 삶을 통해 국가의 정치권력에 대하여 교회의 교리적 자유와 신념을 고수한 영웅으로서 추앙받게 되었다. 아타나시우스의 역사적인 부활절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이 외경적(apocryphal)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책들을 가지고 근사하게 장난질을 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성서와 혼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서 간증되고 우리에게 전승되어온 정경(the Canon)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책들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구약의 목록을 전부 제시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또다시 여러분에게 신약(the New Testament)의 책들을 열거하여 말하는 것이 결코 지루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우선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사도행전이 있고, 또 가톨릭(보편교회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7개의 서한이 있다. 그 7개는 야고보의 편지 하나, 베드로의 편지 둘, 요한의 편지 셋, 그리고 유다의 편지 하나이다. 이에 덧붙여 바울의 14서한이 있다. 다음의 순서대로 쓰여진 것이다. 제일 먼저가 로마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다음으로 고린도사람들에게 보낸 두 편지가 있다. 이 두 편지 다음에 갈라디아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다음에 에베소사람들에게, 다음에 빌립보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골로새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이것들 다음에 데살로니카사람들에게 보낸 두 개의 편지가 있고 히브리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그것들 다음에 디모데에게 보낸 두 개의 편지, 디도에게 보낸 하나의 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이외로 요한계시록이 있다.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c. 293~373)의 부활절메시지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27서 신약성서의 명료한 목록을 발견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나의 ‘감개무량(感慨無量)’이라는 말에 대해서 당대에 얼마나 많은 성서문헌이 존재했는가를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것이다.

27서와 경ㆍ율ㆍ논 삼장
나는 평소 불교대장경을 읽으면서 왜 불교는 이토록 많은 경전을 다 성경으로 존중하고 불교신앙의 자료로 삼고 있는데 왜 기독교는 겨우 달랑 27서 쬐끄만 책 하나만 바이블로서 강요하는가 하고 의구심을 품어왔다. 복음서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는 불교 경장 중에서 아가마(āgama) 즉 사아함경(四阿含經)만 해도 4복음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분량이다. ‘아가마’란 ‘전승되어 내려온 불타의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그것의 한역말이 아함(阿含)이다. 이것은 역사적 불타 즉 싯달타(Siddhartha)의 직설(直說)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 아함경은 장아함(長阿含), 중아함(中阿含), 잡아함(雜阿含), 증일아함(增一阿含)의 4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한 종 속에 엄청나게 많은 경(經)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한역 아함경전의 원전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는(전승경로는 다르다) 팔리어삼장 중 핵심부분인 경장(經藏)은 다섯 부(部, nikāya)로 되어 있다. 장부(長部, Dighanikāya), 중부(中部, Majjhimanikāya), 상응부(相應部, Saṁyuttanikāya), 증지부(增支部, Aṅguttaranikāya), 소부(小部, Khuddakanikāya)의 다섯 니까야가 바로 한역대장경으로 보존되어 있는 사아함경과 대부분 상응되는 것이다.
아함뿐 아니라, 붓다가 승가를 유지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규칙이나 계율에 관하여 설파한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율장(律藏)인데, 이 율장 속에도 부처님의 생애와 초기승단의 모습에 관한 생생한 원시자료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붓다의 법(dharma)에 대한(abhi) 주석이나 설명ㆍ논설을 아비달마(阿毘達磨)라 하는데 이것은 좀 후대의 부파불교시대에 성립한 것이며, 이것을 논장(論藏)이라 한다. 그러니까 경장(經藏)ㆍ율장(律藏)ㆍ논장(論藏)을 합쳐서 삼장(三識)이라 하고 이 삼장(경전을 담은 세 바구니)을 트리-피타카(tri-pițaka) 즉 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한우충동하는 대장경을 보면 27서 기독교성서의 왜소함을 느끼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초기불교나 초기기독교나 경전의 양으로 말하자면 다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그 결집(結集)방식이 달랐을 뿐이었다는 매우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이다. 불교는 유일신에 대한 신앙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 속세의 영욕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느냐 하는 해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설 자체가 인간내면의 심리탐구에 집중해있어서 그다지 정통ㆍ이단의 문제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물론 싯달타(Siddhartha)와 동시대에 간지스강 유역의 마가다 지방을 중심으로 활약한 다양한 자유로운 사상가들이 있었고(영지주의자들처럼) 그들을 총칭하여 6사외도(六師外道)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6사외도의 사상도 상당부분 아함경내에 편집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을 외도로 규정하는 불교의 입장은 결코 정치권력과 결탁된 것은 아니었다. 불교가 경전을 편집한 태도는 어떻게 하면 다양한 생각의 갈래들을 한군데로 모아서 그것이 결국 하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方便, upāya)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붓다의 가르침에 관한 모든 전승(이 상황에도 구전이 주류였다)을 한 바구니에 담았던 것이다.

경전편집에 관한 불교ㆍ기독교의 입장 차이
만약 기독교가 이러한 경전편집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기독교의 경전 역시 대장경 이상의 분량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c. 293~373) 당대까지 300여 년에 이르는 동안 축적된 경서의 양은 불교의 아가마(āgama) 전승 못지않은 것이었다. 예를 들면, 유다서 같은 것은 편지 제일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동생인 나 유다가 이 편지를 씁니다’(유 1:1)라는 한마디 때문에 27서에 편입된 것이다. 유다는 물론 12사도 중의 한 사람도 아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누구인가? ‘야고보의 동생’으로서 유다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동생밖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예수의 동생’이 썼다는 이유 하나로, 즉 예수가족주의적 권위의식의 편견 때문에 27서 안에 포함되는 행운을 얻은 것이다.
이름을 걸려면 아예 이렇게 쎈 이름을 거는 것이 행운을 잡는 길일까? 생각해보자! 예수의 동생이라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토박이로 큰 사람이며(막 6:3) 오직 아람어만 했을 아주 촌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고 절제있고 구성진 희랍어문장의 편지를 쓸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편지내용 자체가 기성교회 체제를 어지럽히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카리스마틱한 교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사기성 그리고 반성령적인 분열주의를 폭로하는 강렬한 아폴로지의 작품이며, 집필연대도 영지주의나 기타 이교도적 교설이 팽배하기 시작한 2세기초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다.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교회의 정통주의를 고수하려는 어떤 유대인 기독교도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다. 논지가 매우 철저하게 유대인적인 발상의 틀을 가지고 있다.
27서의 장르는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가 있고, 바울의 편지가 있고, 바울 외의 사도의 편지가 있고, 또 사도외의 중요한 교회리더들의 편지가 있고, 또 묵시문학적 판타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27서적 장르에 끼어 들어올 수 있는 편지나 역사서나 판타지문학이나 복음서 전기문학은 300여 년 동안 축적된 분량으로 말하자면 불교의 초기경전보다 훨씬 많다. 불교의 초기경전은 오히려 신도들 자체끼리의 편지 같은 것은 아가마로 생각치 않았다.

카논의 의미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경화과정(canonization process)은 4세기에 걸쳐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것이며 그것은 오로지 이단을 배제하려는 배척의 과정이었으며, 결집(結集)이 아닌 전집(專集)의 과정이었다.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c. 293~373)의 367년 부활절 메시지에 최초로 명료하게 나타난 ‘정경적(canonical)인 것과 외경적(apocryphal)인 것’의 분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서 367년 이전의 초기기독교 문헌에 대해서는 우리는 ‘외경’(Apocrypha)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외경은 오직 정경이 있기 때문에만 생겨나는 규정이다. 정경이 확정되는 순간 이전에는 그것은 모두 동일한 경전이었다. 올림픽에서 메달이 확정되는 순간까지는 모든 선수가 동일한 메달리스트 후보인 것이다.
정경이라는 말의 카논(canon)은 무엇을 재는 ‘자 막대기’(rule)라는 뜻인데 그것은 성경(scripture)과 동의어로 쓰이는 말이다. 보통 우리가 외경의 뜻으로 쓰는 아포크립파(apocrypha)는 ‘숨겨진 것’ ‘비밀스러운 것’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 말은 정확하지 못하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외경이 숨겨져 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외경이라는 뜻의 실제적 의미는 ‘27서에 끼지 못한 동일한 자격을 지니는 문헌’이라는 뜻이다. 아포크립파보다는 슈데피그랍파(pseudepigrapha)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 하나, 여기에 또 다시 위(僞)의 개념이 개재되므로 역시 적합하지 못하다.
정경과 위경의 기준으로서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c. 293~373)는 ‘신적인 영감에 의한’(divinely inspired)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이전에 알렉산드리아의 주요사상가였던 오리겐(Origen, c.185~c.254)은 ‘전세계의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homologoumena, 혹은 anantirrhēta)이라는 기준을 세웠다. 일반적으로 정경화과정을 지배한 기준을 대별하면 1)사도저작성(apostolicity) 2)신앙의 잣대(regula fidei) 3)교회의 일치된 의견(the consensus of the churches)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의 논의를 한번 다시 회고하면서 요약해보자!
| AD 30년 | 예수의 십자가 처형 |
| AD 70년경 | 마가복음의 성립 |
| AD 100년경 | 요한복음의 성립 |
| AD 150년경 | 마르시온 정경(11서체제)의 성립 |
| AD 172년경 | 4복음서 디아테사론 성립 |
| AD 300년경 | 무라토리 정경(23서체제) 성립 |
| AD 367년경 | 아타나시우스 27서 정경 성립 |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현세적 권위는 로마제국의 권위였다. 결국 그 사건이 있은지 337년만에 27서정경이 성립하면서 로마제국은 이제 기독교가 마련한 십자가 위에 못박히고 만다. 로마제국에 대한 기독교의 완벽한 승리였다. 27서정경의 성립은 로마제국의 정신적 카논(기준)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27 서정경은 향후 인류사를 지배하는 가장 막강한 카논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초대교회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중요한 두 사실을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
1. 정경이 교회를 성립시킨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경을 성립시켰다. 다시 말해서 27서체제의 정경화작업에는 교회라는 조직의 이해가 얽혀있었다.
2. 27서정경이 성립하기 이전에는 정경과 외경의 분별이 성립할 수 없다.
엄밀하게 정통과 이단의 기준도 성립할 수 없다. 27서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질 당대에만 해도 27서에 편입되지 못한 수많은 정경후보의 책(비블로스)들이 있었다. 그 책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물론 그 방대한 인류의 유산인 그토록 화려한 예술품, 그리스ㆍ로마의 신전들이 하루아침에 우상파괴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무너져버리듯, 분서갱유(焚書坑儒)의 대상이 되어버릴 것은 명약관화한 이치이다. 이제 우리는 이 수많은 고귀한 비블로스들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인용
'고전 > 성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독교 성서의 이해 - 제15장 이집트인들의 종교관념 (0) | 2022.02.27 |
|---|---|
| 기독교 성서의 이해 - 제14장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0) | 2022.02.27 |
| 기독교 성서의 이해 - 제12장 디아테사론과 몬타니즘 (0) | 2022.02.27 |
| 기독교 성서의 이해 - 제11장 요한복음과 로고스기독론 (0) | 2022.02.27 |
| 기독교 성서의 이해 - 제10장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0) | 2022.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