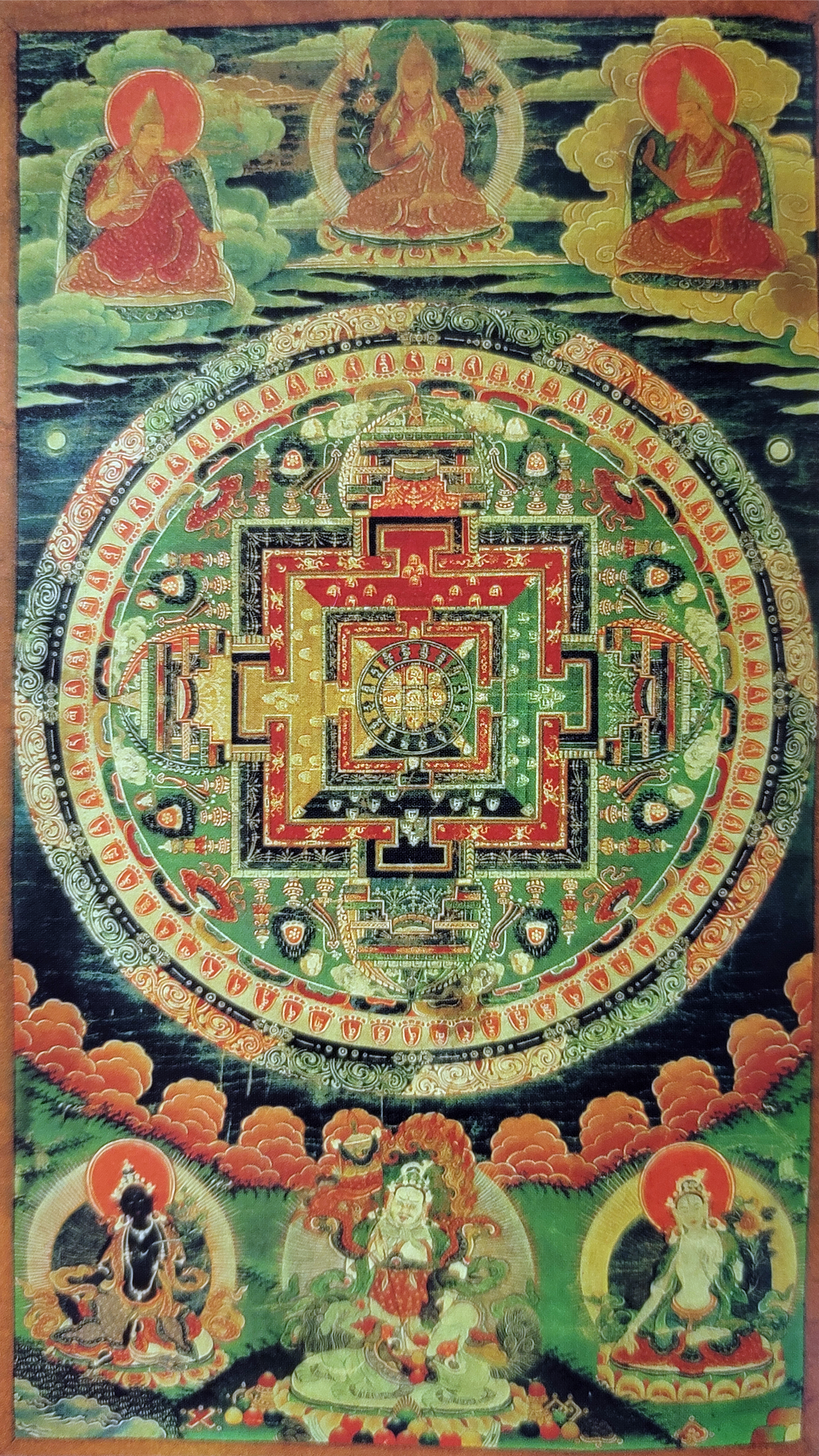비하르의 묵상
인간의 역사는 삶의 흐름이다.
우리 삶은 철학이나 과학이나 예술,
어느 한 가지 디시플린의 소산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과과학의 시각이
합쳐질 때만이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
불교는 희론(戱論)이 아니다. 그것은 이론의 유희가 아니다. 화살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그 화살을 어떻게 뽑냐는 것에 관한 이론을 나열하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 우선 화살을 뽑고 생명의 부식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왜 싯달타가 연기(緣起)를 말했고 무아(無我)를 말했어야 했는지 항상 그 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연기의 실상은 무아론으로 귀착된다. 무아론의 궁극적 존재이유는 바로 무아행(無我行)에 있는 것이다. 무아행이란 자비(慈悲)의 실천이다. 무아의 연기적 실상 그것이 바로 공(空)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공은 자비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 공과 자비를 통합하는 것이 바로 연기요, 무아였던 것이다. 무아의 연기적 실상이 곧 공(空, śūnya, suñña)이요, 무아의 무아행적 실천이 곧 자비인 것이다. 공과 자비,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지혜(智慧, prajñā)와 방편(方便, upāya)이라고 부른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묵상중이었다. 비하르의 터덜거리는 기나긴 여로에 지친 탓이기도 했지만, 니련선하를 처음 바라보는 순간, 그 너머 검푸르게 널려진 시타림과 전정각산이 순간적으로 나에게 던진 압도적 느낌, 그 느낌속에서 보드가야의 대탑에 이르는, 길지도 않은 시간속에서 나는 이와같이 기나긴 생각들의 묵상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우리말에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속언의 위대성을 내가 탄 토요타 쿠발리스의 앞좌석에서 벙거지모자를 푸욱 뒤집어 쓴 채 되씹고 있었다.
▲ 보드가야시내의 정경. 티벹승려의 복장에서 치마같은 아랫도리가 샴탑이고 그 위에 걸친 것이 샌이다. 문안 오른쪽으로 티벹 노점상들이 보인다.
예수와 싯달타의 모습
미켈란제로는 이태리의 어느 거지를 모델로 삼아 예수를 그렸다고 한다. 그가 프로렌스의 자기동네 거지를 모델로 삼아 예수의 모습을 그린 것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는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최초로 싯달타를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 쿠샨왕조(Kushān Dynasty) 간다라(Gandhāra)의 예술가들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이미 조각화되어버린 희랍의 신상을 불타의 모습에 덮어 씌웠다. 붓다의 최초의 모습은 아름답게 생긴 청년 아폴로신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것도 실상은 희랍의 직접적 영향이 아니다.
간다라에 전달된 당대의 미술양식은 전적으로 로마의 것이라 해야 옳다. 그것은 로마제국의 동단에서 발생한 로마미술의 지역적 표현의 하나였다【벤자민 로울랜드 지음, 이주형 옮김, 『인도미술사』(서울: 예경, 1999), p.118. 크레이븐의 하기서도 간다라불상에 관하여 개설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Roy C. Craven, Indian Art, A Concise History(London : Thames & Hudson, 1997), pp.81~102.】. 그런데 간다라의 불상만 하더라도 희랍인들이 그리려고 했던 인간적인 신들의 말랑말랑한 모습들이 그런대로 살아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접하는 불상의 대부분은 간다라의 것이 아닌 마투라(Mathurā)의 불상들을 모델로 한 것이다. 간다라의 불상에서 보여지던 현실적인 인간의 머리카락들이 마투라의 불상에 오면 모두 소라모양의 일정한 양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가부좌를 튼 명상의 자세들은 모두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닌 대각의 추상적 속성을 표현하기 위한 근엄한 자세들이다. 우리가 보는 불상 속에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 인간의 모습이 없는 것이다. 모두 철저히 양식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투라의 조각가들이 그레코-로망풍을 제거하고 자기자신들의 고유한 인도적 관념과 형식을 창안하려는 데서 생겨난 경향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경향은 지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예수의 모습과 싯달타의 모습의 이러한 차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관념의 차이를 나타내준다. 보다 신적인 예수는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반면, 보다 인간적인 싯달타는 우리에게 신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실 역사적으로 대승불교가 우리에게 끼친 해악 중의 하나다. 싯달타라는 인간이 증발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나이란쟈나 강을 보는 순간, 인간 싯달타가 들이마셨던 그 상큼하고 시원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다. 그리고 끊임없는 묵상 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이다. 내가 탄 차는 어느덧 번잡한 보드가야의 시내로 진입하고 있었다. 달라이라마가 주관하는 칼라차크라(Kālacakra, 時輪: 탄트라 이니시에이션) 제식의 대 행사를 앞두고 세계에서 몰려든 불교도들로 붐비고 있었다. 길거리를 메운 진주홍의 법복, 샴탑(gzham thab)과 샌(gzan)을 걸친 티벹승려들, 그리고 울긋불긋 화려한 색깔의 털옷을 팔고 있는 티벹 노점상인들, 오랫만에 다시 만난 정겨운 모습들이었다.
▲ 간다라 지역 하다(Hadda)에서 발견된 위의 이 조각은 희랍신상 같지만 간다라에서 불상을 제작한 장인들의 손에서 이루어진 작품이다. 파리 귀메박물관(Musée Guimet, Paris) 소장. 이러한 장인의 솜씨가 불상으로 전환된 것이다. 아래 베를린 인도박물관 소장(Museum für Indische Kunst, Berlin)의 탁트 이 바히(Takht-i-Bahi) 출토 불좌상의 머리는 소년 모양의 정형이 아닌 아폴로의 긴 머리카락을 묶었다. 얼굴도 정형화되지 않은 미남자의 얼굴이며 가부좌도 어색하고 표현이 어려워 로마인의 옷주름으로 덮어 버렸다. 이것은 단독 불좌상으로는 2세기초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층대의 작품이다. 환조가 아닌 고부조(高浮彫)의 상이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상술한다.
샤 자한과 뭄따즈
오랫만에 다시 정박한 곳은 수자타라는 이름의 호텔이었다. 보드가야에서는 가장 최신의 가장 좋은 호텔로 꼽히는 곳이었지만 나에겐 좀 낯선 곳이었다. 아니, 좀 지겨웁게 느껴지도록 끔찍한 곳이었다. 내가 들어간 곳은 219호실, 방금 칠한 페인트냄새가 풀풀 나는 아주 깨끗한 방이었지만 나를 끔찍하게 만드는 것은 돌의 한기였다. 인도사람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죽음의 공간이 구별이 없는 듯했다.
인도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히는 아그라(Agra)의 따즈 마할(Taj Mahal)도 단순한 한 여자의 무덤이다. 무굴제국의 다섯번째 왕인 샤 자한(Shah Jahan, 1592∼1666)이 자기를 위해 14번째 아기를 낳다가 객사한 부인, 뭄따즈 마할(Mumtaj Mahal)을 못 잊어하면서 지은 무덤이다. 아마도 그것은 한 여자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서는 가장 사치스러운 문명의 장난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뭄따즈가 사치스럽거나 요염한 여자는 아니었다. 그녀의 고모이자 선왕 자한기르(Jahangir)의 부인이었던 누르 자한(Nur Jahan)이 자기 남편을 손아귀에 넣고 권세를 누렸던 것과는 달리, 뭄따즈는 자기 남편에게 매우 순종적이며 지혜로운 충고자였으며, 조용히 수발을 드는 그런 여인이었다. 19년의 결혼생활(1612~1631)에 14명의 아이를 낳았으며 남편이 전장(戰場)을 전전해도 그의 곁을 떠나질 않았다.
샤 자한이 황제로서 등극한 것은 1628년 1월 28일이었으니까, 그들이 아그라에서 황제와 황후로서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은 불과 2년에 불과했다. 샤 자한은 1629년 12월에 데칸에 문제가 생겨 출정을 떠나야 했고, 뭄따즈는 그 출정길을 1년 반이나 수발들었다.
그리고 14번째 아이를 낳다가 객사했던 것이다(1631년 6월 7일 부르한뿌르(Burhanpur] 근교에서 죽음). 그녀는 죽으면서 그녀를 진정으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남편에게 다음의 두 가지 유언을 남겼다.
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날 위해 지어주요.
2. 재혼하지 말아주오.
▲ 따즈 마할로 들어가는 대문. 이 대문만 해도 그 자체로 매우 완성도가 높은 조형물이다. ‘천국이 여기 있으니 여기 영원히 편히 사시오’라는 『꾸란』 82장의 구절이 새겨져 있다. 이 문을 들어서면 십자형 수로의 가든이 있고 그 가든 저편에 웅장한 따즈 마할이 자리잡고 있다.
따즈 마할의 특징은 이전의 무굴제국 건축물의 소재가 붉은 사암인데 비하여 흰 대리석을 썼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태리 프로렌스에서 유행된 피에트라 듀라(pietra dura)라는 돌 상감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20여년 동안에(1631~1653?) 전 세계에서 불러온 2만여명의 석공이 땀을 흘렸다. 이 묘를 지은 석공들이 또 다시 아름다운 묘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손목을 다 잘라버렸다는 설화는 허풍쟁이들이 지어낸 거짓말인 듯하다. 왜냐하면 샤 자한(Shah Jahan, 1592∼1666)은 야무나 강 건너에 이와 동일한 모양의, 자기를 위한 검은 대리석의 묘를 지을려고 했었기 때문이다. 이 날 안개가 너무 심해 선명한 사진을 얻지 뜻했다.
돌방 속 돌침대
샤 자한(Shah Jahan, 1592∼1666)은 정확하게 이 유언을 지켰다. 샤 자한은 매우 섬세하고 화려한 예술적 감각의 소유자였으며 그 자신이 당대 최상의 건축가였다. 샤 자한은 2년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화려한 의상이나 음악, 모든 방종을 자제했다. 그리고 오직 죽은 자기부인만을 생각하면서 눈물로써 세월을 보내며 복상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생애를 따즈 마할의 건축에만 전념하였다. 그리고 말년에는 실정을 거듭하였고, 당현종처럼 그의 아들 아우랑제브에게 태상황으로 유폐되어 8년의 고적한 세월을 보내다 죽었다.
1666년 1월 22일 야무나강 건너 그가 지은 따즈 마할 무덤이 보이는 아그라성(Agra Fort)의 8각형 옥탑에서 그는 『꾸란의 구절을 들으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시신은 다음날 야무나강을 따라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부인의 무덤곁으로 옮겨졌다【Bamber Gascoigne, The Great Moghuls(New Dehli : Time Books International, 1987), p.222.】.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도의 건축물은 죽은 사람의 공간이나 산 사람의 공간이나 모두 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바닥도 벽도 창문도 천정도 모두 돌이다. 무굴제국의 번영의 기초를 닦았을 뿐만 아니라 인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꼽히는, 마하트마 간디조차 아낌없는 존경의 념을 표했던 아크바르(Akbar, 1542~1605)대제의 침실에도 가보았지만, 그것 역시 거대한 돌방에 사람의 키 이상으로 높여진 거대한 돌침대였다【‘완벽한 도시’라는 뜻의 파테푸르 시크리(Fatehpur Sikri)에 아크바르가 지은 궁전 속에 있다. 그의 침실은 크와브가(Khwabgah)라고 불리운다】. 인도의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아크바르, 이슬람ㆍ힌두ㆍ배화교ㆍ쟈이나교ㆍ유대교ㆍ카톨릭 등 모든 종교에 대해 차별없는 관용을 베풀고 편견없는 이해를 호소했던 아크바르도 평생을 돌방 속 돌침대 위에서 보냈던 것이다.
▲ 아그라성의 8각형 옥탑, 무삼만 부르즈(Musamman Burj). 매우 정교한 삐에트라 듀라 기법으로 장식되었다. 이 탑에서 내다 보이는 강이 야무나 강이다. 이 야무나 강의 안개속에 웅장한 따즈 마할이 보인다. 큰 딸 자하나라(Jahanara)가 그의 눈물겨운 8년의 세월을 지켰다.
돌과 인도문명
단순하고 건장한, 질박하고 강인한 느낌이 드는 그의 침실 속에서 나는 그의 문ㆍ무를 겸비한 질소한 인품을 흠끽했지만, 난 정말 돌구뎅이 속에서 자기는 싫었다. 그런데 인도인들은 이러한 환경에 완벽하게 무감각한 듯했다. 내가 인도에서 본 모든 것이 돌이었다. 인도의 문명이란 곧 돌의 가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내가 본 모든 건축물이 돌이었고, 모든 조각품ㆍ공예품이 돌이었고, 대부분의 생활도구가 돌이었다. 아잔타(Ajanta)에서 본 모든 비하라(vihara, 僧房), 그리고 차이띠야(caitya, 法堂)가 그냥 돌절벽을 쌩으로 파고 들어간 돌구멍들일 뿐이었다. 엘로라(Ellora)의 거대한 카일라사 사원(Kailasa Temple), 아테네의 파르테논신전 건물면적의 두배나 되고 높이도 그보다 반이나 더 높은, 복잡한 스트럭쳐와 정교한 조각의 이 거대 건물이 단 하나의 통돌을 파들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베드로사원 같은 것이, 단 하나의 통돌을 파들어간 단일조각품이라는 상상키 어려운 상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7천여명의 석공들이 150여년을 걸려 2만톤의 돌을 깎아낸, 세계 최대의 단일 통돌조각 건조물(the world's largest monolithic sculpture)인 것이다【이 거대사원의 완성자는 인도 중남부 데칸고원의 대부분을 지배한 라슈트라꾸따 왕조(the Rashtrakuta dynasty)의 크리슈나 1세(Krishna I, r. 757~83)였다. 그의 아버지 단띠두르가(Dantidurga)왕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크리슈나 1세 때 집중적으로 그 대부분의 모습이 완성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 거대암석조각은 시바신(Shiva)의 고향인 히말라야산맥의 카일라사 산(Mount Kailasa)을 자기의 왕국내에 옮겨놓음으로써 이 지상에서의 지배권을 확보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엘로라에서 멀지 않은 파이탄(Paithan)이 라슈트라꾸따왕조의 수도였다. 이 카일라사 사원의 존재로 인하여 라슈트라꾸따왕조야말로, 비록 남부데칸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구의 중심이 된다고 믿었으며, 그 왕조의 지배자는 챠크라바르틴(chakravartin, Universal Emperor, 전륜성왕)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 성전의 양외벽에는 힌두의 2대 서사시인 『라마야나』(the Ramavana)와 『마하바라타』(the Mahabharata)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정교한 조각으로 뒤덮여 있다. Vidya Dehejia, Indian Art (London : Phaidon, 1998), p.131. Henri Stierlin, Hindu India (Köln : Taschen, 1998), pp.50–56. M. N. Deshpande, ‘Kailāśa: A Study in its Symbolism in the Light of Contemporary Philosophical Concepts and Tradition,’ Ellora Caves, Ratan Parimoo etal. (New Delhi : Books & Books, 1998), pp. 230– 254.】. 돌, 돌, 돌, 돌, 이제는 정말 돌만 보면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우리나라처럼 건축자재로서는 최적인 양질의 화강암을 산출하는 나라도 많지 않지만 우리선조들은 삶의 공간에 돌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였다. 생명의 공간은 기가 소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내외의 기의 소통을 차단하는 석재를, 계단이나 주춧돌로는 즐겨 사용할지언정, 방바닥이나 벽면, 천정에는 사용하지를 않았던 것이다. 나무나 흙, 종이와 같은 가볍고 보온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건물이라는 것 자체에 영원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의 삶과도 같이 천지간에 잠깐 생겨났다가 스러지고 마는 손님과도 같은 객형(客形)일 뿐이었다.
나는 비록 관광수입꺼리는 후손에게 남겨놓지 않았을지언정, 소박한 집을 짓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그리웠다. 나무기둥 토벽에 따끈한 온돌바닥에서 하룻밤이라도 자봤으면 하는 그리움이 사무칠 무렵, 나는 수자타호텔의 석굴과도 같은 방에 또 다시 여장을 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를 동행한 남군과 이군은 먼저 달라이라마께서 머무시기로 되어있는 궁전에 가서 나의 소재지를 보고했다. 그리고 달라이라마께서 내일 오전 10시경에 보드가야에 도착하실 예정이라는 정보를 다시 확인했다.
▲ 엘로라(kailasanatha-ellora)의 비하라. 이 거대한 시바의 사원이 단 하나의 통돌 조각품이다. 한 구멍 한 구멍이 스님들이 수행하는 방이다. 한 구멍 한 구멍이 스님들이 수행하는 방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원룸 아파트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이 다층 건조물은 우리 아파트보다는 좀 살기 괴로운 곳이었을 것이다. 통풍이 전혀 안되는 돌구멍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박쥐들이 지키고 있다.
꿈만 같던 인도에 가다
나에게 있어서 인도는 하나의 판타지였다. 우리가 자라날 때만 해도 외국에 나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었다. 나는 어렸을 때 내손으로 자동차 한번 몰아보는 것이 꿈이었다. 그것은 마치 『이티』의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창공을 날으는 것과도 같은 그런 보름달의 판타지였다. 그랬던 내가 인도를 간다는 것은 기억도 없는 머나먼 옛날 혜초스님의 발자취를 더듬는 인디아나 죤스의 탐험과도 같은 이야기였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도 변했다. 변해도 변해도 너무도 변했다. 인도가 이제는 바로 지척지간에 있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인도였지만 나에겐 아직도 너무도 멀기만 한 인도였다. 인도하면 왠지 피리소리에 춤을 추는 코브라의 모습이나 공중에 붕 떠있는 요기들의 황홀경, 깡마른 나족의 성자 간디옹의 모습, 그리고 꿈브멜라(Kumbh Mela)의 울긋불긋 한 광란의 제상들만 머리를 감도는 것이다. 나는 고전학도로서 인도에 유학가는 것을 항상 꿈꾸어왔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꿈만 꾸다가 청운의 세월이 다 흘러가버리고 만 것이다.
▲ 아그라에서 카주라호로 가는 비행기가 또 취소되었다. 인도에서는 예고없이 임의대로 기차나 비행기의 일정이 취소되는 것은 다반사다. 책임지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수 없이 아그라의 한 호텔에서 카주라호까지 가는 자동차를 대절해야만 했다. 고달펐지만 덕분에 인도인의 삶과 밀착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아그라의 시내 어느 장마당에서 머리에 사발을 이고 외발자전거를 타면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소년의 가냘픈 모습을 여기 담았다.
▲ 인도의 토착종교인 나가 신앙의 주인공 코브라를 춤추게 만드는 뱀조련사, 인도인의 관념속에 코브라는 애ㆍ증의 콤플렉스로 남아있다.
▲ ’라마교’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다. ‘티벹불교’라 해야 옳다. 라마교라는 표현은 마치 한국불교를 ‘스님교’라고 부르는 것과도 같은 그릇된 표현이다. ‘라마’라는 말은 스승(구루)에 해당 되는 티벹어일 뿐이다. 청조는 티벹불교를 숭상하였다. 옹화궁(雍和宮)은 원래 옹정제의 동궁이었다. 건륭 9년(1744)에 이 궁을 티벹불교(라마교)의 사원으로 만들 었다. 그곳 법륜전(法輪殿)에 겔룩파의 시조 쫑카파(宗喀巴)의 거대한 상(6.1m)을 모셔 놓았다. 본 서를 편집하던 중 궁금하여 북경에 잠시 다녀왔다. 안정문(安定門) 부근에 자리잡고 있었다.
인도라는 판타지
아유타에서 온 허왕후
그렇지만 돌이켜 보면 인도는 결코 우리의 심층의식 속에 그리 멀리 있지 않았다. ‘보드가야’라는 지명은 붓다의 보리수나무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그 지역을 우리는 그냥 ‘가야’(Gaya)라고 부른다.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의미하는 보드(bodhi)를 떼어내면 가야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가야라는 지명이 우리나라의 ‘가야’(伽耶)국의 이름과 모종의 관련이 있다는 설도 단순한 발음의 일치를 넘어서는 어떤 역사적 교류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금관 가야국의 개조(開祖)인 김수로왕(金首露王)이 부인을 취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남쪽바다로부터 배타고 오는 아유타국(阿踰陁國)의 공주, 허황옥(許黃玉)을 왕후로 맞이했다는 전설은 단순한 전설이상의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을 전달해주고 있다고 보여진다【『三國遺事』 卷第二, 紀異第二, 「駕洛國記」.】. 지금도 웃따르 쁘라데쉬(Uttar Pradesh)주의 화이자바드(Faizabad)에서 동쪽으로 6km 떨어진 곳에 아요댜(Ayodhya)라는 성스러운 도시가 있다. 힌두이즘의 7성지중의 하나이며, 『라마야나』의 주인공, 라마(Rama)의 출생지로서, 그 서사시의 많은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고도인 것이다. 이 아요댜가 바로 김수로왕의 부인 허씨공주의 본국인 ‘아유타’(阿踰陁)인 것이다. ‘아유사’(阿踰搯), ‘아유차’(阿踰遮)라고도 표기된다. 현장(玄奘)은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권5에서 다음과 같이 개관하고 있다.
아유타국은 주위가 5천여리고, 나라의 대도성은 주위가 20여리가 된다. 농업이 번창하고 꽃이나 과일이 풍성하다. 기후가 온화하고 풍속이 선량하다. 복 비는 제사를 지내기 좋아하며 기술을 배우는 것에 힘쓴다. 불교가람이 백여개가 되며, 스님들은 3천여명이 주거하며, 대승과 소승을 겸하여 학습하고 있다. 힌두신들을 모시는 사원도 10여군데 있으나, 이교도들은 적은 편이다. 그리고 세친(世親, 바수반두)과 무착(無着, 아상가)과 같은 대사들이 묵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친 강당들이 있다.
阿踰陁國, 周五千餘里. 國大都城, 周二十餘里. 穀稼豊盛, 花果繁茂, 氣序和暢, 風俗善順. 好營福, 勤學藝. 伽藍百有餘所, 僧徒三千餘人, 大乘小乘, 兼攻習學. 天祠十所, 異道寡少. 大城中有故伽藍, 是伐蘇畔度菩薩數十年中, 於此製作大小乘諸異論. …… 『大唐西域記』 卷五.
전설로만 들렸던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는 보다 리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도의 벵갈만에서 배를 타고 가야의 남해안까지 직접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고대사회는 오히려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활발하게 교류된 문명의 터전들이었다. 조선반도의 고대문화가 천축국들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만은 없다.
KBS ‘도올의 논어이야기’ 강좌를 끝내고 나는 외유의 길에 나서야만 했다. 나는 세계문명의 정점에 서 있는 맨하탄의 한복판에서 특별한 콤미트먼트(Commitment)가 없이 3개월의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것은 학문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는 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었다. 젊은 시절때보다도 훨씬 더 집약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인류문명의 정화를 꽃피우고 있던 뉴욕의 싱싱한 젖줄을 실컷 빨아 들이킬 수 있었다. 그 시절은 뉴욕이라는 문명의 클라이막스였다. 나는 트윈 빌딩 바로 밑에서 살았다. 그리고 트윈 빌딩이 폭파되기 바로 며칠 전에 존 에프 케네디공항을 이륙하였던 것이다. 운명의 신은 결코 나의 몸둥이를 구성하고 있는 오온(五蘊)의 이산(離散)을 허락하는 것 같질 않았다.
▲ 우리나라 경주 황룡사 장육존상 기단의 돌 받침. 진흥왕 14년(553) 2월에 대궐을 용궁 남쪽에 지으려하는데 황룡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곳에 절을 지었는데, 그것이 황룡사다. 얼마 안 있어 남쪽에 큰 배 한 척이 떠와 하곡현 사포에 닿았다. 이 배속에 공문이 있었다. 인도 아쇼카왕이 황철 5만 7천근과 황금 3만푼을 모아 석가불상 셋을 주조하려다 이루지 못해 그것을 배에 실어 띄우면서 “인연있는 국토에 가서 장육존상을 이루어 달라[願到有緣國王, 成丈六尊容].”고 축원했다는 내용이었다. 한 부처와 두 보살의 모형도 함께 들어 있었다. 바로 이 장육존상이 우뚝 서 있던 자리가 지금도 황룡사 절터에 남아있다. 『삼국유사』 권 제3, 탑상제4, 황룡사장육(皇龍寺丈六)조.
쫑카파와 겔룩파
나는 뉴욕에서 3개월을 머무는 동안, 뉴욕의 지성가에 새롭게 번지고 있는 많은 새로운 사조의 물결에 접했다. 그 중에서 나의 주목을 끈 것 중의 하나가 티벹불교였다. 소승과 대승과 밀교의 모든 것이 구비된 듯이 보이는 티벹불교는 매우 정교한 이론을 구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단계적인 수행론을 나에게 제시했다. 그리고 나는 티벹장경과 팔리어장경에 새롭게 눈을 떴다. 서양사람들이 원시경전을 통해 이해하고 있는 불교의 모습과 내가 한역불전만에 의존하여 이해해온 불교의 모습에는 무엇인가 새롭게 조화되지 않으면 안 될 괴리감이 강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괴리감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러한 탐색과정에서 인도문명의 전체를 다시 한번 조망하는 위대한 기회를 가졌다. 나는 짧은 시간내에 약 200여권의 책을 독파했다.
나는 나의 후학들에게 참으로 어학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학인이라면 최소한 영어와 일어만은 완벽하게 습득할 필요가 있다. 영어와 일본어 속에 저장된 인류문명의 보고는 참으로 엄청난 것이다. 그런데 어학실력이란 토플성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영어를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영어를 빌어 등장하는 모든 위대한 정신들의 마음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인식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영어와 일어를 통하여 14세기 티벹의 위대한 사상가 쫑카파(Tsong-kha-pa, 1357~1419)를 만났다.
신비롭고도 혁신적인 대학승이었다. 그의 위대한 업적은 곧 티벹인의 내셔날 아이덴티티 즉 민족정신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의 정신적 투쟁 속에서 겔룩파가 태어났고 달라이라마(Dalai Lama)라는 제도가 태어난 것이다.
▲ 달라이라마가 있어야할 곳, 라사의 포탈라궁(The Potala Palace, Lhasa, Tibet), 라사는 9세기부터 티벹의 수도였다. 히말라야 산맥의 3,658m 고지에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 우리나라 화정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카파의 조사도(祖師圖) 탕카. 이 조사도가 쫑카파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그 옆에 있는 두 제자의 모습 때문이다. 쫑카파는 1409년 간덴 사원을 건립하고 초대 좌주(座主)가 되었는데, 그의 두 제자가 2대 3대 좌주를 계승하였다. 이 탕카의 좌측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제2대 좌주 갸르짭제ㆍ달마린첸(rGyal tshab rje Dar ma rin chen, 1364~1432)이고 우측이 제3대 케둡제ㆍ게렉페르삼뽀(mKhas grub rje dGe legs dpal bzaṅ po, 1385~1438)이다. 이 3인을 보통 존자 삼부자(rje yab sras gsum)라고 부른다. 조사도에서 카파는 항상 이들과 같이 있다. 상부에는 미륵정토가 그려져 있다.
▲ 『악취청정(惡趣淸淨) 탄트라』의 일체지비로자나(一切智毘盧遮那) 만다라. Sarvavid Mandala of the Sarvadurgatipariśodhana-tantra, 티벹수도승들은 이 만다라를 통해 상상의 나래를 편다. 이 만다라의 중심부에는 비로자나 부처가 모셔져 있는데 그것은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존격을 상징하는 한 글자의 종자(種字)로 묘사되어 있다. 『악취청정 탄트라』는 장례 등에 널리 사용되는 티벹의 밀교경전이다. 이 만다라가 겔룩파 계열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상단의 쫑카파 사제삼존상으로 알 수 있다. 하단 중앙에는 비사문천(毘沙門天)과 그 양 옆으로 녹색ㆍ백색 타라보살이 배치되어 있다.
▲ 동일한 주제의 『악취청정 탄트라』의 일체지비로자나 만다라인데 이것은 사캬파에서 성립한 것이다. 상단에 사캬파의 조사들이 들어서 있다. 화정박물관 소장
부록 7.1. 중관학을 토착화하여 탄생한 쫑카파
쫑카파(Tsong-kha-pa, 1357~1419)는 티벹 4대종파의 하나인 겔룩파의 개종자이다. 그가 개종한 겔룩파 계보에서 달라이라마제도가 확립되었다. 달라이라마가 티벹의 정치적ㆍ종교적 최고지도자로서의 위치가 확립됨에 따라 쫑카파는 티벹 최대의 사상가로서 추앙되었고 그 부동의 권위가 확보되었다.
그는 중국역사로 이야기하면 원나라가 쇠망하고 명나라가 새왕조의 터전을 닦아가고 있던 전환기의 시대에 활약한 인물이다. 우리나라의 포은 정몽주나 삼봉 정도전과 대략 동시대의 사람이다. 보조 지눌에 비하면 2세기 후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티벹불교의 역사는 연대적으로 같은 시기에 발전한 우리나라 조선조의 유교역사와 비교되면 그 문화사적 이해가 용이하다.
쫑카파 이후 달라이라마제도와 더불어 발전한 티벹불교 5백여 년의 역사는 용수(龍樹) 중심의 중관학(中觀學)의 역사라고 한다면, 조선왕조 5백 년의 신유학의 역사는 주자(朱子) 중심의 주자학(朱子學)의 역사라 할 수 있다. 티벹은 용수학(龍樹學)을 중심으로, 조선은 주자학(朱子學)을 중심으로 그 문명의 윤리적 핵을 형성시켰던 것이다. 용수와 쫑카파의 관계는, 주자(朱子)와 이퇴계(李退溪)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다. 퇴계가 그러하듯이 쫑카파도 결코 독창적인 사상가라 하기는 어렵다. 그는 중관학의 집대성자이며 그것을 티벹의 풍토에 알맞게 재해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학문의 깊이는 경이로운 수준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에 전달된 용수학은 용수의 『중론(中論)』과 『십이문론(十二門論)』, 데바(提婆, Āryadeva)의 『백론(百論)』(Śataśāstra)이라는 삼론(三論)의 극히 제한된 범위에 그친 것이며 그 내용도 기존의 입론(立論)을 파(破)하는 데 그치는 준대승적인 소극적 부정론(Negativism)이었지만, 티벹의 쫑카파에게 전달된 용수학은 대승불교와 밀교 전체를 포괄하고도 남을 매우 다양한 인도논사들의 논의가 모두 포섭된, 그리고 유식학의 문제의식을 극복한 중관학(中觀學)이었다. 쫑카파는 용수의 중관학을 중심으로, 소승의 율(律)과 대승의 이론, 그리고 밀교적 실천을 통합하고, 미륵의 미래불사상을 대중에 보급시켰다. 그리고 그러한 미래불적 사상을 페스티발화시켜 성ㆍ속의 융합을 꾀하고, 간덴(dGa-' ldan)사원, 데풍사원, 세라사원을 건립하였다.
부록 7.2. 쫑카파 연구에 참고한 문헌들
쫑카파에 관하여 손쉽게 그 개략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책으로 우선 하기서를 꼽을 수 있다.
御牧克己ㆍ森山淸徹ㆍ苦米地等流 共譯, 『大乘佛典 第十五卷, ツォンカパ」, 東京 :中央公論社, 1996. 쫑카파의 대표작은 그가 46세(1402) 때 집필했다는 『菩提道次第大論』(람림첸모, Lam rim chen mo; 『菩提道次第廣論』으로도 한역된다)이다.
이 작품은 크게 하사(下士)ㆍ중사(中士)ㆍ상사(上士)의 도차제(道次第)로 나뉘어 있는데, 상사(上士)의 도차제(道次第)가 보살(菩薩)=대승(大乘)의 도차제(道次第)이다. 이 대승(大乘)의 학습(學習)은 다시 총론(總論)과 각론(各論)으로 나뉘어 있다. 총론(總論)에는 육바라밀(六波羅蜜)과 사섭사(四攝事)가 다루어져 있고 각론(各論)에는 육바라밀(六波羅蜜)의 마지막 두 단계인 지(止, 禪定)와 관(觀, 智慧)의 문제가 상세히 다루어져 있다. 정(正)ㆍ관(觀) 이전의 보살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영역된 것이 하기서이다.
Alex Wayman tr. Ethics of Tibet : Bodhisattva Section of Tsong-Kha-Pa's Lam rim chen mo, Delhi : Sri Satguru Publications, 1991.
그리고 止ㆍ觀章에 해당되는 부분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Alex Wayman tr. Calming the Mind and Discerning the Real : Buddhist Meditation and the Middle View From the Lam rim chen mo of Tson-Kha-pa, Delhi : Motilal Banarsidass, 1979.
그런데 상기의 알렉스 웨이만의 번역은 미비한 곳이 많았다. 그래서 와싱톤과 뉴저지에 본부를 두고 있는 티벹불교학습센타(the Tibetan Buddhist Learning Center, TBLC)에서 주관하여 새로운 완역을 3권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그 제1권이 최근에 출간되었다.
Tsong-kha-pa, The Great Treatise on the Stages of the Path to Enlightenment, The Lamrim Chenmo Translation Committee tr., Ithaca : Snow Lion Publications, 2000.
일본에서는 쫑카파의 중관학(中觀學)에 관한 번역ㆍ연구서가 3권 시리이즈로 출간되었다.
1) ツルティムㆍケサン, 高田順仁 共譯, 『ツォンカパ中觀哲學の硏究 I』, 京都 : 文榮堂書店, 1996.
이 책은 『菩提道次第大論』(Lam rim chen imo)의 요약본인 『善提道次第論中篇』(Lamm vim 'Dring po)의 관(觀)에 관한 논술부분인, 『관략론(觀略論)』의 번역이다.
2) 片野道雄, ツルティムㆍケサン 共譯, 『ツォンカパ中觀哲學の硏究 Ⅱ」, 京都 : 文榮堂書店, 1998.
이 책은 쫑카파가 『람림첸모』를 집필하고 난 6년 뒤에 집필한(1408) 『未了義了義善說心髓』(레그 셰 닝뽀, Legs bśad sñiṅ po)의 후반부의 번역이다. 미요의(未了義)는 『해심밀경(解深密經)』에 기초한 유식사상을 말하는 것이며 주로 삼성설(三性說)을 중심으로 해설을 시도하고 있다. 요의(了義)는 중관사상을 말하는데 자립론증파(自立論證派, Svātantrika)와 귀류론증파(歸謬論證派, Prāsaṅgika)의 입론(立論)을 분석하고 있다. 이 후반부의 「중관장(中觀章)」을 번역한 것이다.
3) ツルティムㆍケサン, 藤仲孝司, 『ツォンカパ中觀哲學の硏究 Ⅲ」, 京都 : 文榮堂書店, 2001.
이 책은 쫑카파의 이대제자(二大弟子) 중의 한 사람인 케둡제(mKhas grub rje, 1385~1438)가 쫑카파의 『未了義了義善說心髓』를 주석한 작품, 『千藥大論』(톤톤첸모)의 번역이다. 『未了義了義善說心髓』의 중요한 주제들을, 반야(般若)ㆍ여래장(如來藏)ㆍ인명(因明)ㆍ밀교(密敎) 등의 분야와도 관련지어 가면서 논구한 탁월한 연구서이다.
그리고 『람림첸모』의 「지(止)의 장(章)」을 번역소개한 매우 훌륭한 단행본이 있다
ツォンカパ著, 『佛敎瑜伽行思想の硏究』, ツルティムㆍケサン, 小谷信千代 共譯, 京都 : 文榮堂, 1991.
티벹에서는 쫑카파의 유식학 방면의 연구를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체적으로 중관철학에 역점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쫑카파는 21세(1377) 때 유식에 관한 저작을 남겼다. 『마나식과 아라야식에 관한 난해한 곳의 주석, 善說의 大海』(뀐쉬 깐델, Kun gshiḥi dkaḥ ḥgrel)라는 작품이 그것이다. 이 작품은 『善說心髓』의 「唯識章」, 『람림첸모』의 「正의 章」과 더불어 티유식학 방면의 희소한 서물로서 가치가 높다. 『선설심수(善說心髓)』의 「유식장(唯識章)」은 삼성설(三性說)을 중심으로, 『람림첸모』의 「止의 章」은 유가행(瑜伽行)을 중심으로, 『뀐쉬 깐델』은 아라야식론을 중심으로 쫑카파가 전개한 유식방면의 3대저작이라 할 수 있다. 『뀐쉬 깐델』은 쫑카파가 무착(無着)의 『섭대승론(攝大乘論)』에 의거하여 아라야식과 마나식에 관한 문제점을 해설한 것이다. 이 작품의 일본번역과 주해가 최근 출판되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정평있는 겔룩파小史가 포함되어 있다.
ツォンカパ著, 『ア-ラヤ識とマナ識の研究 ― クンシ・カンテル ―』, ツルティムㆍケサン, 小谷信千代 共譯, 京都 : 文榮堂, 1994.
이상이 내가 쫑카파에 관하여 직접 구입하여 섭렵한 서물의 대체적 범위이다.
인도에 망명정부를 연 달라이라마
나는 귀국하는 대로 달라이라마를 만날 길을 모색했다. 한국에서는 최근 달라이라마 방한을 추진하는 운동이 있었으나 중국정부의 입김이 너무 거센 탓인지 우리 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방한의 기회를 허락치 않았다. 현재의 달라이라마, 텐진 갸초(Tenzin Gyatso, 1935~ )는 제14대 계승자이며【‘달라이’(Dalai)는 ‘큰바다’(Ocean)라는 뜻을 가진 몽고어이고, ‘라마’(Lama)는 스승이라는 뜻을 가진 인도어 ‘구루’(guru)에 해당되는 티벹어이다. 그래서 달라이와 라마를 합하여 ‘지혜의 바다’(Ocean of Wisdom)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달라이라마 자신의 설명에 의하면 이러한 이해방식은 역사적 정황을 정확히 모르는 데서 비롯된 오해일 뿐이라고 한다. ‘달라이’는 제3대 달라이라마의 이름인 소남 갸초(Sonam Gyatso)의 ‘갸초’를 몽고말로 번역한 데서 생겨난 이름일 뿐이라는 것이다. ‘갸초’는 티벹어로 ‘바다’라는 뜻을 갖는 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라마’를 중국사람들이 ‘活佛’(huo-fo)로 번역하는데 이것 또한 매우 잘못된 이해방식이라고 지적한다. 티벹불교는 근본적으로 활불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 달라이라마의 본명은 라모 톤둡(Lhamo Thondup)이며 그것은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여신’(Wish-Fullfilling Goddess)의 뜻이다. 그의 고향 이름은 탁처(Taktser)인데 티벹의 동북부 변방의 암도(Amdo)지역에 속해 있다. 그의 부모는 작은 땅을 임대하여 삶을 영위했던 자작농이었다. 그는 1935년 7월 6일에 태어났다. ‘텐진 갸초’라는 이름은 1940년 겨울 포탈라궁에서 티벹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공식취임한 후에 견습승려로서 득도할 때 받은 이름이다. 그때 타푸(taphue)라는 삭발의식을 거치게 되는데 당시의 섭정인 레팅 린포체(Reting Rinpoché)가 베풀었다. 그때 받은 풀네임이 ‘잠펠 가왕 롭상 예쉐 텐진 갸초’(Jamphel Ngawang Lobsang Yeshe Tenzin Gyatso)였다. Dalai Lama, Freedom in Exile (New York : Harper Collins, 1991), pp.1~18 passim.】, 그는 1959년 중국정부의 압제를 못 이겨 80여 명의 호위단과 함께 히말라야 산길의 사경을 헤치면서 인도로 망명하였고, 망명정부를 인도의 북부지역인 다람살라(Dharamsala)에 정착시켰다. 그 후 40여 년간의 그의 줄기찬 비폭력적 독립의 호소는 세계양심의 심금을 울렸고 1989년에는 노벨평화상(the Nobel Peace Prize)이 주어졌다. 노벨평화상이 그를 빛낸 것이라기 보다는, 그의 수상이 노벨평화상의 진정한 가치를 제고시켰다고 나는 믿는다.
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저는 우리 티벹이 진실과 용기, 그리고 결단력을 무기로, 반드시 해방을 이루고야 말 것이라는 신념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1989년,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문 중에서).
그는 티벹이라는 국가의 유일한 합법적 행정수반이며, 국민의 깊은 존경을 받는 정신적 지도자이다. 나 도올이 한 개인의 자격으로서 한 국가의 수반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더구나 의례적인 짧은 만남이면 모르겠지만, 나는 그와 사적으로 만나서 그의 내면의 정신세계를 파고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한국의 평범한 서생이다. 권위를 가진 일체의 직분이나 사회적 타이틀이 나에겐 한오라기도 없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달라이라마만큼의 어떤 지명도나 명성을 갖고 있지도 않다. 그에게 나의 가치를 인식시킬 기회가 없는 것이다. 그가 나를 만나야 할 필연성을 설득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그는 현실적으로 매우 바쁜 사람이었다. 설사 날 만나고 싶다고 한다해도 그의 스케쥴은 그의 개인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미 3년의 스케쥴이 다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난감했다.
▲ 내가 우리말로 번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의 티벹본. 종이 위에 금은가루로 쓴 것이다. 12.4×38.5cm, 화정박물관 소장.
티벹과 중국
나는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원회의 사람들을 접촉했다. 그리고 달라이라마의 동아시아 스케쥴을 담당하는 망명정부의 대사가 토오쿄오에 주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자툴 린포체(Zatul Rinpoche)라는 인물이었다. 린포체라는 명명은 티벹의 고승이나 고위관직자들의 이름에서 자주 발견이 되는데, 그것은 영적 스승에게 붙여지는 칭호이며, ‘고귀한 분’이라는 뜻이다【Dalai Lama, Freedom in Exile (New York : Harper Collins, 1991), pp.8 passim.】. 그리고 린포체가 가끔 순방길에 한국에도 들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서울의 어느 호텔 커피숍에서 그를 만나는 데 성공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가 나를 만나자마자 나를 알아볼 뿐 아니라 오래 사귄 친구처럼 대해주었다는 것이다. 영문을 알아본즉, 그는 나를 KBS의 테레비화면에서 본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잠깐 비춘 모습이었지만 말은 못 알아들었어도 내가 대단한 영적 힘을 소유한 한국의 정신적 지도자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린포체는 유려한 영어를 또박또박 확실한 발음으로 구사했다. 그의 모습은 완벽한 조선의 신사였다. 완벽한 몽골로이드 혈통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정말 크나큰 행운이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나를 구차스럽게 선전해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테레비의 위력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다. 나는 이 순간에도 나의 ‘논어이야기’프로그램을 제작한 KBS의 모든 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테레비라는 매체를 우리가 위대하게만 사용하기만 한다면 정말 위대한 가치가 브라운관으로부터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나는 자툴 린포체에게 이 조선땅이 동아시아문명에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역설했다. 그리고 티벹의 독립은 인류의 당위라고 잘라 말했다. 우리가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웠을 때도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를 도와주었다. 티벹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국은 이제 아편전쟁의 포화 앞에 무릎꿇고, 홍 시우취앤(洪秀全, 1813~64)의 태평천국에 시달리고, 일본군의 닛뽄도에 짤려 나가는 자국민 동포의 목줄기에서 솟구치는 핏발에 만터우(饅頭)를 찍어먹으려고 우르르 달려드는, 20세기 초의 문호 루 쉰(魯迅, 1881~1936)이 개탄했던 그런 모습의 중국이 아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열강의 전위를 달리는 자격있는 리더로서 실력과 도덕성을 구비해야할 그러한 세계사적 시점에 와있는 것이다. 티벹문제는 세계 리더로서의 중국이 자신의 도덕성의 확립을 위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상황인 것이다.
▲ 뭄바이에 있는 기차역, 빅토리아 터미누스(Victoria Terminus). 영국 식민통치자들이 지은 것이다. 프레데릭 스티븐스(Frederick Stevens)의 설계로 1887년에 완성, 거대하고 아름답게 장식된 고딕 성당이나 궁전처럼 보인다. 그 세부적 조각이 너무도 화려하다. 일본인들은 조선 총독부를 가장 화려하게 지었지만 영국인들은 일반 백성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공유하는 건물을 가장 화려하게 지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사랑받는 건물로 남아있다.
티벹의 비극
나는 평생을, 중국문명의 전도사라고 한다면 정말 자격있는 전도사로서 살아왔다. 나는 중국문명이 자체로 함장(함장)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의 보편성, 그리고 그 위대함에 대하여 항상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왔다. 중국문명의 정신적 가치는 참으로 인류에게 고귀한 삶의 지혜를 끊임없이 던져주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이상의 발현은 국가주의를 초월한 인간성의 발로라고 생각해왔다. 나는 『논어』를, 『노자』를, 그리고 수없는 중국의 고전을 오늘 우리 삶의 가치로서 해석하고 발양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적 가치의 진실된 모습과는 상반되게, 중국문명이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물론 명료하게 지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 지성인들의 광정(匡正)의 요구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세계 지성인들은 우리 한국정부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써 그 도덕성을 요구할 것이다. 나는 보편적 윤리를 공감하는 중국 지성인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싶은 것이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은 서구열강과 야마토의 제국주의의 마수에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중국이 팔로군의 장정을 거쳐 마오라는 위대한 지도자(the Great Helmsman)의 영도하에 주권을 회복했다는 세계사적 전환의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중국은 그러한 주체적 출발과 동시에 자기자신의 새로운 제국주의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했다. 근대적 국가의 기본요건인 제(祭)ㆍ정(政)의 정확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원의 정적 속에서 국제적 정세변화와 무관하게 살고 있었던 6백만의 티벹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시련이 닥치기 시작했다. 1951년 5월 23일 자주적 외교권과 군사권을 박탈하고 단지 종교적 자유, 달라이라마의 지위, 기존의 형식적 정치기구만 존속시키겠다는 터무니없는 17개 조항의 협정(the Seventeen-Point Agreement)이 강제로 조인되었고, 1951년 10월 26일에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라사(Lhasa)에 진주하였다. 1959년 3월 31일, 티벹 조국의 땅을 떠나 망명지 인도의 땅을 밟기까지 10년에 걸쳐 나이 어린 소년군주 달라이라마가 겪었던 고초는, 병자수호조약, 갑오경장, 동학전쟁, 을사보호조약, 한일합방에 이르는 풍전등화 같은 불안의 세월 속을 헤매어야 했던 고종황제의 비극을 연상시킨다. 고종은 합방의 비운 속에 묻혀 버렸고 드디어 일인 손에 독살되고 말았지만, 달라이라마는 인민 해방군의 강점의 포화 속을 탈출하여 인류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서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 것이다.
1949년 이래 약 50여년간 티벹인민들은 줄기찬 항쟁을 계속해왔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무자비한 탄압을 계속해왔다. 승려의 두 눈을 후벼 성벽에서 던져버리고, 거룩한 사원ㆍ성지들을 인간의 도륙장으로 만들고, 개미도 살생해본 적이 없는 승려들에게 도끼를 쥐게 하여 동포의 목을 자르게 하고, 마차에 사람을 묶어 사지를 찢어 죽이고, 말꽁무니에 사람을 매달아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하고, 로프에 매달은 사람들 눈에 고추가루를 퍼붓고, 비구니의 항문과 질 속에 전기봉을 넣어 고문하고, 양심 구속수들이 간수들의 무술연습상대가 되어 죽어가는가 하면…… 차마 인간의 탈을 쓰고는 저지를 수 없는 만행이 예사스럽게 자행되어 온 것이다. 비무장의 시위군중들에 무차별 기관총난사, 연행, 구타, 고문, 재판없는 처형, 투옥, 자살로 목숨을 잃은 티벹인민의 숫자는 무려 130만 명을 넘는다【이상의 참상에 관한 기록은 나의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증언에 의한 것이며, 대부분 달라이라마의 자서전, 『유배된 자유』에 의거한 것이다. Freedom in Exile, p.249.】.
인천과 같은 도시의 전체 인구가 모조리 학살된 것이다. 항우(項羽)는 투항한 진나라의 병사 20만 명을 신안(新安)에 생매장시켰다. 지혜로운 장수 범증(范增)은 항우의 미래는 이러한 만행으로 이미 결판났다고 통곡했다. 지금 남경(南京)에 가보면, 남경대도살기념관(南京大屠殺記念館)이라는 것이 있다. 일본군이 남경을 점령하면서 중국인민 30만 명을 학살한 그 참담한 흔적과 유해가 잘 보존되어 있다. 1937년 12월 13일부터 38년 1월에 이르기까지, 13군데에서 하루에 1만 명씩 모두 30만 명을 도륙한 것이다. 이 비극적 장면들은 우 쯔니우(吳子牛)의 영화 『남경』(南京)에도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가공스러운 만행에 지금도 중국인들은 몸서리를 친다. 창살(槍殺), 활매(活埋), 감살(砍殺), 자살(刺殺), 분소(焚燒), 수익(水溺)! 그런데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명상 속에 잠들고 있던 나라 티벹의 인민을 그보다 더 잔악하게 130만 명이나 도륙한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인류역사의 도덕성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 것인가?
▲ 길거리에서 땅콩을 팔고 있는 인도인, 인도의 음식은 화학조미료가 가미되어 있질 않아서 좋았다. 조미료를 안 넣으려는 의식이 있다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돈이 드는 그런 짓을 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뻔데기 장수들의 봉투와도 같은 것이 꽂혀있는 모습이 정겨웁다.
대담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내다
나는 인도를 떠나기 전날 뭄바이의 어둑어둑한 거리에서 다음과 같은 삐라를 보았다. 때마침 주 르옹지(朱鎔基) 총리가 인도를 방문하고 있었다.
문제는 독립이다!
백만여명이 학살되었다!
육천여개의 사원이 파괴되었다!
수천명이 감옥에!
수백명이 아직도 실종중!
The Issue is Independence!
More than a million killed!
More than 6,000 monasteries destroyed!
Thousands in Prison!
Hundreds still missing!
자툴 대사는 티벹민중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나의 양심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그리고 나에게 달라이라마에게 보내는 친서를 직접 써달라고 했다. 나는 그날 밤으로 장문의 편지를 썼다. 우선 나는 나의 기나긴 학문의 여정을 소개했다. 그리고 고전학자로서 품고 있는 세계관의 일단을 논하면서 내가 달라이라마를 만나야 하는 필연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한국불자들의 열정과 동아시아 정치역학구조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니는 미묘한 지렛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잠깐 동안의 의례적 만남이 아닌 진정한 토론의 장을 허락해줄 것을 간청했다. 나의 편지는 유려한 영어로 쓰여졌다고 자부하는데, 다음과 같은 말로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
That your Holiness be in good health, the Tibetan people free, and that the opportunity to spread your Holiness's compassionate teachings for a better future be granted,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Buddha's Compassion.
성하(聖下)의 건강을 비오며, 티벹인민의 자유를 갈망하오며,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향한 성하의 자애로운 가르침이 저를 통하여 인류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부처님의 자비속에서 간절히 비옵나이다.
▲ 티벹의 십일면천수관음보살상, 높이 27cm, 화정박물관 소장. 티벹에서는 좋은 나무를 구하기 어려워 나무로 만든 불상이 드물다. 이것은 진흙을 틀에 찍어 구워낸 것이다. 손이 천개라는 것은 그만큼 구원의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다. 최근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속의 화부 할아버지 모습도 이런 모티프를 쓴 것이다.
내가 처음 본 인도
아라비아 바다
그 후로 약 한달 동안 서울과 동경 사이에 전화가 오갔는데, 정말 성하의 시간을 뽑아내기가 어렵다는 전갈만 다람살라의 각료들에게서 오고있다는 것이었다. 자툴 린포체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는 내 편지를 가지고 직접 성하를 알현키 위하여 다람살라로 갔다. 그리고 내가 인도로 떠나기 직전에 인도로부터 실낱 같은 목소리를 전해주었다. 도저히 약속시간을 미리 정할 수는 없으나 성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내가 1월 8일까지 보드가야에 도착해있으면 9일부터 15일 사이 어느 시간에 적당한 알현의 기회를 나에게 통보하겠다는 것이었다.
▲ 내가 처음 본 아라비아해, 인도대륙의 서쪽, 아프리카대륙과 연하여 있다. 뭄바이(Mumbai)는 인도의 경제중심이며 영화산업의 심장부이다. 인도의 가장 선진문명이 집결되어 있다. 고대힌두왕조로부터 이슬람정복왕조, 포르투갈, 영국식민통치의 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17세기 후반 동인도회사(the East India Company)의 중심이 되면서 봄베이(Bombay)라는 이름을 얻었다. 1996년 1월부터 뭄바이(Mumbai)로 바뀌었는데 이 새 이름에는 식민지 환영을 벗어나려는 노력과 힌두원리주의자들의 국수주의 냄새가 같이 배어있다.
자툴대사의 감격스러운 목소리가 귓전에 쟁쟁하게 감도는, 2001년 12월 24일, 나는 뭄바이로 가는 대한항공기 KE655편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델리 대학에서 인도미술사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제자 이군의 영접을 받았다. 꿈에만 그리던 혜초의 오천축국의 땅을 밟은 것이다. 어릴 때 서울역에서 탔던 시발택시보다도 더 작고 더 볼품없는 택시에 몸을 싣고, 희미한 가로등, 뿌연 연기, 온갖 거리의 악취, 샤리의 알록달록 색깔이 어른거리는 거리 속을 쏜살같이 달려갔다.
‘여왕의 목걸이’(Queen's Necklace)라는 별명이 붙은 해변을 지나 호텔 하버뷰(Hotel Harbour View) 302호실에 여장을 풀었다. 정신 없이 곯아 떨어졌다. 아침 세차게 눈꺼풀을 때리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떴다. 커텐을 제꼈을 때 나는 항구에 정박한 배들 사이로 영롱하게 반사되는 아라비아해의 찬란한 모습을 처음 본 것이다. 저 멀리 킹 죠지5세와 퀸 매리(King George V and Queen Mary)의 도인(渡印)을 기념하여 세운 그 유명한 ‘인디아의 게이트웨이’(Gateway of India)가 우뚝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나의 인도 여행은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이다.
▲ 뭄바이항구에 서있는 인도의 문(Gateway of India)은 영국인들이 배를 타고 오면 제일 먼저 발을 내린 곳이다. 1911년 12월 2일 죠지5세와 퀸 메리의 방인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졌는데 1924년에 완성되었다. 구자라트 무슬림양식이 반영되어 있다. 24년 후에 간디의 독립운동으로 영국은 이 문을 통해 다시 인도를 떠나는 제식을 올려야만 했다.
달라이라마께서 내일(1월 9일) 오전 10시경에 보드가야에 도착하실 예정이라는 정보를 확인한 후, 우리 일행은 저녁을 수자타호텔에서 간단히 들고 어둑어둑한 밤공기를 헤치며 보드가야대탑 구경에 나섰다.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의 성지들을 순례해보면, 그 진실성에 깊은 의심이 간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곳이 바로 역사적 예수의 활동지라는 역사적 물증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추상화되어 있는 붓다의 경우는, 오히려 그 역사적 물증이 확실하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그 역사적 물증의 제공자가 바로 인도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되며, 원시불교자료에서는 전륜성왕(轉輪聖王, cakra-Vartin rājan)의 이상의 완벽한 구현자로서 기록되어 있는 아쇼카왕(Aśoka, 치세기간 c. 270~230 BC)이다.
▲ 인도의 문을 마주보고 있는 따즈 마할 호텔. 1903년 타타(JN Tata)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타타는 뭄바이의 어느 유럽호텔에서 인도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한 쓰라린 추억의 보상으로 이 아름다운 호텔을 지었다고 한다.
인용
'고전 > 불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 만나기까지, 3. 스투파와 탑 (0) | 2022.03.13 |
|---|---|
|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 만나기까지, 2. 격변의 시기 (0) | 2022.03.10 |
|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 서설, 4. 싯달타의 깨달음 (0) | 2022.03.10 |
|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 서설, 3. 붓다와 깨달음 (0) | 2022.03.10 |
|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 서설, 2. 신비주의와 고행 (0) | 2022.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