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장 1. 하늘과 땅, 얼굴과 오장육부
오늘은 중용(中庸)을 제 27장 한 장만 하고,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최영애 교수님의 『시경(詩經)』 강의를 하겠습니다. 중용(中庸)에서 시경(詩經)의 내용들이 계속 인용되는데, 그와 관련하여 『시경(詩經)』의 일단을 선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제 4림에서는 전적으로 『시경(詩經)』을 강의하기로 했고, 완독할 예정입니다. 제5림 때는 『순자(荀子)』를 강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7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용(中庸)』과 관련하여 내가 매일 느끼는, 사소한 것들이지만 여러분들께 꼭 얘기해 줄 게 참 많아요. 오늘 아침 면도를 하다가 느낀 건데, 남자들에게 있어서 평생 면도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여자들은 월경이라는 게 삶에서 주기적으로 닥치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남자들은 수염 깎는 게 대단한 문제란 말이죠. 하여튼 털이라는 것은 계속 나오는 거고, 사실 자연 상태에서는 그것을 안 깎는 게 정상이겠지만, 문명 생활에서는 깎게 되죠.
얼굴은 내장의 반영
최근에 어느 여학생이 나보고 피부가 참 곱다고 했는데, 난 피부가 곱지는 않아요. 젊게 보인다는 말인데, 물론 그것이 면도 탓은 아닙니다. 얼굴의 모습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내장의 반영입니다. 오장육부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지. 얼굴의 문제는 화장품을 바르는 걸로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내장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을 하늘과 땅의 묘합이라고 보는 천지적 세계관, 즉 하늘과 땅의 세계관에 있어서도 사실 땅 속이란 볼 수가 없어요. 지질학자들이야 지표에 나타난 것을 보고 속을 관찰하겠지만, 그런데 인간의 내장, 즉 오장육부라는 것도 옛날 사람들은 땅속처럼 생각했거든요. 헌데 이 땅을 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에 반해 옛날 사람들이 쉽게 관찰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늘이죠. 인류문명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학문이 천문학(astronomy)이예요. 수학보다 빨라요. 대개 마야문명등 고문명의 형태를 보면 천문학이 수학보다 빠르단 말이죠.

하늘을 보며 인간세상을 점치다
엊그저께 브로노프스키의 책을 읽다가 재미난 것을 발견했는데, 사실 극이라는 개념이 지구가 ‘자전한다’라는 데서 생기는 개념이잖습니까? 그런데 이 북반구에는 하늘을 보면 하필 이 극에 해당되는 상당히 가시적인 곳에 북극성이라는 별이 있단 말이죠.
북극성이란 게 별 게 아니고 이 극pole의 자전축에 해당되는 데에 마침 별이 하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북극성이라는 별을 가지고 관측을 하게 되니까, 이 북반구에서는 휠(wheel, 바퀴)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러니깐 예를 들어, 시간을 설명하는 데도 ‘휠 오브 타임(wheel of time)’, 즉 시간의 수레라든가 하는 표현이 생기죠. 그게 전부 북반구 쪽의 북극성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해서 기타의 별들이 돌아간다는 이 개념, ‘중성공지(衆星共之)’라는 『논어(論語)』의 말도 있듯이, 바로 이 개념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마야 잉카 문명이 나타나는 남반구에는 북극성에 해당되는 별이 없기 때문에 천문학이 그렇게 고도화되지 않습니다. 이쪽 북반구의 에집트라든가 희랍문명에서는 북극성이 있기 때문에 관측이라는 게 정밀해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고도의 수학까지 나오게 되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 항해술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북극성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북극성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각도를 봐가면서 하는 거죠. 옛날에 목포에서 탐라를 가는 데도 전부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박물관에 가보면 별자리에 대한 천체도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철새의 이동도 대개 북반구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철새 이동 같은 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지만 북극성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죠. 북반구에서는 북극성과 같은 어떤 기준점이 있으니까 새들에게도 아마 그런 천체 관측을 하는 게 아닌가. 인간만이 아니라 새들도 그런 관측을 할 수 있죠. 새들도 분명 자연세계와 교감하는 세계가 있을 테니까요.
옛날에는 점성술(astrology)이란 것이 발달했는데, 이 점성술이란 게 뭐냐면 하늘을 봐서 땅의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늘에는 북두칠성이라는 게 있는데, 세계적으로 다 디퍼(Dipper, 똥바가지)라고 부르는데, 그 북두칠성을 구성하는 별들의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떤 것은 흐리고, 어떤 것은 누리끼리 하고. 그래서 옛날 석역서 같은데 보면 북두칠성을 우물 안에다 가둬 놓고 그 색깔을 보면서 점을 치는 것이 나옵니다. 다 미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걸 봐 가지고 인간세계를, 땅의 세계를 안다는 거죠. 하늘을 봐서 땅의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하늘세계인 얼굴을 보면 땅의 세계인 오장육부가 보인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의학에 있어서 하늘은 뭐죠? 인체에서는 우리가 머리라고 부르는 부분이 바로 인체의 하늘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이 하늘을 봐서(얼굴을 봐서) 땅의 세계(오장육부의 상태)를 알아내는 진단방법을 가장 흔한 진단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정교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 주위의 색깔을 가지고 간의 상태를 안다든가, 하다못해 눈동자의 색깔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치 점성술 같지만 그러나 굉장한 지혜가 있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 얘기를 안 하드래도 얼굴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땅속 깊이 묻혀 있는 장부세계가 발현하는 것입니다.
연못에 가면 양쪽에서 낚시꾼들이 낚시를 드리우고 있는데, 그 속을 스쿠버 다이버가 다니면서 본다면, 전혀 고기가 없는데 낚시를 드리우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아마 내장을 환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다면 의사들이 헛 진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스쿠버 다이버처럼 인체 속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다면 참 재미있겠죠?
하여튼 얼굴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하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칠규(七竅)라는 일곱 구멍들(눈, 코, 입, 귀를 구성하는 구멍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바로 하늘의 별자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얼굴의 피부라든가 그 모습이 바로 하늘이고, 그것은 완벽하게 내장의 표현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지난날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제 잘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 밥을 잘 먹었구나, 못 먹었구나 하는 것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얼굴에 꼬무락지가 하나 나도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자기의 내장의 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27장 2. 면도의 요령
그런데 오늘 내가 얘기 할려는 건 그게 아니고 면도에 관한 거예요. 면도에는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면도칼이 있고 또 하나는 전기면도기가 있죠? 나는 평생 둘 다 사용하였는데, 전기면도기는 편하니까 쓰게 되고 또 언뜻 생각하기에 전기면도기가 면도칼보다 피부에 손상을 덜 준다고 생각해서 사용했는데, 최근 내가 여러 전문가들과 상의해보고 또 직접 조사해 본 결과 전기면도기가 휠씬 더 피부를 깎아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면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따꼼따꼼하고 건조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때 스킨 브레이서(skin bracer)니 하는 아프터 쉐이브 로션(After Save Lotion)을 바르죠? 그런 다음 크림 같은 것을 바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최근에 깨달은 건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워 두면 다 삶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난 삼사십년 정도 고생고생 하다가 겨우 깨달은 거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알게 되면 평생 도움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때의 비밀
피부를 보면, 피부라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피부를 조직학적으로 보면 피부를 구성하는 최외층을 에피더미스(epidermis)라고 하는데 이것의 미세구조를 보면 다섯 층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바깥 층부터 차례로 안쪽으로 열거하면, 스트라툼 코르니움(stratum corneum), 스트라툼 루시둠(stratum lucidum), 스트라툼 그라뉼로숨(stratum granulosum), 스트라툼 시피노숨(stratum spinosum), 스트라툼 저미나티붐(stratum germinativum)의 구조를 가집니다.
여기서 스트라툼 저미나티붐이란 말로부터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층으로부터 세포의 증식이 일어남을 알 수 있겠죠? 세포가 여기에서 증식되어 생성되면서 점점 바깥으로 각질화(keratinization)의 과정을 밟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외층의 스트라툼 코르니움이나 스트라툼 루시둠 같은 것은 그 구성 물질이 죽은 세포들 입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 같은 데에 딱딱해져 가지고 떨어지는 게 대개 스트라툼 코르니움이에요. 우리가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데, 사람들은 때라는 걸 자꾸만 더러운 것이 바깥으로부터 끼어서 생기는 걸로 알지만, 때를 민다는 것은 사실 스트라움 코르니움이나 스트라툼 루시둠과 같은 죽은 세포를 밀어내는 것이죠.

면도는 크림을 듬뿍 발라 코팅부터
그런데 대개 남자들이 면도를 할 때 피부에 아무런 윤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드드득하고 면도기를 대요. 그리고 까칠까칠해지면 아프터 쉐이브 로션을 바르고 그 다음에 크림이나 로션을 바르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면도를 할 때 피부의 표층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피부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걸 거꾸로 하란 말이예요. 다시 말해서 반드시 크림을 먼저 바르라는 겁니다. 면도를 하기 전에 크림을 발라가지고 피부에다가 한 꺼풀을 씌우라 이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크림을 두 번 발라야 하니까, 제일 좋은 건 여자들이 흔히 쓰는 싸구려 폰즈나 클린싱 크림 같은 것을 하나 갖다가 그걸 먼저 발라서 얼굴을 윤기 있게 기름코팅을 한 다음에 칼로 면도를 하건 전기면도기로 면도를 하건 하란 말입니다. 그래야 피부가 보호됩니다. 건조한 상태에서 면도를 하는 건 아주 최악의 행위라고! 조직학적으로 보면 에피더미스의 표층부위를 싹싹 깎아 내는 거예요. 전기면도기는 특히 피부에 날이 직접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대개 사람들이 꾹 눌러서 사용하는 꾹 누르는 것 때문에 피부가 싹싹 깎여지게 되고 그래서 따갑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면도를 할 때 반드시 크림을 먼저 바른 후에 면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물로 닦아내고, 그런 다음 아프터 쉐이브 로션을 바르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크림이나 로션 같은 것을 바르도록 하세요. 그것이 평생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니깐.
여러분들은 그런 상식을 깨달으시도록! 그런 것 하나라도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용지도(中庸之道)에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내장을 깨끗이 하고 정확한 생활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남자에게 있어서 사치라는 건 사실 쉐이브 로션의 향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터 쉐이브 로션만은 이 세계에서 최고급을 쓰시도록! 냄새 역겨운 그런 것 쓰지 말고 최고급을 사다 쓰세요. 최소한 일 년은 쓸 수 있으니깐. 최고급을 사서 일 년을 기분 좋게 바르는 게 건강에 휠씬 좋습니다. 우리 도올서원 학생들은 작은 사치는 좀 철저히 할 줄 알아야 되요. 큰 사치는 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부터 중용(中庸) 제 27장을 들어가겠습니다.

27장 3.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광활함
| 大哉! 聖人之道. 위대하도다. 성인의 도여! 包下文兩節而言. 아래의 두 문장을 포괄하여 말하였다. |
주자 주를 보면 26장은 천도(天道)라고 했고, 27장은 인도(人道)라고 했죠?
‘대재 성인지도(大哉 聖人之道)’
참 멋있죠? 여기서 주자는 “아래의 두 절을 포괄하여 말한 것이다[包下文兩節而言].”라고 주를 달았는데, ‘아래의 두절’이란 뭐죠? ‘양양호(洋洋乎)! 발육만물 준극우천(發育萬物 峻極于天)’ ‘우우대재 예의삼백 위의삼천(優優大哉 禮儀三百 威儀三千)’이 바로 그 두절입니다.
| 洋洋乎! 發育萬物, 峻極于天. (성인의 도는) 넓고 넓도다! 만물을 생(生)하고 기르며 우뚝 솟아 하늘에 다하였다. 峻, 高大也. 此言道之極於至大而無外也. 준(峻)은 높고 크다는 것이다. 여기선 도가 지극히 커서 밖이 없는 데로 극진함을 말하였다. |
이 절은 앞에서 주자가 말한 대로, ‘대재 성인지도(大哉 聖人之道)!’에서 말한 성인지도(聖人之道)의 거대함을 구체적으로 상술해 들어간 부분인데, 그 거대함의 느낌을 전체적으로 ‘양양호(洋洋乎)!’라고 했습니다. 양양호(洋洋乎)!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우리가 ‘의기양양하다’라고 할 때도 이 양양인데, 이 양(洋)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바다 ‘양’자죠?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대강 다음의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하늘, 눈에 아무 것도 걸리지 않는 완벽하게 트인 저 광막한 하늘을 볼 적에 느끼는 거대함이 있겠고, 반면에 이 땅이라는 것은 언덕이나 산과 같은 주위 지형에 종속되어 하늘에 비해 시선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이러한 땅의 세계에서 그러한 제한이 거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이 바로 바다예요. 옛날에는 관동별곡 같은 작품을 봐도 상상할 수 있지만, 이 내륙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바다를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내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지금처럼 여기저기 다닌다는 것은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였으니까요. 인간이 지금처럼 이렇게 쏴 다닌 역사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 경상도에 산 사람들 중에 문경새재를 넘어 본 사람이 아마 전체 인구의 0.00000.1%도 안 됐을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만 그 로칼리티를 지키면서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이 바다를 본다는 경험은 고대인들에게 엄청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서 보면, 거대한 평야를 볼 적에도 그렇겠지만, 바다처럼 완벽하게 시선이 탁 트인, 촤~악~터진 경험을 준 것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바다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바다에 가서 받은 느낌을 전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양양호(洋洋乎)’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번역이 안 되요. 바다의 그 광활함과 넘실넘실 탁! 트인 그 장엄한 모습을 양양호(洋洋乎)라고 표현한 겁니다. ‘의기가 양양하다’, 이런 표현도 나의 기(氣)가 바다처럼 탁 트인 모습을 묘사한, 같은 표현들입니다.
‘발육만물 준극우천(發育萬物 峻極于天)’에서 발육(發育)이란 생하고 기른다는 말이고 준(峻)이라는 말은 높다라는 뜻입니다. 준(峻) 자를 보면 ‘산(山)’이 들어가 있죠? 땅과 관련된 표현에서 가장 높은 것을 상징하는 것은 역시 산이거든요. 바다는 넓음으로서 호호탕탕(浩浩蕩蕩)하다든가 양양(洋洋)하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만물을 발육시키는 땅에서는, 그 만물을 길러주는 성인의 도(道)의 거대함을 그 땅의 가장 전형적인 상징인 산의 높음에 빗대어서 “우뚝 솟아 하늘에 다 하였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집니까? “연비려천 어약우연(鳶飛戾天 魚躍于淵)”라는 표현이 연상되죠? 그럴 때, “언기상하찰야(言其上下察也)”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양양(洋洋)하게 만물을 생하고 길러서 그것이 하늘에까지, 그 높음이 하늘에 다하였다”는 말입니다. 카~ 멋있지요?

27장 4. 핵심적인 예와 세부적인 예
| 優優大哉! 禮儀三百, 威儀三千. 많고도 많도다! 기준이 되는 의례가 삼백가지요, 세부적인 의례가 삼천가지도다! 優優, 充足有餘之意. 禮儀, 經禮也. 威儀, 曲禮也. 此言道之入於至小而無間也. 우우(優優)는 충족되면서도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예의(禮儀)는 큰 줄기가 되는 예법이다. 위의(威儀)는 세세한 일상의 예이다. 여기서는 도가 지극히 작아 사이가 없는 데로 들어감을 말하였다. |
주자 주에 “우우(優優)라는 말은 충분하여 넉넉하다는 뜻이다[優優 充足有餘之意].”라고 했죠? 우리가 우등생이라 할 적에도 이 優 자죠. 넉넉하고 크다는 뜻인데, 역시 이것도 앞의 ‘양양호(洋洋乎)’처럼 잘 번역이 되지 않는 감탄사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주자는 여기서 ‘양양호 발육만물 준극우천(洋洋乎 發育萬物 峻極于天)’이라는 절하고 ‘우우대재 예의삼백 위의삼천(優優大哉 禮儀三百 威儀三千)’이라는 절을 둘로 나눴죠. 그래가지고 혜시의 말을 빌어, 전자는 ‘지대이무외(至大而無外, 지극히 커서 바깥이 없는 세계)’, 후자는 ‘지소이무내(至小而無內, 지극히 작아서 안이 없는 세계)’로 대비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성인지도의 매크로한 세계, 천지가 하나로 통하는 거대한 세계, 인간의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봤고, 후자는 같은 큼이지만 성인지도의 마이크로한 세계, 일상생활의 개별적인 사소한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봤습니다.
예의(禮儀)와 위의(威儀)의 의(義)란 무엇이죠? 그것은 인간의 삶에서 지켜야 할 질서이며 의례, 즉 제식(ritual)이예요. 그런데 주자는 예의(禮義)를 ‘경례(經禮)’라고 했고 위의(威義)를 ‘곡례(曲禮)’라고 했습니다. 경(經)이란 기준이 되는 핵심적인 큰 것을 말하고, 곡(曲)이라는 것은 경(經)에 상대되는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말해요. 옷감을 짠다면은 기준이 되는 씨줄이 경(經)이고, 그것에 따라 세부적으로 짜들어 가는 것이 곡(曲)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올 서원에서 강의를 시작하고 끝낼 때 서로 맞절을 하는 것이 경례라면 그 때 죽비를 한번 치면 맞절을 하고, 또 한 번 치면 일어나고, 마지막 한 번 치면 반절을 하는 것은 곡례(曲禮)에 해당됩니다. 경례(經禮)가 있으면 곡례(曲禮)가 있고, 예의(禮義)가 있으면 위의(威義)가 있게 마련이죠. 여기서 위의(威義)라는 말의 위(威)자를 위엄을 갖는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본문의 예의삼백(禮儀三百)과 짝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바는 매사에 경례(經禮)와 곡례(曲禮)의 감각이 다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디테일(Detail)로 들어가면 한이 없어요. 삼천 가지가 아니라 삼만 가지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장의 구조를 보면 ‘양양호 발육만물 준극우천(洋洋乎 發育萬物 峻極于天)’이라고 말하고, 이에 짝하며 ‘우우대재! 예의삼백 위의삼천(優優大哉! 禮儀三百 威儀三千)’이라고 말하여, 매크로한 세계와 마이크로한 세계를 대비시키고 있으며, 이 후에도 쭉 계속하여 이 장의 주요 테마를 이루고 있습니다.

27장 5. 지덕(至德)과 지도(至道)의 관계
| 待其人而後行. 그 사람을 기다린 후에야 행하여지는 것이다. 總結上兩節. 윗 문장을 총결지었다. |
그래서 하는 말이 매크로한 세계와 마이크로한 세계, 거대한 천지의 세계와 인간세의 사소한 예의적인 세계의 양면이 하나로 관통해서 실현될려면 “그 사람을 기다린 후에나 행하여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20장에도 있었죠? “문(文)과 무(武)의 정치는 반포되어 방책(方策)에 다 있으나, 그 사람이 있으면 정치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정치가 멈춰버린다[文武之政 布在方策 其人存則其政擧 其人亡則其政息].”
결국 그 정치가 잘 되냐 안 되냐의 핵심은 그 사람이라고 했죠? 중용(中庸)에서 말하는 바는 항상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기인이후행(待其人而後行)’이라 할 때 핵심은 ‘그 사람[其人]’입니다. “그 사람을 기다린 후에야 행하여진다. 그 사람 여하에 따라서 그 매크로한 세계와 그 마이크로한 세계의 동시적 실천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주자는 주에서 “이것은 위의 두 절을 종합하여 맺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 故曰: “苟不至德, 至道不凝焉.” 그러므로 ‘지극한 덕이 아니면 지극한 도가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한 것이다. 至德, 謂其人. 至道, 指上兩節而言. 凝, 聚也, 成也. 지덕(至德)은 그 사람을 말한다. 지도(至道)는 윗 두 문장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응(凝)은 모인다는 것이니,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
‘고왈(故曰)’이라고 했으니까 ‘구부지덕 지도불응언(苟不至德 至道不凝焉)’이란 말은 중용(中庸)의 저자에게 있어서는 그 이전에 실제 존재했던 말이겠죠? 그런데 이 프라그먼트(Fragment)에 대한 인용의 출처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떠한 문학적 양식에 의하여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자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아마도 이 저자의 시기에 이미 존재하던 어떤 경구일 것입니다.
‘구부지덕 지도불응언(苟不至德 至道 不凝焉)’
주자 주에 보면, “지극한 덕(德)은 그 사람을 일컬은 것이고, 지극한 도(道)는 위의 두절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응(凝)은 모이는 것이요 이루는 것이다[至道 指上兩節而言 凝 聚也 成也].”라고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27장은 중용(中庸)에서도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지덕(至德)과 지도(至道)가 나왔죠? 이것을 거꾸로 하면 노자 『도덕경(道德經)』의 도덕(道德)이 되죠? 고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통하는 거예요. 사실 마왕퇴에서 나온 출토본에는 『도덕경(道德經)』이 아니라 「德道經」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왕퇴 본은 ‘상덕부덕(上德不德).’이라는 제 38장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냐하면, 마왕퇴에서 나온 것은 죽간(竹簡)이 아니라 백서(帛書)기 때문이죠. 비단 위에 연속적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순서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거기에는 덕경(德經)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도경(道經)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지금의 『도덕경(道德經)』 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텍스트의 순서에도 상당히 중요한 엄청난 문제가 내재해 있습니다. 그 단순한 변화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추측을 가능케 한단 말이죠. 그것에 관한 기발한 학설이 내게 많이 있는데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는 세계적인 학설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쓸 예정입니다. 왕필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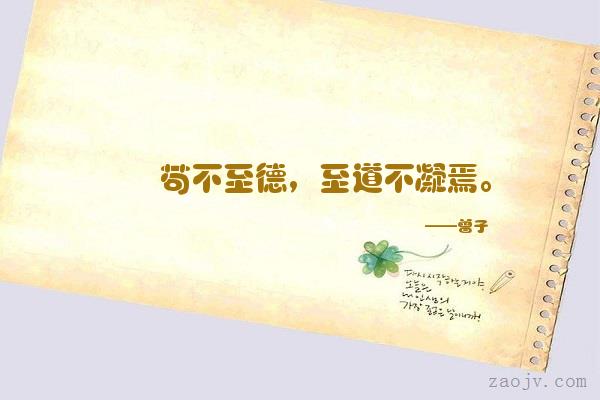
도와 덕을 응축해가다
본문의 응(凝)이라는 글자는 무형적인 그 무엇이 모여 형성된다는 것, 구체화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옛날 사람들은 물이라는 것을 무형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러한 무형의 물이 얼어서 형체를 띤 것, 즉 고체화되는 것을 응(凝)이라고 한 겁니다. 문자적으로 분석하면, 이 삼수변이 있는 걸로 봐서 물, 즉 삼수변에서 뭔가 빠진 것이 얼음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덕(德)이라든가 도(道)라는 것은 무형의 세계죠. 이러한 무형의 세계가, 마치 물이 응집되어 얼음이 되듯, 내 몸에 쌓여서 형성되는 것을 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덕은 쌓여서 형성되는 것이다[德蓄之].”라든지, “덕은 얻는 것이다[德得也].”라고 한 것이고, 내가 말하는 ‘공부론’도 몸의 단련, 즉 끊임없는 수신을 통해서 형성되는 축덕(蓄德)의 과정에 관한 논의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지도 불응언(至道 不凝焉)’은 “지극한 도(道)가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본문에서 말하는 덕(德)과 도(道)의 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죠.
본문의 맥락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도(道)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천지운행의 법칙이나 도덕적 원리로서의 ‘도(道)’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을 읽을 때 혼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도(道)는 말 그대로 구체적인 길(way)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세부적인 방법(method)이예요. 그에 반해서 덕(德)은 도(道)보다 상위개념으로서 형이상학적인, 본체적인, 원리적인 그 무엇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양양호 발육만물 준극우천(洋洋乎 發育萬物 峻極于天)’이 지덕(至德)과 지도(至道)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지덕(至德)과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우우대재 예의삼백 위의삼천(優優大哉 禮儀三百 威儀三千)’ 지도(至道)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일분수(理一分殊)
주자학에 자주 거론되는 말로서 ‘리일분수(理一分殊)’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해석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풀이도 사람에 따라 분분한데, “리(理)는 하나인데 그것이 나뉘어 차별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리(理)는 하나이고 분(分)은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세계는 외형적으로 볼 때 매우 잡다하고 부분적인 법칙에 의해 운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궁극에 가서는 하나의 단순한 법칙(a simple law)이 있다, 하나의 리(理)가 있다는 말이죠. 현대과학이 지향하는 거도 뭐죠? 지금 과학의 여러 분과에서 성립한 국부적인 법칙들(local law)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로 묶는 하나의 단순한 법칙이 있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처럼, 이 세계를 법칙화 해 나가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宋)·명(明) 유학에서 말하는 리일분수(理一分殊)라는 개념과 오늘날 사이언스가 지향하는 바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구조속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지덕(至德)의 세계가 어떤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쓰는 도덕(moral)의 의미가 아니라 리일분수(理一分殊)에서 말하는 리(理)의 세계에 해당되고, 지도(至道)의 세계가 거꾸로 분수(分殊)의 세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문장을 분석해 들어가야 그 다음 절이 이해가 되요.
| 지덕(至德) | 지도(至道) |
| 형이상학적인, 본체적인, 원리적인 그 무엇 | 구체적인 길이자 세부적인 방법 |
| 洋洋乎 發育萬物 峻極于天 | 優優大哉 禮儀三百 威儀三千 |
| 리(理) | 분수(分殊) |

27장 6.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問學)
| 故君子尊德性而道問學, 致廣大而盡精微, 極高明而道中庸, 溫故而知新, 敦厚以崇禮. 그러므로 군자는 하늘로부터 받은 덕성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묻고 배움에 말미암으며, 넓고 큰 데 이르면서도 동시에 정밀하고 미세한 것을 다하며, 높고 밝은 것을 지극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일상의 비근한 것에 말미암으며,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늘 음미하고 반추하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탐구하며, 그 덕성을 돈독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으로써 예(禮)를 높인다. |
여기에 주자의 그 유명한 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 주는 아마도 송명유학, 다시 말해 신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의의 대상중의 하나며,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다뤄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존덕성(尊德性, 자신에게 내재하는 덕성을 높임)과 ‘도문학(道問學, 묻고 배움에 말미암음)으로서 중국철학을 하는 사람이면 입에 닳도록 외우는 구문입니다.
주자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서 정이천을 빼 놓을 수 없는데, 주자의 사상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정이천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덕성의 함양은 모름지기 경으로써 하고, 배움에 나아감은 치지(致知)에 달려 있다[涵養須用敬 進學在致知].” 여기에 ‘함양(涵養)·진학(進學)’, ‘용경(用敬)·치지(致知)’의 짝이 나오죠? 아까 지덕(至德)과 지도(至道)의 세계로 말한다면, 함양(涵養)·용경(用敬)은 至德의 세계, 진학(進學)·치지(致知)는 지도(至道)의 세계를 말해요.
주자 주에 나온 개념을 빌린다면 용경(用敬)ㆍ함양(涵養)은 ‘존심(存心, 내재하는 덕성으로서의 그 마음을 보존함)’에 속하며, 진학(進學)ㆍ치지(致知)는 ‘치지(致知, 지극한 앎에 도달함)에 속합니다. 그러면 주자의 주를 먼저 읽고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지덕(至德) | 지도(至道) |
| 형이상학적인, 본체적인, 원리적인 그 무엇 | 구체적인 길이자 세부적인 방법 |
| 洋洋乎 發育萬物 峻極于天 | 優優大哉 禮儀三百 威儀三千 |
| 리(理) | 분수(分殊) |
| 涵養ㆍ用敬 | 進學ㆍ致知 |
| 存心 | 致知 |

27장 7. 존덕성과 도문학으로 분석한 중국철학
| 尊者, 恭敬奉持之意. 德性者, 吾所受於天之正理. 道, 由也. 溫, 猶燖溫之溫. 謂故學之矣, 復時習之也. 敦, 加厚也. 尊德性, 所以存心而極乎道體之大也. 道問學, 所以致知而盡乎道體之細也. 二者, 修德凝道之大端也. 不以一毫私意自蔽, 不以一毫私欲自累, 涵泳乎其所已知, 敦篤乎其所已能, 此皆存心之屬也. 존(尊)이라는 것은 공경하여 받든다는 뜻이요, 덕성(德性)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정리(正理)’다. ‘도(道, =導)’는 말미암는다[由]는 뜻이다. 온(溫)은 ‘심온(燖溫, 음식 같은 것이 식었을 때 다시 데우는 것)이라 할 때의 온(溫)이니, 그것은 옛 것을 다시 배운다는 말이요 그것을 때때로 다시 익힌다는 것을 말한다. 돈(敦)이라는 것은 더욱 도탑게 한다는 뜻이다. 존덕성(尊德性)은 내재하는 덕성으로서의 그 마음을 보존(存心)하여 도(道)의 거대한 세계[道體之大]에까지 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도문학(道問學)은 지극한 앎에 이르름으로써 도(道)의 극미한 세계[道體之細]를 다하는 것을 말한다【여기에서 도체지대(道體之大)와 도체지세(道體之細)로 나눈 것에 주목할 것. 도올 주】. 그러므로 이 둘은 덕을 쌓고 도를 닦아나가는 커다란 강령이다. 한 터럭의 사사로움으로써도 스스로 가리울 수 없는 것, 한 터럭의 사사로움으로써도 스스로 구차스럽게 할 수 없는 것, 이미 알고 있는 바를 계속 음미하고 보존해 나가는 것【함영호기소기지(涵泳乎其所己知) ‘함영(涵泳)’이란 바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고 할 때의 온고(溫故)를 말한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올바른 뜻은 뒤에 상술. 도올 주】 그리고 이미 능한 바를 돈독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모두 ‘존심(存心)’에 속하는 것들이다. 析理則不使有毫釐之差, 處事則不使有過不及之謬, 理義則日知其所未知, 節文則日謹其所未謹, 此皆致知之屬也. 蓋非存心無以致知, 而存心者 不可以不致知. 故此五句, 大小相資, 首尾相應, 聖賢所示入德之方, 莫詳於此. 學者宜盡心焉. 그 리(理)를 분석해 들어감에 있어서는 호리(毫釐, 털끝만큼)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것, 일에 처할 때는 과불급(過不及)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뜻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알지 못했던 바를 날로 새로 아는 것, 그리고 예를 절도 있게 하는 데[節文]에 있어서는 미처 삼가하지 못했던 바를 날로 삼가는 것, 이러한 것들은 모두 ‘치지(致知)’에 속하는 것들이다. 대저 존심(存心)하지 아니하면 치지(致知)할 수 없는 것이요, 참으로 존심(存心)한다는 것은 또한 치지(致知)로써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다섯 구는 매크로한 세계와 마이크로한 세계가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시작과 끝이 서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 것이니, 성현(聖賢)이 덕에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한 바가 이보다 상세함이 있겠는가? 무릇 배우는 사람은 여기에 그 마음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
여기서 여러분들이 본문의 구조를 알아야만 이 주자 주의 정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다섯 개의 구가 서로 상대되는 한 짝의 개념들을 가지고 병렬되어 있습니다. 송명유학에서 지극히 중요시되는 개념들이죠.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問學)’, ‘치광대(致廣大, 넓고 큰 데 이름)’와 ‘진정미(盡精微, 정밀하고 미세한 것을 다 함)’, ‘극고명(極高明, 지극히 높고 밝도록 함)’과 ‘도중용(道中庸, 일상의 비근한 것에 말미암음)’, ‘온고(溫故,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끊임없이 음미하고 반추함)’와 ‘지신(知新, 새로운 것을 탐구함)’, 그리고 ‘돈후(敦厚, 내재한 덕성을 돈독하게 함)’와 ‘숭례(崇禮, 예를 높임)’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풍우란과 신원도
우리는 여기에서 중국인들이 그들의 사상사를 보는 눈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풍우란이란 사람이 쓴 『정원육서(貞元六書)』라는 책을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풍우란은 중국철학을 근대적 학문으로 정립시킨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중공 치하에서 최초로 출국을 했을 때 하와이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소위 모택동의 1949년 대륙 석권 이후에 중국의 사상가들은 완전히 맑시즘으로 자기들의 사상을 개조해야만 했었지만, 사실은 중국 근대문명이라는 것은 1930년대 항일투쟁 과정에서 이뤄진 기라성 같은 저술들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6.25 부산 피난 시절에 그 피난 보따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학문적 성과가 나왔다는 말이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을 같은 수준에서 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항일 투쟁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성인들은 그들의 구국에 대한 열망을 학문으로 쏟았던 거죠. 풍우란의 걸작도 이 시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 책 중에 『신원도(新原道)』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원도(新原道)라는 말은 딴 뜻이 아니라, 도를 새롭게[新] 캐 들어간다[原, inquire]라는 뜻이죠【한유가 쓴 「원도(原道)」를 본떠서 중국철학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이 책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공맹(孔孟), 제2장은 양묵(揚墨), 제3장은 명가(名家), 제4장은 노장(老莊), 제5장은 학용(學庸), 제6장은 한유(漢儒), 제7장은 현학(玄學), 제8장은 선종(禪宗), 제9장은 도학(道學), 그리고 제10장이 통신(統新)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신(統新)’이란 말은 풍우란 자신이 20세기 중국 철학을 새롭게 통합하여 조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중국사상사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 사상사는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問學)의 역사다’ 철학적으로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존덕성(尊德性)은 형이상학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고, 도문학(道問學)은 형이하학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尊德性이 인간의 내면세계에 관한 추구라면, 道問學은 외면적 객관세계에 대한 인간의 앎의 추구입니다.
이러한 존덕성(尊德性)·도문학(道問學)의 개념적 틀 내에서 중국 사상사는 어떤 때는 극고명(極高明)으로 치달았다가 어떤 때는 도중용(道中庸)으로 치달았다 하면서 발란스를 유지하려는 과정을 지속해 왔다는 것이 이 『신원도(新原道)』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주자가 노불(老佛)을 치고 나올 때, 그의 핵심적 주장은 “노불(老佛)사상은 극고명(極高明)한 것만 있지 도중용(道中庸)이 없다. 존덕성(尊德性)만 있지 도문학(道問學)이 없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관념론의 질곡만 있지 진정한 의미의 격물(格物, 사물을 이치를 가지고 궁구함)이 없다. 그러므로 존덕성(尊德性)에 대하여 도문학(道問學)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원도의 결론
신원도의 결론인 통신(統新)에서 풍우란은 존덕성을 ‘내성(內聖)’의 세계로, 도문학을 ‘외왕(外王)’의 세계로 보고, 이 ‘내성(內聖)’과 ‘외왕(外王)’을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학문의 세계를 ‘신원도(新原道)’라고 부른 것이죠. 그는 당시에 여기에 결정적인 모티브를 준 것이 서양학문이라고 보고, 과거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쳐 형학이 들어와서 신유학으로 새로운 통합이 이뤄졌듯이, 지금 서구라파의 학문이 들어와서 ‘통신(統新)’, 새로운 통합이 이뤄질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원도(新原道)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중국철학은 이 양면, 내성(內聖)과 외왕(外王)을 통합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 尊德性 | 道問學 |
| 致廣大 | 盡精微 |
| 極高明 | 道中庸 |
| 溫故 | 知新 |
| 敦厚 | 崇禮 |
| 至德 | 至道 |
| 存心 | 致知 |
| 內聖 | 外王 |
| 형이상학의 세계 | 형이하학의 세계 |
| 내면세계에 관한 추구 | 인간의 앎의 추구 |
풍우란의 중국사상사를 보는 눈 : 『新原道』

▲ 풍우란馮友蘭(1894~1990)
27장 8. 중국철학의 문제점
도문학(道問學)의 개념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내가 최근에 쓴, 『젊은 유학자의 초상』의 서문 「양명근본의(陽明根本義)」를 보면, 풍우란의 세계와 나의 세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서문에서 나는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問學)의 양단(兩端)이 중용(中庸)적으로 포섭되는 새로운 학문이 출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도문학(道問學)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근원적인 이해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야말로 근대 이후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 온 장본인이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에서 줄곧 논의되고 있는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問學)에서 도문학(道問學)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문학(問學)이라는 것은 묻고 배운다는 거죠? 여기에서 문학(學問)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묻는다는 것은 ‘지신(知新)’, 즉 우리가 모르는 세계를 알기 위해서 묻는 거죠? 묻는다는 것이 곧 학문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내면에 있는 덕성이라는 것을 주자가 주(註)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정리(正理)라고 했죠? 이 정리(正理)를 따르는 것이 존덕성(尊德性)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란 교육을 받을 때, 격물치지(格物致知)를, 도문학(道問學)을 하지 않아도, 존덕성(尊德性)만 해도 내 존재 속에 이미 구비된 리(理)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삶 그 자체는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몸의 자연, 스스로 그러한 세계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들을 보면 전혀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그들의 몸으로부터 획득하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인간은 도문학(道問學), 궁금해서 세계를 자꾸만 알려고 해요. 저 별들이 뭐냐? 도대체 생명의 기원이 무엇이냐? 이 우주는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자꾸만 묻는단 말이죠. 이 묻는다는 것에서 결국 인간의 문명이 나왔고, 이 문명이 바로 ‘외왕(外王)’의 세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도중용(道中庸)이라는 말은 결국 도문학(道問學)의 다른 표현이지만, 중용(中庸)의 포괄적 의미와 『젊은 유학자의 초상』의 서문과 관련하여 중용(中庸)의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보겠습니다. 도중용(道中庸)에서의 중용(中庸)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넓은 의미보다는 극고명(極高明)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쓰인 것이므로 문자 그대로 비근하고 범용한 세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도문학(道問學)과 관련하여 그 참뜻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껏 중국 사상사가 간과해 온 대단히 중요한 문제의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지(致知)를 등한시하다
나는 중용(中庸)을 궁극적으로 역동적 평형(Dynamic Equilibrium) 또는 호미오스타시스(Homeostasis)로 푼다고 했습니다. 사실 중용(中庸)이란 말에 대하여 중국사상사가 저질러 왔던 최대의 오류요 한계는 중용(中庸)이라는 말을 인간세의 덕성 또는 삶의 지혜로만 생각했지 사물에 내재한 객관적 법칙으로서의 중용(中庸)을 생각지 못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생물학의 모든 법칙들이, 물리학의 모든 이론들이 다 중용(中庸)입니다. 생물학에서 말하는 모든 대사과정(metabolism)이나, 물리학에서 말하는 모든 역학이론들이 다 중용(中庸)의 다른 표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용(中庸)적 세계의 객관적 법칙에 대한 격물치지의 과정이, 예를 들면 서양 사람들이 호미오스타시스 하나를 알기 위해 흘려야 했던 땀과 치밀한 물음의 과정이 중국 사상사에는 결여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서구라파 문명에 크게 당한 겁니다.
여기 오른쪽을 보면 지신(知新)이라든가 도중용(道中庸), 진정미(盡精微) 같은 것이 서구 근대과학정신에 매우 잘 부합되잖아~ 근대과학정신이란 여기에서 말하는 진정미(盡精微), 다시 말해 정미(精微)로움을 다하는 세계라고. 그래 이런 말을 하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숭례(崇禮)니 이따위 말로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 철학에서 보면 치지(致知)의 세계보다 용경(用敬)의 세계가 항상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거지! 우리 동양 문명은 이 왼쪽 용경(用敬)에 해당되는 것들은 탓할 게 없는데, 문제는 이 오른쪽 치지(致知)의 세계에 있어서 진정한 정미(精微)로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이 서양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예요. 치지(致知)를 용경(用敬)으로 환원시킨 데에 근세 유학의 최대의 오류가 있다 이겁니다. 치지(致知)는 치지(致知)로서 정미(精微)롭고 지신(知新)하는 그 세계로 나가라!! 온고(溫故)에 빠지지 말고! 이것이 바로 지금 도문학(道問學)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세기에서 참다운 치지(致知)는 서양이 제공했습니다. 치지(致知)의 실내용에 있어서 동양은 서양에 게임도 안 되요. 왕양명이 같이 바보처럼 대나무를 격물(格物)한다면서 대나무 앞에 앉아서, 칠일 밤낮이나, 그것도 아무것도 안 먹고 들여다보기만 했으니 병이 안 날 수 있어? 나는 어릴 적에 집에 현미경이 있어서 양파 껍질을 놓고, “야~, 이렇게 정미로운 세계가 있구나!”하고 세포를 관찰했었는데, 적어도 이렇게 해야지, 사색만 해가지고 되겠냐구? 동양 문명에는 격물치지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결여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 지덕(至德) | 지도(至道) |
| 형이상학적인, 본체적인, 원리적인 그 무엇 | 구체적인 길이자 세부적인 방법 |
| 洋洋乎 發育萬物 峻極于天 | 優優大哉 禮儀三百 威儀三千 |
| 리(理) | 분수(分殊) |
| 涵養ㆍ用敬 | 進學ㆍ致知 |
| 存心 | 致知 |

27장 9.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問學)의 조화로운 학문풍토를 위해
치지(致知)가 모든 학문에 위세(威勢) 떠는 세상의 문제점
그런데 또 지금 현대문명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치지(致知)라는 게, 그 자체가 물리학이 되었건 뭐가 됐건, 그 과학적 지식이란 것이 결국은 내성(內聖)·외왕지학(外王之學)에서 보면 일면에 불과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진리를 다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 군림하고 있으니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냔 말이야. 서양의 과학, 그것은 동양에서 말하는 치지(致知)의 일부분일 뿐인데, 그걸 좀 배웠다고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뭐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람들을 겁주고 있으니.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니 하는 모던 사이언스라고 해봐야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하나의 이해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에 대한 하나의 물음일 뿐이라고. 그것은 주자가 말한 격물치지와 완벽하게 동일한 외연과 내포를 갖는 세계일뿐이야! 그 격물의 참뜻을 회복해야만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問學)이 함께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줄곧 한 것은 바로 도문학(道問學)일 뿐입니다. 그것도 서양에서 발달한 얄팍한 것만 배운 거야. 존덕성(尊德性)이 빠졌고 여기 왼쪽 세트가 다 빠져 버렸어요. 교육이란 게 뭐예요? 도문학(道問學)을 하는 이유가 뭐냐구?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問學)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 중용(中庸)적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점 아냐? 그런데 지금 이 도문학(道問學)만, 이 오른쪽 꺼만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쪼금은 정미(精微)로워졌지? 쪼금 새로워지는 것 같았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요. 이 양면이 통합되는 새로운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問學)을 추구하는 학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기철학이 바로 그 세계예요.
과학이라는 것에 떨 것 없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공룡이 어떻게 죽었어? 최근의 학설은 외계로부터 운석이 떨어져서 그것이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멸종됐다는데, 그것도 일설일 뿐이예요. 그리고 사람도 언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지 누가 알아? 그렇게 되면 아인슈타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말아라 이거야. 아무리 위대한 스티브 호킹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그의 설이 기반하고 있는 가정 위에서만 참일 뿐입니다. 거기에 속을 것 없어요. 물론 그것을 정확하게 배우려는 도문학(道問學)의 자세는 항상 가져야 하겠지만. 인간에게 가장 진실한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산다라는 것 그 사실 밖에는 없습니다. 자! 본문을 봅시다.
격물(格物)하면서 그와 동시에 치지(致知)하라
“그러므로 군자는 하늘로부터 받은 덕성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묻고 배움에 말미암으며, 넓고 큰 데 이르면서도 동시에 정밀하고 미세한 것을 다하며[故君子尊德性而道問學, 致廣大而盡精微],” 여기에 내가 전에 속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나왔죠?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밟아 죽이는 게 뭐라 했어요? 넓게 공부하면 깊이가 없고, 깊게 파면 넓지 못하다는 이런 개똥같은 말이 어디 있느냐고 했잖아! 진실로 넓게 공부하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진실로 깊어지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중용(中庸)』이 말하고 있잖아.
“넓고 큰 데 이르면서도 동시에 정밀하고 미세한 것을 다하며, 높고 밝은 것을 지극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일상의 비근한 것에 말미암을 줄 알아야 한다[致廣大而盡精微, 極高明而道中庸].” 중용(中庸)의 정신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은 꼭 기억하도록!!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이것도 해석들이 죄다 엉터리예요. 하나같이 “옛 것을 배워서 새 것을 알아라”, 이따위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석될 수가 없어요. 온고(溫故)는 존덕성(尊德性)의 세계예요. 지신(知新)은 도문학(道問學)의 세계예요. 이것을 동시에(而) 할 줄 아는 포괄적 인격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항상 내 속에 있는 본래적인 덕성,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늘 음미하고 반추하면서도[溫故],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아는 것[知新]에 힘써라.” 끝으로 “그 덕성을 돈독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으로써 예를 높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 尊德性 | 道問學 |
| 致廣大 | 盡精微 |
| 極高明 | 道中庸 |
| 溫故 | 知新 |
| 敦厚 | 崇禮 |
| 至德 | 至道 |
| 存心 | 致知 |
| 內聖 | 外王 |
| 형이상학의 세계 | 형이하학의 세계 |
| 내면세계에 관한 추구 | 인간의 앎의 추구 |
풍우란의 중국사상사를 보는 눈 : 『新原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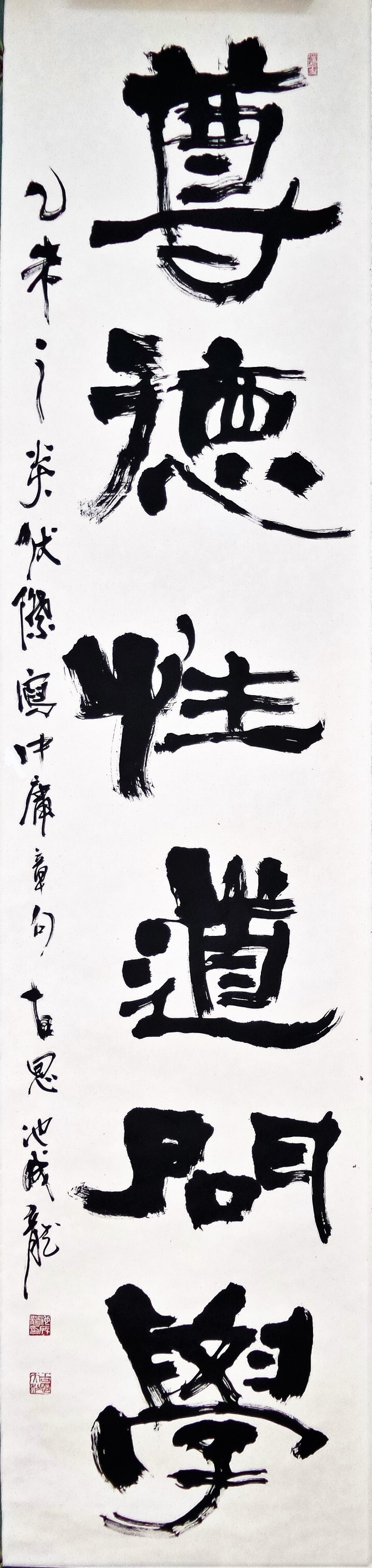
27장 10. 나라가 도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행동
| 是故居上不驕, 爲下不倍. 國有道, 其言足以興; 國無道, 其黙足以容. 詩曰: “旣明且哲, 以保其身.” 其此之謂與! 이러한 까닭에 위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랫사람이 되어서는 배반하지 아니한다. 나라에 도(道)가 있으면 그 말로써 적극 참여하고, 나라에 도(道)가 없으면 침묵을 지켜 그 몸 하나라도 지킨다. 『시경(詩經)』에, ‘이미 밝고 또 밝아 그 몸을 보존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일러 말한 것이로다! 興, 謂興起在位也. 詩, 「大雅烝民」之篇. 右第二十七章. 言人道也. 흥(興)은 흥기하여 지위에 있는 것이다. 시는 「대아증민」의 편이다. 여기까지는 27장이다. 인도(人道)를 말했다. |
여기에 ‘국유도(國有道)~국무도(國無道)~’라는 구문이 나오죠? 이것은 고전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숙어(idiom) 중의 하나로서 『중용(中庸)』이나 『논어(論語)』, 『맹자(孟子)』 등의 고전에 매우 많이 나오는 어법입니다.
| 출처 | 대상 | 邦有道 | 邦無道 |
| 중용27 | 其言足以興 | 其黙足以容 | |
| 진심상42 | 以道殉身 | 以身殉道 | |
| 계씨2 | 禮樂征伐自天子出 | 禮樂征伐自諸侯出 | |
| 공야장1 | 남용 | 不廢 | 免於刑戮 |
| 공야장20 | 甯武子 | 知 | 愚 |
| 태백13 | 전체 | 見 | 隱 |
| 貧且賤焉, 恥也. | 富且貴焉, 恥也. | ||
| 헌문1 | 전체 | 穀, 恥也. | 穀, 恥也. |
| 헌문4 | 전체 | 危言危行 | 危行言孫 |
| 위령공6 | 史魚 | 如矢 | 如矢 |
| 蘧伯玉 | 仕 | 可卷而懷之 |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나라에 도(道)가 있으면 그 말로써 적극 참여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침묵을 지켜 그 몸 하나라도 지킨다.”는 말에 대해서 맑시스트나 사회 정치운동가들은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유가는 나라에 도가 없을 때 침묵을 하느냐, 그런 때일수록 적극 참여하여 진언(陳言)을 해서 그 도(道)를 회복해야지.”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유교에는 두 측면이 있어요. 그러한 적극적 사회참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과거 유학자들 중에 나라에 도(道)가 없을 때, 사약을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간언(諫言)을 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끝내 굽히지 않고 절개를 지킨 그런 예는 많잖아요? 여기에서는 나라에 도(道)가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른 일반적인 정치참여 방식을 말한 것이지만, 그 참뜻은 그 처한 상황에 따라 절도에 맞게 행동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기서 ‘용(容)’이라는 말은 ‘용납되다’, ‘자기 몸 하나라도 살린다’라는 뜻이예요. 아무리 무도한 폭군이라도 침묵하면 그것이 용납되었던 시대가 과거 시대죠. 전두환 시절은 침묵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았던 시대였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싸워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국(國)’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근세 국가적 국(國) 개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금 떠오른 생각이지만 근세 국가(nation-state)에서 “나라에 도가 없을 때 침묵을 지켜 그 몸 하나라도 지킨다.”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갈 구멍이 없거든(There is no escape!) 그런데 유교 경전에 나오는 국(國)은 제후국이야. 그때는 수많은 제후국들이 군웅할거하던 시기였다구.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정한 영토를 갖고 그에 대한 강력한 배타적 권력이 통치자에게 위임되는’ 그런 민족국가가 아니예요. 나라라는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던 시대였으니까 당시 선비들은 그 제후국에 대해 지금 우리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그런 충성심(loyality)이 없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라에 도(道)가 있으면 거기에 적극 참여하라! 도(道)가 없으면 참여하지 마라! 왜 무도한 통치자를 도와주느냐! 침묵을 지켜 철저히 타협하지 말아라! 아니면 도(道)가 있는 다른 제후국으로 가라!” 모두들 이 ‘국유도(國有道 國無道)’를 잘못 해석했어요. 근세 국가에선 국무도(國無道)하면 투쟁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이 당시의 국(國)은 그런 국(國)이 아닙니다.
『대학(大學)』에서 “수신(修身)ㆍ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중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수신(修身)이라고 했죠? ‘수신위본(修身爲本)’, 몸을 닦는 것이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평천하(平天下)보다 중요한 게 치국(治國, 여기에서의 國이 바로 당시의 제후국), 치국(治國)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齊家), 제가(齊家)보다 중요한 게 수신(修身)이예요. 국(國)은 그 중요성이 세 번째에 불과할 뿐이고 몸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이것이 유교주의예요. 그리고 이것은 만고불변의 위대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장의 맨 끝에 인용된 『시경(詩經)』의 구문 ‘기명차철 이보기신(旣明且哲 以保其身, 이미 밝고 또 밝아 그 몸을 보존한다)’에서 ‘明哲保身’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27장 한 장만해도 참으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존덕성 도문학(尊德性 道問學)을 반드시 깊게 새겨 두시도록. 여러분들이 중국철학을 할 적에나 아니면 할아버지 문집을 볼 적에도 이 말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 말의 참뜻이 뭔가를 깨닫고, 오늘 이 강의를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고 『시경(詩經)』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7장 11. 사서독서법과 노트필기에 대해
역시 이 중용(中庸)이라는 책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무궁무진하게 해석이 되고 또한 그에 따라서 생각할 것이 많은, 참으로 위대한 고전인 것 같습니다. 사서(四書)는 중용(中庸)에서 거의 완벽하게 뜻이 정리되고 완결됩니다.
사서(四書)의 독서법
주자(朱子)는 ‘사서운동(四書運動)’을 전개하면서, 사서(四書)를 『대학(大學)』 ⇒ 『논어(論語)』 ⇒ 『맹자(孟子)』 ⇒ 『중용(中庸)』 의 순으로 읽어 나가는 독서법을 권유했습니다.
이 순서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이 순서는 『대학(大學)』에서 먼저 학문의 방향(outline)을 세우고, 즉 읽을 방향의 대강을 세우고, 『논어(論語)』를 거치면서 그것을 심화시키고, 『맹자(孟子)』에서 조금 더 그것을 부연해서 논변(argument)을 배우고, 이것을 다시 『중용(中庸)』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라는 의미에서 짜여 진 것입니다.
| 주희 권장 사서 독서법 |
『대학(大學)』 | 학문의 방향 세움 |
| 『논어(論語)』 | 학문의 방향 심화 | |
| 『맹자(孟子)』 | 학문의 방향을 부연해서 논변 배움 | |
| 『중용(中庸)』 | 학문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정리 |
그러나 시대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나는 『맹자(孟子)』를 먼저 읽고 『논어(論語)』 ⇒ 『대학(大學)』 ⇒ 『중용(中庸)』의 순으로 사서(四書)를 읽을 것을 권장합니다. 고전에 소양이 없고 여러 가지 논문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논변이 있는 유일한 고전인 『맹자(孟子)』를 통해 문장이나 논쟁을 처음 접함으로써 일차적으로 고전의 맛을 배우고, 『논어(論語)』를 통해 그것들을 다시 깊이 있게 느낀 다음, 『대학(大學)』에 와서 아우트라인을 잡아, 『중용(中庸)』에서 철학적 근거를 완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용(中庸)』이 마지막에 온다는 것은 주자(朱子)나 이 김용옥이나 동일합니다. 우리 도올 서원 학생들은 이러한 순서로 읽었고 이것은 나의 독서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 도올 권장 사서 독서법 |
『맹자(孟子)』 | 익숙한 논쟁을 통해 고전 배움 |
| 『논어(論語)』 | 고전의 맛을 깊이 있게 느낌 | |
| 『대학(大學)』 | 고전의 방향을 잡음 | |
| 『중용(中庸)』 | 철학적 근거를 완성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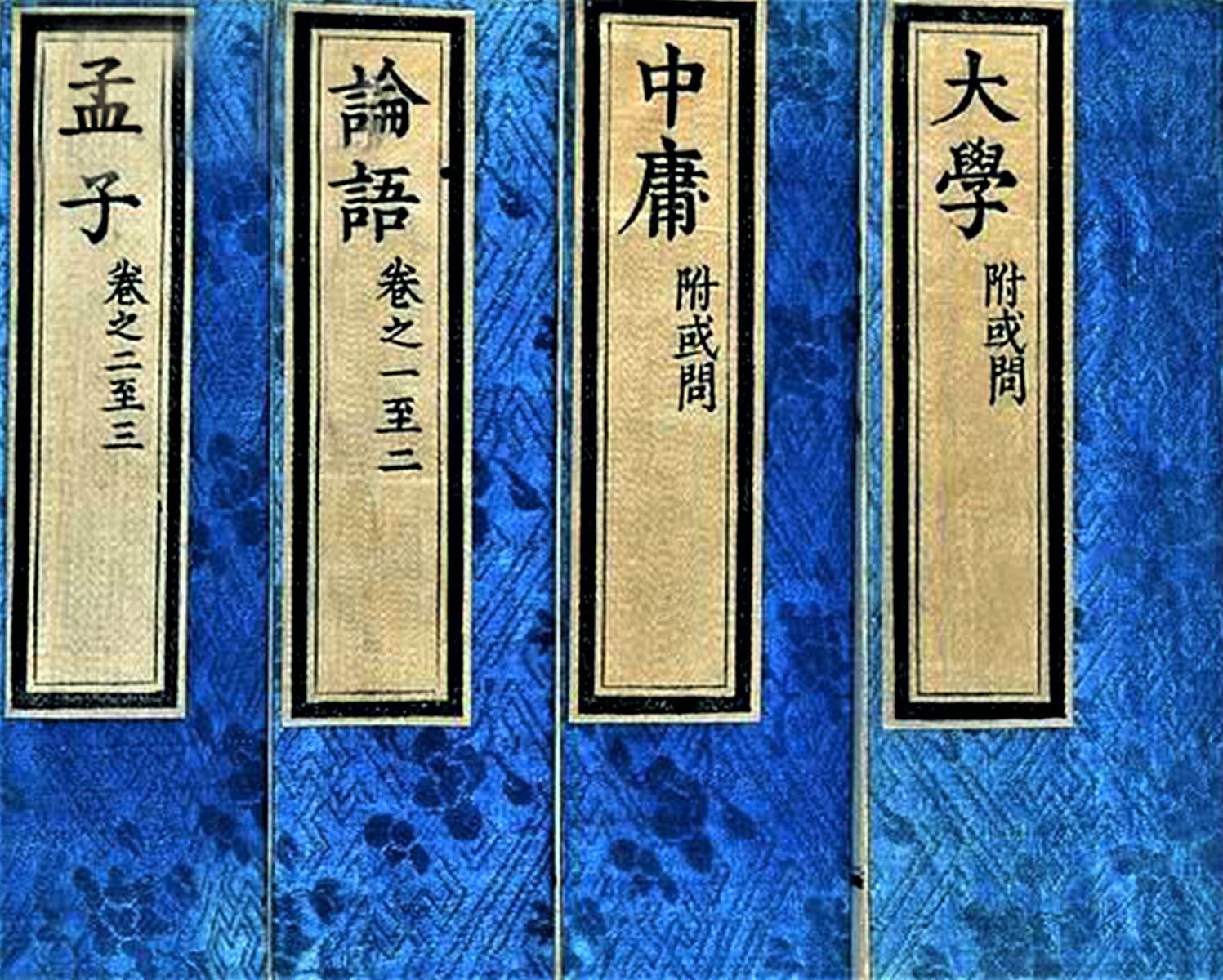
노트 필기에 대해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노트 습관에 대하여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트를 보면 선생님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만을 기록하곤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러한 노트에는 생기가 없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들은 잡담이던 뭐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전부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트만 보고서도 강의의 진행을 하나의 기록영화처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을 때만, 선생님이 하시는 말들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고, 강의 시간에 배운 지식들이 현실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필기를 해야 완벽한 필기인 것입니다. 핵심만 적은 노트로는 전체 분위기를 재현해낼 수 없습니다.

27장 12. 유교의 선비주의
27장에서 우리는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問學)’이라는 중국 철학의 기본 개념(cardinal concept)을 배웠고 국유도(國有道)와 국무도(國無道)의 문제를 배웠는데 이것에 대한 나의 해석은 상당히 새로운 것입니다.
유학자의 적극적인 세계관
실은 나도 그러한 것들을 강의를 하는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유교(儒敎)에서는 나라에 도(道)가 없으면 피해라, 숨어라, 침묵하라, 물러나라고 말하곤 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유교(儒敎)의 소극적인 사회철학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교(儒敎)는 혁명사상이 없으며 불의가 있을 때도 항거를 안 하고, 피하고, 입 다무는 소극적인 철학이라는 가장 가혹한 비판이 가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국유도(國有道)’, ‘국무도(國無道)’에서의 국(國)이라는 것은 결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근세 국가가 아닙니다. 국유도(國有道)ㆍ국무도(國無道)에서의 국(國)은 노(魯)나라니 제(齊)나라니 하는 등의 제후국인 거예요. 오늘날의 의미로 쉽게 이야기한다면, 전라도에 도(道)가 없으면 경상도에 가서 살라는 말이나 유사한 것입니다.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말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지식인들에게 그 나라에 도(道)가 있으면 참여해서 계속 융성하게 만들어주고, 도(道)가 없으면 떠나서 피하든지, 하여튼 그 무도(無道)한 나라를 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유교(儒敎)의 ‘국유도(國有道). 국무도론(國無道論)’에서는 근세 국가적 개념의 ‘국가(state)’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공자(孔子)는 주유천하(周遊天下)를 했던 것이죠. 아마도 ‘공자(孔子)가 위(位)를 갖지 않았다’하는 말은, 공자(孔子)의 보편주의는 천하(天下)를 대상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왕이 되거나 하는 것이 공자(孔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작전적으로 그 위(位) 피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국유도(國有道)·국무도(國無道)의 문제는 당시의 리얼한 상황과 관련지어 해석해야 합니다.
 |
 |
오늘날엔 더욱 의미 있는 명언
무언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오늘날에는 이러한 해석들이 더욱더 리얼하게 느껴집니다. 자기 나라에서 살기 어려우면 이민을 가거나, 교육이 잘못되어 있으면 유학을 가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국가(state)라는 것의 절대성이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근세 국가의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 삶의 절대적인 규범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근세 국가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스테이트(state)인데 이것은 불란서 혁명 이후에나 탄생한 국가 개념인 것입니다. 근세국가의 특징은 대중사회(mass society)로서, 이 대중 사회라는 것은 결국 매스 미디어(Mass media)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매우 특수한 국가개념으로서 대중사회, 즉 매스 미디어에 의하여 지배 받는 경찰국가(police state)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 이런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대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There is no escape!). 즉 여기서의 사회 정의는 ‘정치가 잘못 되었을 때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개념의 유동성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국가(state)’라는 개념이 미래에도 절대적인 제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자 통신망의 발달로 이러한 근대 국가 개념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국가 개념이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사회를 리드하는 리더쉽의 형태도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세 국가만이 유일한 권력 형태는 아닌 거예요. 옛날에도 무수한 다른 형태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것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근대적(Modern) 국가 개념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우는 신라(新羅)가 근대적 의미의 ‘국가’인 줄 안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신라는 절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 당시 마산 부근에 사는 사람에게 “야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하고 묻는다면 “나는 신라 사람이다”하는 류의 답변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골품제도로 모든 신분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지네 동네 꼰대나 생각했지, 신라왕을 무슨 절대 군주로 생각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국의 경계 부근에 살았던 사람들은 전혀 신라니 백제니 하는 의식도 없이 살았을 겁니다. 그때는 통일된 국가 개념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신라를 마치 고정적인 그 무엇으로 생각하지만, 원래 그것은 상당히 경계가 엉성한 어떤 지역을 지칭하는 여러 이름 중의 하나였고, 후에 그 지역을 통털어서 ‘신라’라는 이름으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정리함으로써 ‘신라’라는 이름으로 개념화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나는 신라 사람이다, 백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이렇게 고정적인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라와 백제 왕가 사이에 통혼이 성립하고, 왔다 갔다 하곤 했던 거예요. 영화 ‘여왕 마르고’ 보셨습니까? 보신 분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페인으로 갔다 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아시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state)’가 과연 지금의 형태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김영삼 씨는 아직까지는 좋은 시절에 대통령을 하고 있는 지도 몰라요. 이러한 문제를 남북통일과 관련지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통일 국가의 형태에 대하여도 편협한 오늘날의 국가형태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양하게 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부’라는 것도 절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두환 같은 인물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어 넣고, 고문하고, 죽이는 등 폭력적으로 억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항거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정치가 잘못된 때는 외면해 버리는 것이 국민의 기본적인 생리인 것이고 또 이것이 현명한 처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교의 선비주의
유교(儒敎)의 ‘국유도(國有道)ㆍ국무도론(國無道論)’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나라의 정치가 잘못되면, 지식인이고 국민이고 전부 외면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이 내포하는 궁극적 의미는, 오히려 ‘국유도(國有道)하게 하라’, 즉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하나의 협박(intimidation)이지, 결코 소극적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무도(無道)하면 모든 사람이 외면하게 되고 다 빠질 테니 그 나라를 잘 다스려라 하는 유교(儒敎)적 협박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반어적인 맥락을 잡아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지금까지는 이 유교(儒敎)의 ‘국유도(國有道)ㆍ국무도론(國無道論)’을 ‘근세 국가에서의 사회정의’라는 역사적으로 한시적인, 좁은 틀로 잘못 해석해 왔기 때문에 그 구체적 의미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유도(國有道)ㆍ국무도론(國無道論)’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더욱 리얼하게 어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김영삼! 너 정치 잘 못하면 우리 지식인들 다 빠질 테니 알아서 해라! 하는 정도의 협박이나 압력의 분위기가 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2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은 잊었지만 고려대학의 어느 총장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젊은 학장이 교무회의 중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것을 본 총장이 그 학장에게 감히 건방지게 총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느냐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학장들이 일제히 담배를 꺼내 피웠다는 것입니다. 총장! 너 까불지 마라 하는 협박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고려대학은 그래도 그런 풍도가 있던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요즈음도 자발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정말 회의적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유교(儒敎)의 선비주의가 다 남아있어서 그렇게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 선비주의가 퇴색해 버렸어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무도(無道)하면 외면하고 다 빠진다’ 하는 것이 유교(儒敎)의 선비주의인 것입니다.
| 21장 핵심 내용 |
천도 (天道) |
22장 | 24장 | 26장 | 30장 | 31장 | 32장 | 33장 전편 요약 |
||
| 인도 (人道) |
23장 | 25장 | 27장 | 28장 | 29장 |
'고전 > 대학&학기&중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올선생 중용강의 - 29장 (0) | 2021.09.21 |
|---|---|
| 도올선생 중용강의 - 28장 (0) | 2021.09.21 |
| 도올선생 중용강의 - 26장 (0) | 2021.09.20 |
| 도올선생 중용강의 - 25장 (0) | 2021.09.20 |
| 도올선생 중용강의 - 24장 (0) | 2021.09.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