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신화(金鰲新話)』의 문학사적(文學史的) 위상(位相)
1. 머리말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의 『금오신화(金鰲新話)』는 지금까지 작가론적(作家論的) 측면(側面), 작품론적(作品論的) 측면(側面), 비교문학적(比較文學的) 측면(側面)에서 많이 연구(硏究)되어 왔다. 작가론은 그의 생애와 사상을 추적하는 연구(硏究)가 중심이 되었으며, 연구(硏究) 분량이 가장 많은 작품론(作品論)은 작가와 작품(作品)의 상관성, 작품(作品)의 구조분석, 사상성 내지 우의성(寓意性), 근래에는 성리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기까지 다양한 연구(硏究)성과가 집적되어 왔다. 비교문학적(比較文學的) 논문은 그리 많지는 않으나 주로 『금오신화(剪燈新話)』ㆍ가비자(伽婢子)와의 관계를 다룬 논문들【근래 東方比較文學硏究會에서 월남의 傳記漫錄(臺灣學生書局 刊行)과의 관계가 소개된 바 있다. (제20차 월례 발표 陳京浩) 1987. 9.】이고 근래에는 『금오신화(金鰲新話)』가 우리나라의 설화(說話)적 전통을 계승했다는 국내적 소원(溯源)을 다룬 논문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금오신화(金鰲新話)』의 기록은 김안로(金安老, 1481~1537)의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 6에서 이미 “『금오신화(剪燈新話)』 등을 모방하여 기이한 것을 기록하여 뜻을 붙여 지어 석실에다 감추었다”고 한 기록이 보인다【近代詩僧, 岑爲之領袖, 爲詩典重, 少蔬筍氣. 入金鰲山, 著書, 藏石室, 曰後世必有知岑者, 其書大抵, 述異寓意, 效『금오신화(剪燈新話)』等作也. -金安老, 龍泉談寂記 ㆍ 大東野乘】. 「원각사낙성회시서(圓覺寺落成會詩序)」에는 “을유춘(乙酉春)에 금오산실(金鰲山室)을 짓고 들어앉아 거기서 삶을 마치려 하였다【余於乙酉春, 金鰲山室, 若將終身, 三月晦, 孝寧大君以從馬召余 -『梅月堂全集』 卷 2, 圓覺寺落成會】”고 하였으니 이 해는 1465년(世祖 11) 그의 31세 때로 대개 『금오신화(金鰲新話)』가 이 무렵을 전후해서 지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이퇴계(李退溪, 1501~1570)도 허균(許筠, 1551~1588)에게 답한 글 가운데서 보면 이미 『금오신화(金鰲新話)』를 읽고 있었으나【梅月, 別是一種異人, 近於索隱行怪之徒, 而所値之世適然, 遂成其高節耳. 觀其與柳襄陽書, 『금오신화(金鰲新話)』之類, 恐不可太以高見遠識許之也(答許美叔問目, 退溪集)】 조광정(趙光亭)이 송시열(宋時烈, 1607~1689)에 답한 글에서 보면 이 책이 무척 진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금오신화(金鰲新話)』 弟家本無 兄之所聞 或差也耶】. 그러나 정병욱이 소개한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 1574~1656)의 친필전기집(親筆傳奇集) 가운데도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가 필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제한된 독자나마 국내에서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鄭炳昱, 崔文獻傳紹介, 國文學散藁, 新丘文化社, 1960】.
한편 『금오신화(金鰲新話)』는 임란을 계기로 일본에 건너가 세 차례나 번각(飜刻) 간행(刊行)을 되었다. 초간은 1653년(孝宗 4, 承應 2년)으로 이를 내각문고본(內閣文庫本)이라고 한다. 임란 후 50여년 만에 일본 내각의 주도로 간행된 것이다. 그 후 다시 1673년(顯宗 14, 寬文 13)과, 1884(고종 21. 明治 17)에 동경의 대총언태랑(大塚彦太郞)에 의해 재간되는데 이를 대총본(大塚本)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 역수입되어 온 곳은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이 1927년 계명(啓明) 19호에 상ㆍ하 2책의 이 대총본(大塚本)을 소개하면서부터다【大塚本은 內閣本이 저본이 된 것으로 그 내용은 誤脫字를 제외하면, 동일하다. 내각본은 말미에 「承應二年仲春 崑山館道可處士 刊行」이라 하였고, 大塚本은 卷首에 日人 依田百川의 序와 梅月堂小傳이 실려 있고, 卷末에는 李樹廷의 跋文이 있다. (丁奎福, 『금오신화(金鰲新話)』의 內閣文庫本 解題, 高大 人文論集24輯 1979)】. 『금오신화(金鰲新話)』는 그간 오히려 일본에서 독자를 더 많이 얻은 듯한데 최남선(崔男善)은 그 증거로 강호석서기(江戶釋書記)의 번각조선서(飜刻朝鮮書)에 논급한 1702년(元祿 15) 왜판서적고(倭板書籍考, 寺島宗義)의 『금오신화(金鰲新話)』(一本), 덕천막부시대 서적고(德川幕府時代 書籍考, 牧野善兵衛) 『금오신화(金鰲新話)』(二卷)를 제시하고 있다【崔男善, 『금오신화(金鰲新話)』 解題(啓明 19號)】.
그러면 본론에서는 먼저 김시습(金時習)과 『금오신화(金鰲新話)』의 관계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작품(作品) 전체의 성격을 구분하여 개별 작품(作品)의 문학(文學)적 위상을 알아보기로 하자.
2.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과 『금오신화(金鰲新話)』
김시습(金時習)에 대한 긍부정의 평가(評價)
김시습(金時習)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 허균(許筠)의 물음에 답한 이퇴계(李退溪, 1501~1570)의 주장에서 다음과 같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매월당(梅月堂)이 일종의 이인(異人)으로 색은행괴(索隱行怪)한 무리에 가까운데 마침 그러한 때를 만나 고절(高節)을 이루었을 뿐이며, 「여유양양서(與柳襄陽書)」나 『금오신화(金鰲新話)』 등을 보면 아마도 고견원식(高見遠識)함을 허여할 순 없다.
梅月, 別是一種異人, 近於索隱行怪之徒, 而所値之世適然, 遂成其高節耳. 觀其『與柳襄陽書』, 『금오신화(金鰲新話)』之類, 恐不可太以高見遠識許之也(答許美叔問目, 退溪集)
그러나 이율곡(李栗谷, 1536~1584)은 퇴계와는 달리 매우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그는 왕명으로 일찍이 「김시습전(金時習傳)」를 지은 바 있는데, 다음과 같이 문장에 있어서도 표현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였다고 칭찬하고 있다.
절의(節義)를 표방하고 윤기(倫紀)를 붙들었으며 그 뜻을 궁구하여 일월과 빛을 다툴만하다. 그 풍성을 들으면 나약한 사람이라도 입지가 있을 것이며 백대의 스승이라 하여도 또한 근사할 것이다.
標節義, 扶倫紀, 究其志, 可與日月爭光. 聞其風, 懦夫亦立, 則雖謂之, 百世之師, 亦近之矣.
이러한 율곡의 칭찬은 매월당(梅月堂)의 글을 찾아 십년적공을 하였다는 이자(李耔, 1480~1533)의 서문인 「매월당집서(梅月堂集序)」 가운데도 잘 나타난다.
특히 그의 글은 호탕하여 썰물인 듯 연기인 듯 바람을 몰고 비를 호령하여 노하고 웃는 것이 모두 시가 되었다. 음운에 구속되지 않으면서도 법칙이 문란하지 아니하고 문구에 애쓰지 아니하되 보석처럼 아름답다고 하였다
其爲詩浩蕩, 朝夕烟雲, 驅風詈雨, 怒嗔喜笑, 皆成句語. 不規於聲律, 而典章不紊不刺, 刺於詞華, 而大璞愈麗.
김시습(金時習)의 사상적 내력
이러한 상반되는 평가는 그의 사상적 편력을 통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해 준다.
스스로 성명으로 일찍 성대해졌지만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은둔했다. 정신은 유학자인데 자취는 불자로 당시에 괴상하게 보여질까봐 부러 미치광이 행세를 하여 실제를 가리었다.
自以聲名早盛, 而一朝逃世. 心儒蹟佛, 取怪於時, 乃故作狂易之態, 以掩其實.
율곡의 「김시습전(金時習傳)」 가운데 이 글에서 보면 ‘심유적불(心儒跡佛)’이라 하여 본심은 유교인데 행적은 불교(佛敎)였으므로 시대에 괴상하게 보일까봐 일부러 미친 짓을 함으로써 사실을 엄폐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이 점은 이자(李耔)도 ‘행유이적불(行儒而跡佛)’ ‘불적이유행(佛跡而儒行)’이라 하여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
하물며 나는 청빈하여 유교를 행세하면서 불교를 실천하며 일월의 이치를 알면서도 불교경전에도 해박하다.
況吾淸寒, 行儒而跡佛, 日月理而該釋文.
연려실기술에는 다시 ‘색은행괴(索隱行怪)’라 표현을 하고 있다. 또 이산해(李山海, 1538~1609)의 「매월당집서(梅月堂集序)」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유교를 포기하고 불교(佛敎)로 탈바꿈하여 병든 듯 미친 듯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어찌 다른 뜻이 있어서겠나. 그가 삶의 평형함을 얻지 못한 때문이다.
抛棄名敎, 幻形禪門, 如病如狂, 大恢流俗者, 抑何意歟.ㆍㆍㆍ大要皆不得其平者乎.
이러한 마음의 동요는 유교입국의 당시 조선(朝鮮) 사회가 세조(世祖)의 정권 탈취로 말미암은 사회 정의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는 자주 ‘지여시사괴(志與時事乖)’【虛士本閑雅 早世好大道 志與時事乖 紅塵跡如掃 (梅月堂詩集1 自貽)】라는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뜻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과 잘 맞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다.
몸과 세상 서로 어긋남이 삼하였고 세월은 성큼성큼 빨리도 흘러가네.
身世乖違甚 年光莅苒移(敍悶六首)
몸과 세상이 서로 어긋남을 그는 둥근 구멍에 모난 기둥박기[圓鑿方柄]로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음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屢見身世相違 如圓鑿方柄(上柳襄陽陳情書)】.
조동일(趙東一)은 김시습(金時習)과 허균(許筠)은 중세적 질서에 부딪쳐 이를 거부하지 않을 수 없는 자의식을 최초로 심각하게 느낀 선구자이지만, 김시습(金時習)은 주로 사회적 모순 때문에 허균(許筠)은 주로 이념적 모순 때문에 세계와 맞서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趙東一, 小說의 成立과 初期小說의 類型的 特徵, 韓國小說의 理論 p.p 203~207.】. 사회와 맞서기 위해서 그가 택한 길은 입산의 소극적 방법이었으며 적불(跡佛)을 통해 자신을 숨긴 채 지내야만 했다. 그는 도를 행할 수 없는 세상임을 깨닫고 문득 옷에 검은 물을 들여 입고 산 사람[山人]이 되어 소원을 채우리라 생각하고 유랑의 길을 떠났다고 하였다【若染緇爲山人, 則可以塞願(宕遊關西錄後志)】.
매월당시(梅月堂詩) 사유록(四遊錄)을 보면 그는 관서(關西)ㆍ관동(關東)ㆍ호남(湖南)의 편력에 이어 마지막으로 금오산(金鰲山)을 찾는데 이 무렵에 『금오신화(金鰲新話)』도 창작되었다고 보여 지며, 「유금오록(遊金鰲錄)」의 시편만도 백수를 상회하게 남아 전한다. 후세에 반드시 자신을 알아줄 사람이 있으리라 하고 저서를 모두 석실(石室)에 감추었는데 김안로(金安老)는 그것은 모두 ‘술이우의(述異寓意)’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玉堂揮翰已無心 | 옥당에서 글 지을 맘 이미 없어지고 |
| 端座松窓夜正深 | 솔차창에 앉았으니 밤은 정히 깊었어라 |
| 香揷銅甁烏几淨 | 구리병에 향 꽂으니 안상은 고요한데 |
| 風流奇話細搜尋 | 풍류스런 기이한 말 자세히도 찾아본다. |
「제금오신화(題金鰲新話)」에서 보면 현실에 대한 영광을 그는 이미 포기하고 절연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풍류기화 즉 『금오신화(金鰲新話)』를 매우 진정된 마음으로 창작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최남선(崔男善)은 김시습(金時習)이 “의외의 세변(世變)에 오중(五中)의 격탕(激盪)을 스스로 진정하지 못하고 신세를 아울러 외물(外物)로 포척(抛擲)하고서 단책열루(短策熱淚)로 팔방(八方)에 방랑할새 금강간화(金剛看話)의 전(前)과 설악송소(雪岳誦騷)의 후(後)에 곡부진소불소(哭不盡笑不掃)하던 궁철(窮徹)의 애민(哀憫)을 그대로 동경(東京) 금오산중(金鰲山中)으로 끌고 가서 구수신한(舊愁新恨) 만강울읍(滿腔鬱悒)을 독호모지(禿毫毛紙)의 끝에 서기상망(庶幾喪忘)한 것이 이 일편(一篇)”이라 평하고 있다【崔男善, 『금오신화(金鰲新話)』 解題(啓明 19號)】. 『금오신화(金鰲新話)』에서는 현실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다양한 비현실적 소재를 창출해냈다고 볼 수 있다. 작품(作品)의 주인공으로 하여금 전란으로 죽은 여인의 영혼을 만나 사랑을 속삭이고(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죽은 지 오랜 기씨녀(箕氏女)와 더불어 시주(詩酒)를 응수하며, 지옥으로 달려가 염왕(閻王)을 만나 자신의 주장을 펴고 수중으로 용왕을 찾아가 이계(異界)를 편력(編曆)한다【『금오신화(金鰲新話)』 말미의 ‘書甲集後’라고 한 기록을 통하여 乙集, 丙集 등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다섯 편의 성격을 보면 전기작품(傳奇作品)으로는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오신화(金鰲新話)』, 중국의 영향으로만 볼 것인가, 자생적인 의미로 볼 것인가
김시습(金時習)의 『금오신화(金鰲新話)』를 흔히 우리 문학사(文學史)에서 최고의 전기소설(傳奇小說)로 평가한다. 이러한 위상에 대한 평가는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금오신화(金鰲新話)』를 두고 지금까지 두 가지 상반되는 관점에서 작품(作品)의 생성을 논해 왔다. 그 하나는 중국 문학(文學)의 영향을 강하게 의식하는 측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문화사적 분위기에 더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 측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구우(瞿佑, 1341~1427)의 『금오신화(剪燈新話)』(1378)를 거론한다【『금오신화(金鰲新話)』는 剪燈을 모방하였다 함은 그의 체제와 내용이 혹사함으로써 말함이니... 현존 오편이 『금오신화(剪燈新話)』내의 八篇과 氣脈이 相通한다.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滕穆醉遊聚景園記, 富貴發跡司志 /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渭塘奇遇記 / 「남염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鑑湖夜泛記 /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令狐生冥夢錄, 太虛司法傳 /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水宮慶會錄 龍塘靈會錄(朝鮮小說史, 天台山人)】, 뿐만 아니라 이방(李昉)의 『태평광기(太平廣記)』(977)의 「배항당훤 목인청설화(裵航唐暄 睦仁菁說話)」나 『수신기(搜神記)』의 「행도도설화(幸道度說話)」 등을 들기도 한다【金鉉龍, 韓中小說說話比較硏究, 一志社, 1976「朝鮮傳奇小說」】. 물론 김시습(金時習)의 「제전등신화후(題剪燈新話後)」【山陽君子弄機抒, 手『剪燈新話』奇語... 眼閱一篇走啓齒 蕩我平生磊塊臆(梅月堂詩集4, 題『剪燈新話後』)】같은 시를 읽으면 그가 『금오신화(剪燈新話)』 등에 관심을 두고 읽는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또 『금오신화(金鰲新話)』의 다섯 편이 작품(作品)의 소개나 구성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자의 독서와 잠재적 영향으로 하여 『금오신화(金鰲新話)』를 모방으로 위상을 폄하하려는 자세는 경계되어야 한다. 『금오신화(金鰲新話)』가 김시습(金時習)에 의하여 창작된 배경은 오히려 후자인 독자성과 자생적 분위기가 더욱 중요시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된다【모티프는 우리 民間傳承에 흔히 있는 話類이니 燈話의 皮膜을 뒤집어 쓴 밑에는 그대로 國說의 筋骨이 되어 본대 架鑿과 다만 模襲이 아님을 알 것이며 또 한문의 染濁된 자 분명한 國故라도 地名 人名을 漢土로 轉化함이 예거늘 此書는 이 점에 있어 가장 분명한 향토색을 파지함에 힘써(崔男善, 『금오신화(金鰲新話)』解題)】. 『금오신화(金鰲新話)』가 배태되기까지는 이미 『수이전(殊異傳)』의 유편(遺編)들을 여러 문헌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으며, 『태평통재(太平通載)』(成任)의 「최치원(崔致遠)」나 『삼국유사(三國遺事)』 「조신전(調信傳)」 같은 것은 이미 전기작품(傳奇作品)으로서의 훌륭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여말 가전체의 출현도 주목되는 바이지마는, 이 무렵은 성임(成任)의 『태평광기상절(太平廣記詳節)』 『태평통재(太平通載)』,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 서거정(徐居正)의 『필원잡기(筆苑雜記)』ㆍ『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 같은 저술들이 잇달아 출간되어 소설적(小說的)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고 있었으므로 『금오신화(金鰲新話)』의 출현은 오히려 그러한 명전기(名傳奇) 출현의 사회적 분위기의 성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쪽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林熒澤, 『金鰲新話形成의 史的背景(現實主義的 世界觀과 『金鰲新話』)】.
작품별 분류와 특징, 그리고 감상법
『금오신화(金鰲新話)』는 작품(作品)의 성격상 크게 두 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ㆍ「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ㆍ「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가 하나의 그룹이다. 이 가운데서도 전 2자와 후자의 성격은 또 조금 다르다.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의 양생(梁生),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의 이생(李生)은 각각 죽은 여인의 환신(幻身)과 동서(同棲)하다가 여인을 따라 모두 현세를 등진다. 명혼소설(冥婚小說)로 인귀교환(人鬼交換)이 특색이다. 왜구난(倭寇亂)ㆍ홍건적란(紅巾賊亂) 등 전란이 비극의 시원이 되고 있음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는 전자에 비해 몽유소설(夢遊小說)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고 성애가 거세된 대신 역사적 사건이 만남의 동기가 되고 있다.
한편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와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가 또 하나의 그룹을 이루는데, 이 두 작품(作品)은 완결된 몽유소설(夢遊小說)로 주인공 박생(朴生)ㆍ한생(韓生)이 각각 지옥과 용궁을 편력하는 이계담(異界談)이다. 물론 두 작품(作品)은 여인의 애정관계가 거세되어 있다. 다만 전자에는 박생(朴生)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있고, 후자에서는 글 자랑에다 편력만 장황함에 그쳤다.
신독재(愼獨齋, 1574~1656)의 친필 전기집(傳奇集) 가운데서도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ㆍ「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만 보이는 것을 보면 『금오신화(金鰲新話)』 중 이 양편이 명편으로 중구에 회자되었던 게 틀림없다.
| 冥婚小說, 人鬼交換 | 夢遊小說 |
| 萬福寺樗蒲記ㆍ李生窺墻傳 | 醉遊浮碧亭記ㆍ南炎浮洲志ㆍ龍宮赴宴錄 |
작품(作品)의 종결법에서도 ‘入智異山採藥不知所從’(「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生亦以追念之故得病數月而卒’(「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 ‘沐浴更衣 奄然而逝’(「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數月有病料必不起却醫巫而逝’(「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生不以名利爲懷入名山不知所從’(「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에서 보듯이 모두가 현세를 하직하고 종명(終命)하는 것을 되어 있다. 이것은 작자 김시습(金時習) 자신이 현실에 적응치 못하고 현실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산을 찾았듯이, 주인공이 못다 이룬 여인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현실적 삶의 모순을 합리적 자신의 사고로 현실에서 정당화하기 위한 구성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금오신화(金鰲新話)』에 대한 일차적 해석은 어디까지나 작품(作品) 자체의 독자적인 구성과 미학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차적으로는 작자와 시대를 긴밀히 관련하여 거기에 우의성(寓意性)을 부여하여 작품(作品)의 위상을 추구해가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이 작품(作品)의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재일기외(才溢器外)’는 작자 김시습(金時習)의 압축된 평이다. 그릇 밖으로 재주가 넘쳤다는 뜻이다. 그 넘치는 재주 때문에 그는 세상을 올바로 보지 못했고, 『금오신화(金鰲新話)』의 내용처럼 영혼을 만나고 이계(異界)를 찾아 마음껏 사랑하고 이야기하였다. 남원과 개성(開城), 평양과 경주, 그가 편력한 역사적 지소(地所)를 선정하여 자신이 읽은 작품(作品, 『금오신화(剪燈新話)』 등)에서 지혜를 얻어 ‘풍류기화(風流奇話)’로 엮어낸 『금오신화(金鰲新話)』가 우리 문학(文學)사상 전기소설(傳奇小說)의 효시가 되고 그 위상을 높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3. 작품별 분석
1.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만복사저포기의 의미 탐구
남원의 노총각 양생(梁生)은 어느 날 만복사(萬福寺)를 찾아가 부처님과 함께 저포(摴蒲)놀이를 하여 이긴 대가로 아름다운 한 여인을 배필로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그 여인은 왜란에 의해 죽은 처녀의 환신(幻身)이었다. 이튿날 양생(梁生)은 그녀의 권유에 따라 여인이 살고 있다는 마을로 따라가 거기서 사흘 밤을 머물게 되는데 그곳은 무덤 안이었다. 다음 날은 여인의 대상날로 양생(梁生)은 헤어짐에 앞서 그녀에게서 은주발 하나를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이것이 증거물이 되어 그들은 보련사(寶蓮寺)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러나 재(齋)가 끝나자 여인은 양생(梁生)과의 인연이 다하였음을 말하고 마침내 혼자서 훌훌 저승으로 떠나 버렸다. 양생(梁生)은 그 후 그 여인을 사모하여 장가도 들지 않았으며, 지리산(智異山)에 들어가 약초를 캐다가 그 마친 바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정절을 지키려다 희생된 영혼과의 기연(奇緣)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는 현실적 인물 양생(梁生)과 죽은 여인의 영혼과의 인귀교환(人鬼交換)을 다룬 흥미로운 작품(作品)이다. 이른바 명혼소설(冥婚小說)의 대표적인 작품(作品)이다.
구성상으로 보면 ① 만복사(萬福寺)에서의 만남 ② 무덤에서의 동거 ③ 보련사에서의 재회 ④ 두 사람의 이별의 순으로 기술되어 있다. 만복사(萬福寺)의 저포(摴蒲)놀이가 매개가 되어 양생(梁生)이 평소에 소원하던 아름다운 여인을 부처님에게서 점지 받게 되는데, 매월당(梅月堂)의 『명주일록』에서 보면 그가 선행승(善行僧)과 더불어 저포(摴蒲)놀이를 한 시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생애를 형상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梅月堂全集 14, 溟洲日錄. 與善行鬪摴蒲戱題】. 여인의 상사(狀辭)를 통해 살펴보면 그녀는 왜란에서 정절을 지키려다 희생된 여인의 영혼이었다.
왜구가 쳐들어오자, 싸움이 눈앞에 가득 벌어지고 봉화가 여러 해나 계속되었습니다. 왜놈들이 집을 불살라 없애고 생민들을 노략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동서로 달아나고 좌우로 도망하였습니다. 우리 친척과 종들도 각기 서로 흩어졌었습니다. 저는 버들처럼 가냘픈 소녀의 몸이라 멀리 피난을 가지 못하고, 깊숙한 규방에 들어 앉아 끝까지 정절을 지켰습니다. 윤리에 벗어난 행실을 저지르지 않고서 난리의 화를 면하였습니다. 저의 어버이께서도 여자로서 정절을 지킨 것이 그르지 않았다고 하여, 외진 곳으로 옮겨 초야에 붙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지가 벌써 삼 년이나 되었습니다.
倭寇來侵, 干戈滿目, 烽燧連年. 焚蕩室廬, 盧掠生民, 東西奔竄, 左右逋逃. 親戚僮僕, 各相亂離. 妾以蒲柳弱質, 不能遠逝, 自入深閨, 終守幽貞. 不爲行露之沾, 以避橫逆之禍. 父母以女子守節不爽, 避地僻處, 僑居草野, 已三年矣.
이 대문에서 보면 여인의 죽음의 원인은 전란과 정절을 목숨보다 아끼는 항거에서 찾을 수 있다. 시경에서 보면 ‘행로지점(行路之沾)’의 떳떳함을 그 여인은 자랑하였고 따라서 두 사람은 서로 만나자 의기가 맞아 만복사(萬福寺)의 판호(板戶)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된다. 날이 새자 여인은 인연이 이미 정해졌음을 말하고 곧 인도하여 자신이 거처하는 집으로 양생(梁生)을 안내한다.
여기서 보면 양생(梁生)은 여인과의 만남을 비밀로 하고 남에게 알리려 하지 않는다.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함께 지나가지만 길가는 사람들은 여인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양생(梁生)도 다만 만복사(萬福寺)에 취와(醉臥)했다가 친구를 찾아 가는 길이라고만 말한다[適醉臥萬福寺, 投故友之村墟也].
개령동 집은 무덤과 은완(銀椀)이란 매체
개녕동(開寧洞)의 ‘野藁蔽野, 荊棘參天, 有一屋’은 곧 무덤 속을 의미한다. 그곳의 사흘은 인세의 3년과 같다고 하였다. 비록 작별하지만 재회가 약속되어 있다며 정(鄭)ㆍ오(吳)ㆍ김(金)ㆍ유씨(柳氏) 등 여인들의 송별시(送別詩)에 이어 은완일구(銀椀一具)를 선물로 보련사의 재회를 언약하고 둘은 이별한다.
보련사에서의 재회는 은완(銀椀)이 매체가 되어 여인과의 부부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된다. 주인 부부는 왜란에 죽은 딸의 시신을 개령사 옆에 가매장해 두고 장사를 미루어 왔는데 오늘이 딸의 대상날이라고 했다. 여기서 양인은 행동을 함께 했으나 부모에게는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휘장 옆에서 동숙했으나 끝내 영인의 실체는 잡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무형 중에 엉켜 나타났으나 사라져야만 하는 존재
매월당(梅月堂)은 그의 「신귀설(神鬼說)」에서 음양 이기의 작용으로, 기가 모여 태어나면 사람이 되고 흩어져 죽으면 귀가 된다고 했으며, 기가 멸하면 이 역시 없어져 아무 징조도 없게 되는 상태가 귀(鬼)라고 하였다. 다만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피살되면 그 기가 무형 중에 엉켜 있으나 오래되면 자연히 흩어지고 돌아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왜구의 난에 정조를 지키려다 억울하게 죽은 양생(梁生)이 만난 여인의 기는 아무 징조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기 전에 무형 중에 엉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 p. 230】. 이러한 귀신관(鬼神觀)은 매월당(梅月堂)의 「생사설(生死說)」과도 연관된다. 생과 사는 기의 취산작용(聚散作用)으로, 기가 모여 태어나면 사람이 되고 기가 흩어져 죽으면 귀가 된다는 것이다【梅月堂全集 권 20, 生死說】. 그러므로 이 여인은 다만 억울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으나 곧 다시 그 형체를 감추지 않으면 안 된다. 여인이 먼저 이별을 고한다.
애닮게도 업보(業報)를 피할 수가 없어서 저승길을 떠나야 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움을 미처 다하지도 못하였는데, 슬픈 이별이 닥쳐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운우(雲雨)는 양대(陽臺)에 개고 오작(烏鵲)은 은하에 흩어질 것입니다. 이제 한번 헤어지면 뒷날을 기약하기가 어렵습니다.
自恨業不可避, 冥道當然. 歡娛未極, 哀別遽至. 今則步蓮入屛, 阿香輾車. 雲雨霽於陽臺, 烏鵲散於天津. 從此一別, 後會難期.
업보는 불가피하며 명도가 당연함을 말하고, 이로부터 이별하게 되면 다시 만날 기약이 없다고 말함은 분명한 유명의 구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음날 양생(梁生)은 개령동을 찾아가 여인의 무덤에 제사지내고 제문을 지어 조상한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여인은 공중에 나타나 양생(梁生)을 불러, 자신은 천발(薦拔)을 힘입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음을 말하고, 양생(梁生)도 착한 업을 닦아 함께 속세의 누를 벗어나도록 당부한다.
현실적으로 죽은 여인과의 사랑은 불가능하다. 죽는다는 것은 기가 소멸하여 아무 징조도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고 했으니 더욱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양생(梁生)이 현실에서 그녀를 만나 사랑을 누렸다는 것은 일종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두 사람은 만복사(萬福寺)의 판방(板房)에서, 개령동에서, 보련사 소장에서 거듭되는 사랑의 보금자리를 꾸몄다. 그러나 끝내 화합할 수 없다는 사실이 필연적인 별리(別離)를 통해 증명된다. 이렇게 되자 두 사람은 합리적인 사랑의 장소로 다시 공간을 이동한다. 여인은 양생(梁生)의 천발에 힘입어 다른 나라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했고, 양생(梁生)도 현세에서 다시 장가들지 않고 그 여인을 좇는 것으로 종결된다.
‘生後不復婚嫁, 入智異山採藥, 不知所終.’의 마지막 표현은, 현세에 대한 부정을 통해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의 성취를 강조한 역설법이라고 해석된다.
결말에 대한 각 학자들의 평가
강진옥【강진옥, 『금오신화(金鰲新話)』와 만남의 문제 古典小說硏究의 方向, 새문사, 1985.】은, 비현실적 존재인 상대와의 만남은 주인공에게 공간적 이동을 통한 내면적 변모를 체험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 그 결과 그들의 존재 양식까지 변모시켜 새로운 차원의 존재론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혜순(李慧淳)【李慧淳, 『금오신화(金鰲新話)』에 나타난 人鬼交換說話의 類型的 考察, -李崇寧先生 古稀記念 國語國文學論叢, 1977.】은 이 작품(作品)이야말로 김시습(金時習)의 솜씨가 가장 많이 번뜩이는 작품(作品)으로, 남자의 호구를 얻으려는 적극성과 여자의 괴로움을 면하고자 하는 원망이 잘 짝을 이루고 있는 작품(作品)으로, 결합과 이별이 반복되는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에 비해서는 그 구성이 한층 단순화되어 있는 작품(作品)이라고 하고 있다.
김일열(金一烈)은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가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에 나타난 운명의 하강과정 가운데 그 주요부를 뽑아 확대하면서 거기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 작품(作品)이라고 비교 평가하고, 따라서 행복에서 불행으로 진전되는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는 달리 이미 불행한 자(梁生)가 더욱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인 비극소설(悲劇小說)로 평가하고 있다【金一烈, 『금오신화(金鰲新話)』考察, 朝鮮傳奇의 言語와 文學, 韓國語文學會, 螢雪出版社, 1976.】.
한편 김성기(金聖基)는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에서 양생(梁生)이 여인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양생(梁生)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조자를 필요로 하는데, 첫째는 양생(梁生)이 부처와 더불어 하는 저포희(樗蒲戱), 둘째는 보련사에서 양생(梁生)과 낭자의 환신(幻身)이 함께 드리는 예불, 셋째는 양생(梁生)이 낭자의 환신(幻身)과 이별 후 슬픔을 이기지 못해 올리는 재가 그것으로, 이러한 단계적 교섭을 통해 이 작품(作品)은 완성에 달하여 종결에 이르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金聖基,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에 나타난 心理的 考察」, 韓國古典산문硏究, 張德順先生 華甲紀念論叢, 同化文化社, 1981.】.
설중환(薛重煥)은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를 ‘한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해석하여 양생(梁生)이 여귀를 만나 현실계의 소원을 성취하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또한 여귀는 원한으로 떠돌다가 양생(梁生)으로 인하여 자신의 한을 풀고 바라던 저승에 남자 몸으로 태어나 자신의 소원을 이룬다는, 한의 구조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薛重煥, 『金鰲新話硏究』, 高大 民族文化硏究叢書 15, 1983.】.
이 작품은 김시습의 심정을 우의로 풀어낸 작품
그런데 이 작품(作品)은 단순히 작품(作品)의 형식적 구조도 검토의 중요 대상이기는 하지마는 이 작품(作品)의 김안로(金安老)의 ‘술이우의(述異寓意)’의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작자 자신의 우의(寓意)를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가원(李家源)은 이 작품(作品)을 들어 동봉(東峯) 자신이 일찍이 44세의 노총각 신세가 되었음도 엄치할 사실이 못되거니와 양생(梁生)의 상처(喪妻)ㆍ파산(破産) 등의 장면도 동봉(東峯) 자신의 일과 흡사하며 그 여인이 천발(薦拔)을 얻어 타국의 남자로 태어난 것은 신라의 분황사비(芬皇寺婢)가 지었다는 원왕생가(願往生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했다【李家源, 『금오신화(金鰲新話)』, 通文館, 1959, 「解題」】.
이재수(李在秀)는 『금오신화(金鰲新話)』의 전 작품(作品)이 모두 작자의 우의(寓意)적 표현 아님이 없음을 말하고, 특히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의 양생(梁生)은 경주 용장사에 머무를 때의 작자의 처지와 매우 혹사함을 말하면서 김시습(金時習)과 양생(梁生)의 생애를 도표로 대비해 보여주고 있다【李在秀, 韓國小說硏究, 宣明文化社, 1969, p.62.】.
이렇게 보면 본 작품(作品)은 곧 작자 자신의 생애를 우의(寓意)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현실의 자아를 이상적 자아로 형상화한 과정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다.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는 훌륭한 한편의 비극적 전가작품(傳奇作品)이다. 불우한 주인공 양생(梁生)의 비극이 있고 현실에서 사랑을 끝내 성취하지 못하고 떠난 환녀(幻女)의 비극이 있다. 게다가 거기에는 왜란이란 전란이 개재되어 양인의 만남을 근원적으로 비극화하는 동인을 만들고 있다. 주인공이 처해 있는 삶과의 싸움이 처절해질수록 비극은 가속화된다. 불우한 주인공이 전란에 피살된 환녀(幻女)를 현실에서 만난 것 자체가 비극의 출발이요 삶의 처절화이며, 끝내는 삶의 거부를 통해 비극의 절정을 이룬다. 이는 곧 동봉(東峯) 자신의 세조정변(世祖政變)을 토해 사회와 맞서지 않으면 안 되었던 처절한 싸움이며 그 싸움에서 좌절할 수 없었던 작자 정신의 문학(文學)적 표현이 곧 비극으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
이생규장전, 구조적 측면의 의미
송도(宋都)의 이생(李生)은 국학에 가던 도중 최가의 담장 안을 엿보다가 아름다운 최낭자(崔娘子)를 보고 마음이 끌리게 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곧 꽃다운 인연을 맺지만, 이를 눈치 챈 이생(李生)의 아버지는 그를 멀리 울주농장(蔚州農場)으로 쫓아버리고, 이를 상심한 최낭자(崔娘子)는 그를 사모하여 몸져눕게 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그녀의 부모는 곧 매자(媒者)를 이가에 보내어 이 사실을 알리고, 드디어 양인은 결혼하여 끊겼던 사랑을 다시 잇게 된다.
그러나 그 뒤 홍건적의 난을 만나 이생(李生)은 겨우 목숨을 구하였으나, 최낭자(崔娘子)는 끝내 정조를 지키려다 피살되고 만다. 난 후 이생(李生)은 죽은 최낭자(崔娘子)의 환신(幻身)과 다시 만나 옛사랑을 다시 잇게 되지만, 삼년이 지난 어느 날 최낭자(崔娘子)는 문득 이승의 인연이 다하였음을 말하고 작별을 고한다. 이생(李生)은 하릴없이 그녀를 떠나보내고, 자신도 아내를 생각한 나머지 병을 얻어 곧 세상을 떠나고 만다.
이생규장전이 만복사저포기보다 뛰어나다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는 이생(李生)과 최낭자(崔娘子)의 만남이 거듭되는 특이한 구성을 지니고 있다.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에서는 현실의 양생(梁生)이 처음부터 죽은 여인의 환신(幻身)을 만나 동거하는 전개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에서 보면 이생(李生)과 최낭자(崔娘子)의 첫 번째 만남은 명계와의 관계없이 현실적인 사랑을 맺는다. 그러나 홍건적의 난을 계기로 재회하는 과정에서는 전자처럼 환신(幻身)과의 만남으로 변모된다.
두 작품(作品)의 구성을 비교해 보면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의 후반이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라고도 할 수 있다.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는 애당초 환신(幻身)과의 만남에서 이들의 이별까지를 다룬 작품(作品)인데 반하여,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는 양인이 현실에서 사랑을 맺었다가 다시 환신(幻身)을 만나 못 다한 사랑을 성취하고 이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작품(作品)의 기교나 가치면에서 본다면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가 전자에 비해 월등한 가치 부여를 받을 만하다.
이생규장전의 만남과 이별의 세 단계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는 결합과 이별의 단계가 세 단계로 복잡화되어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이생(李生)과 최낭자(崔娘子)가 가연을 맺었다가 이생가(李生家)의 반대로 서로 이별하게 되는 사건이다. 사랑에의 도발은 이생(李生)이 먼저이지만 다음 단계의 행위부터는 최낭자(崔娘子)가 더욱 적극성을 띤다. 이생가(李生家)에 의해 두 사람은 다시 이별을 맛보게 되지만 최낭자(崔娘子)의 적극성으로 말미암아 양인은 재결합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梅月堂外集 권 1,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 父母如從我願 終保餘生 徜違情款 斃而有已 當與李生 重遊黃泉之下 誓不登他門也.】.
그러나 홍건적의 난은 그 두 번째 이별의 단서를 마련해 주고 있다. 최낭자(崔娘子)의 죽음은 정조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전란이 끝난 후 이생(李生)은 최낭자(崔娘子)의 환신(幻身)과 다시 만난다. 두 사람은 삼세(三世)의 깊은 인연이 있어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고 다시 만난다고 하였다. 그들은 세상의 벼슬을 구하지 않고 사랑에만 몰두한다.
그러나 또 다시 세 번째의 이별이 다가온다【三遇佳期, 世事蹉跎, 歡娛不厭, 哀別遽至.세 번이나 가약을 맺었지만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슬프게 헤어져야만 하겠어요】. 이 이별도 최낭자(崔娘子)가 선창한다. 저승길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非久留人世以惑陽人].’을 말하며 옥루춘(玉樓春) 일결(一闋)로 이별을 고한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冥府)에 실려 있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볼 수가 없지요. 제가 굳이 인간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가진다면 명부의 법도를 어기게 되니, 저에게만 죄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또한 누가 미치게 된답니다.
李郞之壽, 剩有餘紀, 妾已載鬼籙, 不能久視. 若固眷戀人間, 違犯修令, 非唯罪我, 兼亦累及於君.
최랑의 수명은 이미 저승의 명부에 올라있으니 더 오래 머물 수 없으며, 굳이 인세에 미련을 가진다면 명부(冥府)의 법에 위배되어 이생(李生)에게도 죄가 미치게 된다는 논리다. ‘언흘점멸, 료무종적(言訖漸滅, 了無踪跡)’이라는 표현 가운데서 마지막 이별의 슬픔을 본다.
세 번의 헤어짐에 대한 평가
이혜순(李慧淳)은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의 구성을 결합과 이별의 삼단계로 도식화하면서 삶과 죽음의 대조가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는 특색을 들며 중국의 「이장무전(李章武傳)」 패턴의 작품(作品)이라고 설명하였다【李慧淳, 『금오신화(金鰲新話)』에 나타난 人鬼交換說話의 유형적 考察, 前揭書, p.595】.
임형택(林熒澤)은 이를 세 차례의 시련과정으로 설명한다. 이생(李生)이 시골로 쫓겨나고 최낭자(崔娘子)가 상사병으로 눕게 되는 상황, 전란으로 말미암은 최낭자(崔娘子)의 죽음, 최낭자(崔娘子)가 영원히 이생(李生)의 곁을 떠나는 상황, 이 가운데서, 첫 번째 상황은 개인 대 사회의 관계이므로 노력으로 극복되었으며, 두 번째 시련은 전란이라는 불가항력의 것으로 다만 비애의 절실함을 보여주는데 그쳤으나, 세 번째 시련은 절대적인 운명으로 이는 극복되지 못하고 이생(李生)과 최낭자(崔娘子)의 이별을 감수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고 하고 있다. 이생(李生)은 결국 절대적 운명에 순종하지 않자니 자기 자신도 죽음의 길을 택할 도리밖에 없었던 것이며 따라서 비극이 절정에 달하게 된다【林熒澤, 現實主義的 世界觀과 『금오신화(金鰲新話)』, 前揭書, pp.34~35.】.
김일렬(金一烈)은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의 결합과 이별의 반복을 상승과정과 하강과정으로 설명하고, 전자는 구애(求愛)와 만남, 부모에 의한 이별, 정식혼인에 이르는 점진적 결합의 상태, 후자는 전란(戰亂)에 의한 이별, 생자와 사자의 만남, 생자와 사자의 이별에 이르는 점진적 분리의 상태로 양분화하여 전자에서 성취된 행복이 후자에서 차츰 좌절되어가는 비극적 도식의 작품(作品)이라고 설명한다【金一烈, 『금오신화(金鰲新話)』考察, 前揭書, p.273.】.
“生拾骨, 附葬于親墓傍. 旣葬, 生亦以追念之故得病數月而卒.”의 마지막 대문에서, 이생(李生)이 최낭자(崔娘子)의 유골을 장사지내고 그녀를 추념하다 병을 얻어 결국 자신도 죽음으로써 삶을 끝마쳤다는 귀결은 최낭자(崔娘子)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시 행위이며 사랑을 앗아간 현실에 대한 반항이요 거부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죽은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계와 화합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만큼 처절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며, 필연적 이별을 통해 자아는 패배를 겪게 되는데 이는 세계와의 처절한 투쟁을 겪으면서 이루어지는 비장한 패배이며, 죽음에 이르는 결말은 자아가 세계를 전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좌절에 머물지 않으려는 각오를 나타낸 것이란 표현이 매우 설득력을 갖는다【趙東一, 小說의 성립과 초기小說의 유형적 특징, 前揭書, p.231.】.
이생과 최 규수에게 투영된 계유정난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는 상술한 구조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우의적(寓意的) 측면에서도 다각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정주동(鄭鉒東)은 이생(李生)이 곧 김시습(金時習) 자신이며 시구 중 ‘구수신한(舊愁新恨)’ 등은 자신의 심정적 우의(寓意)의 표현이고 유인의 유해를 거두어 달라는 당부는 단종(端宗) 참사 후의 사실에 대한 우의(寓意)임을 주장한 바 있다【鄭鉒東, 梅月堂 金時習硏究(新雅社) 1965. 古代小說論(螢雪出版社) 1966 참조.】.
또 이재호(李載浩)도, 최낭자(崔娘子)가 이리떼같은 도적의 칼날에 쓰러지면서까지 끝내 정조를 지켜 이생(李生)을 사랑했다는 사실은 김시습(金時習) 자신이 세조(世祖)를 지켜 이생(李生)을 사랑했다는 사실은 김시습(金時習) 자신이 세조(世祖)정권에 지조를 팔지 않고 단종(端宗)에게 충성을 바치려고 한 굳센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李載浩, 『금오신화(金鰲新話)』, 乙酉文化社, 1972, p.11.】.
이 밖에도 김용덕(金容德)은 절의(節義)를 흠모하고 있는 이생(李生)은 김시습(金時習)이며 최낭자(崔娘子)의 죽음에 대한 동기도 정조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했음을 들어, 이 작품(作品)이 세조(世祖)의 왕위 찬탈(簒奪)과 관련하여 세상을 징계코자 한 우의(寓意)적 작품(作品)으로 복 있으며【金容德,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硏究, 韓國語文學硏究, 民族文化社, 1983.】,
설성경(薛盛璟)은 절의(節義)로 죽은 이들에 대한 한풀이의 맥락에서 역시 이생(李生)을 김시습(金時習), 최낭자(崔娘子)를 비롯한 전란의 희생자를 단종(端宗)을 비롯한 왕원의 희생자들로 대응시켜 작품(作品)의 우의성(寓意性)을 설명하고 있다【薛盛璟,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의 構造와 意味, 古小說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1986.】.
김혜숙 역시, 홍건적의 침입과 그로 인해 야기된 난세상은 세조(世祖)의 찬탈(簒奪)행위가 인도의 훼손인 난세상에 대응됨을 의미하며, 최낭자(崔娘子)의 환신(幻身)은 단종(端宗)의 죽음과 그 한을, 이생(李生)의 삶은 자신의 좌절된 삶과 세종 및 단종(端宗)에 대한 충성심 수의(守義)의 결의 등을 가탁한 것으로 보았다【김혜숙,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 그 寓意의 內幕, 울산어문논집 3집, 1987, p.142】.
결국 유교 이념을 표방하면서도 스스로 그 이념을 붕괴시켜버린 이율배반의 세조정변(世祖政變)을 작품(作品) 속에서 우의화(寓意化)하여, 최낭자(崔娘子)가 죽자 이생(李生)도 따라 죽는 작품(作品)의 구도 속에서 원래의 이념을 실현해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야말로 ‘심유적불(心儒跡佛)’의 이율배반적 삶을 살아왔던 김시습(金時習)의 갈등이 이 작품(作品)을 통해 그 나름대로의 삶의 양식을 정립해 나가는 가운데 합리화의 출구를 모색해 본 작품(作品)으로 비중을 높여 볼 수도 있겠다. 작품(作品) 가운데서 최낭자(崔娘子)가 적극적인데 반해 이생(李生)은 매우 소극적이요 피동적이다. 이 이생(李生)의 소극성을 작자로 치환할 때, 김시습(金時習)의 성장과정과 세종의 승하 과거의 실패 등 여러 번의 좌절로 자신이 병약했던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薛重煥, 『금오신화(金鰲新話)』의 文學的 特徵, 前揭書】. 그러나 그러한 소극성이 최낭자(崔娘子)가 죽자 자신도 따라 죽는 마지막 대문에서는 적극적 행위로 바뀐다. 소극성을 삶에 대한 갈등이라고 볼 때 적극성은 결단이다. 정절을 지켜 죽었고 죽어서도 자신을 사랑했던 최낭자(崔娘子)가 죽자 그녀를 따라 죽는 이생(李生)의 행위는 유교적 도덕관의 종국적 실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생규장전은 비극소설의 전범
그러나 일차적 작품(作品)의 해석은 그 작품(作品)을 생산한 작가의 복잡한 상황과는 일단 관계를 단절하고 작품(作品) 그 자체에 대한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생(李生)과 최낭자(崔娘子)의 순수한 사랑 자유연애사상(自由戀愛思想)에 먼저 문학적(文學的) 가치가 부여되어야 하고, 그것이 현실의 단계를 넘어서 환신(幻身)과의 관계가 다시 맺어졌다는 것은 현실에서 못 다한 사랑의 강조기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최낭자(崔娘子)의 환신(幻身)이 떠나가자 이생(李生)도 함께 삶을 끝마쳤다는 종결은 이 작품(作品)의 승화된 비극미를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작가와 관련된 우의적(寓意的) 해석은 이차적 의미망에 속한다.
아무튼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는 비극적 인간으로서의 김시습(金時習)이 모순된 세계와의 부단한 조화를 꾀하는 인간적 희구와 그 가운데 발생하는 좌절을 표현하고자 한 작품(作品)으로, 이생(李生)의 불우한 생애, 전란이라는 비극적 배경, 현실과 비현실의 숙명적 갈등상황이 어우러져 빚어낸 비극소설(悲劇小說)의 한 표본적 작품(作品)임에 틀림없다【김명순, 『금오신화(金鰲新話)』의 悲劇性, 雨田 辛鎬烈先生古稀記念論文集, 創批社, 1983.】.
3.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취유부벽정기란 몽유소설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는 홍생(洪生)과 기씨녀(箕氏女)의 만남을 작품화(作品化)하고 있다. 개성(開城)의 홍생(洪生)은 팔월 한가위날을 맞아 동무들과 평양 저자에 피륙과 면사를 싣고 와 대동강가에 배를 대어 놓고 그곳 기생들과 수작하게 된다. 마침 성중의 친구 이생(李生)을 만나 잔치를 벌이고 배를 불러 달빛을 싣고 부벽정(浮碧亭) 밑에 이르러 배를 매어두고 부벽루(浮碧樓)에 올라 고국의 흥망을 탄식하며 회고의 시를 읊는다.
그러자 문득 한 여인이 나타나 홍생(洪生)이 시를 듣고 자신도 시를 써 화답(和答)하였다. 그녀는 은왕실(殷王室)의 후손인 기씨(箕氏)의 딸인데 선고(先考)가 필부(匹夫)의 손에 패하여 나라를 잃고 위만(衛滿)이 그 틈을 타 왕위를 도적질함으로써 조선(朝鮮)의 왕업이 끊어졌다고 말한다. 자신은 신인(神人)의 인도로 광한전(廣寒殿)에 올라 수정궁(水晶宮) 항아의 향안(香案) 받드는 시녀를 삼았는데 문득 고국 생각이 나서 잠시 부벽루(浮碧樓)에 내려왔다는 것이다. 홍생(洪生)은 여인에게 다시 40운(韻)의 시를 요청하였는데 여인은 짓기를 마치자 붓을 던지고 공중으로 사라져 버린다. 홍생(洪生)은 무료히 그녀가 남긴 말을 서책에 기록하고 다시 시 한 수를 읊은 후 날이 샐 무렵 배를 대었던 물가로 돌아간다. 친구들의 물음에 그는 사실을 감추고 다만 장경문(長慶門) 밖 조천석(朝天石)에서 낚시질로 밤을 새웠다고 말한다. 그 후 홍생(洪生)은 그 여인을 잊지 못하고 병을 얻어 신음하다가 신녀의 꿈을 꾸고 죽으니 사람들은 그가 우선시해(遇仙屍解)했음을 믿었다는 것이다.
몽유소설의 형식이 녹아나다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는 ‘사몽비몽, 사진비진(似夢非夢, 似眞非眞)’이라 했으니 몽유소설(夢遊小說)의 형식이며, 홍생(洪生)과 죽은 기씨녀(箕氏女)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으니 명혼소설(冥婚小說) 또는 인귀교환소설(人鬼交換小說)이라고 할 수 있다. 홍생(洪生)이 부벽정(浮碧亭)에서 만났던 여인을 잊지 못해 병상에 누워 있던 어느 날 그는 또 다시 꿈을 꾼다.
우리 아가씨께서 선비님의 이야기를 옥황상제께 아뢰었더니 상제께서 선비님의 재주를 사랑하시어, 견우성 막하(幕下)에 붙여 종사관으로 삼으셨습니다. 옥황상제께서 선비님께 명하셨으니 어찌 피하겠습니까?
主母奏于上皇, 上皇惜其才, 使隸河鼓幕下爲從事. 上帝勅汝, 其可避乎?
우리 아씨가 당신 재주를 아까워하여 상제께 여쭈어 견우성 막하의 종사벼슬에 명하였으니 빨리 부임하라는 천상녀(天上女)의 전갈을 받는 꿈을 꾼다. 그 후 그는 깨끗이 목욕하고 향을 피우고 자리를 정리한 뒤 잠깐 누웠다가 문득 세상을 떠난다. 홍생(洪生)과 기씨녀(箕氏女)는 다만 시만을 서로 주고받았을 뿐 남녀 간의 육체적인 접촉은 가진 바 없다.
| 雲雨陽臺一夢間, | 양대에서 뵈온 님 다만 일장춘몽인가 |
| 何年重見玉簫還. | 가신님 어느 해에 퉁소불고 돌아오리. |
| 江波縱是無情物, | 대동강 푸른 물결 비록 무정하다마는 |
| 嗚咽哀鳴下別灣. | 임 여윈 저곳으로 슬피 울며 흘러가네. |
그러나 위와 같은 홍생(洪生)의 시에서나, 기녀가 떠난 후 그는 좋은 인연을 얻었으나 마음에 쌓인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한 서운함【그는 기이하게 만났지만 가슴속에 쌓인 이야기를 다하지 못한 것이 서운하여[因念奇遇而未盡情欸]】을 술회한 대문에서 보면 애틋한 감정의 교환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홍생(洪生)은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처럼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향불을 피우고 자리에 누웠다가 세상을 떠나 기씨녀(箕氏女)를 찾아 떠난다【李慧淳, 『금오신화(金鰲新話)』에 나타난 人鬼交換說話의 類型的 考察, 前揭書.】.
반존화주의 사상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의 특색은 홍생(洪生)과 기씨녀(箕氏女)의 교환처럼 역사적 사건을 그 배경으로 깔고 있는데 있다.
나는 은나라 임금의 후손이며 기씨의 딸이라오. 나의 선조(기자)께서 실로 이 땅에 봉해지자 예법과 정치제도를 모두 탕왕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였고, 팔조(八條)의 금법(禁法)으로써 백성을 가르쳤으므로, 문물이 천년이나 빛나게 되었었소. 갑자기 나라의 운수가 곤경에 빠지고 환난이 문득 닥쳐와, 나의 선친(준왕)께서 필부(匹夫)의 손에 실패하여 드디어 종묘사직을 잃으셨소. 위만(衛滿)이 이 틈을 타서 보위(寶位)를 훔쳤으므로, 우리 조선의 왕업은 끊어지고 말았소.
弱質, 殷王之裔, 箕氏之女. 我先祖, 實封于此, 禮樂典刑, 悉遵湯訓, 以八條敎民, 文物鮮華, 千有餘年. 一旦天步艱難, 灾患奄至, 先考敗績匹夫之手, 遂失宗社. 衛瞞乘時, 竊其寶位, 而朝鮮之業墜矣.
여기서 보면 여인은 은왕실의 후손인 기씨(箕氏)의 딸인데 선조가 이 땅의 왕이 되어 예법과 정치 제도를 탕왕(湯王)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고 팔조(八條)의 금법(禁法)을 행해 천년이나 문물이 빛났으나 국운이 갑자기 비색해져 선고(先考, 準王)가 필부의 손에 패하여 마침내 국가를 잃게 되고 위만이 이를 틈타 왕의를 도적질하여 조선(朝鮮)의 왕업이 여기서 끊기고 말았다고 하였다.
매월당(梅月堂)은 단군에서 비롯되는 민족사의 정통 속에 기자를 포함하는 반면 주무왕(周武王)과 위만(衛滿)을 적대 세력으로 파악하는 동이문화권(東夷文化圈) 대(對) 중화문화권(中華文化圈)의 대립을 의식했으며, 따라서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의 핵심적 갈등은 반존화적 민족주의 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李相澤, 「남염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의 道家的 文化意識, 韓國古典小說의 硏究, 中央出版社, 1981.】.
이상택은 이어서 기자와 위만이 다 같이 중국에서 왔으나 기자는 동이문화권의 동류민족으로 포용되고 위만은 주무왕과 함께 동이족의 적대세력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최동(崔棟)의 『조선상고민족사(朝鮮上古民族史)』 등에서는 기자가 동이족고토(東夷族古土)인 동방조선(東方朝鮮)에 이주한 사실과 위만이 한족유민(漢族流民)으로 조선왕(朝鮮王) 준(準)을 속여 나라를 빼앗은 역사적 사실을 들어 반존화적(反尊華的) 민족의식(民族意識)을 고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만이 기자의 나라를 빼앗았다는 내용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으로 생각해 볼 때 단종(端宗)의 실위와 세조(世祖)의 왕위찬탈(王位簒奪)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하겠으나, 이 문제는 왜 굳이 위만이 나라를 빼앗고 기자가 나라를 빼앗기는 여탈(與奪)관계로 설정하였느냐의 문제는 재고의 여지가 남는 문제라고 하겠다【朴晟義, 東峯 김시습(金時習)과 『금오신화(金鰲新話)』, 韓國古代小說史, 日新社, 1958.】.
초월적 현실주의관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에 등장하는 기씨녀(箕氏女)는 위만에 의해 朝鮮의 왕업이 끊어진 후 단군을 만나 해중도(海中島)에 들어가 함께 불사약을 먹고 신선이 된다. 십주삼도(十州三島)의 편력이 끝나자 옥황상제가 계시는 광한전에 들어가 수정궁으로 항아를 찾아가 그곳에서 향안을 받드는 시녀의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문득 고국 생각이 나서 조상의 무덤에 참배하고 부벽정(浮碧亭) 구경을 마침 나왔던 길이라고 하였다. 기씨녀(箕氏女)가 선계의 여인임을 확인하는 대문으로는 홍생(洪生)의 초대연에 차린 음식이 모두 人世의 것이 아니어서 딱딱하여 먹을 수 없으므로 신호사(神護寺)의 절밥과 주암(酒巖)의 잉어반찬을 얻어와 별도로 대접하는 장면을 들 수가 있다.
기녀가 홍생(洪生)의 곁을 떠나는 장면은 ‘척필능공이서, 막측소지(擲筆凌空而逝, 莫測所之)’라 하여 붓을 던지고 공중으로 높이 오르니 간 바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녀가 떠난 뒤에는 곧 회오리바람이 불어 그녀가 지은 시와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자리마저 걷어가 버려 인세(人世)에 신선이 내려왔던 자취를 없애고자 하였다고 하였다.
어느 날 꿈속에서 천상에서 내려온 담장여인(淡妝女人)을 만나 홍생(洪生)을 견우성 막하의 속관(屬官)을 삼겠다고 전하는 기녀의 전갈을 받은 뒤로는 곧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맞는다. 현실에서의 죽음은 곧 그녀와의 천상재회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한갓 현실도피의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作品)에서는 오히려 현실을 떠남으로써 정화되고 안정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초월적 현실주의관을 살펴볼 수 있다【崔三龍, 『금오신화(金鰲新話)의 悲劇性과 超越의 問題』, 韓國古小說硏究, 二友出版社, 1983.】.
선관사상
작품(作品)의 결말 죽음의 대목에는 ‘빈지수일 안색불변 인이위우선시해(殯之數日 顔色不變 人以爲遇仙屍解)’라고 하여 시체를 빈소에 안치한 지 수일이 지나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으며 그 때 사람들은 그가 신선을 만났으므로 죽음에서 해탈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선시해(遇仙屍解)’의 이른바 도가적(道家的) 초월주의(超越主義)는 미학적 뿌리를 중국에서 찾기보다 이능화(李能和)의 한국도교사(韓國道敎史)나 북애자(北崖子)의 규원사화(揆園史話) 등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단군신화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며, 기씨녀(箕氏女)가 신인의 도움으로 동천복지(洞天福池) 십주삼도(十洲三島)를 유람하다가 월궁 광한전에 올라 천신이 되고 잠시 지상고토(地上故土)에 하강했다가 다시 천상본향(天上本鄕)으로 회귀해 가는 이야기 전개는 천상본향의 낙원회복을 갈망하는 지상인의 실낙원(失樂園)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 인간본연의 선관사상(仙觀思想)에 동의하게 된다【李相澤, 「남염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의 道家的 文化意識, 前揭書】.
홍생(洪生)과 기녀의 만남은 이 작품(作品)이 역사적 상황이나,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성을 갖느냐의 문제는 역사주의적 또는 사회학적 분야에 속하는 일일 것이다. 다만 양인이 현실에서 잇지 못한 사랑의 사연을 지상에서 지속해 보려는 초월적 현실주의사상과 도가적(道家的) 신선사상(神仙思想)이 이 작품(作品)에 혼용되어 지배하고 있어, 『금오신화(金鰲新話)』 가운데서도 한 차원 높은 작품(作品)으로 평가되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4.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남염부주지는 김시습의 사상소설
『금오신화(金鰲新話)』 가운데서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는 매월당(梅月堂)의 사상을 압축하고 있는 대표적 사상소설(思想小說)이다. 작자 자신의 철학적 온오(蘊奧)를 설명하기 위하여 서정성을 제거하였으며, 따라서 여타 작품(作品)에서 볼 수 있는 시적 문체를 거세(去勢)하였다.
박생(朴生)과 염라왕(閻羅王)과의 대화를 통하여 박생(朴生), 즉 매월당(梅月堂)이 평소 생각하던 철리와 현실에 대한 자신의 사회관을 낱낱이 피력하고 있다. 자유로운 논술을 펴기 위하여 그는 몽유(夢遊)의 형태를 빌려와 염부주(閻浮洲)라는 한 가상의 공간을 설정해 두고 그곳을 탐방하여 염라왕(閻羅王)을 만나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염라와의 문답으로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다
박생(朴生)은 불교(佛敎)ㆍ무격(巫覡)ㆍ귀신(鬼神) 등의 설에 의심을 품고 중용과 역경을 읽은 후 자신의 견해를 믿게 되었으며, 극락과 지옥설에 대해서도, 하늘과 땅은 한 음과 한 양 뿐인데 어찌 이 천지 밖에 또 다른 천지가 있겠느냐고 자문하고, 자신이 일찍 지은 「일리론(一理論)」이란 글을 통하여 불가설을 부인하고 있다.
염라왕(閻羅王)은 염부주(閻浮洲)를 다스린 지 일만 년이 넘는다고 했다. 문답이 시작되어, 주공(周公)ㆍ공자(孔子)ㆍ석가(釋迦)가 어떤 사람인가의 질문에 주공(周公)ㆍ공자(孔子)의 가르침은 정도(正道)로써 사도(邪道)를 물리치는 일이며 석가(釋迦)의 법은 사도로써 설문하여 사도를 물리치는 것이란 해답을 얻는다.
귀신(鬼神)이란 무엇이냐는 물음에 염왕(閻王)은 ‘귀는 음의 정기요 신은 양의 정기이며, 귀와 신은 조화의 자취요 음양의 양능(良能)으로 살아 있을 때는 인물이라 하고 죽으면 귀신(鬼神)이라 하나 본디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속에서 제사를 받는 귀신(鬼神)과 조화의 귀신(鬼神)도 다르지 않다는 답변에 이어, 요괴(妖怪)의 정체를 묻는 물음에 귀란 굽힌다는 뜻이요, 신이란 편다는 뜻이며 조화의 신은 굽혔다 폈다 할 수 있으나 울결(鬱結)된 요괴들은 굽혔다 폈다 할 수 없으며 조화의 신은 자취가 없으나 요괴는 각각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 대문은 김시습(金時習)의 「귀신(鬼神)」 또는 「신귀설(神鬼說)」에서,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면 귀신(鬼神)의 이도 남지 않으며, 천지자연에 대한 제사는 다만 기가 바르게 움직인 데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기일원론적(氣一元論的) 귀신론(鬼神論)으로도 설명된다【趙東一, 鬼神論과 敍事文學, 韓國古典文學硏究會 발표요지(水安堡, 1988)】.
박생(朴生)은 이어 극락과 지옥이 존재에 대해서 묻고 지옥의 명부(冥府)에는 시왕(十王)이 배치되어 죄인을 심판한다는 설에 대하여 염라왕(閻羅王)의 부정적인 해답을 통하여 염라국의 존재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정신과 기운은 곧 흩어지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몸뚱이는 땅으로 내려가 근본으로 돌아가는데 결코 캄캄한 저승 속에 머무는 일이 없을 것이라 말한다. 또 갑자기 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기는 당장 흩어지지 않고 여귀(厲鬼)나 원귀(寃鬼)가 되어 결국은 소멸하고 마는 것이므로 부처님께 재(齋)를 올리고 시왕께 제사지내는 일은 속임수라고 하였다. 사람이 윤회(輪廻)를 멈추지 않고 이승을 떠나면 저승에 산다는 내세관(來世觀)에 대해서도, 정기가 흩어지면 소멸된다고 하여 결국 윤회사상(輪廻思想)을 부인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율곡이 그의 「김시습전(金時習傳)」에서 말한 이른바 ‘심유적불(心儒跡佛)’의 본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염라왕(閻羅王)이 통치하는 염부주(閻浮洲)에는 전생에 부모나 왕을 죽인 대역(大逆)이나 간흉(奸凶)들이 많은데,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자면 박생(朴生) 같은 바른 생각의 소유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영라왕이 자신은 이미 시운(時運)이 다하였고 박생(朴生)도 인세의 시운이 다하였으니 염부주(閻浮洲)에 돌아와 자신의 후계자가 되어 달라는 것이다. 양인의 합의를 기념하는 축하연은 역사의 평가에 집중된다.
임금에 대한 생각
화제가 고려의 건국에 미치자, 치자는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하지 말 것이며 덕망이 없는 자가 권력으로 왕위에 올라서는 안 되며, 천명이 가버리고 민심이 떠나버리면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미치게 됨을 염라왕(閻羅王)은 말한다. 간사한 신하가 벌떼처럼 일어나고 난리가 잦은데도 임금이 백성들을 위협하여 그것을 잘한 일로 생각하고 명예를 구한다면 결코 나라가 평안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박생(朴生)이 제기하는 일련의 문제들은 철학적인 데에서 점차 정치적인 것으로 나아간다. 정치적인 화제는 현실적인 데로 접근한다. 음양(陰陽) 귀신(鬼神)의 도와 군자ㆍ소인의 변(辨)ㆍ고금(古今)의 치란(治亂)은 자취를 구명하되 귀신(鬼神)에 대한 결론은 무신론에 귀착시켰다. 그리고 유불양교의 차이점은 정직(正直)과 탄망(誕妄)에 있으며 고금의 치란은 위정자(爲政者)의 현불초(賢不肖)에 매여 있음을 명증(明證)하고 있다【李家源,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금오신화(金鰲新話)』解題, 통문관, 1959.】.
이러한 우주관(宇宙觀)ㆍ유불관(儒彿觀)ㆍ귀신관(鬼神觀)ㆍ치란관(治亂觀)은 매월당(梅月堂)의 고금제왕국가흥망론(古今帝王國家興亡論), 고금군자은현론(古今君子隱顯論), 고금충신의사총론(古今忠臣義士摠論), 인재설생재설(人才說生財說)ㆍ명분론(名分論)ㆍ사생론(死生論)ㆍ불의부귀여부운변(不義富貴如浮雲辨) 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세조(世祖)의 왕위찬탈(王位簒奪)에 불만을 품고 두타(頭陀)의 형상으로 세상을 등지고 살면서 양왕(佯狂)으로 위정자들을 매도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생애와 매우 근사한 일치점을 보여주고 있다【金容德,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의 構成分析, 古典小說硏究의 方向, 새문사, 1985.】.
염라의 자기부정
여기서 염라왕(閻羅王)은 세간의 상식이 용인하는 염라왕(閻羅王)이 아니다. 박생(朴生)의 지론에 동조하여 인간을 심판하는 염라국을 오히려 부정하고, 백성을 그릇 인도하는 왕의 횡포를 비판하고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진 박생(朴生)을 옹호하고, 끝내는 그 박생(朴生)이 마음에 들어 염라국왕의 자리까지 물려주는데 이른다.
작자의 의도는 박생(朴生)과 염라왕(閻羅王)의 대화를 통하여, 오히려 염라왕(閻羅王)이나 저승의 존재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패러독스를 이용함으로써 현실적 행위와 사상을 더 강하게 부인해 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매월당(梅月堂)은 염라왕(閻羅王)이라는 가상 인물을 통하여 작가가 처한 시대의 이념적 모순과 정치 사회의 모순과 정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해 보려는 의도를 이 작품(作品)을 통해 실현하려 하고 있다【趙東一, 韓國小說의 理論, p.236.】.
우리 염주땅은 실로 야만의 나라이다. 옛 하우(夏禹)의 발자취 이르지 못하였고 주목왕(周穆王) 발자취도 미친 적이 없다. 붉은 구름 햇빛을 덮고 독한 안개 공중을 막아 목마를 때 녹은 구리 마시며 주리면 뜨거운 쇳조각을 먹고 야차(夜叉)ㆍ나찰(羅刹) 아니면 발붙일 곳 없고 도깨비패 아니면 기운도 펼 수 없다. 화성 천리요 철산 만첩이라 민속이 한악하니 정작 없으면 간사함을 판단할 수 없고 신성한 위엄 없으면 조화를 베풀 수 없다.
이제 동국의 박모는 사람됨이 정직하여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으며 굳세고 씩씩하여 결단성이 있고 재질이 유달라 모든 백성의 기대에 어김이 없으리니 경은 마땅히 도덕과 예법으로 인민을 지도할 것이며 온 누리를 태평하게 하여 주오.
炎洲之域, 實是瘴厲之鄕, 禹跡之所不至, 穆駿之所未窮. 彤雲蔽日, 毒霧障天, 渴飮赫赫之洋銅, 飢餐烘烘之融鐵, 非夜叉羅刹, 無以措其足, 魑魅魍魎, 莫能肆其氣. 火城千里, 鐵嶽萬重, 民俗强悍, 非正直無以辨其姦, 地勢凹隆, 非神威不可施其化.
咨! 爾東國某, 正直無私, 剛毅有斷, 著含章之質, 有發蒙之才, 顯榮雖蔑於身前, 綱紀實在於身後, 兆民永賴, 非子而誰? 宜導德齊禮, 冀納民於至善, 躬行心得, 庶躋世於雍熙.
이 인용문은 염라왕(閻羅王)이 박생(朴生)에게 내린 선위문(禪位文)이다. 박생(朴生)의 재질이 빼어나며 정직하여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고 도덕과 예법으로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역으로 현실에 정직이 통용되지 않으며 도덕과 예법이 통용되지 않는 불의가 지배하는 세상이란 뜻도 된다. 이는 초두의 ‘의기고매, 견세불굴(意氣高邁, 見勢不屈)’이라 하여 뜻이 매우 고매하고 시세에 아부하지 않았다는 박생(朴生)의 서술과도 일치한다.
결말 부분의 ‘기출문 만거자 차질복철 생복지경기이각 내일몽야(旣出門 挽車者 蹉跌覆轍 生伏地驚起而覺 乃一夢也)’에서 보면 문을 나서 수레 끌던 사람이 헛디뎌 수레바퀴가 넘어지자 그 바람에 박생(朴生)도 엎어졌는데 놀라 깨달으니 한바탕 꿈이었다고 하였다. 입몽(入夢)의 과정은 박생(朴生)이 거실에서 밤에 등불을 돋우고 글을 읽다가 베개에 기대어 옷을 입은 채 잠이 들었는데 문득 한 나라에 이르니 바다 속의 한 섬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입몽(入夢)에서 보면 ‘양해중일도서(洋海中一島嶼)’로 설정된 염부주(閻浮洲)가 각몽(覺夢)에서는 수레를 타고 나오다 깨는 ‘차질복철(蹉跌覆轍)’로 되어 있다. 각몽(覺夢) 후 서책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고 등잔불이 가물거리는 상황은 몽중세계를 현실과 자연스레 연결하는 기법으로, 박생(朴生)은 장차 죽을 일을 염두에 두고 집안일을 미리 정리한 후 세상을 떠나 이웃집 사람의 꿈을 통해 박생(朴生)이 염라왕(閻羅王)이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박생(朴生)과 염왕(閻王)은 매월당(梅月堂)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다. 박생(朴生)이 현실이라면 염왕(閻王)은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박생(朴生)은 이미 해답을 가지고 현실의 제반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염왕(閻王)의 입을 통하여 추구해 나간다. 박생(朴生)이 염라왕(閻羅王)의 후계자가 되었으니 결국 염라왕(閻羅王)의 해답은 박생(朴生) 자신의 해답이다. 매월당(梅月堂)은 귀신관(鬼神觀)ㆍ유불관(儒彿觀)ㆍ이상관(理想觀)ㆍ치국관(治國觀) 등 평소 자신의 생각과 현실의 갈등 관계를 박생(朴生)과 염라왕(閻羅王)의 대화를 통해 문제 삼고 있으며, 저승을 부정하는 염라왕(閻羅王)의 역설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정당하며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 작품(作品)은 결국 김시습(金時習) 당대의 현실 비판을 의도한 작품(作品)으로, 염라왕(閻羅王)은 성리학적 현군(賢君)으로 설정하고 그를 통해 지옥(地獄)ㆍ윤회(輪廻) 등 불설의 타당성을 부정케 함은 시군(時君)에 대한 묵시적 비판이며 이는 불교(佛敎)로써 불교(佛敎)를 비판하는 역설적 수법이기도 하다【김명호, 김시습(金時習)의 文學과 성리학사상, 韓國학보 35집, 1984.】.
5.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
용궁부연록, 몽유록 방식으로 하고 싶은 말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는 한생(韓生)의 용궁체험을 담고 있다. 이 작품(作品)에서는 바다 속의 용궁이 아니고 송도(宋都, 開城) 천마산(天磨山)의 용추(龍湫) 박연(朴淵)이 용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어느 날 한생(韓生)은 천상에서 내려온 청삼(靑衫) 복두(幞頭)의 종자를 따라 날개 달린 준마(駿馬)를 타고 하늘을 날아 용궁에 다다른다. 함인지문(含仁之門)을 지나 용궁에 이르니 용왕이 반겨 맞이하고 함께 초대한 조강신(祖江神)ㆍ낙하신(洛河神)ㆍ벽란신(碧瀾神)과 더불어 자리를 같이 하게 된다. 용왕은 자신의 무남독녀가 화촉동방(花燭洞房)을 꾸밀 별당을 지어 가회각(佳會閣)으로 이름하고 상량문(上樑文)을 지어 바치게 하기 위해 문사(文士) 한생(韓生)을 초대했다는 것이다. 한생(韓生)은 이에 비단폭을 받아, 『시경(詩經)』 「관저(關雎)」 장(章)의 ‘窈窕淑女君子好逑’와 『주역(周易)』 「건괘(乾卦)」의 ‘비룡재천 리견대인(飛龍在天 利見大人)’을 인용하여 한 편의 글을 짓고 다시 단가(短歌)로써 용궁의 경사를 하례하게 된다. 주연(酒宴)이 시작되자 미희(美姬)들의 「벽담곡(碧潭曲)」ㆍ「회풍곡(回風曲)」에 이어 용왕도 「수룡음(水龍吟)」 한 곡을 불러 흥을 더하게 된다. 용왕의 명으로 곽개사(郭介士, 게)의 팔풍무(八風舞), 현선생(玄先生)의 구공무(九功舞)가 더욱 흥을 돋우고, 이어 조강신(祖江神)ㆍ낙하신(洛河神)ㆍ벽란신(碧瀾神)의 시에 이어 한생(韓生)의 장편시이십운(長篇詩二十韻)이 더욱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한생(韓生)은 파연(罷宴) 후 용궁관람을 허가 받고, 용왕이 하늘에 조회할 때 치장하는 능허각(凌虛閣), 번개를 맡은 전모(電母)의 거울, 우레를 맡은 뇌공(雷公)의 북,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 용왕의 칠보곳간 등을 두루 구경한다. 떠남에 임하여 한생(韓生)은 용왕으로부터 산호반(珊瑚盤) 위에 야광주(夜光珠)와 빙초(氷綃) 두 필을 받아 사자의 등을 타고 바람과 물을 가르는 서각(犀角)에 힘입어 현세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몽유록소설의 특징
이윽고 그 소리가 그쳐서 눈을 떠보았더니, 자기 몸이 거실에 드러누워 있었다. 한생이 문 밖에 나와서 보았더니 커다란 별이 드문드문 보였다. 동방이 밝아 오고 닭이 세 홰나 쳤으니, 밤이 오경쯤 되었다. 재빨리 품속을 더듬어 보았더니 진주와 비단이 있었다.
聲止開目, 但偃臥居室而已. 生出戶視之, 大星初稀. 東方向明, 鷄三鳴而更五點矣. 急探其懷而視之, 則珠綃在焉.
이 인용문을 보면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처럼 이 작품(作品) 역시 몽유록(夢遊錄)의 형식을 빌고 있다. 새벽녘에 꿈을 꾼 것이다. 그런데 그 꿈이 하도 선연하여 꿈속의 물건을 찾아보았더니 용왕에게서 받은 야광주(夜光珠)와 빙초(氷綃)가 그대로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수법은 ‘깨여 사면을 바라보니, 구름과 연기는 천지에 가득하고 새벽빛은 창망하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은 없고 김진사가 적은 책자만 남아 있을 뿐이다[覺而視之, 雲烟滿地, 曉色蒼茫. 四顧無人, 只有金生所記冊子而已].’라 하여 꿈을 깬 후 김진사가 기록한 책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표현처럼 몽유사연(夢中事緣)을 현실에서 긴밀히 연결하려는 표현의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용궁부연록, 결말에 대한 해석
한생(韓生)은 용왕에게서 받은 야광주(夜光珠)와 수초를 상자 속에 고이 간직하여 소중한 보물로 삼고 남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았으며, 이 일로 하여 한생(韓生)은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생각지 않고 명산에 들어갔는데 그 마친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야광주(夜光珠)와 빙초(氷綃)는 한생(韓生)의 꿈속에서 얻은 소중한 선물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용궁 체험의 증거물이므로 현실의 남에게 보여서도 이해되지 못하는 물건이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는 상자 속에 고이 간직하여 보물로 삼았으며 세상의 명리를 등지고 ‘입명산, 부지소종(入名山, 不知所從).’하게 된다.
이러한 작품(作品)의 결말은 작자의 이원적(二元的) 세계관(世界觀)을 그래도 보여준다. 꿈으로 상징되는 세계는 현실세계와 배치될 수밖에 없다. 현실에 맞서는 또 하나의 세계는 몽중의 상량문(上樑文) - 용왕의 환대 – 명주ㆍ빙초 – 장지건상(藏之巾箱)- 부지소종(不知所從)으로 이어진다. 여타의 작품(作品) 결말도 대개 이와 유사한데, 이는 그의 시 가운데서 자주 ‘지여시사괴(志與時事乖)’【梅月堂詩集 1, 「自貽」(註 20)】 또는 ‘루견신세상위여원착방병(屢見身世相違如圓鑿方柄)’【上柳襄陽陳情書(註 22)】이라 하여 세상과 자신의 뜻이 서로 어긋나고, 자신과 세상이 마치 둥근 구멍에 모난 기둥을 박는 것 같이 잘 들어맞지 않았다는 구절 가운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세조정변(世祖政變) 이래 매월당(梅月堂)의 편력은 관서지방(關西地方)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그의 「탕유관서록후지(宕遊關西錄後志)」(1458)에는 자신이 만약 벼슬길을 떨치지 못하였더라면 이 아름다운 산수를 자유롭게 노닐지 못하였을 것이라 하며 관서(關西) 편력을 통하여 150여 수의(守義) 시를 남기고 있다. 거기에는 천마산(天磨山)【烟霞浮靉靆 松檜響凄凉 絶頂非人世 憑虛試欲望(遊天磨山)】, 박연폭포(朴淵瀑布)【蒙崖萬丈何雄哉 上有泓潭千尺深 蟄龍睡起怒不禁 噴出明珠千萬斛(飄淵)】에 대하여 읊은 시도 있다.
최생우진기(崔生遇眞記)와의 유사점
용궁을 박연폭포(朴淵瀑布) 표연(飄淵)으로 설정한 것은 「수궁경회록(水宮慶會錄)」에서 여선문(余善文)이 체험한 해중의 용궁과는 다르나, 후대 기재(企齋) 신광한(申光漢, 1484~1555)이 「최생우진기(崔生遇眞記)」에서 최생이 두타산(頭陀山) 용추(龍湫)를 통하여 용궁에 나아가는 수법과 비슷하다. 「수궁경회록(水宮慶會錄)」에는 광리왕(廣利王)의 초청을 받은 여선문이 용궁에 나아가 신축한 영덕전(靈德殿)의 상량문(上樑文)을 짓는다. 초대연의 참석자로는 광연왕(廣淵王)ㆍ광덕왕(廣德王)ㆍ광택왕(廣澤王)이 등장한다. 미녀들이 등장하여 능파지사(凌波之詞)와 채련곡(採蓮曲)을 노래하고 선문(善文)은 수궁경회시이십운(水宮慶會詩二十韻)을 짓는다. 잔치를 파하자 광리왕은 파려반(玻瓈盤)에 야광주(夜光珠)와 통천(通天)의 서각(犀角)을 담아 글값으로 답례한다.
‘후역불이공명위의 기가수도 편유명산 부지소종(後亦不以功名爲意 棄家修道 徧遊名山 不知所從)’은 ‘기후 생불이명리위회 입명산 부지소종(其後 生不以名利爲懷 入名山 不知所從)’과도 비슷하다. 그러나 「최생우진기(崔生遇眞記)」에서는 최생이 결국 두타용추(頭陀龍湫)를 통해 용궁을 찾아가는데, 거기에는 동선(洞仙)ㆍ도선(島仙)ㆍ산선(山仙)의 삼선(三仙)이 초대되어 있었으며 파연(罷宴) 후 귀가길에는 동선(洞仙)이 주는 연명(延命)의 선약(仙藥)을 받아 학을 타고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미의 ‘기후생입산채약 부지소종 증공노거무주암 다설차사(其後生入山採藥 不知所從 證空老居無住菴 多說此事)’에서 보면 종결법은 같으나 증공(證空)이 늦도록 무주암(無住菴)에 살면서 최생의 체험을 후세에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에서 한생(韓生)과 더불어 초대된 인물은 조강신(祖江神)ㆍ낙하신(洛河神)ㆍ벽란신(碧瀾神)이라고 했다. 조강(祖江)은 한강과 임진강이 합쳐지는 곳이요. 낙하(洛河)는 한강의 속칭이며, 벽란(碧瀾)은 개성부(開城府) 서쪽 삼십리에 있는 나루를 이른다. 그러므로 본 작품(作品)은 송도(宋都)의 명승 박연폭포(朴淵瀑布, 龍湫)를 용궁으로 설정하고 주변의 한강 임진강 등의 제신(諸神)이 한생(韓生)과 어우러지는 용궁세계를 허구화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곽개사(郭介士)ㆍ현선생(玄先生)ㆍ강하군장(江河君長) 등은 조정백관을 이르고, 소운기(掃雲器)ㆍ전모경(電母鏡)ㆍ뇌공고(雷公鼓)ㆍ초풍탁(哨風橐)ㆍ쇄수추(灑水箒) 등은 세종의 천문의기ㆍ측우기ㆍ자격루 등 과학기구를 가리키며 상량문(上樑文)을 청함은 세종께서 시습을 불러 그이 재명을 친시한 것으로 봄은 박성의(朴晟義)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朴晟義, 東峯김시습(金時習)과 『금오신화(金鰲新話)』, 前揭書】.
이처럼 한생(韓生)의 체험을 김시습(金時習)의 성장체험과 대비해보면 거의 유사성이 발견된다. 그리고 용왕이 한생(韓生)에게 부탁한 상량문(上樑文)처럼 김시습(金時習)의 재명을 인정하는 일문으로도 보아진다.
꿈에서 깨어난 후 명리를 떠났다는 것
그러나 작품(作品)을 단순히 한 작가의 자서전적 기록으로 속단해 버릴 경우 그 작품(作品)의 문학적(文學的) 위상(位相)에 손상을 입힐 염려가 있다. 「제전등신화후(題剪燈新話後)」에서 이미 보는 것처럼 「수궁경회록(水宮慶會錄)」이나 「용당영회록(龍塘靈會錄)」 등을 읽은 경험이 이 작품(作品)의 골격을 이루고, ‘夙著異靈 載諸傳奇 國家歲時 以牲牢祀之’에서 보는 것처럼 박연용추(朴淵龍湫)에서 예부터 용신이 있어 이를 국가에서 명절이면 큰 소를 잡아 제사하는 우리 전통적 민속신앙을 전래, 용궁사상과 결부시켜 창작해낸 작품(作品)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한생(韓生)의 용궁 환대는 상대적으로 현실에서의 작자의 소대(疏待)를 의미한다. 꿈을 깨자 용궁에서 받은 선물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꿈속에서 누렸던 환대를 격하할 수 없다는 절대적 가치 부여를 의미한다. 그 후 세상의 명리를 생각지 않고 명산에 들어가 자취를 감추었다는 말은, 현실에서는 비록 패배자가 될지라도 끝까지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세상으로부터의 횡포를 거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趙東一, 『小說의 출현-금오신화(金鰲新話)의 경우』, 韓國文學通史, 권 2, 2005.】.
4. 맺음말
지금까지 『금오신화(金鰲新話)』의 문학적 위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근년에 와서는 『금오신화(金鰲新話)』를 소설문학(小說文學)의 효시로 보아 온 학설에 이의를 제가한 논문도 여러 편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수이전(殊異傳)』나 『삼국유사(三國遺事)』 유편들 가운데서 이미 전기소설(傳奇小說)의 싹을 보기도 한다. 그러나 진술한 바와 같이 조선의 『금오신화(金鰲新話)』가 출현하기까지의 제반 여건들은 매월당(梅月堂)시대를 여는 예비 과정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르면, 역시 본격적 전기작품(傳奇作品)으로서의 『금오신화(金鰲新話)』의 위상을 원상회복할 수밖에 없다.
『금오신화(金鰲新話)』가 『금오신화(剪燈新話)』의 영향을 입었다고 볼 때 그 시간적 격차가 40여년 밖에 되지 않는다【瞿佑가 저술한 『금오신화(剪燈新話)』는 1378년 (洪武 11)의 自序가 있으나, 우리 나라에 들어온 현존본은 1421 년 (永樂 19) 저자 75세시 「重校剪燈新話後序」가 분은 작품(조카 瞿暹刊行)이다. -柳鐸一, 15~16世紀 中國小說의 韓國傳入과 受容, 釜山大 語文敎育論集 10집, 1988.】. 이는 조선(朝鮮)뿐만 아니라 그 후 일본(日本) 가비자(伽婢子) 월남(越南) 전기만록(傳記漫錄) 등에 전기소설(傳奇小說)의 꽃을 피우기에 이르는데, 그렇다면 모방이 아니라 전기(傳奇)적 토양 속에서 각각 전통적 설화(說話)를 바탕으로 독창적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시습(金時習)은 우리 소설문학(小說文學) 사상 작품(作品)을 의식하고 창작활동을 한 최초의 작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는 유교적 사회정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자아와 현실의 어긋남 가운데서 창작을 통해 자신의 뜻을 펼 필요성을 느꼈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이른바 ‘심유적불(心儒跡佛)’의 본의 아닌 방랑을 계속하였다. 현실에서 뜻을 실현하자니 그는 자신을 위장할 수밖에 없었고, 설잠(雪岑)으로서의 위장된 생활을 계속하다보니 결국 유불일치에 이르는 합일의 경지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다. 용장사 깊숙이 들어 앉아 써낸 ‘風流奇話細搜尋’은 곧 김시습(金時習) 자신의 의식세계요 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금오신화(金鰲新話)』는 그 자체로써 일단 완결된 작품(作品)으로 보고자 한다.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는 그 중에서도 백미가 되는 작품(作品)으로 사랑을 주제로 한 인귀교환(人鬼交換)의 명혼소설(冥婚小說)이다.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는 명혼소설(冥婚小說)이면서 몽유(夢遊)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나,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는 이계(異界)편력의 몽유소설(夢遊小說)로서 각각 작자의 유불관(儒彿觀)과 문장관(文章觀)을 표방하고 있다.
『금오신화(金鰲新話)』가 하나의 전범이 되어 후대의 『기재기이(企齋記異)』나 「운영전(雲英傳)」 같은 작품(作品)들이 그 비극적 구성의 일치점을 보이고 있음은 그 영향 관계에서 특기할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참고문헌(參考文獻)
沈慶昊, 『梅月堂 金時習 金鰲新話』, 弘益出版社, 2000
이병주 外, 『漢文學史』, 새문사, 1998
趙東一, 『韓國文學通史』 3 , (株)知識産業社, 2005
참고논문(參考論文)
강진옥, 「금오신화(金鰲新話)와 만남의 문제 古典小說硏究의 方向」, 새문사, 1985.
金容德,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 硏究」, 韓國語文學硏究, 民族文化社, 1983.
金一烈, 「금오신화(金鰲新話) 考察」, 朝鮮傳奇의 言語와 文學, 韓國語文學會, 螢雪出版社, 1976.
金鉉龍, 韓中小說說話比較硏究, 一志社, 1976.
김명순, 『금오신화(金鰲新話)』의 悲劇性, 雨田 辛鎬烈先生古稀記念論文集, 創批社,
朴晟義, 東峯 김시습(金時習)과 『금오신화(金鰲新話)』, 韓國古代小說史, 日新社, 1958.
薛重煥, 『금오신화(金鰲新話)』硏究, 高大 民族文化硏究叢書 15, 1983.
李家源, 『금오신화(金鰲新話)』, 通文館, 1959, 「解題」
李相澤, 「남염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의 道家的 文化意識, 韓國古典小說의 硏究, 中央出版社, 1981.
李崇寧先生 古稀記念 國語國文學論叢, 1977.
李在秀, 韓國小說硏究, 宣明文化社, 1969.
李慧淳, 『금오신화(金鰲新話)』에 나타난 人鬼交換說話의 類型的 考察, 前揭書.
林熒澤, 現實主義的 世界觀과 『금오신화(金鰲新話)』, 前揭書.
鄭炳昱, 崔文獻傳紹介, 國文學散藁, 新丘文化社, 1960
趙東一, 小說의 成立과 初期小說의 類型的 特徵, 前揭書,
崔三龍, 『금오신화(金鰲新話)』의 悲劇性과 超越의 問題, 韓國古小說硏究, 二友出版社, 198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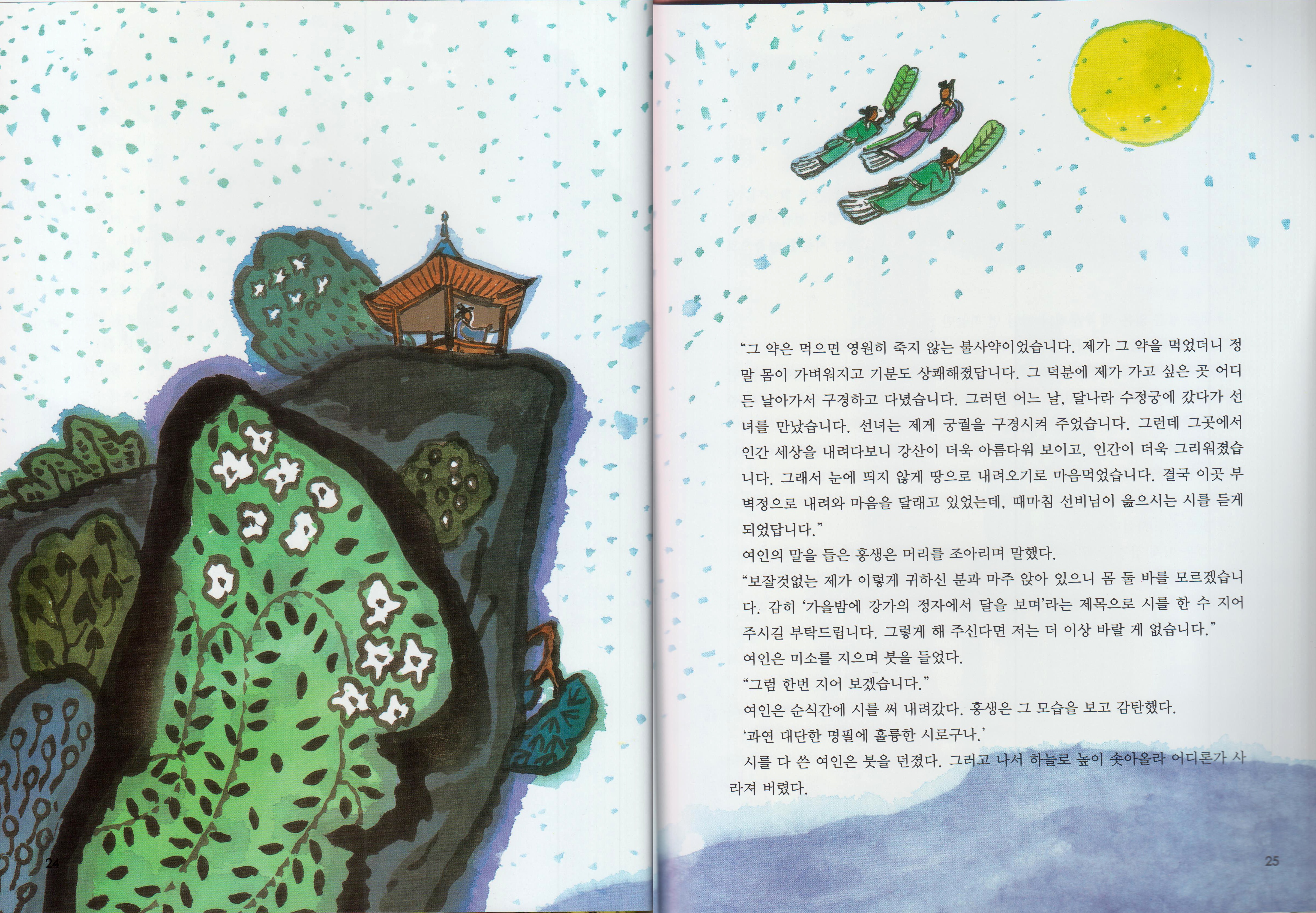 |
 |
 |
인용
'한문놀이터 > 논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심경호 -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고뇌, 『금오신화』② (0) | 2022.10.24 |
|---|---|
| 심경호 -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고뇌, 『금오신화』① (0) | 2022.10.24 |
| 이연순 - 의승기의 주제의식 고찰 (0) | 2022.10.23 |
| 이종묵 - 16~17세기 한시사 연구 (1) | 2022.10.23 |
| 전경원 - 향랑고사를 수용한 한시의 의미 (0) | 2022.10.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