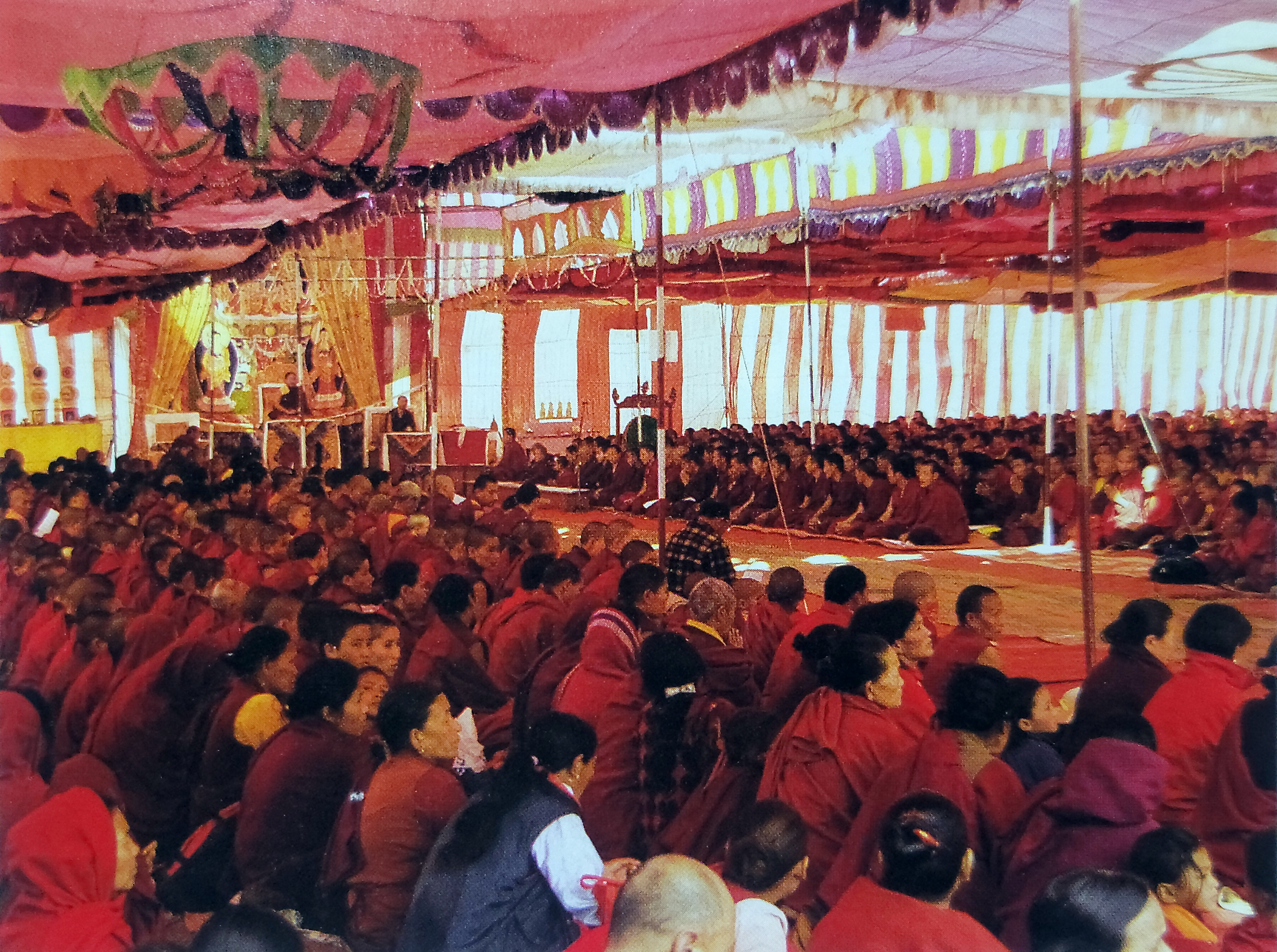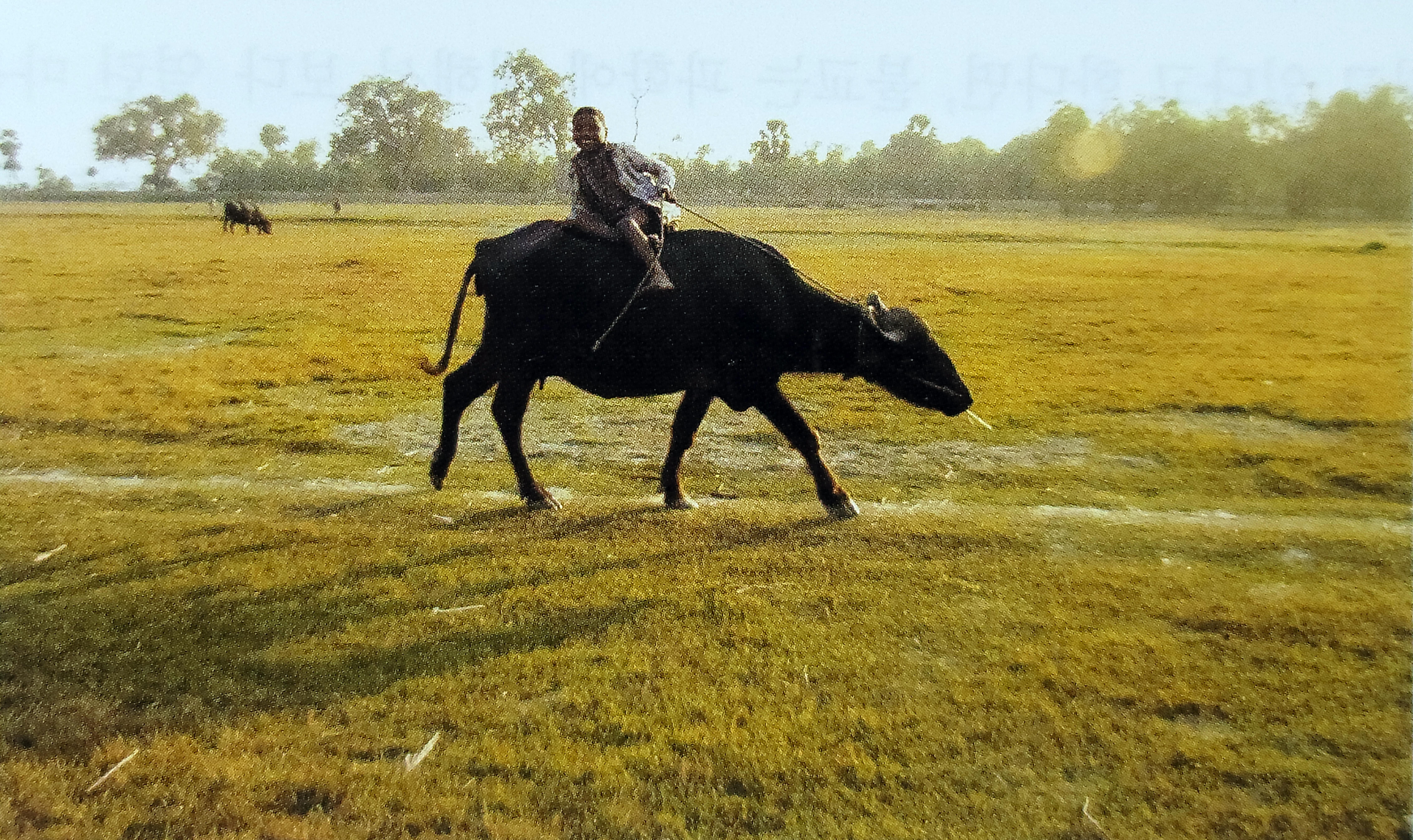기독교는 본래 아시아대륙의 종교
“그런데 지금 논의가 조금 빗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 종교적 진리의 다양성의 관용이 또 다시 종교간의 에반젤리즘의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 문제는 결코 성하께서 답변하신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앞으로 종교간의 충돌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사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한 다양성의 관용 이상의 어떤 종교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뉴잉글란드로 건너간 청교도들보다도 더 순결하고 엄격한 기독교신앙을 가지신 어머님 슬하에서 자라났고 한때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에서 도가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또 한때 절깐에서 승려생활까지 했고 불교경전을 깊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학으로 물려받은 것은 엄격한 유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 세대의 사람으로서 유교경전을 저만큼 폭넓게 몸에 익히고 있는 인간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부디스트(불교인)? 크리스챤(기독교인)? 따오이스트(도학자)? 콘퓨시안(유학자)?…… 사실 저는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문제로써 엄청난 갈등을 겪었습니다. 성하처럼 단일한 색깔의 문명 속에서 단일한 종교적 목표를 향하여 성장하신 분은 저 같은 인간이 지니는 갈등과 고민을 상상은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체득하실 수는 없으실 것입니다. 한 인간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다른 제도종교의 신념의 갈등은 매우 폭력적이며 결코 쉽게 조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아크바르 같은 사람의 시도의 내면에 깔린 고뇌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하를 뵈옵자마자 저는 프레케와 간디의 최근 연구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들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스칼라십의 수준이라든가 생각의 깊이에 완벽하게 동의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들을 가상히 여긴 것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문제되는 것을 다 피해가는 피상적인 종교간의 대화보다는 한 종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본질적인 대화를 가능케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발견된(1945년에 발견되어 근 30여 년의 정리작업을 거침) 나하그 함마하디 영지주의 문서를 들여다 보고 있으면 초기기독교운동이 얼마나 복잡한 갈래의 운동이었는가, 그리고 지중해연안에 산재해 있던 유대인 콤뮤니티벹의 종교적 성향 속에 얼마나 다양한 갈래의 신학체계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기독교의 원래적 모습을 천착해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고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신앙체계의 절대성이 붕괴될 수 있으며, 그 신앙체계 배면의 다양한 인식체계의 정당성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통과 이단의 의미가 역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규정짓고 있는 정통과 이단의 구분근거가 전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의 종교에 대한 진실한 이해를 천착해 들어가면 갈수록 그 종교가 형성되어간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한 형성과정(formative process)에 대한 다이내믹한 고찰을 해보면 해볼수록 하나의 종교 그 자체가 이미 오늘날 우리가 시도하려는 종교간의 대화 이상으로 이미 엄청난 문화ㆍ종교현상의 교류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원래 기독교로서 고존(孤存)한 것이 아니라 수없는 교류 속에서 장구한 세월에 걸쳐 다이내믹하게 그 아이덴티티를 형성해갔다는 그 사실에 눈을 떠야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시불교를 말하려면 베다나 우파니샤드(Upanisad)나 쟈이니즘이나 육사외도 등의 교류된 다양한 체계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듯이, 원시기독교를 말하려면 그노스티시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은 희랍의 올페이즘이나 이집트의 헤르메티카, 그리고 특히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고 후대에 중국에까지 크게 위세를 떨친 마니교, 그리고 이란과 인도에 공통된 신화적 세계관과의 관련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기독교하며는 당연히 서양의 종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로 채택된 이후 라틴 웨스트를 중심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뿐입니다. 기독교는 본래 아시아대륙의 종교며, 소아시아 페르시아-인도로 걸치는 문명권에 깔려있는 신비주의의 소산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라틴 웨스트를 중심으로만 보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의 정신적 지도자들과 많은 교류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만 제 마음 속에서 솔직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의 해석입니다. 신을 인격적 존재로서 이야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비인격적 추상적 진리체계로서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모든 것이 갈려지게 되어있습니다. 신을 추상적 진리체계로서 이야기한다면 모든 종교의 대화는 쉬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모든 종교의 이해를 서로에게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에게서 인격적 존재성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신을 추상적인 진리체계로서 이해하는 척하다가도 결국은 인격적 존재성의 전제로부터 나오는 사유체계로 함몰되어버리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더 깊은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들은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부록 10. 조로아스터교에 대해
조로아스터교의 한 상징인 미트라(Mithra)는 기원전 272년 12월 25일 동정녀 아나히타(Anahita)에게 태어났다. 미트라의 일생은 예수의 일생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예수의 설화보다 훨씬 이전에 성립하였다. 미트라신앙의 보급 때문에 초기 기독교가 쉽게 소아시아 지역에 퍼질 수 있었다. 조로아스터교는 이란의 사산왕조(the Sāsānian) 때 국교로서 위세를 떨치다가 무슬림에게 정복당하면서 핍박을 받고 인도로 망명, 뭄바이에 정착하였다(8~10세기). 인도에서 이들은 구자라트말로 ‘페르시안’을 뜻하는 ‘파르시스’(Parsis)로 불리었다.
배화교 사람들은 놀라웁게 정직하며, 교육에 힘쓰고, 또 사회복지를 위하여 엄청나게 베푸는 미덕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영국식민통치자와 잘 협조되었고 따라서 인도의 뭄바이 상권을 거의 장악했다. 그러나 영국이 떠나면서 힌두의 주체회복 운동에 따라 이들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 현재 5만 명 정도가 뭄바이에 살고 있으나 여전히 부유하고 정결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의 신전에는 외부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사제는 꺼지지 않는 불을 계속 지피고 있다. 불은 최고의 선신 아후라 마즈다(Ahura Mazdā)의 물리적 현현이며 의로움과 진리를 상징한다. 이들은 시신을 발가벗겨 새들에게 쪼아 멕이는 조장의 풍습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화장으로 간소하게 치르고 있다. 배화교 사람들은 종족과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비배화교 사람들과의 결혼을 엄금한다.
그러나 이런 관습은 지금 깨져 나가고 있으며, 지금은 아버지만 배화교 사람이면 입교가 허락된다. 배화교는 선악의 이원론을 명시하는 모든 종교의 원조이지만, 이들은 선업을 통해 악을 물리치는 매우 정직한 전통을 지키고 있으며, 죽은 물체나,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을 멀리하는 생활습속을 지킨다. 니이체의 그 유명한 저작의 주인공, 짜라투스트라(Zarathustra)가 BC 6세기에 이 종교를 창시한 역사적 인물이며, 그 유명한 지휘자 주빈 메타(Zubin Mehta)도 배화교 인도인이다.
▲ 뭄바이 시내 한복판, 배화교(조로아스터교)사원의 입구에 서있는 화라바하르(Faravahar) 성상.
불교와 인간해방
“우리가 지금 종교간의 대화를 문제삼고 있는 것은, 종교가 근원적으로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제도 속으로 인간을 구속시키는 데서 오는 갈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전쟁이라는 인간의 참혹한 죄악상으로 발전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민족주의적 제국주의의 탐욕을 가장한 마오이스트들의 침략구실일 경우에 한해서 성하의 혐오감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원적으로 종교가 인류의 구원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류에게 종교가 있어서 좋은 것인가? 없어도 좋을 것인가? 저는 인류에게 종교가 없을 수 있다면 그 나름대로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가 분명 있겠지만, 최소한 대규모 전쟁과도 같은 상당히 본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흔히 고등종교ㆍ저등종교로 나누기도 하지만, 인류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은 저등종교가 아닙니다. 저등종교는 샤마니즘과도 같이 토속적인 생활습관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의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의 저능성은 오히려 우리가 고등종교라고 부르는 권력화된 제도종교에 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쎈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현재 신교ㆍ구교를 합한 기독교의 세력이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이 지구상에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로부터 우리 논의의 망각하기 쉬운 매우 단순한 전제가 도출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교 그 자체에 대한 정의를 기독교가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교에 대한 어떠한 논의를 해도, ‘릴리젼’(religion)이라는 말을 쓰는 한에 있어서 그것은 모두 기독교식의 사유 속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을 말하는 유신론을 말하든, 이 모든 것이 기독교적 사유가 규정하는 신학의 한 갈래로서 이해되고 논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종교적 논의 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성하께서 50억이 넘는 인류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반신앙인이며 종교를 의식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 둘째는 신앙인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종교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적대심이 없는 사람들, 세 번째는 신앙인이며 수행자며 종교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저는 이 세 부류에 다 속하는 요상한 인간입니다. 저는 종교를 아주 부정적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전혀 종교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 생활을 잘 들여다보면 신앙이 돈독한 수행인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삶의 미덕을 어떠한 종교인보다도 더 충실하게 저의 삶 속에서 구현하고 있다는 자각이 있습니다.”
이때 달라이라마는 매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저는 고독한 인간일 뿐입니다. 저는 기존의 어떠한 종교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식인이며 수행인입니다. 그러나 저의 수행은 오로지 저 자신이 자각하고 자득한 수행이며 기존의 어떠한 방법에도 예속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독한 한 수행자의 입장에서 제가 불교에 대해서 갖는 바램은 불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불교라는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불교에 대한 모든 믿음은 바로 불교가 인간을 종교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류의 모든 고전을 탐색하고, 모든 종교의 성전을 이해하려는 뜻은, 바로 경전의 진정한 이해를 통하여 인간이 경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신념에 있는 것입니다. 경전의 깊은 이해와 해석은 인간이 경전에 대하여 부과시켜 온 부당한 권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데 그 본뜻이 있는 것입니다.”
순간 달라이라마의 얼굴에는 광채가 빛나는 듯했다.
진리 중시의 기독교와 깨달음 중시의 불교
“불교가 인간을 종교로부터 해방시켜준다라는 도올선생의 말씀은 제 가슴을 깊게 후려치는 명언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모두 종교적 신앙을 가져야만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리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종교에 대한 도올선생의 부정적 언급이나 저의 긍정적 언급이나 모두 말장난일 뿐 그 근원에 있어서는 상통되는 어떠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예수의 신비가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그것이 근원적으로 ‘역사적 예수’에 관한 논의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를 탐색하려는 집요한 노력들이 좀 황당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아무리 그러한 논의가 치밀하게 전개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전적으로 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교적 신앙의 체계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가장 원초적 출발이 싯달타라는 역사적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싯달타라는 인간이 구현하려고 했던 진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근원적으로 불타의 색신(色身, rūpa-kāya)보다는 법신(法身, dharma-kāya)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색신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법신의 의미를 경감시키지 않습니다. 법신은 법이며, 법은 곧 진리입니다.
도올선생의 말씀을 들으면서 재미있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즉 기독교의 예수에 관한 논의가 너무 지나치게 사건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고 갈릴리 바다를 잠재우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였으며 로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부활하였다 하는 범상치 않은 사건 때문에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그러한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타가 행한 어떠한 기적적 사건 때문에 불교가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좋은 것입니다. 불교가 문제삼는 것은 불타라는 인간이 우리에게 전한 법이며 진리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도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것 자체로 무오류적이고 고정불변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의 한 계기로서의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하나의 법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표현을 썼습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기독교와 달리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경전에 대해 전혀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대장경 그 모두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들의 깨달음의 기록이며, 깨달음을 유발시키기 위한 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가 유일신관을 포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이해 자체를 사건중심에서 법(다르마) 중심으로 그 축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의 이동이 없으면 기독교는 앞으로 급속도의 쇠락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최소한 로마제국의 권력이 날조해낸 리터랄리스트의 사기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생명력을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과학의 시대에 있어서 동정녀탄생이나 육신부활의 비인과적인 신화적 사태를 사실로서 강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화는 신화로서 족한 것이 아닙니까? 이미 서구사회에 있어서 기독교는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상류층이나 지식인이나 지도층보다는 흑인이나 소외된 보수세력의 지지기반 속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샤마니즘적 성향이 강렬한 제3세계나 기독교 전통을 새롭게 수용한 신생국가에서 오히려 그 발랄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교가 그 발상지인 인도에서는 암베드까르 박사의 개종운동이 상징하듯이 최하층민인 불가촉천민의 종교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한국에서도 개화된 상류층의 트레이드 마크가 기독교일 수는 있어도 불교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재미있는 현상은 미국사회에서는 이러한 이미지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사회에서는 오히려 하층부의 사람들은 햄버거나 스테이크를 잔뜩 먹고 뚱뚱하며 기독교의 영성에 사로잡혀 있는 반면, 개명한 상층부의 사람들은 비만형의 인간들이 별로 없고 채식주의자들이 많으며 불교도라는 트레이드 마크를 달고 일본 스시집에를 잘 간다는 것이죠. 아~참! 여기와 보니깐 인도에서는 천민들은 비만형의 사람들이 전무한데, 아름다운 샤리를 걸친 상층부의 사람들은 예외없이 뚱뚱하더군요. 하여튼 불교는 홀쭉한 사람들을 잘 따라 다니는 것 같습니다.”
▲ 암베드까르의 흉상과 그를 사랑하는 하리잔 아동들, 아우랑가바드의 한 동네에서
부록 11. 불가촉천민을 위해 헌신한 암베드까르
암베드까르(Bhimrao Ramji Ambedkar, 1891~1956)는 불가촉천민(the Untouchable)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탄생된 인도공화국의 초대법무장관을 지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의 헌법을 기안했다. 그러니까 인도가 영국식민지에서 벗어나 근대국가로 태동되는 과정에서 인도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카스트의 문제를 한 몸에 구현하고 투쟁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불가촉천민 부모의 14번째 자식으로 태어난 암베드까르는 학교에서 높은 카스트의 아이들에게 굴욕을 당하면서 성장한다. 그의 아버지는 인도군대의 장교였다. 암베드까르는 봄베이에서 대학을 나오고 뉴욕의 콜럼비아대학에서 경제학박사를 획득했고 그 뒤로 영국과 독일에서도 계속 공부했고 변호사자격을 획득했다. 1924년 그는 봄베이에서 변호사활동을 개시하면서 불가촉천민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복지활동과 저널운동을 전개하였다. 1927년에는 불가촉천민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티야그라하(Satyagraha, 진리파지운동)를 전개하였고 1937년, 봄베이 고등법원에서 불가촉천민의 권리와 관련하여 승소하는 쾌거를 올렸다. 암베드까르는 간디와 함께 불가촉천민(Untouchables)이라는 이름을 ‘하리잔’(Harijans, Peoples of God)으로 바꾸고 공동의 목적을 향해 매진하기로 하였지만 간디와 적지 않은 긴장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불가촉천민의 독립된 선거구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1947년 초대법무장관이 되어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을 불법화시키는 조항을 명시한 인도공화국의 헌법을 기안하였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국회에 통과시키는 데 수완을 발휘하였다. 1951년 인도정부내에 그의 영향력이 배제되는 것을 개탄하고 사임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근대인도사회에 사회평등과 사회정의의 개념을 법적으로 각인시키는 데 기념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56년 10월, 힌두교의 미래에 절망감을 느낀 나머지, 나그푸르(Nāgpur)에서 불가촉천민 20만명과 함께 불교도로 개종하는 제식을 올렸다. 현재 인도사회에서의 불교에 대한 인식은 암베드까르와 밀착되어 있다. 이것은 긍정적인 시각에서 해석되어야 하겠지만, 불교를 불가촉천민의 종교로 낙인을 찍는 부정적인 측면도 강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도 불가촉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 어느 곳에서든지 암베드까르의 흉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택동에게 애도를 표한 달라이라마
나의 어조에 담긴 절묘한 새커즘(Sarcasm, 빈정거림, 풍자)을 달라이라마는 정확히 다 파악하는 듯했다. 그러면서 유쾌하게 깔깔 웃었다. 이런 말을 하며는 좀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에 로마교황이 나타나면 도로변에 마중 나온 사람들은 그 대부분이 비대한 흑인들이나 삶에 지친 서민들의 얼굴이다. 그러나 달라이라마가 맨하탄에 한번 나타나면 센트랄 파크의 잔디밭을 메우는 엄숙한 수만의 군중은 75%가 대학원 졸업생들이라고 한다. 현재 미국 불교도의 60%가 박사며 의사며 변호사며 회사고위간부 등, 프로펫셔날(professional)들이 차지한다. 미국사회의 인텔리겐챠(intelligentia, 지식노동자)들은 더 이상 기독교로부터 새로운 문명의 젖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정신적 빈곤이 찾아오게 마련이고, 여유로운 정상적 생활의 루틴을 가진 사람일수록 새로운 정신적 문화를 갈망한다. 마돈나가 한번 오프라 윈프리쇼에 나와 우리 삶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요가만한 것이 없다고 몇 마디 하자마자 미국전역의 슈퍼마켄에 요가테잎이 깔리는 추세인 것이다. 그리고 티벹불교는 비쥬알하게 매우 화려하다. 티불교는 미국사회에 매우 강력한 세력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새로운 정신운동의 구심점에 살아있는 각자(覺者) 달라이라마가 있다. 그 달라이라마가 지금 내 앞에서 깔깔대고 웃고 앉아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화는 매우 이론적이고 진지했지만 그는 나를 아무런 격이 없이 대해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대화에 취해서 점점 친근한 감정 속으로 빨려들어 가고 있었다. 이때 나는 갑자기 재미있는 질문을 던졌다.
“모택동 주석이 서거했을 때 성하께서는 심심의 애도를 표시했다는 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어찌되었든 모택동(毛澤東, 1893~1976)은 중국사람들에게는 주체적인 역사를 회복시켜준 은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구열강의 침략으로 파멸의 위기에 간 중국을 공산운동을 통해 다시 근대국가로 변모시킨 장본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세계사적 위인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성하의 자서전에 보면 그래도 모택동에 대한 인상은 그리 나쁜 것 같지는 않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은래(周恩來, 1898~1976)는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모택동이나 주은래나 우리 티벹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하여 헌신하는 맑스주의자들이 아니었으며 철저한 국가주의자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가장한 쇼비니스트(chauvinist)들이며, 탐욕스러운 제국주의자들이며, 편협한 광신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의 마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렇게 고난의 장정(長征)의 투쟁을 거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꿈이었고 이상이었던 공화국을 세우자마자 갑자기 서구열강의 제국주의보다 더 악랄한 제국주의자들로 표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택동은 사람이 좀 무뚝뚝하고 우직하지만 진실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주은래는 ‘츄우 앤 라이’(Chew and Lie)라는 별명대로, 항상 생글생글 웃고 친철하지만 차갑고 교활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두 사람 사이에 우열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인간세에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탐욕의 화신들일 뿐이지요.”
“그런데 왜 애도를 표시하셨습니까?”
“제가 어찌 이 자리에서 가장된 감정의 위선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중국지도부의 만행으로부터 얻은 심적 고통을 어찌 다 여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매우 적나라한 현실 속에서 일개의 약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약자가 할 수 있는 적나라한 결론은 그저 참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제가 아무리 불교의 가르침을 잘 배웠다 해도, 저는 포탈라궁 속의 관념에 갇힌 제식의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둘러싸고 있었던 티벹의 고위관료들은 무능했고 무책임했고 세상사에 어두웠습니다. 대승불교의 실천덕목으로서 6바라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 하나가 인욕이 아닙니까? 이 인욕의 이야기가 수없이 본생담(자타카, Jātaka)에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설화였습니다. 어찌 제가 인생 속에서 양팔이 잘리고 양다리가 싹둑 베어지고 코가 베어지는 그러한 끄샨띠바딘 리쉬(Kṣāntivādin ṛṣi, 忍辱仙人)【끄샨띠바딘 리쉬(Kṣāntivādin ṛṣi)는 ‘인욕선인(忍辱仙人)’이라는 뜻이며 유명한 본생담(자타카, Jātaka)의 주인공이다. 물론 싯달타의 전신 중의 하나다. ‘찬제파리(羼提波梨)’로 음역된다. 그 이야기는 나의 『금강경 강해』를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도올 김용옥의 금강경 강해』(서울 : 통나무, 1999), pp.278~281.】의 인육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중국의 지도부는 저에게 진정한 인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에게 참혹하게 가르쳐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핍박을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고 오늘의 평온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택동(毛澤東, 1893~1976)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의 적이 영원히 적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서운 적이라 할지라도 그 적으로 인해 나에게서 생겨나는 선을 더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귀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른뺨을 치며는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마 5:39~40)는 아가페적인 신의 사랑의 실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행무상(諸行無常)이나 제법무아(諸法無我)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솟구치는 그러한 힘이지요. 내가 참으로 분노를 느끼는 순간, 고통과 굴욕과 진노의 불길에 내가 휩싸여 있는 그러한 순간에는 적은 적으로만 보이고, 그것은 절대적인 적이며 영원히 용서될 수 없는 그러한 실체로서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항상 이러한 탐ㆍ진ㆍ치(貪瞋痴)의 감정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진노의 불길 속에서만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생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노가 강렬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진노가 가라앉은 고요한 마음의 평화나 용서를 베푸는 그러한 감정의 전환상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전환상태를 귀하게 키우려고 하지 않고 다시 진노의 불길 속으로 자신을 채찍질해 들어가는 불행한 자멸의 길을 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 적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은 항구불변의 실체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곧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아(無我)지요. 그렇게 되면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행이 무상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어려서부터 그토록 암송만 하고 살았던 이러한 진리를 우리 티벹민족이 당면했던 극도의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진노 속에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나는 이성의 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솔직히 말해서 나보다 영어가 좀 딸리는 편이었다. 그러나 그의 영어는 매우 듣기가 편했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단어선택이 정확했고 문법적으로도 정확했고 간결했다. 그런데 이 대목에 와서는 심한 제스츄어(gesture)를 쓰면서 아주 열심히 공들이면서 표현을 했다.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의 고귀한 체험을 나에게 전달해주려는 애틋함이 있었다. 나는 조선에서 온 한 무명(無名)의 인간이다. 그런데 그러한 한 무명의 인간을 앞에 놓고 온갖 정성을 쏟는 그의 진실된 모습은 정말 나를 감동시켰다. 130만의 티벹인민의 처참한 학살의 현장을 눈에 그리면서 나는 그의 말의 진실성과 깊이를 되새겨보곤 했다. 그가 말하는 인욕의 의미는 엄청난 고통의 심연에서 우러나온 말임이 분명했다. 그런 말을 할 때에는 그의 눈가에는 매우 비극적인 기운이 서렸지만 정말 쾌활하기 그지 없는 얼굴이었고 나의 고향집 툇마루 앞에 활짝 피는 백목련의 모습보다 더 화창한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로 마감을 했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자비로움 속에서 끝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욕(kṣānti)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 대한 복종이나 굴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택동(毛澤東, 1893~1976)이 지은 업은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택동(毛澤東, 1893~1976)을 빌미로 중국민족이 우리 티벹민족에게 저지른 악업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시간성이 결여된 아가페 이론과 불교의 이성적 이론이 다른 점입니다.”
▲ 중국인민해방군에 의하여 파괴된 유서깊은 간덴사원(dga' ldan)의 폐허. 간덴사원은 쫑카파가 그의 제자 달마린첸과 함께 1409년에 창건한 겔룩파의 가장 권위있는 성전이었다. 『유배된 자유』에서.
야크를 탄 세계정신
이 부분에서 그의 말씨는 매우 무거웠고 매우 또박또박했다. 나는 짓궂게 또다시 물었다.
“모택동(毛澤東, 1893~1976)에게 또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너무 많지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는 호탕한 웃음을 지었다. 나도 그의 호탕한 웃음을 따라 같이 웃을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우리를 떠돌이 신세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 인류에게 불법(佛法)이 전파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티벹 사람들에게 한없는 고통을 주었을지언정, 그는 우리 티벹인민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과거의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사의 흐름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광막한 고원의 적막 속에 갇혀있다가 바깥세상을 배우게 된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헤겔은 그의 역사철학을 논하면서 보편사(Universal History)를 지배하는 이성의 간계(List der Vernunft, Cunning of Reason)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헤겔은 인간의 역사를 절대정신의 자기실현과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절대정신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사적 개인(World-historical Individual)을 수단화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사적 개인은 물론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절대정신의 간교한 계산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착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사적 개인의 자유의지적인 목적과 절대이성의 목적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세계사적 개인의 자유의지적 목적은 절대이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택동(毛澤東, 1893~1976)은 중국이라는 국가주의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티벹이라는 자주민족의 한 국가를 말살시키는 악업을 지었을지 모르지만, 세계정신은 바로 그러한 악업을, 티벹 역사에 함장되어 있는 보편적 가치를 인류에게 드러내기 위한 보편사적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헤겔은 독일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나에 입성하는 나폴레옹을 보고 ‘저기! 말탄 세계정신이 간다!’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1814년 4월 나폴레옹이 실각하고 엘바섬으로 귀양갈 때 매우 슬퍼했습니다. 위대한 세계사적 천재의 스펙타클이 범용에 의하여 파괴되는 비극이라고 개탄해하였던 것입니다【Peter Singer, Hegel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p.1~2. J. N. Findlay, Hegel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pp.330~1.】.
제가 지금, 여기 달라이라마 당신을 놓고 ‘야크를 탄 세계정신이 여기에 간다!’라고 외친다면 불경이겠습니까?”
“도올선생님은 말씀을 참 재미나게 하시는군요. 나는 도올선생처럼 그렇게 깊게 서양철학공부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사를 그렇게 조작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헤겔의 말은 결과적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도들은 인류의 역사가 어떤 거대한 초월적 실체에 의하여 계획된 대로 움직여간다는 거시적 사관을 거부합니다. 즉 그러한 섭리적 사관은 무아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또 다시 제국주의적 탐욕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론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무한한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택동(毛澤東, 1893~1976)에게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으로 인해 오히려 인류에게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소박한 명제 이상의 의미부여는 좀 위험합니다.”
▲ 룸비니에 있는 아쇼카 석주에 새긴 명문 지금도 명료하게 읽을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에게 사랑을 받는 우리의 왕 피야다쉬(Piyadashi, 아쇼카왕의 다른 이름)는 대관 20년 되던 해에 이곳을 직접 순행하시었다. 붓다 샤캬무니는 이곳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성지에 돌로 난간을 만들고 석주를 세운다. 세존께서 이곳에 태어나셨으므로 룸비니 마을에는 세제감면의 혜택을 부여한다. 보통의 1/8만 징수한다.’
이로써 아쇼카 석주가 마우리야왕조의 사회경제사적 기반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세계사 전환의 계기
“깨우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헤겔의 언급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는 본시 인도의 종교입니다. 현재 불교는 인도 자체에서는 괄목할 만한 족적을 남기고 있지 않지만, 대승불교ㆍ밀교를 포함해서 모든 불교의 원형은 분명히 인도문명에서 잉태되고 장육(長育)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잉태되고 성장한 이 인도라는 토양은, 드라비다족으로 추정되는 원주민의 문명을 잠시 도외시하고 이야기하자면, 인도-유러피안어군에 속하는 산스크리트어를 조형으로 하는 인도 아리안어족의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태까지 논의한 초월적 종교의 모든 원형은 함족ㆍ셈족어군(Hamito-Semitic languages)의 문명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함족ㆍ셈족어군(Hamito-Semitic languages)은 ‘Semito-Hamitic,’ ‘Erythraean,’ ‘Afro-Asiatic,’ ‘Afrasian languages’로 불리기도 한다. 그 조형은 기원전 6∼8천년경 사하라사막지역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이다. 이 언어는 세미틱(Semitic), 에집티안(Egyptian), 버버(Berber), 쿠쉬틱(Cushitic), 챠디(Chadlic)의 5개 지류로 분류된다. 원래 셈(Sem)이니 함(Ham)이니 하는 말들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첫째아들과 둘째아들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노아의 맏아들 셈으로부터 앗시리아인, 아라비아인, 아람인, 히브리인이 나왔고, 함으로부터 에티오피아인(구스인), 에집트인(미쓰렘인), 리비아인, 가나안인이 나왔다고 얘기되지만 이 모두가 정확한 구분근거를 가지는 학설은 아니다.】.
결국 유대교ㆍ기독교ㆍ이슬람교가 모두 하나의 언어풍토의 동일한 신의 계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인도문명은 이러한 초월종교의 신화적 토양과 일찍부터 교류가 된 공통의 문명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황하문명과는 전혀 어족을 달리 하는 문명이며 그것은 중국사람들이 항상 ‘서역’(西域)이니 ‘서방’(西方)이니 ‘천축’(天竺)이니 하는 말로 표현했지만 그것은 동아시아문명권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지금 서양이라고 부르는 복합문명체에 친화력을 지니는 문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싯달타라는 기적적인 역사적 개인은 그러한 토양의 공통분모를 완전히 벗어나는 새로운 발상을 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그러한 공통의 문명기저(인도ㆍ유러피안어족 + 하미토ㆍ세미틱어족)의 어떠한 종교적 언어로도 인수분해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패러다임의 형성은 아리안 이전의 토착문화(pre-Aryan indigenous culture)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아리안계 국가주의에 저항하는 토착적인, 혈연중심의 종족사회(=씨족공동체)의 가치체계와 관련지어 집요하게 추구해 들어간 명저가 미야사카 유우쇼오의 하기서이다. 宮坂宥勝, 『佛敎の起源」, 東京 : 山喜房, 1987.】.
그러나 이 패러다임은 결코 쉽게 이해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종교가 아닌 종교였으며, 구원이 아닌 구원이었으며, 복음이 아닌 복음이었으며, 신이 아닌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패러다임은 기나긴 역사의 시간을 요구하는, 너무도 인류의 이성의 발전단계를 일찍 뛰어넘은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도저히 이 불교를 수용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쇼카 왕의 그러한 대규모의 노력도 결코 불교를 인도라는 토양에 정착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카스트라고 하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었지만 이것은 카스트만의 문제가 아닌 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의 모든 방면에 있어서 혁명을 요구하는 너무도 거대한 과제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불교가 세계문명의 윤회바퀴 속에서 거대한 도전을 시도한 것이 중국문명과의 해후였습니다. 이 불교와 중국문명의 해후는 참으로 인류사에 유례를 보기 힘든 양대 독립문명간의 대규모적 융합이었고, 그 융합은 신유학(新儒學, Neo-confucianism)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조 등 그 나름대로 엄청난 복합화합물들을 창조했지만, 중국문명이 서구문명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 나름대로의 유기체적 사명을 종료했던 것입니다. 즉 중국불교는 정확하게 대승불교라고 하기보다는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 생명과 성격을 가지는 중국불교일 뿐이며, 그 중국불교는 이미 명ㆍ청시대를 거치면서 쇠락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문명 속에서의 불교는 당(唐)대의 극성기를 지나 꾸준히 쇠락의 일로를 걸으면서 그 나름대로의 유기체적 시간을 종료한 것입니다. 이 중국불교의 대표적인 두 적자가 한국불교와 일본불교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국불교의 특수성은 제가 얘기를 보류하겠습니다만, 일본불교의 경우 진정하게 살아있는 수행과 신앙의 터전으로서의 불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불교는 어디까지나 신토이즘(Shintōism, 神道)이라고 하는 영원히 떼어 버릴 수 없는 자체 샤마니즘의 토양 위에서만 배접된 것이며, 그나마 에도시대를 거치면서 반기독교정책으로 인하여 모든 테라(절)는 일종의 관청같은 것으로 변모하여 버렸습니다. 일본의 현실적 불교는 일종의 형해화된 대처승들의 제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일본불교의 위대성은 학문적으로 불교가 세계화될 수 있는 엄청난 토양을 창조했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불교의 가치는 종교적 실천에 있다기 보다는 탁월한 학문적 업적에 있습니다. 세계불교의 연구는 모두 일본학자들의 업적에 신세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수행불교로서의 오리지날한 불교의 면목을 보유하고 있는 문명은 현재, 한국ㆍ미얀마ㆍ스리랑카ㆍ티벹 정도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절은 북전불교로서는 민중의 신앙 속에서 살아있는 유일한 수행의 도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 한국ㆍ미얀마ㆍ스리랑카ㆍ티벹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약소국이며, 세계사의 주류를 리드하고 있지는 못한 주변문명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불교의 최고경전이라 할 수 있는 『팔리어삼장』(Pali Tipitaka)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아쇼카왕의 파탈리푸트라 제3결집 경에는 대강의 모습이 형성된 것이고 그것이 스리랑카에 전해져서 문자로 기록된 것은 대강 기원전후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사회에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19세기 후반 이 지역으로의 대영제국의 진출에 따른 제국학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파우스뵐(V. Fausböll)이 학술적 원전으로서의 『법구경』을 출판한 것이 1855년의 일이었고, 리즈 데이비즈(T. W. Rhys Davids)가 런던에 팔리성전협회(Pali Text Society)를 설립한 것이 1881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학자들이 이미 1930년대에 이 팔리어삼장을 『남전대장경』이라는 이름으로 완역하여 출간하였습니다. 70책의 방대한 분량이지요. 저는 최근 이 일역 팔리어삼장을 구입하여 미친듯이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역대장경에만 의존하여 이해하던 불교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생생한 원시불교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팔리어삼장을 읽으면서 2천여 년 동안 인간의 때가 묻지 않은 채 어느 심원한 고적 속에서 숨쉬고 있던 찬란한 보석을 들여다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의 총체적 모습이 본격적으로 인류에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기부터 이며, 그것은 팔레스타인에서 탄생한 기독교가 2ㆍ3세기의 초대교회운동을 거쳐 313년 로마에서 공인을 받은 것에 비유한다면, 불교의 경우, 그러한 초대교회운동이 실제로 2500여 년을 소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시아대륙에서 태어나 천하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세계사의 주류로 일찍 접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두 밀레니엄의 위용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불교가 서방세계에 접목되어 세계사의 주류에 접목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 두 밀레니엄의 바톤을 이어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약소민족의 약소그룹의 기독교운동이 이방인의 사도, 사도바울에 의하여 먼저 소아시아ㆍ아테네에 걸치는 헬레니즘세계에 전파되었고 그 여력을 휘몰아 드디어 로마로 접목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한국ㆍ미얀마ㆍ스리랑카ㆍ티벹과 같은 약소국가에서 그 원시적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불교가 미국이라는 세계사의 주류의 정신적 토양을 일궈내기 시작한다면 인류사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미국은 잉글란드의 적자로서 태어난 뉴잉글란드로부터 시작된 신생문명이며, 그 문명의 정신적 기저를 퓨리타니즘으로부터 출발시켰지만, 이미 나다니엘 호돈(Nathaniel Hawthorne, 1804~64)이 그리고 있는 그러한 퓨리타니즘(puritanism)의 정신은 거의 소멸되었으며, 그 정신적 공백을 20세기 프래그머티즘(pragmatism)과 같은 사조가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불교이념을 바르게 소화해낸다면 인류문명의 새로운 정신적 리더십을 창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가 자신들의 토속적 신앙형태를 버리고 이방인의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문명을 구축했던 것과도 같은, 어떠한 새로운 세계사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모우먼트(moment)에 모택동(毛澤東, 1893~1976)이 티벹의 승려들을 전세계를 향해 내몰았다고 하는 사건은 단순히 우연적인 계기로만 해석되기에는 너무도 거대한 인류사의 아이러니가 매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달라이라마 당신을 야크 위의 세계정신이라고 말한 그 표현이 어찌 지나치는 죠크에 지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세계 정신사의 거시적 관점에서 본 하나의 필연적 길목에 성하와 티벹인민들의 고난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무거운 책임감이 성하와 성하의 고난을 같이 해야 할 인류의 지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 달라이라마의 고향 암도는 수제비 음식으로 유명하다. 수제비를 만들고 있는 티벹사람들, 룸비니 티벹사원에 모여 법회중인 승려들.
불교는 과학이다
달라이라마는 내 말을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들어주었다. 그리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나에게 던졌다.
“서양인들에게 불교가 아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사실 달라이라마가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 잘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몸소 그런 방면에 있어서 체험적인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서구인의 정신적 위기,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 빈곤 등등의 클리쉐(cliché)를 되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달랐다.
“우선 제가 충분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사실 서양인들에게 불교가 아필된다, 이런 말을 근본적으로 하기가 싫습니다. 지금 동양과 서양, 이런 구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일어난 불교가 서양에 전파된다, 이런 말도 매우 진부한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동ㆍ서양의 구분근거가 무색할 정도로 정보가 교류되고 공간의 국소적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불교의 세계사의 주류문명에로의 접목이라는 사건은 공간적인 이동이라기 보다는 인류사 전체의 시각적 이동을 두고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에서 서로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2천여 년의 인류사의 주축이 21세기를 접어들면서 새로운 주축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류사는 여러 문명의 흥기와 소멸에 의하여 이어져 내려왔지만 뭐니뭐니 해도 인류사의 주축문명의 흐름을 장악한 것은 그레코-로망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레코 로망을 중심으로 한 계몽주의(Enlightenment) 전통이외로도, 가치있고 또 화려한 많은 고문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독 그레코로망-르네쌍스-계몽주의의 전통을 인류사의 주축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이라고 하는 인류의 물질환경을 지배하는 강력한 연역적 사고(deductive thinking)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 전통을 선취한 문명은 모두 20세기 제국주의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과학이라는 놈은 기독교 전통의 유일신관을 전제로 해서 태어난 변종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 우주에 대하여 초월적 창조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실제적 의미는 이 세계의 입법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뜻과 상통합니다. 즉 신은 이 우주의 운행의 법칙체계를 입법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르네쌍스의 과학자들은 이 우주에 대한 신의 입법체계를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자연의 법칙을 알아내려는 과학의 노력은 애초에는 유신론적 입법체계와 결부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이러한 방면의 매우 포괄적이고 계발적인 논의는 죠세프 니이담의 다음 글을 참조하는 것이 좋다. Joseph Needham, ‘Human Law and the Laws of Nature in China and the West,’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pp.518~583.】. 그것이 르네쌍스의 과학이라고 하는 위대한 근대문명의 단초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불교의 다르마(Dhama)는 기독교적 신의 법칙체계(divine legislature)보다 훨씬 더 내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윤리적 목적의 지배를 받았고, 또 결정적인 것은 희랍인들의 수학과도 같은 정교한 토톨로지의 연역적 언어를 그 바탕으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의 운명은 점점 유신론적 체계로부터 독립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의 법칙의 발견은 최초의 작동자로서의 신이나 입법자로서의 신의 전제가 없이 우주 자체의 인과법칙에 따라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따라서 과학은 근원적으로 신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는 합리성의 체계로서 자기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세과학은 인류에게 무신론과 상식에 대한 무한한 신념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근대인(Moderm Man)의 이성(Reason)은 초월적인 창조주에로의 복속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즉 과학이라는 기독교의 사생아는 더 이상 기독교라는 아버지와의 핏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자신이 독자적인 삶을 개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인류정신사의 패러다임 쉬프트는 이 과학의 자기이해의 패러다임 쉬프트와 보조를 맞추는 사건이라는 것이며, 기독교로부터 불교에로의 세계사적 전환은 바로 이러한 과학의 보편화가 인류에게 공헌해온 정신적 토양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싯달타의 정신혁명은 2500년 후에나 세계 기독교가 성취해놓은 과학문명의 새로운 정신적 토대를 계기로 겨우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기의 성격을 우리 동양사람들보다는 서양사람들이 보다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다고 하는 현상이, 곧 요즈음 미국이나 유럽에서 식자들에게 불교가 아필되고 있는 현상의 진면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올선생님의 통찰은 정말 제가 가슴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정말 어린애처럼 나의 말을 좋아했다. 그리고 나에게 강력한 정신적 유대감을 표시해주었다.
▲ 생전에 달라이라마님과 눈 한번 스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두손 모아 기다리는 티벹의 군중.
불교와 정신적 패러다임
나는 물었다.
“불교는 무신론(atheism)이라는 저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물론이지요! 유신론의 전제는 반드시 이 세계에 대하여 이 세계 밖에 있는 창조주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도 인간 밖에 구세주(Savior)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불교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며 구세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우주 밖에 있는 초월적 존재자로서의 신의 개념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불교는 분명한 무신론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과학의 힘을 믿는 모든 상식인들은 그 상식의 논리에 철저하기만 한다면 모두 무신론자(atheist)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의 종교인들은 무신론하면 아주 나쁜 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무신론은 모든 진정한 합리성의 기초이며 근대적 삶의 기본요건입니다. 무신론자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근대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에게는 무신론의 종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신론 그 자체가 하나의 심오한 신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과학이라는 인과 세계의 신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영성(spirituality)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에 제는 21세기 인류사의 정신적 패러다임 쉬프트가 불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댓스 라이트’(That's right.)라는 말에 환희에 가까운 액센트를 주면서 나의 말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보충설명을 했다.
“불교는 창조주도 구세주도 초월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상(meditation)이라고 하는 종교적 수행방법을 제시하며, 고통으로부터의 해탈(解脫, mokṣa)이라고 하는 구원(salvation)의 윤리를 제시하며, 내세(next life)라고 하는 윤회의 이론을 제시합니다. 불교는 신이 없이도 인간에게 무한한 영성(spirituality)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교는 엄연한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의 성립 요건에 유신론이 필요충분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중요한 문제를 발견합니다. 서양인들이 불교에 귀의한다고 해서 불교라는 종교적 제도(institutional religion)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카톨릭이나 프로테스탄티즘의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단지 영성(spirituality)의 개발이나 제고를 위하여 불교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가 무신론이고 또 서양적 의미에서 종교가 아닌 이상, 종교적 교리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이도 명상이나 마음의 수련을 위해 불교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에반젤리즘의 논의 속에서 이미 충분히 토론한 것이지만, 불교는 결코 자신의 특별한 제도를 타인이나 타문화에 강요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용자 자신의 풍토나 습관이나 성향이나 기질에 맞추어 변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교는 티벹에서는 티벹불교가 되었고, 중국에서는 중국불교가 되었고, 일본에서는 일본불교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한국불교가 되었습니다. 로마교황청과도 같은 중앙통제력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까지도 자유롭게 변용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저는 티벹불교를 세계에 전파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에 가면 그것은 미국인들의 기질과 습관과 실제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식적인 측면에서 일양(一樣)적인 기준을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미국인들 자신의 판단에 의한 새로운 승가의 발전을 장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핵심적 교리는, 아무리 우리가 해석의 자유를 허용한다 할지라도, 결코 훼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다르마며 진리입니다. 그리고 일단 불교에 심취한 사람은 아무리 그가 타신앙체계를 보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합적인 믿음체계(integral system)를 구축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 소치는 아이. 인도의 매력은 바로 우리주변에서 사라져 버린 이런 광경의 정취 때문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를 빈다. 제백석의 그림과도 같은 한 폭
지혜와 지식
달라이라마의 논리는 매우 명료했다. 나는 이어 인간의 지식에 관한 또 하나의 주제를 끄집어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불교가 과학적 세계관이나 과학적 가치와 접목됨으로써 앞으로 닥쳐올 인류의 미래를 리드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불교는 과학에 대해서 보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과학적 사유의 본령 속으로 깊게 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ㆍ서양을 막론하고 대체적으로 종교적 지도자들이 너무 무식합니다. 원래 과학이라는 말은 스키엔티아(scientia)라는 라틴어에서 온 표현인데, 그것은 지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의 원래적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그노시스(Gnosis), 즉 영지(靈知)였습니다. 이 그노시스의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서 알케미(alchemy)라는 연금술이 나오고, 르네쌍스과학의 중세적 기초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승려들이 너무 지식과 지혜에 대한 이분법적 사유에 매달려 있으며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무시하려는 고압적 자세로 과학적 대중을 지도하려는 착각증세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티벹의 승려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만, 대부분의 승려들에게서 받는 우리의 인상은 그들의 지식에 대한 천시가 자신의 무지를 정당화시키는 어리석은 업을 지을 뿐 아니라, 과학적 세기를 리드할 수 있는 역량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는 감정과 본능에 치우친 신앙심과 자비심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역설해왔습니다. 궁극적으로 감정과 이성은 인간에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의식체계의 소산이며, 영적 수행에 지성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혜와 지식도 이분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이성은, 지혜나 감성을 위하여 무한히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이지요! 왜냐하면 지혜를 증가시키지 않는 지식은 결코 지식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때 정말 달라이라마님께 엎드려 절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솟구쳤다. 진(眞)ㆍ속(俗)의 이분을 거부하고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외치는 고승이라는 자들이 대중 앞에서 벌이는 많은 추태를 경험해온 나로서는 달라이라마의 이러한 진솔한 태도는 너무도 존경스러운 것이었다. 지식인들이 지식을 통하여 달성하는 경이로운 지혜의 경지, 그것이 단지 지식을 위한 지식의 축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오한 삶의 기쁨을 끊임없이 개척하고 또 그러한 지식의 축적이 가져오는 존재의 건강이 고승의 어떠한 경지보다도 더 광막한 지혜의 바다를 헤쳐나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한국의 선승들은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다. 나가르쥬나도 아띠샤도 쫑카파도 원효도 지눌도 당대의 최고의 과학인이요 지식인이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때로 스님에게서 보다 첨단과학자들에게서 더 많은 깨달음과 불법을 얻고 있는 것이다.
▲ 아우랑제브(Aurangzeb)는 샤 자한(Shah Jahan, 1592∼1666)과 뭄따즈의 셋째 아들이다. 그의 삶은 무굴 최고의 영화와 몰락을 동시에 구현했다. 데칸 아우랑가바드에 자기 부인의 화려한 묘를 지었다. 내 눈에는 이 비비까(Bibi-ka-Maqbara)가 따즈 마할보다 더 아름다웠고 완성도가 높았다. 그러나 자신의 묘는 관 하나 이외에 일체의 뚜껑을 가리지 않게 했다. 그는 1707년 2월 20일 아침기도를 올린 후 『꾸란』을 암송하며 죽어갔다. 그리고 그가 손수 지은 모자를 판돈 4.5루삐만을 장례비용으로 쓰게 했다. 그리고 자신이 베껴 만든 『꾸란』을 판돈, 305루삐를 당대의 무슬림 성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 그것이 그가 소유한 전부였다. 그는 무자비한 제국주의자였으며 극단적 수니파 금욕주의자였다.
잉글리쉬교육과 잉글리쉬 마인드
달라이라마는 다음과 같은 웅변으로 자신의 지식에 대한 논지를 매듭지었다
“나는 달라이라마라는 제도에 의하여 어려서 발탁이 되었고 그래서 고독한 유년기ㆍ청년기를 포탈라궁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티벹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라마 14세로서 공식적으로 즉위하여 포탈라궁의 사자좌에 앉은 것이 1940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나의 나이가 만 5세였습니다. 나는 그때 취임식에 대한 기억조차 별로 없습니다. 보석장식이 달려있고 아름다운 조각이 새겨진 커다란 나무의자에 앉아있었던 기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바깥세계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계기로 시계를 분해했다 조립했다 하는 기계조작의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취미를 통해서 내가 느꼈던 것은 그러한 작은 기계들이 법칙적으로 운행되도록 고안한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지식의 체계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나는 지식에 대한 갈망 속에서 나의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나는 종교적 지도자들보다는 계발적인 과학자들을 만나기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바람이라는 현상에 대하여 신화적 인식을 가지고 공포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기압의 차이에 의한 기류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너무도 많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되고 또 바람이라는 현상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이성을 통하여 이렇게 과학적 지식을 개발한 이유는 바로 인간의 삶을 인과가 파괴되는 신화적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며, 인간이 보다 합리적으로, 즉 합다르마적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적 지식이 또 다시 인류를 위협하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업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해서 지식 그 자체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폄하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곧 지혜라는 신념은 나의 체험적 소산이며, 그러한 생각에는 동요의 여지가 없습니다.”
▲ 유년시절의 달라이라마 『유배된 자유』에서.
우리는 학교에 간다. 지식을 습득하러 학교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서울대학 입시 준비의 수단일 뿐이며, 좋은 회사 취직을 위한 방편일 뿐이다. 그 고귀한 지식들을 삶의 지혜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사는 현대인들의 병폐를 생각하면 달라이라마의 체험적 호소는 얼마나 우리가 개화기의 지식에 대한 소박한 갈망으로부터 소외되었고, 타락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깊게 반성케 한다. 우리는 지혜롭기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을 통하여 지혜에 도달한 위대한 지성인들의 모습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인의 큰 병일 것이다.
“티벹의 승려들은 근대적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까?”
“도올선생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얼마나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티벹인민들의 교육과정은 상당히 근대화되어 있고 또 영어를 필수로 삼고 있습니다. 나는 네루의 도움을 잊지를 못합니다. 네루는 중국과의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 티벹의 입장에서 본다면 섭섭한 결정도 많이 내렸지마는, 그는 우리 망명정부가 인도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민족의 교육이 구원한 장래를 위하여 가장 우선적 문제라고 하면서 교육을 위한 기본설비를 지원해주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생각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티벹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인도라는 문명의 토양이 아니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계 어느 곳에서 인도와 같이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고 또 아주 본질적으로 관용의 품을 허락하는 곳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영어라는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라는 언어매체를 통해서 표현된 인간의 생각과 그 생각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습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와 관련된 사고방식이나 습관, 기호까지도 같이 묻어 들어오게 됩니다. 즉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영어마인드를 배운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영어마인드와 나의 전통적 마인드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영어를 배우면서 이러한 갈등에 몹시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문제상황이 항상 나의 정신적 씨름판에 등장해 있었습니다. 진정한 잉글릿쉬마인드의 교육은 티벹마인드를 파괴시킬 수도 있고, 티벹 멘탈리티의 순수성을 교란시킬 수도 있으며, 또 그러한 지식의 업장에 인간이 희생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진정으로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고유한 티마인드를 지킬 줄 아는 자만이 미래의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는 해외에서 공부하는 티벹 학승들이 길 잃고 타락하는 사례들도 소개했다. 그리고 오만의 업장에 가리어 본연의 순수성을 잃는 사례도 없지 않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티벹의 미래는 인류사의 보편적 흐름에 참여하는 근대국가의 구축이며, 그러한 근대국가의 구축은 전적으로 근대적 교육에 의존한다는 것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종교는 개인의 선택의 대상이지만 문화는 개인의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티벹인민들이 어떠한 종교를 선택하든지간에 그것은 그들의 개인의 실존적 결단이나 사적인 취향의 문제로 귀결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티벹인이 기독교도가 되어도 좋고 이슬람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자유를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뿌리깊은 불교문화가 전통과 관습으로서 배어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존의 관계그물입니다. 나는 우리민족이 아무리 근대화되고 도올선생께서 말씀하신 대로 잉글릿쉬마인드의 포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불교문화는 계속 이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 취침 전에 경전을 암송하는 꼬마 스님들, 자려다가 내가 들어가 사진 좀 찍자하니까 구찮아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열심히 포즈를 취해주었다. 명랑하기 그지없었다. 보드가야에서.
인도야말로 세계의 중심
달라이라마는 하나의 군주로서 볼 때에도 정말 개명한 군주였다. 마음이 열려있고 부패하지 않았으며 모든 도전 속에도 명랑한 자신감을 잃지 않는 그런 인간이었다. 그는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돌리려는 듯 엉뚱한 질문을 했다.
“도올선생은 인도에 처음 오신 겁니까?”
“네, 처음입니다. 성하 덕분에 꿈에만 그리던 환상의 인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참 많은 것을 느끼셨겠군요. 우리 티벹인들은 인도를 아랴부미(Aryabhumi)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땅(the Land of the Holy)이라는 뜻이지요. 나 역시 인도에 한번 스쳐 오는 것을 등에 그쳤습니다. 제가 인도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1956년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감회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라즈가트(Rajghat. 간디의 화장터)에서 느겼던 아힘사(Ahimsa, 불살생ㆍ비폭력 저항은 등 의 전을은 제 인생을 더받치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올선생께서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동경에 유학하고 있을 때 미국을 여행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레이하운드 뻐스에 몸을 싣고 필라델피아를 떠났는데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어둠이 깊게 깔린 맨하탄 한복판으로 뻐스가 진입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눈을 뜨게 되었는데 제 눈에 비친 맨하탄의 야경은 정말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경외감이었습니다. 코앞을 스쳐 지나가는 위압적인 마천루들의 음영은 정말 거대한 레바이아탄(leviathan)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노자의 말을 빌어 인간의 유위(有爲)의 장난이 이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니! 라는 감회를 발하는 한시를 한 수 지었습니다. 저는 유위를 싫어하는 자연주의자였지만, 맨하탄이라는 유위의 극치를 매우 심미적으로 경탄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받은 가장 경이로운 느낌은 무위(無爲)와 유위(有爲)의 공존이 주는 격렬한 콘트라스트였습니다. 인도처럼 태고의 무위와 최첨단의 유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상상키 어려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인도문명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의 극한태를 다 공유하고 용해하는 희한한 힘을 가진 문명인 것 같습니다.”
“참 재미난 표현이군요.”
“저는 아시아대륙의 극동변방의 조그만 반도에서 태어났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암암리 자기가 태어난 문명이 세계문명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려서부터 본 세계지도는 태평양이 가운데 놓여있고 한국이 그 중심에 놓여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세계는, 한국이 직접적으로 속한 중국황하문명과 이 문명에 가장 큰 도전을 던진 그레코-로망 중심의 서구문명, 이 두 문명권을 동양과 서양이라는 개념으로 묶어 인류사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세계였습니다. 이러한 동ㆍ서양이라는 좁은 개념의 세계인식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요번 저의 인도여행은 너무도 다른 세계인식의 가능성을 저에게 피부로 와닿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인도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최소한 그러한 시각에서 이 세계를 바라볼 때 훨씬 더 유용하고 다양한 세계인식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고생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코끼리가 인도대륙에 있는 것을 예로 들어, 아주 옛날에는 인도대륙과 아프리카대륙이 하나로 붙어있었다가 점점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종적으로도 코카소이드(Caucasoid), 몽골로이드(Mongoloid), 오스트랄로이드(Australoid), 니그로이드(Negroid)의 4대 인종이 다양하게 섞여 인종박물관과 같은 느낌을 주고, 언어도 기어슨경(Sir George Gierson, 1851~1941)의 써베이에 의하면 723개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크게 나누면, 드라비다어족(Dravidia), 인도-이라니안어족(Indo-Iranian), 남아어족(Austro-Asiatic), 한장어족(Sino-Tibetan)으로 대별됩니다. 인도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언어만 해도 15개가 됩니다【남방의 5대 언어문화권: 1) Tamil 2) Kannada 3) Malayālam 4) Telugu 5) Orivā 그리고 북방의 10대 언어문화권: 1) Assamese 2) Bengali 3) Gujarātī 4) Hindī 5) Kashmīrī 6) Marāțhī 7) Punjābī 8) Sanskrit 9) Sindhī 10) Urdū.】. 종교도 힌두교, 쟈이나교, 불교, 시크교,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조로아스터교(배화교) 등이 그 뿌리로부터 이 토양에서 성장해왔습니다. 기독교만 해도 예수의 사도인 도마가 AD 52년에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저는 요번 여행을 통해 인도문명을 새롭게 탐구하게 되었고, 새로운 세계사의 인식에 도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크나큰 소득입니다. 누에가 고치를 벗어버리고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듯한 해방감을 인도에서 느꼈습니다.”
“도올선생님같이 다양한 문명과 언어의 체험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아마도 그러한 느낌은 매우 리얼하고 또 타인보다 훨씬 더 증폭되어 나타났을 것입니다. 불교유적을 보시면서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궁금하군요.”
달라이라마는 정말 무한한 호기심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남의 말을 참으로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었다. 언젠가 나는 테레비 강연 속에서 우리말의 성인(聖人)이라는 표현에 귀 이(耳)변이 있는 것을 들어, 성인이란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달라이라마는 정말 귀가 열린 성인이었다. 불교유적에 관한 나의 소감이 뭐 그리 들을 만한 게 있을까보냐마는 그는 내가 말을 야물야물 재미있게 잘 해서 그런지 계속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 델리 라즈가트에 참배하고 있는 필자,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비폭력주의에 대한 간디의 헌신이야말로 정치적 해결의 유일한 길을 예시했다고 확신했다.” 『유배된 자유』에서
인용
'고전 > 불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 대담 2일차, 불교와 심리학 (0) | 2022.03.14 |
|---|---|
|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 대담 1일차, 3. 석굴과 성상주의 (0) | 2022.03.14 |
|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 대담 1일차, 1. 불교와 기독교 (0) | 2022.03.14 |
|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 만나기까지, 4. 인도 기행기 (0) | 2022.03.13 |
|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 만나기까지, 3. 스투파와 탑 (0) | 2022.03.13 |